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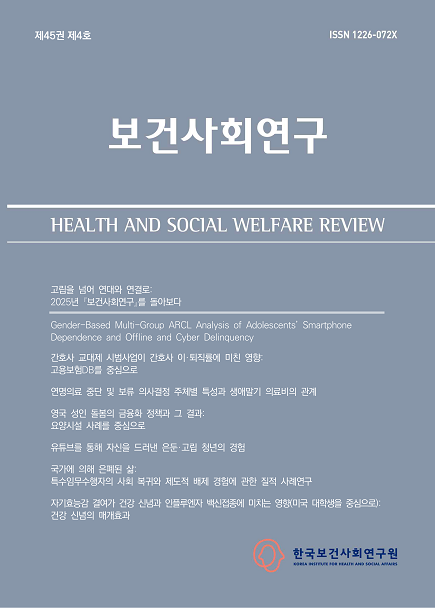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한국남성의 흡연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
Smoking Patterns of Korean Male Smokers over 9 Years
Park, Hyunyong
보건사회연구, Vol.37, No.4, pp.269-293, December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4.269
Abstract
Smoking and their related negative impacts o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re important health issues, as well as social problems. This is because smoking and their negative impacts are considered the preventable disease.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longitudinal patterns of smoking behaviors among Korean male smoker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mployed Repeated Measure Latent Class Analysis (RMLCA) to explore the longitudinal smoking patterns of 4,527 Korean male smokers. This study utilized the 2008-2016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to examine longitudinal smoking pattern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We identified five groups of smokers who had similar smoking behaviors patterns: (1) Consistent smokers (47.2%), (2) consistent former smokers (33.2%), (3) early quitter (7.0%), (4) late quitter (7.5%), and (5) relapser (5.0%).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e.g., levels of depression, drinking) were associated with identified latent groups. Findings highlight the five distinct patterns of smoking behaviors over 9 years and their association with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Findings can be useful for practitioners to make tailored interventions based on their profile.
초록
흡연은 개인과 다른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예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보건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하지만, 일반 남성 흡연자들의 장기적인 흡연행동에 대한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복측정 잠재계층모형을 활용하여 일반 남성 흡연자들의 흡연행동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2008~2016년까지의 9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흡연자의 흡연행동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였다. 잠재계층 분석결과로 (1) 지속적 흡연자(47.2%), (2) 지속적 금연자(33.2%), (3) 초기 금연자(7.0%), (4) 늦은 금연자(7.5%), (5) 재흡연자(5.0%)의 다섯 개의 잠재그룹이 도출되었다. 또한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임상적 특성들이 이러한 흡연행동 변화패턴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남성 흡연자의 장기적인 흡연 패턴을 규명하고 관련 요인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각 잠재집단에 적합한 금연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Ⅰ. 서론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은 1998년 35.1%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5년 만 19세 이상 성인의 22.6%가 흡연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특히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흡연은 개인과 다른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경제적 손실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흡연은 암, 심혈관계 질환, 당뇨 그리고 폐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흡연관련 사망자 수가 5만 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정금지, 윤영덕, 백수진, 지선하, 김일순, 2012),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3년 7조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이선미, 윤영덕, 백종환, 현경래, 강하렴, 2015). 특히 흡연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보건 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흡연자들 중 다수가 매년 금연에의 의지를 보이거나 금연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enter for Disease Control[CDC], 2002; Hymowitz, Cummings, Hyland, Lynn, Pechacek, & Hartwell, 1997).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흡연자 중 매년 절반이상(2013년 기준 57.5%)이 금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이처럼 흡연자의 다수가 금연을 원하고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연에 성공하는 흡연자의 비율은 5%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Fiore et al., 2008). 선행연구들에서는 흡연자들이 금연을 한 번에 성공하기보다는 여러 번 금연과 흡연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금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다(Chaiton et al., 2016). 예를 들면, 흡연자들은 일반적으로 8-14회 정도의 금연시도를 한 이후에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tion et al., 2016; DHHS, 2014). 즉 흡연행동은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흡연행동의 장기적인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것은 성인의 흡연 혹은 금연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연 성공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성공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대다수였다(김희숙, 배상수, 2011; 송태민 등, 2008; 이군자, 장춘자, 김명순, 이명희, 조영희, 2006). 하지만 이주열(2005)의 연구에 따르면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흡연자 중의 극히 일부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 클리닉에 방문하는 성인들의 금연에의 의지가 금연 클리닉에 방문하지 않는 일반 성인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일반 성인남성의 흡연행동 변화양상을 살펴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금연클리닉에 기반을 둔 선행연구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후 금연 성공 여부를 비교하여 프로그램 참여 직후나 3개월 혹은 6개월 후의 금연 여부를 측정하고 있어 단기간의 금연 성공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즉, 상대적으로 소수의 연구들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의 흡연행동의 종단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손선주, 2013; 이재상, 강신명, 김형진, 이경연, 조비룡, 고유라,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금연 클리닉에 방문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성인 남성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흡연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성인 남성 흡연자의 흡연행동에 있어서 잠재적인 변화패턴이 존재하는가?
둘째, 이러한 잠재적인 흡연행동 변화패턴과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임상적 특성들이 연관되어 있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개인의 흡연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흡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및 흡연 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임상적 특성들이 흡연행동 및 흡연행동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흡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선행연구들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흡연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김혜련, 2007; Broms et al., 2003; Cho, Khang, Jun & Kawachi, 2008; Fiore, Bailey & Cohen, 2000; Levy, Romano, & Mumford, 2005). 예를 들면, Cho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미혼 혹은 이혼/별거/사별과 같이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흡연보다는 금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련, 2007; Levy et al., 2005). 추가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흡연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된다(Messer et al., 2008; Levy et al., 2005). 예를 들어, Levy 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금연시도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연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연령, 혼인상태, 그리고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서 흡연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임상적 특성
흡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더불어 개인의 임상적 특성들이 금연시도와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 및 자아존중감, 음주행동, 그리고 흡연관련 특성(첫 흡연연령, 하루흡연량)들이 금연시도 및 금연성공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다(Bobo & Husten, 2000; Hymowitz et al., 1997; Nichter, Carkoglu, Lyoyd-Richardson, 2010; Stepankova et al., 2017; Weinberger et al., 2016).
선행연구들에서는 높은 수준의 우울과 흡연행동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고하였다(Weinberger et al., 2017). 예를 들면, 우울수준이 높은 개인이 우울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흡연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울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금연시도를 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lassman et al., 1990). 또한 Stepankova 등(2017)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금연시도를 어렵게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금연시도 자체가 개인의 우울증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전진아, 박현용, 손선주(2012)의 우울증의 변화패턴과 흡연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우울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집단과 비교하여 우울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집단이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흡연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우울수준과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중요한 예측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Strecher, Devellis, Becker, & Rosenstock, 1997). 자아존중감은 금연시도 및 금연 성공여부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기존 연구들에서 간주되고 있다(Abernathy, Massad, & Romano-Dwyer, 1995; Gibbons, Eggleston, & Benthin, 1997). 즉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금연시도를 하기 위한 개인의 실행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금연시도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Saari, Kentala, Mattila(2015)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상대적으로 규칙적으로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Gibbons 등(199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금연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행동 역시 흡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고 기존 선행연구들은 보고한다(Acosta et al., 2008; Bobo & Husten, 2000). 예를 들면, 음주를 하는 사람보다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흡연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King과 Epstein(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 흡연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흡연욕구의 증가가 흡연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흡연자의 흡연행태적 특성이 흡연행동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한다(송태민, 이주열, 2009; Bondy et al., 2013; Hymowitz et al., 1997). 예를 들면, 하루 평균 흡연량이 많은 개인의 경우에 금연을 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ymowitz et al., 1997). 또한 금연 클리닉에 방문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루 평균 흡연량이 많은 개인들의 장기적 금연성공률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태민, 이주열, 2009). 이러한 결과는 하루 평균 흡연량이 많은 개인의 경우 높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의존으로 재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Weinberger et al., 2017).
2. 흡연행동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
흡연행동의 변화를 종단으로 살펴본 국내외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흡연행동 또는 금연행동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들은 금연클리닉에 방문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의 금연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김희숙, 배상수, 2011; 송태민 등, 2008; 이군자, 장춘자, 김명순, 이명희, 조영희, 2006).
일부 연구들에서 성인의 흡연행동의 변화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조사하였다. Bondy 등(2013)의 연구는 Ontrario Tobacco Survey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4,355명의 흡연자들의 3년간의 흡연행동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매일 흡연자들(daily smokers)의 83% 정도가 흡연행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간헐적 흡연자(occational smokers)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연과 흡연을 반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년의 걸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흡연 및 음주 행동의 변화를 살펴본 Paavola 등(2004)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흡연행동이 청소년기 초기에 형성이 되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흡연자들의 흡연행동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로써 일부 국내 연구들이 있다(손선주, 2012; 송태민, 이주열, 2009; 이재상 등, 2008). 손선주(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흡연자들의 3년 동안의 흡연량의 변화를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비슷한 성장모형을 보이는 여성흡연자들의 집단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두 개의 여성흡연자 잠재집단을 확인하였으며, 두 집단의 흡연량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형태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상 등(2008)의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검진센터에 방문한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9년간의 흡연행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금연기간이 길어질수록 재흡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다양한 흡연행태관련 요인들(하루 평균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등)이 금연행동의 지속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은 금연 클리닉이나 병원에 방문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반 성인 남성들의 흡연행동 지속여부 혹은 금연행동 지속여부에 대한 장기적인 추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행동 변화 추이를 종단으로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손선주, 2012). 또한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의 흡연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의 흡연행동의 변화에 대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또한 국내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대부분은 인간중심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중 잠재성장모형 혹은 잠재계층성장모형 등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성인의 흡연량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손선주, 2012). 예를 들어, 손선주(2012)의 연구는 성인 여성흡연자의 흡연량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하루 평균 흡연량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연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유무(금연여부)와 같이 흡연 행동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s)를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단계적인 발달(discontinous development)을 확인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으로써 반복측정 잠재계층분석(Repeated Measure Latent Class Analysis)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행동의 단계적인 변화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성에 비해 남성의 흡연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성인 중 남성에 초점을 두어 반복측정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한국 성인의 금연행동 변화 패턴의 잠재적 하위집단들을 파악하고 그룹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우울수준, 자아존중감, 음주행동, 흡연량이 금연행동 변화 패턴의 잠재적 하위집단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로써 흡연행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이 추가된 2008년도부터 2015년 사이의 9개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는 한국의 복지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의 가구 정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학력, 소득, 직업 등),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실태,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표본은 2008년을 기준으로 총 12,191명의 개인 자료 중 (1) 2008년 당시 만 19세 이상 남성으로 (2)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따라서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하였으며 현재도 흡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총 4,527명의 성인 남성이다.
2. 변수
가. 흡연행동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반복측정 잠재계층 분석에 사용된 변수
흡연행동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반복측정 잠재계층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현재 흡연여부이다. 본 연구에서 2008년 당시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흡연 여부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2008년도부터 11차 년인 2015년까지 사용된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예=1, 아니오=2)으로 측정되었다. 총 9개 년도의 현재흡연 여부가 반복측정 잠재계층분석에 포함되었다.
1) 우울수준
우울수준에 대한 변수는 한국복지패널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11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한국판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CES-D1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ES-D11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CES-D11은 성별 및 연령집단사이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만세, 박병선, 배성우, 2015). CES-D11은 지난 1주일간 우울증상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4점 척도(극히 드물다=0에서 대부분 그랬다=3)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진다”와 같은 질문들로 CESD-11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비교적 잘 지냈다”와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의 두 질문은 역코딩을 하였다. CESD-11은 이전 연구들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강상경, 권태연, 2008; 전진아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CESD-11의 총점을 통하여 우울의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우울수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ESD-11의 신뢰도는 0.85로 나타났다.
2) 자존감
자존감에 대한 변수는 한국복지패널에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와 같은 5개의 긍정적인 질문들과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와 같은 5개의 부정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응답은 4점 척도(1=대체로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된 5개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0.74로 나타났다.
3) 하루 평균 흡연량
하루 평균 흡연량에 대한 변수는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세 개의 범주(10개비 미만=1, 20개비 이하=2, 21개비 이상=3)로 나누어서 사용하였다. 특히, 분석에서는 10개비 미만을 피우는 것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다항로지스틱 모델에 투입하였다.
4) 음주여부
음주여부에 대한 변수는 “귀하는 지난 1년간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이분형 변수로 변환하여 지난 1년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0)과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사람으로(1) 구분하였다.
5)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 소득수준 의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령은 설문조사의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만나이로 계산하였다. 학력은 3개의 범주(고등학교 이하=0, 고등학교 졸업=1, 고등학교 졸업 이상=2)로 나눈 후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 다. 혼인상태는 결혼(1)과 비결혼(0)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수준 변수는 연가구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일반가구(0)와 저소득가구(1)로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반복측정 잠재계층분석(Repeated Measure Latent Class Analysis [RMLCA])를 활용하여 흡연행동의 변화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인간중심접근(Person-centered approaches)의 하나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활용하여 개인들을 유형화하는 접근방식이다(Collins & Lanza, 2010). 특히 반복측정 잠재계층분석은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s)들을 활용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단계적인 발달(discontinuous development)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접근 방식이다(Lanza & Collins, 2006). 따라서 흡연여부라는 범주형 변수를 활용하여 종단적인 흡연행동의 변화패턴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계층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최적의 잠재계층의 수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계층의 수를 2-, 3-, 4-, 5-, 6-계층의 순으로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적절한 잠재계층 수를 정하기 위하여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djusted BIC, 엔트로피(Entropy) 및 Lo-Mendell-Rubin Adjusted Liklihood Ratio Test(LMRT)의 값을 비교하였다. AIC, BIC, Adjusted BIC들은 상대적인 모델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값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좋은 모델로 판단된다. 엔트로피의 값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각 계층이 동질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이 잠재그룹에 정확하게 분류되었음을 나타낸다. LMRT의 경우는 계층의 수가 다르게 추정된 모델 두 개를 비교하여 어느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지를 알려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LMRT 결과는 하나 적은 수의 계층을 추정한 잠재계층모형이 더 적합함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각 잠재그룹별로 평균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ies)과 정분류율(Odds of Correct Classification [OCC])값을 확인하였다. Nagin(2005)에 따르면, 각 잠재계층별로 평균 사후확률이 .7이상이고 OCC값의 경우에는 5이상인 것을 추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수의 잠재계층모델들 간의 조건부 응답확률에 대한 의미와 실용적인 함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종 잠재계층수를 정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모형검정치 통계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조건부 응답확률을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흡연행동 변화에 있어서 잠재집단간의 질적인 차이를 살펴보았다(Collins & Lanza, 2010). 또한 흡연행동의 변화패턴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 잠재계층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흡연행동변화 패턴과 인구사회학적인 및 임상적 특성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은 Asparouhov와 Muthen(2014)이 제안한 3-Step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모형 분석을 통하여 개인들을 각 잠재계층으로 할당하여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을 측정변수(Manifest variable)처럼 변화시키고 일원배치변량분석(ANOVA) 혹은 다항로지스틱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는 방식을 통하여 잠재변수와 관련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관련성을 살펴보았다(Asparouhov & Muthen, 2014; Jung & Wickraman, 2008).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잠재변수를 측정변수처럼 다루기 때문에 일정정도 비판이 받아왔다. 또한 확인된 잠재계층변수를 설명하는 공변량 변수들(Covariates)을 잠재계층분석에 동시에 투입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공변량 변수의 영향으로 각 잠재계층의 비율이 변화하는 하는 등 기존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Asparouhov & Muthen, 2014). 따라서 잠재계층의 이동(shifting)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3-step 접근법을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기초적인 분석을 위하여 SAS버전 9.4 (Cary, NC, USA)를 활용하였으며, 반복측정 잠재계층분석과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Mplus (버전 7.4)를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수준, 자아존중감, 평균 흡연량 및 음주여부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총 4,527명의 가중치 적용 전 표본의 평균연령은 52.3(SD=17.1, 최저=19, 최고=96)로 과반수(74.8%) 이상이 결혼한 상태로 나타났다. 약 41%의 표본이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특성으로 흡연 남성의 14.6%의 매일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약 15%의 남성이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08년도 전체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성들(N = 4,527)
| Unweighted | Weighted | |||
|---|---|---|---|---|
|
|
|
|||
| n | % | % | M (SE) | |
|
|
||||
| 연령, M(SD) | 51.5 | (16.6) | 46.2 (0.24) | |
|
|
||||
| 학력 | ||||
| 고등학교 졸업 미만 | 1,699 | (40.8) | (23.9) | |
| 고등학교 졸업 | 1,787 | (37.7) | (44.0) | |
| 대학교 이상 | 1,041 | (23.0) | (32.1) | |
|
|
||||
| 혼인상태 | ||||
| 결혼 | 3,373 | (74.8) | (73.4) | |
| 별거/이혼/사별 | 403 | (8.9) | (6.6) | |
| 미혼 | 734 | (16.3) | (20.0) | |
|
|
||||
| 연가구소득 60% 이하 | 1,476 | (32.6) | (19.0) | |
| CESD-11, M(SD) | 4.6 | (5.1) | 4.1(0.08) | |
| 자존감, M(SD) | 30.1 | (4.3) | 30.7(0.07) | |
|
|
||||
| 평균흡연량 (일일 평균) | ||||
| 반갑 이하(10개피 이하) | 1,606 | (35.6) | (36.5) | |
| 한갑 이하(20개피 이하) | 2,247 | (49.8) | (50.1) | |
| 한갑 이상(20+ 개피) | 660 | (14.6) | (13.4) | |
|
|
||||
| 음주여부(예) | 879 | (19.4) | (14.5) | |
2. 흡연행동 변화패턴
적절한 수의 잠재계층을 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의 수를 2에서부터 7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잠재계층의 수에 따른 모델의 적합도(Model fit statistics)를 확인하였다. <표 2>는 각 잠재 계층의 숫자별 모델의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AIC, BIC, Adj. BIC 값들은 6계층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반면, Entropy와 LMR-LRT 값은 5계층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5계층 모델과 6계층 모델 모두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ies), OCC 값, 그리고 각 잠재계층의 의미 및 실용적 특성(예를 들면, 가장 작은 그룹의 비율)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단순히 모델의 적합도와 분류의 정확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확인된 잠재그룹들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특히 5계층 모델과 6계층 모델을 비교할 경우에, 5계층 모델의 재흡연 그룹이 6계층 모델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면서, 전체적인 비율이 5% 미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5계층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모형 검정치 통계(Model fit statistics)
| 2 Class | 3 Class | 4 Class | 5 Class | 6 class | 7 class | |
|---|---|---|---|---|---|---|
| AIC | 22,218 | 20,891 | 20,522 | 20,265 | 20,194 | 20,154 |
| BIC | 22,340 | 21,077 | 20,773 | 20,580 | 20,573 | 20,597 |
| Adj. BIC | 22,279 | 20,985 | 20,649 | 20,424 | 20,386 | 20,378 |
| Entropy | 0.93 | 0.85 | 0.81 | 0.83 | 0.82 | 0.82 |
| LMRT | <.001 | <.001 | 0.004 | 0.001 | 0.419 | 0.765 |
<표 4>은 5계층 모델의 각 연도별 흡연 유무의 조건부 응답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조건부 응답확률을 확인한 후, 5개의 잠재계층 집단에 대해서 발달단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름을 부여하였다. 발달단계적 특성을 고려한 각 잠재계층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 흡연자 집단 (n=2,318, 51.2%), (2) 지속적 금연자 집단(n=1,556, 34.4%), (3) 흡연에서 금연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집단(n=222, 4.9%), (4) 흡연에서 금연으로 변화하는 두 번째 집단(n=250, 5.5%), 그리고 (5) 재흡연자(n=182, 4.0%)로 구분되었다. [그림 1]은 조건부 응답확률을 바탕으로 한 종단적인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행동 변화의 추이를 보여준다. <표 3>과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약 80% 정도의 남성의 흡연행동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14% 정도의 성인 남성들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초기에는 흡연을 하고 있었으나 금연하는 형태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5% 정도의 남성이 금연과 흡연에 대한 확률이 .5에 가까운 상태에서 흡연과 금연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서히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이를 볼 수 있다.
표 3
잠재계층의 조건부 응답확률(5개 그룹)
| Class 1 늦은 금연자2 | Class 2 재흡연자 | Class 3 지속적 흡연자 | Class 4 지속적 금연자 | Class 5 초기 금연자1 | |
|---|---|---|---|---|---|
|
|
|
|
|
|
|
| (7.5%) | (5.0%) | (47.2%) | (33.2%) | (7.0%) | |
|
|
|||||
| 흡연(예) T1 | .90 | .46 | .98 | .07 | .90 |
|
|
|||||
| 흡연(예) T2 | .90 | .36 | .98 | .02 | .87 |
|
|
|||||
| 흡연(예) T3 | .98 | .52 | .97 | .03 | .61 |
|
|
|||||
| 흡연(예) T4 | .91 | .49 | .97 | .02 | .32 |
|
|
|||||
| 흡연(예) T5 | .99 | .48 | .96 | .01 | .06 |
|
|
|||||
| 흡연(예) T6 | .78 | .53 | .96 | .00 | .03 |
|
|
|||||
| 흡연(예) T7 | .54 | .58 | .96 | .01 | .04 |
|
|
|||||
| 흡연(예) T8 | .01 | .53 | .93 | .00 | .02 |
|
|
|||||
| 흡연(예) T9 | .11 | .58 | .91 | .01 | .03 |
표 4
흡연 행동 패턴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우울수준, 자존감, 그리고 음주유무
| 흡연-금연 그룹 1 vs 지속적 흡연그룹 (ref) | 재흡연 그룹 vs 지속적 흡연그룹 (ref) | 지속적 금연그룹 vs 지속적 흡연그룹 (ref) | 흡연-금연 그룹 2 vs 지속적 흡연그룹 (ref) | |||||
|---|---|---|---|---|---|---|---|---|
|
|
|
|
|
|||||
| OR | 95% CI | OR | 95% CI | OR | 95% CI | OR | 95% CI | |
|
|
||||||||
| 연령 | 1.02 | (1.00, 1.04) | 1.03 | (1.00, 1.06) | 1.08 | (1.07, 1.09) | 1.06 | (1.04, 1.08) |
|
|
||||||||
| 학력(Ref=대학 이상) | ||||||||
| 고등학교 미만 | 0.80 | (0.4, 1.59) | 0.32 | (0.13, 0.8) | 0.49 | (0.36, 0.68) | 0.69 | (0.36, 1.29) |
| 고등학교 졸업 | 0.89 | (0.53, 1.51) | 0.37 | (0.19, 0.74) | 0.69 | (0.53, 0.89) | 0.70 | (0.42, 1.16) |
|
|
||||||||
| 혼인상태(결혼) | 1.17 | (0.66, 2.08) | 1.40 | (0.66, 2.99) | 1.61 | (1.23, 2.11) | 1.19 | (0.70, 2.05) |
| 가구소득 60% 미만 | 0.86 | (0.50, 1.49) | 0.91 | (0.47, 1.76) | 0.92 | (0.71, 1.18) | 0.89 | (0.52, 1.54) |
| CESD-11 | 0.99 | (0.93, 1.06) | 0.99 | (0.93, 1.05) | 0.97 | (0.95, 0.99) | 1.00 | (0.96, 1.05) |
| 자아존중감 | 1.00 | (0.93, 1.07) | 1.04 | (0.97, 1.12) | 1.03 | (1.00, 1.06) | 1.03 | (0.98, 1.08) |
| 음주여부(예) | 1.46 | (0.69, 3.12) | 0.47 | (0.23, 0.99) | 0.55 | (0.41, 0.72) | 1.24 | (0.62, 2.51) |
|
|
||||||||
| 평균흡연량(ref=반갑 이하) | ||||||||
| 흡연량 10~20개피 | 0.79 | (0.49, 1.26) | 0.40 | (0.22, 0.74) | 0.50 | (0.4, 0.64) | 0.42 | (0.27, 0.65) |
| 흡연량 20 + | 0.59 | (0.28, 1.27) | 0.52 | (0.23, 1.19) | 0.71 | (0.53, 0.97) | 0.16 | (0.07, 0.39) |
<표 4>는 지속적 흡연자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적 흡연자 집단과 비교하여 연령이 높을수록(OR=1.08, 95% CI=1.07-1.09), 학력이 높을수록(고등학교 미만일 경우 OR=0.49, 95% CI=0.36-0.68;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 OR=0.69, 95% CI=0.53-0.89), 혼인상태일수록 (OR=1.61, 95% CI=1.23-2.1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OR=1.03, 95% CI = 1.00-1.06), 우울수준이 낮을수록(OR=0.97, 95% CI=0.95-0.99), 음주하지 않을 경우(OR=0.55, 95% CI=0.41-0.72), 그리고 하루 평균 흡연량이 적을수록(흡연량 반갑에서 한갑 사이 OR=0.50, 95% CI = 0.40-0.64, 흡연량 한갑 이상 OR=0.71, 95% CI = 0.53-0.97) 지속적 금연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흡연 집단과 지속적 흡연집단의 비교결과, 연령이 높을수록(OR=1.03, 95% CI=1.00-1.06), 학력이 높을수록(고등학교 미만일 경우 OR=0.32, 95% CI=0.13-0.80;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 OR=0.37, 95% CI=0.19-0.74),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OR=0.47, 95% CI=0.23-0.99), 하루 평균 흡연량이 적을수록(흡연량 반갑 이하 OR=0.40, 95% CI=0.22-0.99) 재흡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흡연에서 금연으로 변화하는 그룹과 지속적 흡연집단의 비교를 살펴보면 그룹의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금은 일찍 흡연에서 금연으로 변화하는 집단과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OR=1.06, 95% CI=1.04-1.08), 하루 평균 흡연량이 낮을수록(반 갑 이하 OR=0.42, 95% CI=0.27-0.65, 한 갑 이상 OR=0.16, 95% CI=0.07-0.39) 상대적으로 초기에 금연을 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속적 흡연집단과 상대적으로 금연을 나중에 시작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임상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표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금연자 집단과 비교하여 연령이 낮거나(초기 금연자: OR=0.98, 95% CI=0.96-0.999. 후기 금연자: OR=0.95, 95% CI=0.93-0.97) 음주를 하고 있는 경우(초기 금연자: OR=2.28, 95% CI=1.18-4.40. 후기 금연자: OR=2.67, 95% CI=1.32-5.40) 초기 또는 후기 금연자 집단들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 금연자 집단과 재흡연 집단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임상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기에 금연을 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나중에 금연을 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9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흡연자의 흡연행동의 종단적인 패턴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흡연자들에게 장기적인 흡연(금연) 행동에 일정한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각 계층을 유형화하였으며, 이 잠재계층들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및 임상적인 특성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측정 잠재계층집단분석을 통해 성인 남성의 흡연행동 패턴의 하위 집단들을 파악하였다. 약 80%정도의 성인 남성은 흡연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행동이라는 것이 청소년기에 형성되고 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Bondy et al., 2013; Paavola et al., 2004). 특히 본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50% 정도가 다년간에 걸쳐서 흡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기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부 성인 남성(14%)이 흡연에서 금연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전반적으로 흡연인구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낮은 비율이지만 5%의 성인남성이 재흡연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행동의 변화에 있어서 금연을 지속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흡연-금연행동을 반복하는 복잡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hiton et al., 2017).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임상적 특성들과 반복측정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나타난 흡연행동 패턴 간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들이 흡연행동의 변화패턴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속적 금연집단과 지속적 흡연집단의 경우에 선행연구들이 보고하는 영향 요인들과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령이 높을수록(Levy et al., 2005), 학력이 높을수록(김혜련, 2007), 혼인상태일수록(Cho et al., 2008),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Abernathy et al., 1995), 음주을 하지 않을 경우(King & Epstein, 2005), 우울수준이 낮을수록(Weinberger et al., 2016), 하루 평균 흡연량이 적을수록(송태민, 이주열, 2009) 지속적 흡연집단보다는 지속적 금연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흡연집단과 상대적으로 늦은 금연자 집단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임상적 요인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임상적 특성 변수들이 2008년도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속적 금연집단과 재흡연 집단의 경우에 초기에는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반대로 초기에 지속적인 흡연집단과 상대적으로 나중에 금연을 하는 집단은 초기의 임상적 특성들이 유사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른 임상적 특성들이 차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면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들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의 학술적 및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지역사회거주 일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흡연행동을 추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금연클리닉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후를 살펴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일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9년간의 흡연행동 패턴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특히 기존의 횡단 연구들에서의 한계였던 시간에 따른 흡연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흡연행동의 변화패턴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손선주(2012)의 연구에서 하루 평균 흡연량을 중심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것과 달리 범주형 변수인 흡연여부를 바탕으로 금연 정책에의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종단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흡연행동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거의 발생하지는 않는 그룹과 흡연에 있어서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집단들의 확인하였다. 약 80%가 흡연행동에 변화가 없는 집단, 즉 지속적 흡연자(33.2%)이거나 지속적 금연자(47.2%)인 반면 일부는 흡연자였다가 금연자가 된 경우(14.5%), 금연을 했다가 다시 흡연자가 된 경우도(5.0%) 나타났다. 특히, 흡연자에서 금연자로 변화하는 집단의 경우 이른 시기에 금연을 시도하는 집단과 조금 늦게 금연을 시도하는 집단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흡연을 하게 되는 흡연자들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연정책 프로그램들이 그룹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령이 낮은 집단,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우울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 음주자 및 흡연량이 많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금연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흡연과 음주, 흡연과 우울, 자존감간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음주와 흡연행동을 같이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홍보나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나 직장을 기반으로 실행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같은 학술적, 실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흡연여부를 묻는 질문이 자기기입식 질문으로, 응답자가 실제로 흡연을 하고 있지만, 흡연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흡연행동에 대한 측정 방식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한 문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단순하게 흡연행동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흡연의 행동변화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확인을 하였지만, 그 측정기간간의 차이가 다소 긴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금연시도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특정한 개입(금연 클리닉, 금연 패치) 등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그러한 금연보조제 혹은 금연관련 프로그램의 참석여부에 관한 변수들이 추가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잠재적인 흡연행동의 변화패턴이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라서 흡연행동의 변화패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상적 특성에 관련된 변수들의 경우 2008년도를 기준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흡연행동의 변화와 관련하여 관련 임상적 특성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면, 2008년의 임상적 특성들(우울수준 혹은 자존감 수준)을 가지고 9년 후의 흡연행동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약간의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차후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량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일반 성인 흡연자의 흡연행동 변화를 상대적으로 긴 9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규명하고, 그 흡연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역시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성인 남성의 장기적 흡연 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각 대상 집단에 적합한 금연 정책 및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이 연구의 제한점을 다룰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 , , , & (2008). Characterizing early cigarette use episodes in novice smokers. Addictive Behaviors, 33(1), 106-121. [PubMed]
, , , , & (2004). Smoking cessation by socioeconomic status and marital status: The contribution of smoking behavior and family background. Nicotine & Tobacco Research, 6(3), 447-455. [PubMed]
, , , & (2008). Marital status and smoking in Korea: The influence of gender and age. Soc Sci Med, 66(3), 609-619. [PubMed]
, , & (1997). Cognitive reactions to smoking relapse: The reciprocal relation between dissonance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184. [PubMed]
, , , , , , & (1990). Smoking, smoking cessation, and major depression. Jama, 264(12), 1546-1549. [PubMed]
, & (2005). Alcohol dose–dependent increases in smoking urge in light smoker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9(4), 547-552. [PubMed]
, & (2006). A mixture model of discontinuous development in heavy drinking from ages 18 to 30: The role of college enrollme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7(4), 552-561. [PubMed]
, , & (2005). The relationship of smoking cessation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moking intensity, and tobacco control policies. Nicotine & Tobacco Research, 7(3), 387-396. [PubMed]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PMC]
, , , , & (2010). Smoking and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It’s a package deal”.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06(1), 16-20. [PubMed]
, , & (2004). Smoking, alcohol use, and physical activity: A 13-year longitudinal study ranging from adolescence into adulthood. J Adolesc Health, 35(3), 238-244. [PubMed]
, , , & (1986). The role of self-efficacy in achieving health behavior change. Health Education Quarterly, 13(1), 73-92. [PubMed]
(2014).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Atlanta, G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ffice on Smoking and Health.
, , , , , , et al. (2017). Depression and cigarette smoking behavior: A critical review of population-based studies.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43(4), 416-431.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10-30
- 수정일Revised Date
- 2017-12-17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12-19

- 3693Download
- 3509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