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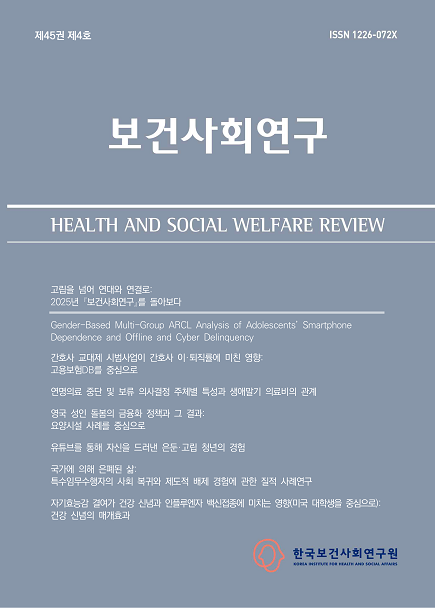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장기요양 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유지 및 이탈에 대한 영향요인: 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한 탐색
Analysis on the Staying at-Home of the Qualified Recipients of Long-Term Care for Aging in Place: Exploring Aging in Place Support
Seok, Jae Eun*; Yi, Gijoo*
보건사회연구, Vol.37, No.4, pp.5-42, December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4.5
Abstract
By adapting survival analysis on the staying at home of qualified recipients for long-term care,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clarify what factors contribute to staying at home as long as possible.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Long-Term Care Qualification Longitudinal Survey (2008-2015),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itial benefit selection and at-home survival rate.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choosing home care was higher for males, lower age group, having family caregiver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ementia, the probability of choosing institutional care was high. As a result of the life table analysis, it was found that 13.1% of the initial home care users changed to institutional care, and about 71% of the moves take place between 2 and 4 years.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analysis showed that the likelihood of withdrawal from home care was higher: for women, for older, for those living together, and for those with dementia. On the other hand, good housing conditions contributed to a higher likelihood of staying at hom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patience of family care is about two years, and it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aging in place: gender perspective, support for family caregive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community support for dementia are needed.
초록
이 논문은 장기요양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재가급여 유지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ging in Place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장기요양인정자 전체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종단조사자료(2008-2015년)를 이용하였으며, Andersen 서비스이용 행동모델을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초 급여선택 영향요인 분석결과,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수발자가 있는 경우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높은 반면,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생명표 분석결과, 초기 재가급여 이용자 중 13.1%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로 이동하는 재가 이탈자의 71%가 장기요양인정 이후 2년에서 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콕스 비례위험회귀분석을 통해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을 분석한 결과,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독거에 비해 주수발자 여부 관계없이 동거하는 경우, 치매가 있는 경우에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높았다. 반면 양호한 주거상태는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가족수발의 인내는 2년 정도이며, Aging in Place를 위해 젠더인지적 관점, 가족수발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치매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Ⅰ. 서론
Aging in Place(이하 AIP)는 전세계적으로 장기요양정책에서 존엄한 노년의 삶과 비용효율적인 사회적 돌봄을 위한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이다(Colombo et al., 2011; 2015). AIP는 노인들이 일상생활 장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자신이 살던 친숙하고 익숙한 곳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머물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임연옥, 2016; 석재은 등, 2016). 한국에서도 AIP를 장기요양정책 방향으로 삼고, 재가급여 우선원칙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2항).
AIP가 장기요양 정책방향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P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최근 AIP에 대한 조건에 대한 실증연구로 2개 논문이 발표되었다. 김수영 등(2016)은 AIP를 구성하는 조건을 이동, 주거, 건강 및 돌봄, 사회참여, 사회소통 5가지로 설정하고 고령친화조건에 대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임연옥(2016)은 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지역 환경 요인을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농촌과 도시 간에 AIP의 경로와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시도를 하였다. 두 연구는 AIP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노인들의 AIP에 대한 선호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친 것에 비해, AIP의 구성조건들을 분석하고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이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장기요양대상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들을 포괄하여 AIP를 위한 지역단위의 고령친화(age-friendly) 수준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임연옥(2016) 연구는 개인의 특성과 지역사회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AIP를 위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AIP를 위한 고령친화 생활환경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연구 모두 AIP 핵심 구성개념인 ‘노인들이 일상생활 장애에도 불구하고’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자신이 살던 친숙하고 익숙한 곳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머물며 나이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연구 모두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대상자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일상생활 장애에도 불구하고 AIP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에 어떠한 요인들이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려웠다.
한편, 연구목적에 AIP를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요양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AIP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급여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는 이가옥과 이미진(2001), 윤현숙(2001), 임정기(2008), 이윤경(2009), 이재정(2010), 한은정 등(2011)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AIP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 재가급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가급여를 선택하고 그 이후 재가급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관찰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기존에 수행되어온 장기요양 급여선택 결정요인 연구들은 AIP에서 중요한 핵심요소인 재가에 계속 머무는‘지속성’을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은정 등(2011) 연구는 비록 1년간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2009-2010년 1년간을 대상으로 재가급여 이탈 위험을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AIP의 지속성 개념을 반영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찰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아서 AIP가 실현되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 또한 한은정 등(2011)의 연구는 장기요양인정 후 최초 급여 선택시에 재가급여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분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IP에 기여하는 요인을 전면적으로 온전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수록 장기요양정책에서 ‘가능한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기(AIP)’에 대한 강조가 커지는 상황에서 AIP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AIP 개념을 온전히 반영하여 타당성있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계획되었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라는 AIP의 핵심개념에 포함된 ‘재가급여 선택’과‘재가급여 계속성(continuity)’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통해 AIP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장기요양인정 전수(全數)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AIP)’ 기여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제도시작 시점인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장기요양제도 운영기간 중 장기요양인정자의 최초 급여선택시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급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자마다 상이한 첫 급여선택 시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자의 첫 급여선택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정리하여 최초 재가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AIP를 위한 첫단계 기여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재가급여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최초 급여선택시 재가급여를 선택한 장기요양인정자 중에서 계속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또는 시설급여로 이탈하는 양상을 생명표 분석(life table analysis)을 통해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생존분석을 통해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Kaplan-Meier 생존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자들이 등급인정 이후 재가생존 기간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재가에서 시설로의 이탈이 특성별로 주로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AIP, 즉 자신이 살던 곳에 가능한 오래 머무는 데에 기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 때 AIP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특성을 범주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Andersen의 의료서비스이용 행동모델(Behavior Model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을 채용하여 속성/성향요인, 여건/자원요인, 욕구요인들로 구분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장기요양인정자의 AI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장기요양인정 이후 최초 급여선택 영향요인과 재가급여 선택 이후 재가급여 유지 또는 이탈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AIP를 목표로 하는 장기요양정책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Aging in Place 개념과 재가서비스 강조 동향
Aging in Place(이하 AIP)는 노인들이 장애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친숙한 집과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며 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Pynoos, 1993; 임연옥, 2016). AIP는 1992년 UN 비엔나 국제고령화계획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다: 노인돌봄의 기본적 원칙은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권고 9); 노인에게 집은 단지 거주지 이상의 것이며,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들의 집에서 계속 살수 있도록 정책이 지원해야 한다(권고 19).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2항에서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AIP를 정책방향으로 공표하고 있다.
AIP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친숙하고 익숙한 곳에서 삶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유지하며 노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선호되며, 사회적으로는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다(Cutchin, 2003; Rantz et al., 2005; 임연옥, 2016; 이승훈, 2016; 김수영 등, 2016; 석재은 등, 2016).
AIP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dignity)을 유지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보장에 유리하다(이승훈, 2016): 첫째, AIP는 공간의 전유성, 즉 공간의 편리함과 익숙함으로 인해 삶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AIP는 친밀한 이웃, 아는 사람이 있는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삶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AIP는 삶의 단절적 경험을 회피하고 삶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넷째, AIP는 삶의 자립성 및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김수영 등(2016), 임연옥(2016)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정체성과 자기존엄성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P를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과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AIP 상태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Erickson, Call, Brown, 2012; 임연옥, 2016).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머물던 곳에서 지내는 상태, 즉 Stuck in Aging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은 AIP를 장기요양정책의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 OECD 보고서(2011, 2015)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많은 OECD 국가들은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급여를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였다(그림 1). 특히 스웨덴, 프랑스, 한국에서는 동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특별한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스웨덴은 지역사회 장기요양서비스를 권장하는 일환으로 시설의 수용정원을 줄였으며, 프랑스는 2025년까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수용능력을 23만명으로 늘려나가는 다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Colombo et al., 2011; OECD, 2015). 덴마크는 최근 ‘존엄과 재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개혁이 이루어졌다. 존엄 보장을 위해 노인의 자택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노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게 주택을 개조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재활과 예방까지 중점을 두고 있다(Kvist, 2014; 석재은 등, 2016). 재활은 노인들을 신체적, 사회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들며, 예방은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기능을 강화한다. 재가서비스에 있어서 재활은 재활전문가에 의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자조(self-help) 강화를 의미한다(Fersch, 2012; 석재은 등, 2016).
그림 1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중 재가서비스 수급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5,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또한 재가서비스는 시설서비스보다 급여비용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에서는 시설서비스 확대를 억제하고 재가서비스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서비스 정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일정수준에서 억제시켜 왔다. 더 나아가 시설서비스 급여에서 재가서비스 급여에 비해 유리한 혜택을 제거시켜 나가는 정책조치들을 취해왔다. 예컨대, 독일, 일본에서는 시설급여에서 거주비를 본인부담으로 변경하였으며,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외한 식비, 생활용품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재가급여에 비해 시설급여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생활비 지원혜택을 제거했다. 또한 AIP를 위해 재가급여를 시설급여 수준에 가깝게 확대하고 재가급여 형태도 촘촘하게 다양화하는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Aging in Place 실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는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최대한 유지하고 잔존능력을 가능한 끝까지 활용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높은 고령화율과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어 비용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강화될 것이다.
2.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구분된다. 장기요양대상자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선택하는 데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가? 또한 재가에서 이탈하여 시설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 급여선택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 진행된 장기요양 급여선택의 결정요인 관련 실증연구에는 시설서비스 이용결정요인(김은영 등, 2008; 이윤경, 2009), 재가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이가옥, 이미진, 2001; 이재모, 이신영, 2006; 김은영 등, 2008; 이윤경, 2009; 김성희 등, 2011)과 같이 특정 급여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와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함께 고려하여 급여형태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이윤경, 2009; 한은정 등, 2011; 박창제, 2015)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급여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예컨대, 이윤경(2009)에서는 여성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국내 연구들에서는 성별과 급여선택과의 관계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등, 2011; 한은정 등, 2011; 박창제, 2015). 외국 연구에서는 여성이 오히려 시설입소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ley, et al., 1990; Miller & Weissert, 2000). 연령의 증가는 대체적으로 시설입소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이인정, 2001; Miller & Weissert, 2000; Luppa et al., 2010), 국내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들은 그 관계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이재모, 이신영, 2006; 이윤경, 2009; 김성희 등, 2011; 한은정 등, 2011; 박창제, 2015).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본인부담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시설입소 이용확률이 높으며, 소득이 다소 높은 차상위계층과 건강보험가입자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09; 김성희 등, 2011). 독거의 경우 Miller와 Weisser(2000)에서는 재가와 시설서비스 모두에서 급여이용 선택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시설서비스 이용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09; 박창제, 2015). 김성희 등(2011)에서는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 재가서비스 이용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은정 등(2011)의 연구에서는 그 관계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개인의 신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상태는 국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급여선택과의 관계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김성희 등, 2011; 이윤경, 2009; 박창제, 2015; 한은정 등, 2011).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개인 간 차이를 좀 더 세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인정점수가 아닌 요양등급을 변수로 투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치매는 시설입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이윤경, 2009; 박창제, 2015; Bharucha et al., 2004; Luppa et al., 2010; Borrayo et al., 2002; Hanley et al., 1990), 요양욕구를 높이는 경관영양과 도뇨관은 시설입소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었다(Sorbye et al., 2010).
또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이용 중인 서비스 종류와 시설입소와의 관계를 검증한 이재정(2010)의 연구에서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집단에 비해 방문요양을 이용한 집단에서 부양자의 시설입소 의사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Zarit 등(2011)에서도 주간보호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낮춰 시설입소를 지연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기요양 급여종류 선택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요인들과 관계성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각 변수를 중심으로 재가서비스 이용, 시설입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검증된 경우, 또는 급여이용 선택과 관계없음으로 나타난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이 얼마나 상이한 분석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선행연구의 장기요양 급여종류 선택과 관련된 주요 요인
| 요인 | 재가서비스 이용 | 시설서비스 이용 | 관계없음 |
|---|---|---|---|
| 여성 | 이윤경(2009) | Hanley et al.(1990) Miller & Weissert(2000) |
김성희 등(2011) 한은정 등(2011) 박창제(2015) |
| 연령 | 이인정(2001) Luppa et al.(2010) Miller & Weisser(2000) |
김성희 등(2011) 이윤경(2009) 이재모, 이신영(2006) 박창제(2015) 한은정 등(2011) |
|
| 소득계층 | 이윤경(2009): 차상위 김성희 등(2011): 건강보험 |
이윤경(2009): 국기초 | 한은정 등(2011) |
| 독거 | Miller & Weisser(2000) | 이윤경(2009) 박창제(2015) Miller & Weisser(2000) |
이가옥, 이미진(2001) 한은정 등(2011) |
| 주수발자 | 김성희 등(2011) | 한은정 등(2011) | |
| 장기요양 상태 및 와상도 | 김성희 등(2011) 이윤경(2009) 한은정 등(2011) 박창제(2015) |
||
| 치매 여부 | 이윤경(2009) 박창제(2015) Bharucha et al.(2004) Luppa et al.(2010) Borrayo et al.(2002) Hanley et al.(1990) |
한은정 등(2011) | |
| 경관영양 | Sorbye et al.(2010) | ||
| 도뇨관 | Sorbye et al.(2010) | ||
| 재가서비스 이용종류 | 이재정(2010): 주야간보호 Zarit et al.(2011): 주간보호 |
선행연구에서 급여이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일관된 관계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선행연구들이 활용한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한은정 등(2011) 연구도 2009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대상을 분석하고 있어 표본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이유로, 장기요양은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한 시점의 급여이용 선택을 분석하기 보다는 장기간의 관찰기간을 확보하여 급여 이용 선택의 변화여부를 관찰하고, 급여이용 선택의 지속 또는 변화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시점에서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에는 여러 요인들이 혼재되어 포함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중에 급여를 선택하는 것과 기존에 급여를 이용하고 있던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급여로 전환하는 것에는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ging in Place 기여요인 또는 방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 재가서비스를 이탈하여 시설서비스로 이동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이용 관련 종단자료를 확보하여 급여이용 변화에 관한 종단적 분석(longitudinal analysis) 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특정시점의 급여이용 자료를 횡단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이다. 한은정 등(2011) 연구는 종단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관찰기간이 2009년 중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1년여의 초단기간 변화만 관찰하여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장기요양 만족도 조사를 이용한 것이어서 표본수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의 한계를 극복한 최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재심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원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장기요양인정자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장기요양인정자가 등급인정후 최초 급여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가급여를 선택했던 이용자가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요인, 다른 측면으로는 재가급여에서 이탈하여 시설급여로 이동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관심이 있으므로 전체 장기요양인정자 중 최초시점에 재가급여를 선택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생존분석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축적된 장기요양인정자 조사자료를 패널화하여 급여종류의 변화와 그 결정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ging in Place를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 요인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의 활용이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차별성을 갖는 점이고, 도출된 분석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장기요양인정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인적, 욕구 특성과 자원을 지닌 노인들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머무르면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조사자료(2008-2015년)와 2015년 급여실적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장기요양인정심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장기요양인정조사자료는 모든 장기요양인정신청자를 대상으로 등급판정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료이다. 장기요양인정조사에서는 장기요양인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인 개인의 신체, 인지 상태 및 간호, 재활 상태뿐만 아니라 동거가족, 주거상태 등 주변환경도 조사하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신청한 노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연령, 성별, 동거가족 등을 조사한 일반사항, 장애, 와상도, 일상생활수행 능력 등 개인의 신체상태 및 인지 상태를 조사한 인정조사항목, 그리고 장기요양니즈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판정결과와 함께 급여니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위해 정기적으로 등급판정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현재 이용 중인 급여종류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자료를 패널화하여 장기요양인정자가 어떠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인정조사 자료는 등급판정을 위한 법적절차에 따라 공신력을 갖고 수집된 자료이며, 장기요양 최초 진입시뿐만 아니라 등급재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인정자 노인의 상태 및 여건에 대해 종단적인 상태변화를 가장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법규정에 의해 한 개인에 대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재인정조사가 진행되는데, 개인의 이의신청, 등급조정 신청 등 다양한 이유로 추가적인 재인정조사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등급인정자의 정보는 비정기적 시점에서 반복 축적된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별로 관찰 시점이 차이가 있지만 반복 측정된 불균형(unbalanced) 패널(panel) 자료로 구성하여 등급인정 이후 급여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급여선택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할 수 있다. 급여이용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 횟수이상 축적된 장기요양인정 조사자료가 필요하다. 즉, 최초 등급인정조사 자료만으로는 선택하여 이용하는 급여종류를 확인할 수 없지만, 등급인정 후 재조사시에 현재 이용 중인 급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등급인정 조사의 정보를 활용하면 동일한 종류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는 급여의 종류가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종단자료의 특징을 활용하여 급여이용 형태를 파악하였고,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및 집단을 구분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 등급인정자를 대상으로 급여선택 유형에 따른 특성을 비교한다. 2008년에서 2015년까지 관찰기간동안 개인별로 장기요양인정 시점에 차이가 있지만, 급여이용의 시작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급인정 이후 최초 급여선택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재가급여를 선택한 인정자를 대상으로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게 되는 특성 및 유지 확률 또는 이탈 확률을 분석한다. 분석대상의 선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등급인정자 중에서 최소 2회 이상 인정조사를 받은 대상자를 선택하였다. 다음은 다양한 사유로 반복 조사되는 인정조사를 통해 현재 이용 중인 급여현황을 파악하고 최초로 등급을 받은 시점을 확인하여 등급인정 이후 재가급여를 이용한 집단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분석집단에서 다시 다음 차수 인정조사를 통해 재가급여 계속이용 집단과 시설급여로 이탈한 집단으로 구분하고, 시설급여로 이동한 집단의 경우 이동시점과 재가급여 이용기간을 추정하였다. 두 번째로 2015년에 장기요양인정조사를 받아 인정조사 2회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분석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2015년도 급여이용자료를 결합하여 2015년 현재 급여이용 현황 및 급여선택 변경여부를 파악하였다.
한편, 생존분석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 표본탈락 등의 사유로 이탈한 경우(censored)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분석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모순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종시점 이전에 이탈하더라도 이탈직전까지의 정보를 분석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송경일, 안재억, 2006). 장기요양인정 노인은 사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기간 동안 사망한 인정자를 분석과정에 포함하여 중도절단(censored)된 것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기간 동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반복적으로 변경한 인정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재가급여를 이용한 인정자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특성이 변화하였을 때 급여이용에 전환이 발생하게 되는가, 즉 어떠한 특성요인에 따라 Aging in Place 유지기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급여를 변경한 인정자의 경우 그 규모도 무시할 만큼 작지만, 여러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집단과는 상이한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분석대상 선정과정으로 50.9만명을 선정하여 급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이중 33.7만명을 대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장기요양인정자가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는지, 또는 재가급여를 이탈하여 시설급여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기요양인정조사 자료는 개인의 신체상태 및 주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정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자격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가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위한 자료활용 자격(P01-201608-22-002)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규에 따라 자료이용과 활용에 대한 내부위원회 심의(NHIS- 2017-1-162)를 거쳐 자료를 취득하였고, 자료의 정리 및 분석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
2. 분석방법
첫째, 장기요양등급인정 이후 최초 급여선택의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누가 재가급여를 선택하고 시설급여를 선택하였는지 집단 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인정 이후 최초 급여선택 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급여선택 결정요인 분석모형은 Andersen의 서비스 이용 행동모델에 따라 주요변수를 선정하였다. Andersen의 행동 모형(Behavior Model of Service Utilization)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예측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장기요양의 급여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여러 연구에서 Andersen의 행동 모형을 채용해왔다(이가옥, 이미진, 2001; 윤현숙, 2001; 이윤경, 2009; Kadushin, 2004). Andersen의 초기 행동모형에서는 개인적 요소를 중요시하였고, 이후 수정·발전시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약하는 여건/자원요인들(enabling factors), 그리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 요인들(need factors)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모형을 제시하였다(Andersen 1995). 속성/성향요인(predisposing characteristics)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질병과는 무관하게 관련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속성/성향 요인은 크게 개인의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demographic) 특성과 함께 결혼 상태 등 사회적 조건, 건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선호도 등으로 구성된다(Andersen & Newman, 1973). 여건/자원요인(enabling factors)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또는 제약할 수도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 및 자원요인은 개인수준, 가족수준, 지역사회 및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욕구요인(need factors)은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이용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질병 및 수준, 장애여부 및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요인은 다시 각 개인별로 본인이 건강수준 및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인지된 욕구(perceived need)와 전문가 진단에 의해서 의료서비스 필요도가 평가된 욕구(evaluated need)로 구성된다(Andersen & Newman, 1973). 본 연구에서는 속성/성향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여건/자원요인으로는 소득계층, 동거가족 및 주수발자 유무, 주거상태 요인을 분석하였다.1) 욕구요인으로는 장기요양인정자의 일상생활수행 능력, 인지, 신체,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점수와 함께 치매 및 치매증상 여부를 주요변수로 구성하였다.
둘째, 장기요양 등급인정 이후 재가급여를 선택한 이용자 중에서 누가 지속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특성을 가진 장기요양인정자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여 이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재가급여 유지 및 시설급여로의 이탈을 분석하기 위해 등급인정 후 첫 급여선택에서 재가서비스를 선택한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이후 급여선택 이력을 추적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장기요양인정 후 첫 급여이용을 재가급여로 선택한 동질적 집단이었지만,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재가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집단과 재가서비스에서 시설서비스로 이동한 집단으로 나눠질 수 있다.
재가급여 유지 및 이탈을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생명표 분석(life table analysis)을 통해 첫 급여이용으로 재가급여를 선택한 장기요양인정자들이 장기요양인정기간 경과에 따른 재가급여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분석은 관찰기간 동안 동일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생존확률을 도출하게 되는데, 관찰대상자수가 많을 경우 적절하다(박재빈, 2006; 송경일, 최정수, 2008). 본 연구는 장기요양대상자 중 등급인정 후 최초 급여로 재가서비스를 선택한 모든 장기요양인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분석대상자수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표분석 활용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작시점인 t0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본 연구에서는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이동하게 되는 전환 시점인) T까지 기간까지인 생존기간(t)은 T-t0이 되고, 각 시점별로 이탈하거나 생존한 집단의 비율을 추정하게 되는데, t시점의 생존함수는 아래 식(1)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분석을 활용하는데, 사건 발생 시점에서 생존곡선(curve)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생존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박재빈, 2006; 송경일, 최정수, 2008). Kaplan-Meier 분석은 위험함수(hazard function)를 활용하여 생존율을 추정하는데, 이는 t시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계량화한 것으로, 추정 식은 아래와 같다.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 분포를 도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Cox 비례위험 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사건발생 및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Cox 비례위험 회귀모형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주요요인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생존분석은 관찰시점에서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이탈자들을 분석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다. 본 분석대상인 장기요양인정자들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한 장기요양인정조사를 받게 되므로 다른 패널 사회조사와 달리 임의적인 표본탈락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하는 경우에는 관찰기간 중에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특성을 고려할 때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통해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을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은 위험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생존시간에 대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모수적 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아래 식과 같은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준모수적 모형으로 구분된다(송경일, 최정수, 2008; 김상문, 2011).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Z는 t시점에서 위험요인의 집합을, h0 (t)는 t시점에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위험 함수를 의미한다. β는 회귀계수로 모형을 통해 추정하게 되는데,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질 때 위험함수가 커지게 되면서 위험은 커지고 생존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음의 값은 반대로 생존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Ⅳ. 분석결과
1. 최초 급여선택의 영향요인
가. 급여선택 유형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
장기요양등급인정 이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선택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면, 남성 인정자가 여성 인정자에 비해 재가급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약 8.1%p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p<.001). 또한 장기요양등급이 낮을수록 재가급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1등급 인정자의 47.7%, 2등급의 48.2%가 재가급여를 선택한 반면, 3등급 이하는 74.4%가 재가급여를 선택하여 등급이 낮을수록 재가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이는 제도초기에 정책적으로 시설급여를 1-2등급만 선택할 수 있도록 통제한 영향도 상당할 것이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가급여보다는 시설급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며,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과 일반 소득계층(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시설급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p<.001).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에 관계없이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시설급여 이용에 본인부담이 없고 주수발자 등 이용자원이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동거가족과 가족수발자 유무에 따른 급여선택 유형을 분석하면, 동거가족이 있으면서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 재가급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27.4%에 불과한 반면, 동거가족이 있고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가급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78.6%로 주수발자 요인이 급여선택에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독거일 경우에는 가족수발자가 있을 경우 재가급여를 선택할 비율이 76.8%로, 주수발자가 없을 경우 71.1%에 비해 약 5.7%p만 높았다. 이는 시설급여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주수발자 여부와 함께 동거가족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상태가 양호한 경우 재가급여 선택률이 65.8%로, 불량한 경우 재가급여 선택률 78.3%보다 12.5%p 낮았다.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다른 선택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사는 Stuck in Aging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치매 및 치매증상이 있는 경우 재가급여 선택하는 비율은 51.7%로, 치매 및 치매증상이 없는 인정자의 동비율이 76.1%인 것에 비하여 14.1%p 낮았다. 즉 치매 및 치매증상은 AIP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표 2
장기요양인정 후 최초 급여선택에 따른 특성 비교
| 재가 | 시설 | 전체 | χ2 | |||||
|---|---|---|---|---|---|---|---|---|
|
|
|
|
||||||
| 사례수 (명) | 구성비 (%) | 사례수 (명) | 구성비 (%) | 사례수 (명) | 구성비 (%) | |||
|
|
||||||||
| 성별 | 남성 | 106,162 | 72.0 | 41,277 | 28.0 | 147,439 | 100.0 | 3088.677*** |
| 여성 | 231,499 | 63.9 | 130,868 | 36.1 | 362,367 | 100.0 | ||
| 연령 | 60대 이하 | 59,763 | 75.1 | 19,853 | 24.9 | 79,616 | 100.0 | 6663.062*** |
| 70대 | 127,298 | 69.2 | 56,731 | 30.8 | 184,029 | 100.0 | ||
| 80대 | 123,151 | 62.1 | 75,247 | 37.9 | 198,398 | 100.0 | ||
| 90대 이상 | 27,449 | 57.5 | 20,314 | 42.5 | 47,763 | 100.0 | ||
| 소득계층 | 국민기초 생활보장 | 46,710 | 53.4 | 40,794 | 46.6 | 87,504 | 100.0 | 8104.898*** |
| 차상위 (의료급여) | 28,787 | 65.2 | 15,369 | 34.8 | 44,156 | 100.0 | ||
| 건강보험 | 262,164 | 69.3 | 115,982 | 30.7 | 378,146 | 100.0 | ||
| 동거가족& 가족 주수발자 | 동거, 없음 | 32,492 | 27.6 | 85,051 | 72.4 | 117,543 | 100.0 | 102593.423*** |
| 동거, 있음 | 260,072 | 78.6 | 70,674 | 21.4 | 330,746 | 100.0 | ||
| 독거, 없음 | 27,058 | 71.1 | 10,985 | 28.9 | 38,043 | 100.0 | ||
| 독거, 있음 | 18,039 | 76.8 | 5,435 | 23.2 | 23,474 | 100.0 | ||
| 주거상태 | 양호 | 275,884 | 65.8 | 143,252 | 34.2 | 419,136 | 100.0 | 2160.721*** |
| 불량 | 25,918 | 78.3 | 7,171 | 21.7 | 33,089 | 100.0 | ||
| 요양등급 | 1 등급 | 26,666 | 47.7 | 29,293 | 52.3 | 55,959 | 100.0 | 33877.927*** |
| 2 등급 | 49,005 | 48.2 | 52,648 | 51.8 | 101,653 | 100.0 | ||
| 3 등급 이하 | 261,990 | 74.4 | 90,204 | 25.6 | 352,194 | 100.0 | ||
| 치매 및 증상 | 없음 | 228,711 | 76.1 | 71,759 | 23.9 | 300,470 | 100.0 | 32305.721*** |
| 있음 | 104,436 | 51.7 | 97,668 | 48.3 | 202,104 | 100.0 | ||
| 전체 | 337,661 | 66.2 | 172,145 | 33.8 | 509,806 | 100.0 | ||
나. 최초 급여선택 영향요인: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regressionanalysis)
장기요양 등급인정 후 최초 급여선택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 급여선택 영향요인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시설급여(기준변수)와 재가급여이다. 시설급여를 기준으로 재가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표 3
최초 재가급여 선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모형
| 변수 | 측정 및 조작적 정의 | ||
|---|---|---|---|
| 종속변수 | 최초 급여선택 | 재가급여 선택(1) | 시설(0), 재가(1) |
| 독립변수 | 속성/성향 요인 | 성별 | 남성(0), 여성(1) |
| 연령 | 연령(연속변수) | ||
| 여건/자원 요인 | 소득계층 | 기초보장,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기준변수) | |
| 동거가족 및 가족수발자 | 독거 및 수발자 없음(기준 변수), 독거 및 수발자 있음, 동거 및 수발자 없음, 동거 및 수발자 있음 | ||
| 주거상태 | 불량(0), 양호(1) | ||
| 욕구요인 | 장기요양인정점수 | 장기요양인정점수(연속변수) | |
| 치매여부 | 치매여부 |
성향요인은 성별과 연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남성 인정자를 기준변수(0)로 하여 여성 인정자와 비교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를 투입하였다. 여건 및 자원요인으로는 소득계층, 가족자원, 주거상태를 투입하였다. 소득계층은 소득계층 구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단, 의료급여수급자 집단, 건강보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자원은 동거가족 및 가족수발자 여부를 결합하여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독거 및 가족수발자가 없는 집단을 기준으로 동거 및 가족수발자가 있는 집단, 동거 및 가족수발자가 없는 집단. 독거 및 가족수발자가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 자원요인으로 주거상태는 불량을 기준변수로 양호할 경우 재가급여 결정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욕구요인으로는 장기요양인정점수, 치매 및 치매증상 여부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체상태를 비롯하여, 인지, 행동, 간호 등 인정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여 판정한 결과로 인정자의 욕구를 가장 과학적이고 포괄적으로 판정한 결과이다. 치매 및 치매관련 증상 없음을 기준으로 있는 경우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장기요양등급인정 이후 최초 급여선택의 결정요인 분석모형으로 시설급여 선택 대비 재가급여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속성/성향요인의 경우, 여성 인정자는 남성 인정자에 비해 재가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10.9% 낮았으며,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재가급여를 선택하는 확률이 2.8%씩 낮아졌다(p<.001). 여건/자원요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높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즉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최초 급여선택에서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높았다. 가족자원 요인의 경우 동거가족이 없고 가족 주수발자도 없는 인정자와 재가급여 선택을 비교해보면, 동거가족이 있거나 없어도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가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았으며, 동거가족이 있지만 가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p<.001). 한편, 앞의 집단특성 분석결과와 달리,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분석모형에서는 주거상태가 양호할 경우 재가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높을수록 재가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약간 낮았다. 그런데, 치매 및 치매증상이 있는 인정자는 치매 및 치매증상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재가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무려 64.1% 낮았다(p<.001). 이는 장기요양 중증도 그 자체보다는 치매 및 치매증상이 AIP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표 4
최초 재가급여 선택 영향요인
| 최초 재가급여 선택 (기준: 시설급여 선택) | ||||
|---|---|---|---|---|
|
|
||||
| B | SE | Exp (B) | ||
|
|
||||
| 상수 | 4.416 | .044 | 82.757*** | |
|
|
||||
| 여성 | -.115 | .009 | .891*** | |
|
|
||||
| 연령 | -.028 | .000 | .972*** | |
|
|
||||
| 소득 계층 | 차상위(의료급여) | .188 | .016 | 1.207*** |
|
|
||||
| 건강보험 | .393 | .010 | 1.481*** | |
|
|
||||
| 동거여부, 가족수발자 (독거, 없음 기준) | 동거, 없음 | -1.572 | .015 | .208*** |
|
|
||||
| 동거, 있음 | .594 | .014 | 1.811*** | |
|
|
||||
| 독거, 있음 | .422 | .022 | 1.525*** | |
|
|
||||
| 주거상태 양호 | .320 | .015 | 1.378*** | |
|
|
||||
| 인정점수 | -.022 | .000 | .979*** | |
|
|
||||
| 치매 있음 | -1.024 | .008 | .359*** | |
|
|
||||
| Model fit | -2LL | 439055.541 | ||
| χ2 | 129082.0389*** | |||
| df | 10 | |||
가. 재가서비스 계속이용 집단과 시설서비스 이동 집단의 특성 비교
최초 급여선택에서 재가서비스를 선택한 인정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이후 서비스 이용이력을 추적하여, 재가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집단과 시설서비스로 변경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Andersen의 서비스이용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속성/성향요인, 여건자원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비교하였다.
2008년에서 2015년까지 관찰기간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에서 최초 급여로 재가급여를 선택한 약 33.8만명 중 약 13.1%인 4만 4천명이 시설급여로 급여를 변경하였고, 계속해서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인정자는 약 29만 3천명이었다.
성별 급여이용 선택을 보면, 여성의 경우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전환한 비율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여성은 최초 급여선택에서도 재가급여 선택률이 남성보다 낮았고, 재가급여 이용과정에서 시설급여 변경률도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한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60대 이하에서는 6.7%만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한 반면, 80대 이상에서는 14.8%, 90대 이상에서는 17.9%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였다.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에서는 2등급 인정자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한 비율이 22.0%로 가장 높았으며, 1등급 인정자 중에서는 20.7%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였고, 3등급 이하 인정자는 8.2%만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였다.
일반계층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13.5%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였으며,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은 12.7%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였으며, 차상위 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7%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여 가장 낮은 변경률을 보였다. 동거가족이 있지만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한 비율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동거가족이 있으면서 주수발자가 있는 인정자는 3.8%만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였다. 반면 독거인 경우에는 주수발자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급여로 변경비율이 0.8~1.3%로 극히 낮았다. 이는 독거인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노인 개인의 AIP 욕구를 반영하여 AIP가 더 유지되는 반면, 동거인 경우 동거가족의 의사에 의해 노인을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상태가 양호한 인정자의 12.3%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여, 주거상태가 불량한 인정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급여 변경비율이 높았다. 치매 및 치매증상이 있는 인정자의 20.5%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여, 치매가 없는 인정자의 시설급여 변경비율 7.3%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높은 변경비율을 보이고 있다. 역시 치매가 AIP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이 확인된다.
표 5
현재 시점에서 재가 계속이용 집단 및 시설급여 이탈 집단별 특성 비교
| 재가 → 재가 | 재가 → 시설 | 전체 | χ2 | |||||
|---|---|---|---|---|---|---|---|---|
|
|
|
|
||||||
| 사례수 (명) | 구성비 (%) | 사례수 (명) | 구성비 (%) | 사례수 (명) | 구성비 (%) | |||
|
|
||||||||
| 성별 | 남성 | 96,299 | 90.7 | 9,863 | 9.3 | 106,162 | 100.0 | 5179.351*** |
| 여성 | 197,055 | 85.1 | 34,445 | 14.9 | 231,499 | 100.0 | ||
| 연령 | 60대 이하 | 33,972 | 93.3 | 2,453 | 6.7 | 36,425 | 100.0 | 9486.792*** |
| 70대 | 95,554 | 89.3 | 11,484 | 10.7 | 107,038 | 100.0 | ||
| 80대 | 121,520 | 85.2 | 21,144 | 14.8 | 142,664 | 100.0 | ||
| 90대 이상 | 42,308 | 82.1 | 9,227 | 17.9 | 51,535 | 100.0 | ||
| 소득계층 | 국민기초 생활보장 | 40,775 | 87.3 | 5,936 | 12.7 | 46,710 | 100.0 | 8287.959*** |
| 차상위 (의료급여) | 25,717 | 89.3 | 3,070 | 10.7 | 28,787 | 100.0 | ||
| 건강보험 | 226,862 | 86.5 | 35,302 | 13.5 | 262,164 | 100.0 | ||
| 동거가족& 주수발자 | 동거, 없음 | 33,523 | 48.8 | 35,155 | 51.2 | 68,678 | 100.0 | 285267.504*** |
| 동거, 있음 | 221,298 | 96.2 | 8,739 | 3.8 | 230,037 | 100.0 | ||
| 독거, 없음 | 22,029 | 98.7 | 288 | 1.3 | 22,317 | 100.0 | ||
| 독거, 있음 | 16,504 | 99.2 | 126 | 0.8 | 16,630 | 100.0 | ||
| 주거상태 | 양호 | 159,046 | 87.7 | 22,208 | 12.3 | 181,254 | 100.0 | 4423.869*** |
| 불량 | 8,161 | 97.3 | 230 | 2.7 | 8,391 | 100.0 | ||
| 요양등급 | 1 등급 | 41,970 | 79.3 | 10,967 | 20.7 | 52,937 | 100.0 | 33509.895*** |
| 2 등급 | 56,559 | 78.0 | 15,950 | 22.0 | 72,509 | 100.0 | ||
| 3 등급 이하 | 194,825 | 91.8 | 17,391 | 8.2 | 212,216 | 100.0 | ||
| 치매 및 증상 | 없음 | 174,050 | 92.7 | 13,800 | 7.3 | 187,850 | 100.0 | 43878.613*** |
| 없음 | 118,068 | 79.5 | 30,371 | 20.5 | 148,439 | 100.0 | ||
| 전체 | 293,354 | 86.9 | 44,308 | 13.1 | 337,661 | 100.0 | ||
나. 생명표 분석 및 Kaplan-Meier 생존분석
장기요양등급인정 후 최초 재가급여 선택자를 대상으로 생명표 생존분석을 통해 재가급여 생존율과 시설급여로 이탈확률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 33만 8천명의 최초 재가급여 이용자 중에서 시설로 이동한 인원은 4만 4천 3백명으로 약 13.1% 수준이다. 생명표 분석을 통해 등급인정 후 기간별 이탈률을 분석해 보면, 등급인정 이후 2년이 지났을 때 전체 시설이동자의 33.6%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동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동자의 71%가 등급인정 이후 약 2년에서 4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이 가족수발의 최대 고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별 생존기간 차이를 Kaplan-Meier 생존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첫 번째로 속성/성향요인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생존확률 차이를 분석하였다.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로 이탈할 확률이 높았다. 등급인정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노인의 시설로의 이탈확률이 남성 노인에 비해 높아졌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인정기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로의 이탈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등급인정 기간이 2년에서 3년이 지나면서 60대에 비해 그 이상 고령집단의 시설로의 이탈확률이 높았다. 3~4년을 지나면서는 70대에 비해 80대 및 90대 이상 집단에서 재가를 계속 이용하는 확률이 낮아졌다.
표 6
등급인정기간 경과에 따른 재가이탈 비율
| (단위: 명, %) | |||||||||
|---|---|---|---|---|---|---|---|---|---|
|
|
|||||||||
| 총계 | 등급인정기간 | ||||||||
|
|
|||||||||
| 0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
|
|
|||||||||
| 최초 재가급여 선택 인원 | 337,662 (100.0) | 337,662 | 326,378 | 233,043 | 155,110 | 115,979 | 61,799 | 36,267 | 9,082 |
|
|
|||||||||
| 재가급여 계속유지 인원 | 293,354 (86.9) | 337,482 | 322,616 | 218,157 | 146,420 | 106,826 | 58,099 | 33,314 | 8,098 |
|
|
|||||||||
| 재가→시설 이동인원 | 44,308 | 180 | 3,762 | 14,886 | 8,690 | 9,153 | 3,700 | 2,953 | 984 |
| (13.1) | |||||||||
| (100.0) | (0.41) | (8.49) | (33.60) | (19.61) | (20.66) | (8.35) | (6.66) | (2.22) | |
두 번째로 여건 및 자원 요인으로, 빈곤층인 국민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인 의료급여/경감대상자나 일반 소득계층인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할 확률이 약간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등급인정시점에는 재가급여 선택률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았으나, 재가급여 이용 후에는 재가급여 계속 이용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거가족 및 가족수발자 여부에 따른 재가급여 계속 이용확률을 분석하면,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독거에 비해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확률이 낮았으며, 동거가족이 있어도 가족수발자가 없는 경우 재가급여에서 시설로의 이탈확률은 급속히 높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수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이 지쳐가면서 독거노인보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시설로의 이탈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자원요인으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독거노인보다 비용부담이 높은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수발자가 없는 경우는 시설로의 이탈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거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가생존율이 높고 주거상태가 양호한 집단에서 시설로 이동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다른 선택이 어려워 주거상태가 열악함에도 집에 계속 머무는 Stuck in Aging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으로, 요양등급 3등급의 재가 생존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1등급, 2등급 순이었다. 2등급 인정자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등급 및 3등급 인정자에 비해 시설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1등급 인정자의 이탈률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탈률을 보이고 있다. 치매 및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인정자에 비해 시설로 이동 확률이 높아졌는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탈률이 크게 높아졌다.
다.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 분석: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통해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을 분석하였다. 처음에 재가급여를 선택한 인정자를 대상으로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는지 또는 시설급여로 이탈하였는지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을 분석하였다.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재가급여 계속이용을 기준으로 재가급여 이탈과 재가급여 계속이용기간(생존기간)이다.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에서 재가급여 계속이용 집단을 기준(0)으로 시설급여로 이탈한 집단(1)을 비교하였다. 각 시점에서 이탈 위험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예측변수와의 관계가 부적(-) 방향일 경우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생존확률이 증가하는 것이며, 반대로 정적(+) 관계일 경우는 이탈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는 앞의 <표 3>의 급여선택 영향요인분석에서 사용된 Andersen 행동이론에 입각한 요인들과 같다.
등급인정 후 처음으로 재가급여를 선택한 인정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이 현재 시점까지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거나 또는 시설급여 이탈 확률을 높이는가를 분석하였다(표 7).
표 7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 분석
| 재가급여 이탈 확률 (기준: 재가급여 계속이용) | ||||
|---|---|---|---|---|
|
|
||||
| B | SE | Exp (B) | ||
|
|
||||
| 상수 | - | - | - | |
|
|
||||
| 여성 | .162 | .014 | 1.176*** | |
|
|
||||
| 연령 | .002 | .001 | 1.002*** | |
|
|
||||
| 소득 계층 | 차상위(의료급여) | .262 | .027 | 1.300*** |
|
|
||||
| 건강보험 | .237 | .017 | 1.268*** | |
|
|
||||
| 동거여부, 주수발자 (독거, 없음 기준) | 동거, 없음 | 3.466 | .076 | 31.998*** |
|
|
||||
| 동거, 있음 | 1.284 | .077 | 3.612*** | |
|
|
||||
| 독거, 있음 | -.375 | .131 | .687** | |
|
|
||||
| 주거상태 양호 | -.730 | .058 | .482*** | |
|
|
||||
| 인정점수 | -.002 | .000 | .998*** | |
|
|
||||
| 치매 있음 | .466 | .012 | 1.594*** | |
|
|
||||
| Model fit | -2LL | 666581.83 | ||
| χ2 | 53231.317*** | |||
| df | 10 | |||
분석결과 남성 인정자에 비해 여성 인정자는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17.6% 높았다. 또한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p<.001). 소득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의료급여대상자의 재가급여 이탈 확률은 30.0% 높았으며, 건강보험가입자의 재가급여 이탈 확률은 26.8% 높았다(p<.001). 동거가족과 주수발자 여부의 경우, 독거에 비해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특히 동거가족이 있지만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는 독거이며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무려 32배나 높았다. 동거가족이 있고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에도 독거이면서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3.6배 높았다. 같은 독거라도 해도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31.3% 낮았다. 이는 가족 주수발자가 동거하지 않으며 수발하는 경우에 오히려 AIP의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분석모형에서는 주거상태가 양호할 경우 재가급여 이탈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비해 주거상태가 양호할 경우 재가급여 이탈 확률은 51.8% 낮아진다(p<.001). 이는 주거상태 개선이 AIP 강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해준다. 한편, 다른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높을수록 오히려 재가급여 이탈 확률을 미미하지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매 및 치매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59.4%나 높았다(p<.001). 역시 치매는 AIP를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존엄한 노년의 삶과 자기통제권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Aging in Plac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자 중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며 가능한 집에 오래 머무는 데 기여하는 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장기요양인정자가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지, 반대로 어떤 특성을 가진 장기요양인정자가 시설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인정자 전체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종단자료(2008-2015년)를 이용하였으며, Andersen 서비스이용 행동모델(Behavior Model of Service Utilization)을 채용하여 속성/성향요인, 여건/자원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재가급여 지속 및 이탈에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인정자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초 재가급여 선택확률 및 영향요인과 재가급여 선택의 유지 및 이탈 확률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종단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관련 선행연구들과 질적인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재가급여 선택자의 지속 및 이탈에 대한 종단 분석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AI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온전히 포착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는 분명한 차별적 기여가 있다.
장기요양인정자 중에서 최초 급여로 재가급여를 선택한 약 33만 8천명 중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인정자는 약 29만 3천명이었고, 시설급여로 급여를 변경한 인정자는 약 13.1%인 4만 4천명이었다. 등급인정초기 재가급여를 선택한 장기요양인정자를 생명표를 활용하여 생존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가에서 시설로 이동한 인정자들의 71%가 등급인정 이후 약 2년에서 4년 사이에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최초 급여선택 결정요인과 재가급여 계속이용확률 분석결과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에서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성별과 급여선택 간 관계에서 본 연구와 반대 결과를 보이거나(이윤경, 2009),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김성희 등, 2011; 한은정 등, 2011; 박창제, 2015)와 달리, 국외 선행연구(Hanley et al., 1990; Miller & Weissert, 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도 여성 노인의 시설생활 수용도 및 적응력이 더 높고, 시설에서 여성 입소자가 남성 입소자보다 더 환영받으며 실제 여성 입소자수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배우자가 주수발자 역할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보다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따라서 이번 실증적 연구결과는 여성 노인의 AIP 지원을 위해 성인지적(gender sensitive)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8
분석결과 요약표: 재가급여 선택 및 재가급여 계속이용(생존) 확률과의 관계
| 변수 | 최초 재가급여 선택 |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 | |||||
|---|---|---|---|---|---|---|---|
|
|
|
||||||
| 최초 재가급여 선택 집단특성 | 결정요인 분석 Logistic regression | 최종 재가급여 선택 집단특성 | Kaplan Meier Analysis |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 |||
|
|
|||||||
| 속성/성향 요인 | 여성 | - | - | -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
|
|||||||
| 여건/자원 요인 | 소득계층 (기초수 급) | 의료급여 | + | + | + | - | - |
|
|
|||||||
| 건강보험 | + | + | - | - | - | ||
|
|
|||||||
| 동거, 가족 수발자 (독거, 없음) | 동거, 없음 | - | - | - | - | - | |
|
|
|||||||
| 동거, 있음 | + | + | - | - | - | ||
|
|
|||||||
| 독거, 있음 | + | + | + | + | + | ||
|
|
|||||||
| 주거상태 양호 | - | + | - | - | + | ||
|
|
|||||||
| 욕구 요인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 | - | - | + | |
|
|
|||||||
| 치매 있음 | - | - | - | - | - | ||
주: 시설급여 대비 재가급여의 선택임. <표 7>에서 분석한 재가이탈 위험 확률을 같은 기준인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의 관점에서 바꾸어 정리하였고, 본 표에서 +는 재가급여를 선택하는 비율 및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는 시설을 선택하는 비율 및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함.
둘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초 재가급여 선택 및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인정, 2001; Miller & Weissert, 2000; Luppa et al., 2010)이며,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국내 선행연구(이재모, 이신영, 2006; 이윤경, 2009; 김성희 등, 2011; 한은정 등, 2011; 박창제, 2015)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기요양기간이 길어지고 가족수발자의 고령화와 소진으로 시설로 이동이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간이 길어질 때에도 AIP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치매 및 치매증상이 있는 경우 최초 재가급여 선택 및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이 모두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치매가 시설입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윤경, 2009; 박창제, 2015; Bharucha et al., 2004; Luppa et al., 2010; Borrayo et al., 2002; Hanley et al., 1990). 치매는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AIP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에 대해서는 AIP를 지원하더라도 가족자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사회적 지원을 통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최초 급여선택 결정요인과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 분석결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최초 재가급여 선택 영향요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시설급여 선택 확률이 높았으며, 독거 및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동거 및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가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높을수록 시설급여 선택 확률이 높았다. 이와 같이 최초 급여선택시와 재가급여를 지속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실천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급여 최초 선택시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시설급여 선택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단 재가급여를 선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재가에서 머물게 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시점의 급여선택 영향요인을 분석한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되지 못한 부분을 밝힌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시설입소 이용확률이 높고, 소득이 다소 높은 차상위계층과 건강보험가입자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했었다(이윤경, 2009; 김성희 등, 2011). 이는 본 연구의 최초 급여선택과는 일치하는 연구이지만, 재가급여 지속 및 이탈 요인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최초 급여선택에서 기초수급자의 시설급여 선택률이 높았던 이유로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이미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기초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최초 급여선택시 재가급여를 선택한 기초수급자의 경우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재가이탈 유인이 낮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의 재가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시설급여로 입소할 수 있는 선택권은 개인보다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AIP 지원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최초 급여 선택시에는 동거 및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가 독거 및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보다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높았으나, 장기요양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수발자 유무와 관계없이 독거에 비해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급여선택시에는 부양규범 등에 의해 동거가족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 노인을 수발하며 재가급여를 선택하지만, 장기요양기간이 길어지면서 동거가족이 급격히 지치고 동거가족의 의사에 따라 장기요양노인을 시설로 이동시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의 불완전한 연구결과를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독거는 시설급여 이용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으며(이윤경, 2009; 박창제, 2015). 김성희 등(2011)에서는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 재가서비스 이용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했고, 한은정 등(2011)의 연구에서는 그 관계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생명표 분석과 Kaplan Meier 분석을 보면, 장기요양인정기간 이후 2년이 최대 고비로 이후 4년까지 시설로의 이탈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자 동거가족 및 가족수발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2년에서 4년 사이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초기에는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높을수록 시설급여 선택이 높았으나, 장기요양기간이 길어지면서는 치매와 연령 등의 상호작용효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장기요양인정상태와 급여선택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었다(김성희 등, 2011; 이윤경, 2009; 박창제, 2015; 한은정 등, 2011). 치매가 재가급여 확률을 낮추는 확실한 요인인데 비해, 장기요양 중증도 자체는 최초 급여선택시에는 미미하나마 재가급여 선택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요양기간이 지속되면 미미하나마 AIP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AIP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중증도 그 자체보다는 치매 와 같이 AIP를 어렵게 하는 노인의 특성적 상태에 더 초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은 장기요양인정자의 AIP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어떠한 부분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가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여성 노인의 AIP 생존율이 낮다는 점에서 AIP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자신의 의지대로 존엄성과 자기통제권을 갖고 자신의 마지막 단계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 대해 여성 노인의 존엄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가족수발을 의존하지 않아도 AIP가 가능한 재가급여의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최초 급여선택시에는 독거가 재가급여 선택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재가급여 선택 이후 지속 및 이탈요인 분석에서는 독거인 경우보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시설로의 이탈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거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진을 막을 수 있도록 가족수발자 지원정책을 마련하거나, 또는 가족수발자에게 크게 부담을 주며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요양노인의 AIP를 지원할 수 있는 재가급여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가족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AIP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족수발자의 소진이 급속하게 나타나 AIP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수발자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등 결국 동거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수발자를 장기요양의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더라도 노인과 동거하는 방식보다는 따로 살면서 노인을 지원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돌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정책에서 주수발자의 수발부담을 덜어주는 가족수발자 휴식서비스, 가족수발자 상담 및 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노인이 가족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AIP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가 시설급여에 준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準)시설급여 수준의 재가급여 확대와 통합재가급여의 개발 등 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 등 재가급여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2)
셋째, 최초 재가급여 선택 영향요인 분석 및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 결과, 주거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설로 이탈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거상태가 양호한 경우 AIP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거가족보다는 노인과 따로 사는 경우에 AIP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익숙한 지역사회내에 장기요양노인이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촘촘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련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AIP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진 국가들에서 AIP를 위해 채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간 형태로서 서비스가 병행되는 독립주거(assisted living home, seviced housing)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가급여 영향요인 분석 및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 결과, 치매 및 치매증상은 AIP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시설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AIP 실현을 위하여 치매노인 뿐 아니라 치매노인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 주수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용가능한 치매지원 대책의 마련이 중요하다. 2015년 제3차 치매종합대책(2016-2020)이 마련되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3) 따라서 치매 노인의 존엄한 삶과 삶의 질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기치매발견, 인지재활훈련, 치매안심마을, 돌봄공동체 치매지킴이, 주민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실천적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Notes
이는 석재은 등(2015, 2016)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와 [장기요양 재가급여 개편방안 연구]에서 제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 중인 통합재가급여를 통한 중증 및 독거노인에 대한 사례관리와 맞춤 통합재가급여, 재가급여의 준(準)시설 서비스화, 1일 수회 서비스와 요양보호사와 서비스대상의 1:1 매칭이 아니라 팀대 다수의 매칭으로 재가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공적서비스로서의 특성을 강화하는 운영형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References
, & (1973).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51, 95-124. [PubMed]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1), 1-10. [PubMed]
, & (1987). The influence of family caregivers on elder's use of in-home services: An expande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184-196. [PubMed]
, , , , & (2004). Predictors of Nursing Facility Admission: A 12‐Year Epidemiological Stud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2(3), 434-439. [PubMed]
, , , & (2002). Utilization across the continuum of long-term care services. The Gerontologist, 42(5), 603-612. [PubMed]
, , & (1986). The Risk Factor of Nursing Home Entry among Residents of Six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Journal of Gerontology, 43, 15-21. [PubMed]
(2003). The process of mediated aging-in-place: A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based model. Journal of Social Sciences & Medicine, 57, 1077-1090. [PubMed]
, et al. (1998). Profiles of Hospital, Physician, and Home Health Service Use by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The Gerontologist, 38(3), 320-330. [PubMed]
(1991). Health care users residing on the Mexican border. What factors determine choice of the U.S. or Mexican health system?. Med Care, 29(5), 419-429. [PubMed]
, , , & (1990). Predicting elderly nursing home admissions: results from the 1982-1984 national long-term care survey. Research on Aging, 12(2), 199-228. [PubMed]
(2004). Home Health care utilization: a review of the research for social work. Health and Social Work, 29(3), 219-244. [PubMed]
, , , , , & (2010). Predi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in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Age and Ageing, 39, 31-38. [PubMed]
, & (2000). Predicting elderly people’s risk for nursing home placement, hospitalization, functional impairment, and mortality: a synthesis. Medical Care Research & Review, 57(3), 259-297. [PubMed]
, , & (1992). Mental Illness and Help-seeking Behavior Among Mariel Cuban and Haitian Refugees in South Flori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4), 283-298. [PubMed]
(2005). Tiger place: A new future of older adults. Journal of Nursing Care Quality, 20, 1-4. [PubMed]

- 3508Download
- 2981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