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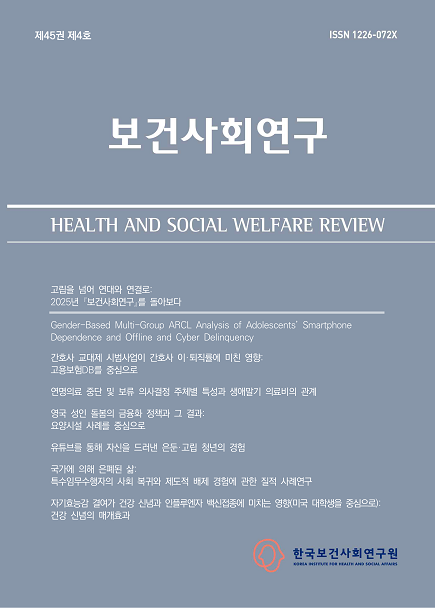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After-School Self-Car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Panel Ordered Logit Model
Lim, Hyejung
보건사회연구, Vol.37, No.4, pp.510-534, December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4.51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affecting factors of after-school self-care for 1st-3rd graders? For this purpose, two different data sources were used in this researc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1st Graders’ Panel (1st-3rd waves) and the result of supply and demand for after-school care service analyzed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sibility of caring for four levels separated by after-school self-care in elementary schools, I used a panel ordered logit model with the longitudinal data of 2,116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result shows that double income families have higher probability of self-care gap than single income families, and a higher education level of parents―a college or university degree or above―and students with older siblings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higher possibility of self-care gap than a lower level of education―high school degree or below―and those without older siblings. Also, increase in school grades and low family income showed higher probability in self-care gap. Furthermore, I confirmed the marginal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belonging to each of the four levels classified according to degree of after-school self-care. As a result, the marginal effect of the household income showed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income levels at each level of self-care.
초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1 패널 1-3차에 해당하는 2,116명 학생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군구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자료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패널순서형로짓 모형을 설정해 임의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초대졸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손위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커졌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구분된 네 개 수준 각각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한계효과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가구소득의 한계효과는 각각의 돌봄공백 수준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 변화 양상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Ⅰ. 서론
현대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있다. 197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9.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이진숙, 이슬기, 2013) 현재는 약 50%를 웃돌고 있다. 가족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 71.5%였던 핵가족 비율은 2015년 81.7%로 증가했다(통계청, 2017a). 특히 맞벌이 가정의 비율은 1990년 21.8%에서 2015년 현재 약 40%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17b).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어 다양한 보육정책이 사회정책 차원에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정책 차원의 돌봄서비스는 영유아기에 치중되어 학령기 아동을 위한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이었다(노성향, 조선하, 박지희, 2007).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 정책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 서비스들이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지 못하고(구슬이, 2014), 수요와 공급도 고려하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이채정, 2016). 따라서 돌봄공백 문제는 종일반 같은 보육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영유아기보다는 초등학교 시기에 더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오아림, 유계숙, 2012). 영유아는 무상보육과 같은 전폭적인 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령기까지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이슬기, 2012).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64.1%가 방과후에 자녀를 맡길 기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서문희, 김유경, 2006), 워킹맘의 41.4%가 이 시기를 가장 힘든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예지은 등, 2010). 즉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학생들은 ‘돌봄절벽’ 상황에 놓이게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목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은 돌봄공백 초등학생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2015년 전국 초등학생의 약 37%가 방과후 성인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돌봄공백 상황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장혜경 등, 2015). 사실 돌봄공백은 아동의 인지적, 비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보육에서 교육으로 중심축이 변한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집중된 한국에서 학령기 자녀의 성공적인 교육적 결과를 위한 교육적 지원은 모성의 핵심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나윤경, 태희원, 장인자, 2007). 따라서 각 가정은 자녀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가령 가정에서는 이를 위해 사적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어머니 직장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 결과 과도한 양육비 지출과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과후 돌봄공백은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취약계층은 이런 선택마저 할 수 없어서 자녀를 심각한 돌봄공백 상태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박복용, 이재혁, 2015). 따라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학생들이 돌봄공백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 상황에 관한 국내 연구는 실태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몇몇 선행연구(김지경, 김균희, 2013; 이준호, 박현정, 2012)에서는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김지경과 김균희(2013) 는 전국 초등학교 1학년 2,342명과 4학년 학생 2,378명으로 구성된 이질적인 두 표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학년 진급에 따른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엄밀히 분석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이준호와 박현정(2012)은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수준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였지만, 학생들의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횡단자료를 이용해 정적인 관계 분석에 그쳤다. 한편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동적인 관계뿐 아니라 변수의 변동성도 고려한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인식, 최필선,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는 저학년 시기 동안의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영향요인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각 가정에 전가된 현실에서 학령기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돌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적절한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초 분석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방과후 돌봄공백의 개념과 실태
방과후 돌봄공백이란 방과후에 아동이 성인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 없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합의된 정의가 없어 맥락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방과후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돌봄공백 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나홀로 아동’ 또는 ‘자기보호 아동’이라고 칭하고 있다(구슬이, 2014). 유사한 개념으로 ‘Latchkey child’는 1980년대 미국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 아동이 스스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방과후 돌봄공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Vandell과 Corasaniti(1988)는 ‘Latchkey child’를 방과후에 일정시간 이상 혼자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 지내는 아동이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봉주와 조미라(2011)는 돌봄공백 상태가 ‘방과후 방치’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방과후에 일정 시간을 성인보호자 없이 지내는 상태를 말하는 물리적 개념”이라 규정하였다. 이처럼 방과후 돌봄공백은 서로 다른 용어들로 설명되고 있지만 공통으로 일정 시간 이상 성인 보호자 없이 있게 되는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실태에 대해서는 몇몇 기관에서 수행된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먼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현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단위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아동실태조사1)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초등학교 저학년의 약 24.2%, 고학년의 약 46.7%, 전체 초등학생의 약 35.5%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의 방과후 돌봄공백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2013년 조사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약 30.9%, 고학년의 약 49.7%, 전체 초등학생의 약 40.3%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의 방과후 돌봄공백 상태임이 확인되어 5년 전보다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통계청, 2017c).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에서는 전국적으로 표집된 가구 중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방과후에 혼자 있는 시간을 5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초등학생 중 43.4%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방과후 돌봄공백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조희금 등, 2010). 그런데 2015년 조사 결과에서는 성인 보호자의 돌봄 없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홀로 있는 아동 비율은 약 37.0%로 감소하였다(장혜경 등, 2015). 그러나 이러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과후 나홀로 아동이 약 3분의 1 이상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정배경, 지역사회 등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는 아동 연령, 성별, 형제・자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연령은 돌봄공백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지경, 김균희, 2013; Cain & Hofferth, 1989; Casper & Smith, 2004; Vandivere, Tout, Capizzano & Zaslow, 2003). 이는 부모들이 자녀가 성장할수록 혼자 있어도 될 만큼 성숙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 성별에 대한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Vandivere, Tout, Capizzano와 Zaslow(2003)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도 돌봄공백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지만, Casper과 Smith(2004)는 돌봄공백 상황 가능성에 대한 성별 차이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커진다. Brandon(1999)은 방과후 돌봄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돌봄공백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십대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직접 돌보지 않고 홀로 둘 가능성이 높았다(이준호, 박현정, 2012; Vandivere, Tout, Capizzano & Zaslow, 2003). 이는 부모들이 십대 손위 형제・자매가 최소한의 보호자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돌봄공백에 대한 선행연구 및 조사결과에서는 공통으로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와 있는 경우를 돌봄공백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가정배경 중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 소득수준, 부모학력, 한부모 가족과 같은 가족구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주된 영향요인은 바로 부모의 맞벌이 상황이다(Cain & Hofferth, 1989; Casper & Smith, 2004; Vandivere, Tout, Capizzano & Zaslow, 2003). 반면 소득수준이 방과후 돌봄공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 결과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나기도 한다. 김지경, 김균희(2013)와 Cain과 Hofferth(1989)는 월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방과후에 돌봄받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은 방과후 돌봄공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Casper & Smith, 2004; Shumow, Smith & Smith, 2009). 오히려 몇몇 연구(Kerrebrock & Lewitt, 1999; Vandivere, Tout, Capizzano & Zaslow, 2003)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홀로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Vandivere, Tout, Capizzano와 Zaslow(2003)은 방과후 돌봄공백은 단순히 소득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맞벌이 가정인지 여부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즉 낮은 소득수준의 원인이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미취업 상태와 같은 고용상태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부모의 학력도 자녀의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다. 김지경과 김균희(2013)는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돌봄공백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이들은 고학력 부모들이 학력이 낮은 부모에 비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뛰어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한편 나홀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전체 아동의 약 2배인 63.7%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장혜경 등, 2015). 이는 한부모 가정과 같은 가족구조는 자녀의 돌봄공백 가능성을 높일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지역사회 특성 중에서는 읍면지역 여부, 주거지의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지역사회 이웃 관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Casper과 Smith(2004)는 도시 중심지보다는 시골 지역에서 자녀를 홀로 두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밝혔다.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 및 소도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과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의 연관성을 확인한 김지경과 김균희(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방과후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대도시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지가 치안이 불안한 우범지역이라면 자녀를 홀로 두는 경향성은 낮아진다. 이런 경향성은 Kerrebrock와 Lewitt(1999), Vandell과 Shumow(199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도 오히려 자녀를 홀로 두는 경향이 더 크다는 점과 연결된다.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은 치안이 취약한 환경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환경에 자녀를 홀로 두는 것은 위험하다. 이에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자녀를 홀로 두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방과후 돌봄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성화를 강조할수록 취약계층은 이중의 격차를 경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의 지역사회는 치안이 불안하고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친밀성도 돌봄공백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다(McHale, Crouter & Tucker, 2001). 이는 부모들이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이웃들 간에 아이들에 대한 상호 감독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확대됐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6년 예산액 기준 아동복지사업 예산의 48.5%가 이러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투입되어 재정투입의 규모도 상당하다(이채정, 2016). 따라서 이러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도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3) 초1 패널 1‐3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0년 기준 8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1학년이었던 2,34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매 학년 진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패널 자료이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이 실제 지역 아동청소년의 돌봄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군구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자료(이채정, 2016)를 통합하였다4). 한편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는 1차연도 조사 대상자였던 2,342명 중 2, 3차 시기에 이탈한 표본인 142명은 제외되었다. 또 종속변수인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문항에 대해 1, 2, 3차연도에 단 한 번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84명의 자료도 제외하였다. 이리하여 최종분석에는 2,116명의 3년간 자료가 사용되었다.
2. 변수 설정
종속변수인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는 주당 일수와 하루 평균 시간을 묻는 두 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값을 이용해 변숫값을 산출하였다.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주당 일수 및 하루 평균 시간에 대한 두 문항은 모두 보호자가 응답하였으며, 특정 값이 아닌 범위로 설정된 구간 값으로 측정되었다.5).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대한 범주형 변수 설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당 일수는 조사 대상 학생이 “방과 후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적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됩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1=거의 없다, 2=1‐2일 정도, 3=3‐4일 정도, 4=거의 매일’로 측정되었다. 이렇게 측정된 값을 ‘1=0, 2=1.5, 3=3.5, 4=7’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하루 평균 돌봄공백 시간은 “방과후 혼자 있거나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해 ‘1=1시간 미만, 2=1‐2시간 정도, 3=3‐4시간 정도, 4=4시간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이 값을 ‘1=0.5, 2=1.5, 3=3.5, 4=7’로 변환하였다. 이렇게 돌봄공백에 관해 묻는 두 개 문항으로 측정된 값을 변환한 후 이 변환된 값을 기준으로하여 주당 평균 돌봄공백 일수와 하루 평균 돌봄공백 시간을 곱해 주당 돌봄공백 시간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산출된 주당 돌봄공백 시간에 대해 ‘0=0, 0 초과‐3시간 미만=1, 3시간 이상–9시간 미만=2, 9시간 이상=3’의 값을 부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방과후 돌봄공백을 주당 일수 및 일 평균 시간 각각을 4개 범주로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당 3시간 이상을 모두 한 범주로 사용하게 되면 방과후 돌봄공백 시간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6) 이에 Lord와 Mahoney(2007)가 주당 평균 돌봄공백 시간에 따라 돌봄공백 정도를 구분한 방법을 참고하여 주당 방과후 돌봄시간 3시간과 9시간을 경곗값으로 하여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돌봄공백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네 개 집단을 구분하였고, ‘0=돌봄공백 아님, 1=돌봄공백 낮은 정도, 2=돌봄공백 중간 정도, 3=돌봄공백 높은 정도’를 의미하게 된다. 즉, 돌봄공백 정도를 의미하는 값이 클수록 돌봄공백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로는 학생 성별, 형제구조와 같은 개인특성 변수, 가구소득, 맞벌이 가정 여부, 부모학력, 거주지가 읍면지역인지 아닌지 등과 같은 가정배경, 방과후돌봄서비스충분성과 같은 지역 특성변수 등을 설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자료의 변수에 따라 존재하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결측 자료에 대해 임의성을 전제로 하는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사용하였다. 결측치를 대체하여 전체 표본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보 이용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Carlin, Galati & Royston, 2008). 총 20회 다중대체 실시 후 투입한 변수에 대한 모든 자료값이 존재하는 온전한 20개의 데이터 세트를 얻었다.
<표 1>에서는 전술한 변수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중대체에 의해 얻은 20개의 데이터 세트에서 산출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다.
표 1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7)
| 변수 설명 | % | 평균 (s.d) | 결측 대체율 | |
|---|---|---|---|---|
|
|
||||
|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 | 돌봄공백 아님=0 | 69.85% | 0% | |
| 돌봄공백 낮은 정도=1 | 10.26% | |||
| 돌봄공백 중간 정도=2 | 7.06% | |||
| 돌봄공백 높은 정도=3 | 12.84% | |||
|
|
||||
| 맞벌이여부 | 부와 모 모두 근로 상태인 경우=1 | 48.79% | 3.17% | |
| 그렇지 않은 경우=0 | 51.21% | |||
|
|
||||
| 가구소득 (ln(연평균+1)) | 연평균 가구소득에 1을 더한 후 자연로그를 취한 값 | 8.240 (0.711) | 5.74% | |
|
|
||||
| 성별 | 여학생=1 | 48.63% | 0% | |
| 남학생=0 | 51.37% | |||
|
|
||||
| 부모학력 | 부모 각각의 최종 학력 중 최댓값을 부모학력으로 설정 | 3.28% | ||
| 중졸 이하와 고졸인 경우를 고졸 이하=1 | 32.72% | |||
| 전문대졸=2 | 21.48% | |||
| 4년제 대졸과 대학원졸을 4년제 대졸 이상=3 | 45.80% | |||
|
|
||||
| 형제구조8) |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인 경우=0 | 12.33% | 0% | |
| 손아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1 | 36.44% | |||
|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2 | 51.23% | |||
|
|
||||
| 읍면지역 | 읍면지역인 경우=1(19.17%), | 19.19% | 0% | |
| 거주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0(80.83%) | 80.81% | |||
|
|
||||
| 방과후 서비스 충분성 | 지역의 방과후 서비스가 수요 대비 공급 정도가 적정한지를 의미 | 2.679 (0.846) | 0% | |
| ‘매우 부족한 경우=1, 조금 부족한 경우=2, 적정한 경우=3, 조금 초과한 경우=4, 많이 초과한 경우=5’ | ||||
3. 연구 모형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학생이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돌봄공백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종단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종속변수인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는 초등학생이 돌봄공백에 처해 있는 정도를 네 개 단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범주는 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 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하였고, 설정된 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수식에서 i, t는 각각 개별 학생과 학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표본의 크기는 2,116이고, 학생별로 3개 학년동안의 자료를 이용하므로 1 ≤ i ≤ 2, 116, 1 ≤ t ≤ 3 이다.
수식에서 돌봄공백 는 관측되지 않는 잠재변수이고, 이 값이 가장 낮은 경우 돌봄공백 아님, 그 다음은 순서대로 돌봄공백 낮은 정도, 돌봄공백 중간 정도, 돌봄공백 높은 정도 집단에 속한다고 본다. 즉 돌봄공백 값에 따라 관측 가능한 돌봄공백it 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식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경계값(cutoff point) ξ1, ξ2, ξ3 은 응답자가 4개의 집단 중 어디에 속할지에 대한 내재된 기준이다. 그리고 오차항 μi, νit 각각에 대해서는 (단, Iit : Xit, Zi를 모두 포함하는 벡터)이고, νit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각 학생 개인별 비관측 시간불변 오차항에 대해 임의성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모형의 추정량은 패널순서형로짓임의효과(panel logit random effect) 추정량을 의미한다. Xit 는 초등학생의 학년 진급에 따라 변하는 변수로 구성된 벡터이고, Zi는 시간 불변의 변수로 구성된 벡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돌봄공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 성별, 손위 또는 손아래 형제・자매 유무와 같은 형제구조,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부모학력, 거주지가 읍면지역인지 여부, 방과후서비스 충분성 등의 변수들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변수 중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등은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변수로 Xit 에 해당하고, 학생 성별, 손위 및 손아래 형제・자매 유무, 부모학력, 거주지가 읍면지역인지 여부, 방과후서비스 충분성 등은 시간 불변 변수로 Zi에 해당한다. 특히 학년 더미변수를 투입하여 모든 학생의 학년 진급에 따른 공통적인 특성도 통제하였다.
전술한 분석방법에 따른 추정치 산출에는 STATA 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산출된 추정치는 다중대체법으로 얻어진 20개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통합추정치이다.
Ⅳ. 연구결과
1.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구분된 4개 수준에 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아동이 방과후 돌봄공백에 처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순서형로짓 모형을 이용해 임의효과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는데, 제시한 추정치는 다중대체법을 이용해 결측대체된 20개의 온전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통합 추정치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R검정(Likelihood‐Ratio test)9)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패널 자료의 개체별 이질성을 고려해 설정한 패널순서형로짓 임의효과 모형이 합동순서형로짓 모형보다도 더 적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 계수 | (표준오차) | 승산비 | ||
|---|---|---|---|---|
| 맞벌이여부 | 2.294*** | (0.104) | 9.911 | |
| 가구소득(연평균) | -0.264*** | (0.072) | 0.768 | |
| 성별 | -0.134 | (0.116) | 0.874 | |
| 부모학력 | 전문대졸 | -0.420** | (0.164) | 0.657 |
| 4년제 이상 | -0.589*** | (0.139) | 0.555 | |
| 형제구조 | 손아래있음 | -0.232 | (0.199) | 0.793 |
| 손위있음 | 0.870*** | (0.188) | 2.387 | |
| 읍면지역 | 0.109 | (0.151) | 1.115 | |
| 방과후서비스충분성 | 0.060 | (0.071) | 0.942 | |
| 학년 | 2학년 | 0.359*** | (0.083) | 1.431 |
| 3학년 | 0.283*** | (0.084) | 1.327 | |
| Log likelihood | -5042.892 | |||
| LR χ2 (df) | 590.46***(11) | |||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맞벌이여부, 가구소득, 부모학력, 손위형제자매 있음, 학년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여부에 대한 추정계수(b=2.294, exp(b)=9.911)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방과후 돌봄공백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추정계수는 가구소득과 부모학력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제하여 얻어진 값이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맞벌이가 자녀의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영향요인이 부모의 맞벌이임을 밝힌 선행 연구 결과(Cain & Hofferth, 1989; Casper & Smith, 2004; Vandivere, Tout, Capizzano & Zaslow, 2003)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방과후 돌봄공백이 아닐 가능성은 커지고 돌봄공백이 높은 정도 수준일 가능성은 작아져 취약한 가정배경이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추정계수는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에 대한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이었던 맞벌이 가정여부를 통제하여 산출된 값이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 자녀라는 조건이 같다면 부모의 가구소득이나 부모학력이 높은 수준일 때 돌봄공백 가능성이 더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는 경제력이나 인적자본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자녀 돌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의 방과후 돌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경우 저소득층과 부모학력이 낮을 때 자녀가 방과후 돌봄공백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한 김지경과 김균희(2013)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손위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 외동인 경우에 비해 방과후 돌봄공백 아님보다는 돌봄공백 높은 정도일 가능성이 커져 돌봄의 역할을 손위 형제나 자매가 맡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손위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돌봄역할을 기대하며 방과 후에 자녀끼리 둘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준호, 박현정, 2012; Vandivere, Tout, Capizzano & Zaslow, 2003).
또 1학년에 비해 2학년, 3학년 때는 방과후 돌봄공백 아님보다는 돌봄공백 높은 정도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초등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선행연구들(김지경, 김균희, 2013; Cain & Hofferth, 1989; Casper & Smith, 2004; Vandivere, Tout, Capizzano & Zaslow, 2003) 과 일관된 결과이다. 이는 초등학생이 학년이 진급할수록 부모가 자녀가 자기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홀로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성별이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음의 계수로 나타난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방과후 돌봄공백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실제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도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되기도 하였지만(Vandivere, Tout, Capizzano & Zaslow, 2003),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없다고 밝혀지기도 하였다(Casper & Smith, 2004). 그리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었다. 또한,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방과후 서비스가 수요 대비 적정하게 공급되었는지를 의미하는 방과후서비스충분성에 대한 추정계수는 음수이다. 이는 방과후 서비스가 수요에 맞게 충분히 공급될수록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작아진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런 결과는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에 대한 한계효과
<표 2>에서 제시하는 계수는 방과후 돌봄공백이 아닐 확률에 비해 돌봄공백이 높은 정도일 확률이 더 클지 또는 작을지에 대한 방향성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공백 수준 각각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된 영향요인들에 대해 한계효과를 확인하였다. 한계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개별효과인 μi는 0이라고 가정되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에 대한 한계효과
| 공백아님 한계효과 (표준오차) | 낮은정도 한계효과 (표준오차) | 중간정도 한계효과 (표준오차) | 높은정도 한계효과 (표준오차) | ||
|---|---|---|---|---|---|
|
|
|||||
| 맞벌이여부 | 0.335*** | 0.165*** | 0.090*** | 0.080*** | |
| (0.017) | (0.010) | (0.006) | (0.006) | ||
|
|
|||||
| 가구소득 | 0.035*** | 0.017*** | 0.009*** | 0.008*** | |
| (0.010) | (0.005) | (0.003) | (0.003) | ||
|
|
|||||
| 부모학력 | 전문대졸 | 0.069* | 0.033* | 0.019** | 0.017** |
| (0.025) | (0.012) | (0.007) | (0.006) | ||
|
|
|||||
| 4년제 이상 | 0.090*** | 0.044*** | 0.024*** | 0.022*** | |
| (0.022) | (0.010) | (0.006) | (0.006) | ||
|
|
|||||
| 형제구조 | 손아래 있음 | 0.024 | 0.014 | 0.006 | 0.005 |
| (0.022) | (0.012) | (0.005) | (0.004) | ||
|
|
|||||
| 손위 있음 | 0.132*** | 0.067*** | 0.035*** | 0.030*** | |
| (0.024) | (0.013) | (0.007) | (0.006) | ||
|
|
|||||
| 학년 | 2학년 | 0.051*** | 0.026*** | 0.014*** | 0.012*** |
| (0.012) | (0.006) | (0.003) | (0.003) | ||
|
|
|||||
| 3학년 | 0.040*** | 0.020*** | 0.011*** | 0.009*** | |
| (0.012) | (0.006) | (0.003) | (0.003) | ||
먼저 맞벌이 가정인 경우 자녀가 돌봄공백 상황에 처해있지 않을 가능성은 33.5%p 더 낮지만, 돌봄공백 낮은 정도, 돌봄공백 중간 정도, 돌봄공백 높은 정도일 가능성이 각각 16.5%p, 9.0%p, 8.0%p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학력의 경우 전문대졸 집단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돌봄공백 상황이 아닐 가능성은 6.9%p 더 높지만, 돌봄공백 정도가 낮은 정도에 대해서는 3.3%, 중간 정도에는 1.9%p, 높은 정도에는 1.7%p 더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4년제 이상이면 돌봄공백 상황이 아닐 가능성은 9.0%p 더 높지만, 돌봄공백 정도가 낮은 정도에 대해서는 4.4%p, 중간 정도에는 2.4%, 높은 정도에는 2.2%p 더 낮게 확인된다.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와 전문대졸 및 4년제 대졸 이상 집단 각각을 비교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학력의 위계순에 따라 돌봄공백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돌봄공백 낮은 정도, 중간 정도, 높은 정도의 가능성은 부모학력 위계와 역순으로 가능성의 크기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위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 돌봄공백이 아닐 가능성은 외동보다 13.2%p 더 낮지만, 돌봄공백이 낮은 정도는 6.7%p, 중간 정도는 3.5%p, 높은 정도는 3.0%p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에서도 1학년 시기보다 돌봄공백이 아닐 가능성은 더 낮지만, 돌봄공백 정도 모든 수준에서 그 가능성은 더 높게 확인된다.
한편 맞벌이 여부, 부모학력, 형제 구조, 학년과 같은 더미변수와 달리 가구소득은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표 3>에서 제시한 한계효과는 가구소득에 대한 평균적 한계효과 값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구분된 서로 다른 네 개 수준별로 가구소득의 모든 값에 대한 한계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에 대한 가구소득의 한계효과
| 가구소득 (ln가구 소득) | 공백아님 | 낮은정도 | 중간정도 | 높은정도 | ||||
|---|---|---|---|---|---|---|---|---|
|
|
|
|
|
|||||
| 한계효과 | (표준오차) | 한계효과 | (표준오차) | 한계효과 | (표준오차) | 한계효과 | (표준오차) | |
|
|
||||||||
| 1 | 0.406** | (0.130) | 0.224*** | (0.010) | 0.165*** | (0.036) | 0.205* | (0.091) |
|
|
||||||||
| 2 | 0.459*** | (0.117) | 0.220*** | (0.016) | 0.150*** | (0.035) | 0.171* | (0.070) |
|
|
||||||||
| 3 | 0.514*** | (0.102) | 0.212*** | (0.021) | 0.133*** | (0.032) | 0.141** | (0.052) |
|
|
||||||||
| 4 | 0.568*** | (0.085) | 0.200*** | (0.023) | 0.117*** | (0.026) | 0.115** | (0.037) |
|
|
||||||||
| 5 | 0.621*** | (0.066) | 0.185*** | (0.022) | 0.101*** | (0.021) | 0.094*** | (0.026) |
|
|
||||||||
| 6 | 0.671*** | (0.048) | 0.167*** | (0.019) | 0.086*** | (0.015) | 0.076*** | (0.017) |
|
|
||||||||
| 7 | 0.718*** | (0.032) | 0.149*** | (0.014) | 0.072*** | (0.010) | 0.061*** | (0.010) |
|
|
||||||||
| 8 | 0.761*** | (0.019) | 0.131*** | (0.009) | 0.060*** | (0.006) | 0.049*** | (0.006) |
|
|
||||||||
| 9 | 0.799*** | (0.011) | 0.113*** | (0.006) | 0.049*** | (0.004) | 0.039*** | (0.003) |
|
|
||||||||
| 10 | 0.833*** | (0.012) | 0.096*** | (0.006) | 0.040*** | (0.004) | 0.031*** | (0.003) |
|
|
||||||||
| 11 | 0.863*** | (0.017) | 0.080*** | (0.009) | 0.032*** | (0.004) | 0.025*** | (0.004) |
|
|
||||||||
| 12 | 0.888*** | (0.020) | 0.067*** | (0.011) | 0.026*** | (0.005) | 0.020*** | (0.004) |
<표 4>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상황에 처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돌봄공백이 낮은 정도, 중간 정도, 높은 정도에 속할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2>에서 확인된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에 대한 가구소득의 추정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봄공백의 낮음, 중간, 높음과 각 수준에서 가구소득의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의 크기 변화양상이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돌봄공백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의 한계효과 크기 자체는 커지는 가운데 한계효과의 변화량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돌봄공백이 높은 정도일 가능성에 대해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의 한계효과는 감소하지만, 한계효과의 변화량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 즉 방과후 돌봄공백 아님과 높은 정도일 가능성 각각에 대한 한계효과는 모든 가구소득 수준에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변화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돌봄공백 낮은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효과 자체는 줄어들지만 한계효과의 변화량은 점차 증가하다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돌봄공백 중간 정도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효과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계효과의 변화량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돌봄공백 낮은 정도에 속할 가능성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소득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지만, 돌봄공백 중간 정도에 속할 가능성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소득변화의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소득변화에 따른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 각 수준에 속할 가능성의 변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 최하 두 개 집단에서 방과후 돌봄공백 아님, 낮은 정도, 중간 정도, 높은 정도 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비교해 보면 집단별로 40.6%, 22.4%, 16.5%, 20.5%와 45.9%, 22.0%, 15.0%, 17.1%이다. 따라서 소득수준 최하 두 개 집단에 대한 가능성 차이는 5.4%p, -0.4%p, -1.5%p, -3.4%p이다. 즉 가구소득 최하위 집단에서는 가구소득 상승이 방과후 돌봄공백이 아닐 가능성을 상당수준 높이고, 돌봄공백 높은 정도에 속할 가능성은 일정부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소득수준 최상 두 개 집단에서 방과후 돌봄공백 아님, 낮은 정도, 중간 정도, 높은 정도 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비교해 보면 집단별로 86.3%, 8.0%, 3.2%, 2.5%와 88.8%, 6.7%, 2.6%, 2.0%이다. 따라서 소득수준 최상 두 개 집단에 대한 가능성 차이는 2.5%p, -1.4%p, -0.6%p, -0.5%p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최상인 두 집단에서는 방과후 돌봄공백 각 수준에 속할 가능성의 차이가 미미함을 보여준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한계효과의 크기 변화와 가구소득 최하 및 최상 집단 간 한계효과 비교 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 증가의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즉 가구소득이 방과후 돌봄공백 아님 및 높은 정도에 속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클 수 있다.
Ⅴ. 결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영향요인을 방과후 돌봄공백이 아님, 낮은 정도, 중간 정도, 높은 정도와 같은 네 개 수준으로 구분된 값에 대해 패널순서형로짓 모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가장 주된 영향요인은 맞벌이로 확인되었다. 즉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정 확대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실 현대사회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적자본 투자가 이뤄졌고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 고등교육의 성별 격차는 거의 없어졌다(김기헌, 방하남, 2005),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이러한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뿐 아니라 외벌이로는 가정경제를 운영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기인한다(Esping-Anderson, 2002).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지가 되어 있다. 특히 가정 내 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전과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가정 내 돌봄 부재로 이어진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공적 자원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 및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도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 낮은 가구소득과 저학력으로 대변되는 취약한 가정배경의 자녀가 방과후 돌봄공백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는 취약계층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정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자녀가 방과후 돌봄공백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 가정배경에 의해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가용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기도 한다. 그런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취업시장에 재진입할 때 직업지위는 낮아지고 고용의 불안정성은 높아지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한다(김민영, 2010). 그리고 이전 직업의 근로소득이 적었고, 저학력인 여성일수록 이런 타격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김난주, 2016). 즉 취약한 가정배경의 어머니가 자녀 돌봄공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면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시 질 낮은 직업지위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취약계층의 한정된 자원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정책 마련 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결과는 부모들이 손위 형제・자매를 돌봄에 대한 보완적 장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들이 자녀를 홀로 두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결과도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돌봄공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시간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활 처리만은 아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는 적절한 정서적 지지, 충분한 휴식 시간, 균형 잡힌 간식 등 발달단계에 적합한 돌봄이 필요하다(류방란, 2004)
또한, 이렇게 어린 시기에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결핍은 청소년기와 그 이후 성장 과정에서도 심리・정서적 문제의 원인이 될 여지가 크다(정춘식, 2014).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단지 학년이 한 학년 진급했다고 해서 혼자 있게 되거나, 손위 형제・자매와 있게 되는 상황은 어린 학생에게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자기보호와 보호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초등학생에게 왜곡된 발달단계를 거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했다고 해서 혼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동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린 학생들의 돌봄공백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과후 돌봄공백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한편 유의미한 영향요인에 대해 방과후 돌봄공백 수준별로 한계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가구소득의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의 크기 변화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방과후 돌봄공백 낮은 정도와 높은 정도와 달리 돌봄공백 아님과 돌봄공백 높은 정도에 대한 한계효과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 증가에 따른 한계효과의 변화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효과의 변화량은 방과후 돌봄공백 낮은 정도에서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반면 돌봄공백 중간 정도에서는 감소하다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구소득의 변화가 방과후 돌봄공백 각 수준에 속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 비해 낮을 때 가구소득의 증가가 방과후 돌봄공백 높은 정도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정도가 더 컸다.
이는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실시되는 양육비 지원과 같은 소득보전 정책은 가구소득 수준과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정책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물질적 지원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실질적 증가가 높은 수준의 돌봄공백 가능성은 낮출 수 있지만 낮은 정도의 돌봄공백을 감소시키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양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가구소득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방과후 돌봄공백 높은 정도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는 작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정책을 계획할 때 일률적인 물질적 지원 방식보다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자녀의 실제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의 사례에서는 효과적인 돌봄정책은 현금 지원보다는 질 높은 공공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과 같은 돌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황옥경, 2009)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막는 데는 가구소득 보전뿐 아니라 체계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한 직접적인 대응책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회구조적 변화와 초저출산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각 가정,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나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는 요원할 것이다. 돌봄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출산율 제고, 교육격차 개선 등 우리 사회의 명운이 걸린 핵심사안임이 틀림없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는 돌봄정책 수립 시 가장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책적 개입을 통해 양질의 공적 돌봄 자원을 활용하여 개별 가정의 한정된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학생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동안의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 변화 양상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생들이 방과후 돌봄공백을 경험하지 않았다가 경험하게 되는지와 같은 돌봄공백 정도의 변화 양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공백의 변화 양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 및 방과후 돌봄공백 변화 양상이 학생들의 학교적응이나 효능감과 같은 발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비점이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기 바란다.
Notes
가족실태조사에서는 2010년에는 총 2,500가구 중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516가구, 2015년에는 총 5,018가구 중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793가구를 조사하였다(장혜경 등, 2015; 조희금 등,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학생의 시군구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자료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통합하였다. 한편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자료는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 자료가 국내에서 최초로 분석된 자료로 사용 가능한 다른 자료가 없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본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점상의 문제점이 불가피하게 내재하여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분석결과 해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변숫값을 이용해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방과후 돌봄공백의 분포를 살펴보면 방과후 돌봄공백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1학년 73.8%, 2학년 67.5%, 3학년 68.2%이고, 왜도는 학년별로 각각 4.24, 3.56, 3.78로 돌봄공백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런 경우 연속형 변수보다는 범주형 변수 설정이 더 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Shumow, Smith & Smith, 2009).
References
. (2012.03.12). 아동 돌봄정책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3/12/0200000000AKR20120312114100004.HTML에서 2017.9.19. 인출
. (2017a). 가족의 형태별 분포.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76&board_cd=INDX_001에서 2017.2.10. 인출
. (2017b).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I034&vw_cd=MT_ZTITLE&list_id=G_A_4_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7.2.10. 인출
. (2017c). 아동종합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parentId=D.1;D3.2;117_11774.3;117_11774.4#dhtmlgoodies_treeNode74.2에서 2017.2.10. 인출
, & (2004). Self care : Why do parents leave their children unsupervised?. Demography, 41(2), 285-301. [PubMed]
, & (1999). Children in self-care. The Future of Children, 9(2), 151-160. [PubMed]
, & (2007). Neighborhood crime and self-care: Risks for aggression and lower academic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321. [PubMed]
, , & (2001). Free‐time activities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6), 1764-1778. [PubMed]
, & (1988). The Relation between Third Graders’ After-School Care and Social, Academic, and 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4), 868-875. [PubMed]
, & (1999). When school is out : Vol. 9. The future of children. Los Altos, CA: David and Lucille Packard Foundation. After-school child care programs, , pp. 64-80.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07-31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9-20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9-27

- 3176Download
- 1878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