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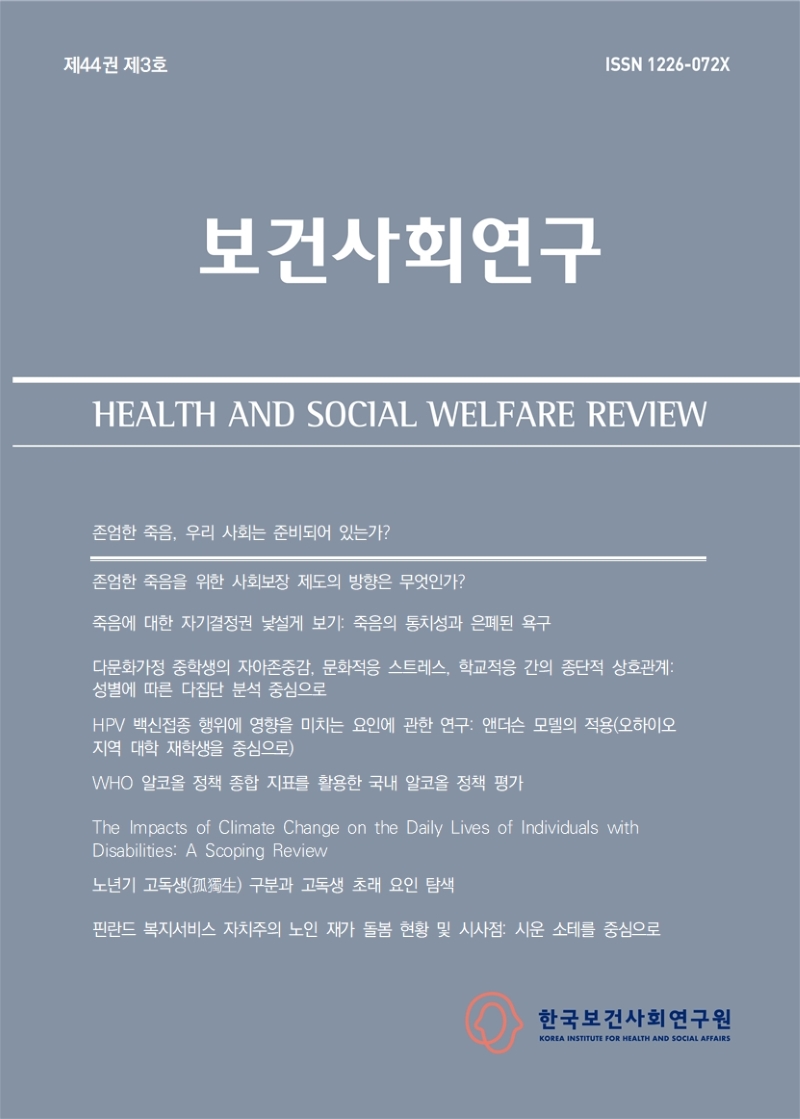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경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비급여 가격에 미치는 영향: 식사재료비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Competition on the Price of Non-Covered Servi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Evidence from Meal Ingredient Prices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급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영리 사업자의 수익 확대 동기,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가 맞물리면서 비급여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량제가 비급여 가격, 특히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요양시설 간 경쟁이 증가할수록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총량제와 같은 진입규제를 통해 공급자 수를 제한할 경우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자에 의한 경합가능성이 차단되면서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식사재료비는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이·미용비나 상급병실료와 달리 요양시설 입소자가 그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장기요양 인정자의 요양시설 접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요양시설 공급 규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some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introduced a quota system that limits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citing the detrimental effects of oversuppl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ompetition among long-term care providers on the price of non-covered meal ingredients at the facility level. The market was delineated at the county level, with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the number of care facilities, and provider density defined as indicators of competition. Data on non-covered meal ingredient prices from 5,154 care facilities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as competition among care facilities intensifies, the price of non-covered meal ingredients tends to decrease. Motivated by profit expansion, the growing demand for high-quality care services, and the activation of private long-term care insurance, the use of non-covered services is expected to increase, along with a rising demand for the expansion of non-covered service offerings. Considering these market conditions, the finding that competition among providers significantly impacts the price of non-covered meal ingredients suggests that a more cautious approach is necessary when implementing policies aimed at promoting competition or regulating supply.
초록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급과잉의 폐해를 지적하며, 장기요양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 시설급여 공급자 간 경쟁이 비급여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시설 단위에서 분석한다. 시군구를 시장으로 획정하여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요양시설 수, 공급자 밀도 등을 경쟁도 지표로 정의하고 요양시설 5,154개의 비급여 식사재료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분석 결과, 요양 시설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리 사업자의 수익 확대 동기,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등이 맞물려 비급여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비급여 서비스 범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비급여 식사재료비 가격에 공급자 간 경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경쟁 촉진 정책 또는 공급 규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수혜대상자가 증가하고 요양서비스의 확대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2년에 12조 5,742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2010년 대비 약 4.6배 증가한 수치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박선아, 202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가 정책을 통해 비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기제를 도입하였다. 급여 종류별 서비스 가격과 요양등급별 이용가능금액 한도를 통제하면서, 시설 및 인력 등의 진입 기준을 완화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를 사회복지법인에서 개인 또는 영리법인으로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였다.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진입 기준 완화 및 운영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공급기관을 증가시키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공급자 간의 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시장화 정책의 결과로 장기요양기관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1) 그러나 지난 15년간 장기요양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 되면서,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이 불법·편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물론, 잦은 폐업으로 인해 입소 노인들의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학계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쟁 및 운영주체의 다원화가 서비스 질과 급여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전용호, 2012; 이기주, 석재은, 2019a; 2019b; 2020 등). 이에 2018년 각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검토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었다. 2021년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시, 포천시, 오산시, 용인 처인구·기흥시, 화성시, 연천군 등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재정 악화의 문제를 들어, 공급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총량제는 인접 지자체로 장기요양기관 신청이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로 총량제 도입이 확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총량제는 신규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시설 운영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총량제와 같은 공급 규제가 서비스 가격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 어렵다. 과거 미국과 영국에서는 고령 인구 증가와 요양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공급을 제한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운영 주체의 다원화와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다수의 선행 연구는 미국과 영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과 가격 간의 부(-)의 관계를 확인하였 다(Nyman, 1994; Forder & Netten, 2000; Forder & Allan, 2014). 이처럼 경쟁 촉진과 공급 제한이 시설요양 서비스 시장에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시설급여 공급자 간 경쟁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입소자 유치를 둘러싼 시설 간 경쟁이 비급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다.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지불보상방식은 포괄수가제로, 요양등급별 1인당·1일당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고 비급여로 정한 항목 이외에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모든 용역과 물품 등의 비용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 비급여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 실제 소요비용에 근거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동일 항목이라도 시설 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법정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료, 이·미용비, 그리고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으로 제한된다(「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시설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상하수도료, 가스료 등)은 급여수가에 포함되며, 식사재료비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한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인건비 등 다른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액보다 많은 비용을 수납할 수 없다(「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이러한 비급여 가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 간 입소자 유치를 둘러싼 요양시설 간 경쟁은 비급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요양시설은 식사재료의 질을 경쟁 시설과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식재료 조달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화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 설정이 요양시설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시설 간 1끼당 식사재료비의 편차(167~5,600원)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급여 가격이 온전히 실제 소요비용만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2)
현재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높은 보장성으로 인해 요양시설의 수입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낮지만, 시설급여 이용자의 총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3) 더불어, 요양시설 입장에서는 침상당 매출과 수익이 고정된 요양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비급여 영역을 확대할 경제적 유인을 가진다. 또한, 경제력과 교육 수준 등에서 기존 노인층과는 이질적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으로 대거 편입되면서, 이들의 다양한 요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급여 서비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에서 제공하는 균일한 수준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상급병실은 물론 다양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나 이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포괄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총량제와 같은 공급 규제가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되었고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다양한 요양수요에 대응한 비급여 서비스 확대로 수급자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자 간 경쟁이 비급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 간 경쟁이 비급여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시설 단위 자료(5,154개 시설)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비급여 항목 중 식사재료비는 모든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로, 이·미용비나 상급병실료와 달리 입소자 입장에서 그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인정자의 요양시설 접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시설 이용자가 일반실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요양시설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중 식사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4)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시장 내 경쟁의 효과를 시설 단위에서 검토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특히 경쟁의 영향을 비급여 가격 측면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Ⅱ. 선행연구와 연구의 필요성
다수의 공급자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집중도는 개별 기업의 수요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집중도가 높아지면 소수 기업 간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지므로 기업은 가격을 높게 책정할 개연성이 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서는 일찍이 고령인구 및 요양수요 증가로 장기요양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지자, 이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는 공급 제한을, 서유럽에서는 경쟁 촉진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간 경쟁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경쟁과 서비스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경쟁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요양서비스의 가격을 관찰하기 어려운 데다 서비스의 다양성으로 인해 가격을 표준화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국가마다 요양시설 운영제도와 정책수단으로서 경쟁촉진 및 공급규제의 맥락이 다르므로, 이하에서는 요양시설 서비스 시장 내 경쟁과 가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전문요양시설에서 단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와 저소득층에 한해 각각 메디케이드(Medicaid)와 메디케어(Medicare)에서 요양시설 이용료를 보조하고,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닌 경우 개인이 요양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요양시설 서비스 가격은 엄격히 규제되고, 본인전액부담자(private-pay)에 한해 시설 간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5)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요양시설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수급자와 함께 본인전액부담자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이용료 부담 주체와 서비스 가격에 상관없이 입소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Harris-Kojetin et al., 2019). 미국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주요 정책 이슈는 공급 규제, 요양시설에 대한 공시 강화, 운영주체(사모펀드, 비사모펀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규제, 그리고 메디케이드 수가 인상 등으로, 각 정책수단이 서비스질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장기요양시장 내 경쟁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인데, 이는 요양시설에 부과된 공급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0년대 의료 및 요양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의료비용이 급증하자, 정부는 요양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투자를 제한하였다. 1978년 CON(Certificate of Need)법을 통해 신규 진입과 기존 시설의 증설 등 의료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을 제한하고 일부 주는 건축유예(construction moratoria)를 통해 수요에 상관없이 병상수를 제한하였다. CON을 도입한 주에서는 새로운 의료시설의 설립 및 확장 시 주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자 기존 요양시설들은 서비스 수준을 낮추거나 돌봄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거부하는 식으로 대응하였다(Grabowski et al., 2003). 장기요양시장 내 경쟁과 가격에 대한 실증연구는 본인전액부담자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경쟁과 가격 간 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Nyman, 1994; Mukamel et al., 2005; Gulley & Santerre, 2007; Ching et al., 2015; Huang et al., 2021). Nyman(1994)과 Ching et al.(2015)은 위스콘신주와 같이 공급 제약으로 경쟁이 낮은 주에서 요양원은 서비스 질을 낮추고 높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높은 마크업(mark-up)을 누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들은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CON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도리어 CON 규제가 기존 요양시설의 집중도와 시장지배력을 높여 전액본인부담 시장의 가격 인상을 초래함으로써 고령자의 자산 소진을 앞당기고 메디케이드에 조기 의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Huang et al.(2021)이 미국 8개 주의 요양시설 가격 데이터를 이용해서 입소율이 높은 요양원일수록, 집중도가 높은 시장일수록 가격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6)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돌봄 필요도와 자산 수준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인정한 자에 한해,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의료성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연계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한다. 2023년 기준 자산이 23,250파운드 이상인 자는 비의료성 요양 서비스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요양시설 입주자의 비용부담 주체는 2014년 기준 지방정부 보조 49%, 전액본인부담 41%, NHS(National Health Service) 10%로 구성된다(UK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2017). 초기에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였으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자 서비스 공급을 외부에 위탁하는 등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등 공급기관을 다원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7) 요양시설은 지방정부로부터 요양서비스 계약의 수주뿐만 아니라 전액본인부담자 유치를 위해 경쟁한다. 미국에서는 CON과 같은 공급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쟁의 영향이 주로 논의된 반면, 영국에서는 요양서비스 시장화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서비스 가격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Forder and Netten(2000)은 경쟁이 10% 증가하면 요양서비스 가격이 평균적으로 4% 낮아지며, 런던의 경우 가격이 8%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Forder and Allan(2014)은 경쟁이 10% 증가할 경우 가격이 2.2% 감소하지만, 이와 함께 요양시설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의 질도 저하됨을 보였다. Allan et al.(2020) 은 요양서비스 구매자인 지방정부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클수록 공공부담자와 본인부담자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지만, 이러한 효과는 시장 내 경쟁이 낮을수록 감소하며, 공급자 간 경쟁이 증가할수록 가격 격차가 축소됨을 확인하였다.8) 이는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부담자에게 부과된 가격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호주 정부는 돌봄필요도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요양시설 보조금의 수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며, 수급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요양시설 인가 경쟁 입찰(Aged Care Approvals Round, ACAR)을 통해 지역별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한다(Yang et al., 2022).9) 또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별 인구 규모와 구성을 고려하여 목표공급률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제한한다. 요양시설은 2018년 기준 207,800개소이며 입소율은 90%에 이르나, 목표공급률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초과 수요와 긴 대기시간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양시설 이용 비용은 크게 숙식비, 기본돌봄비, 자산연계 돌봄비(means-tested care fees), 추가서비스 비용 등 네 가지로 구성되며, 공급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하되 일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Yang et al.(2021)은 경쟁이 서비스 가격 또는 품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요양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 공시와 가격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기인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경쟁이 장기요양 시설급여 시장에서 재정부담 완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시설급여 공급자 간 경쟁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 보험제도 내 경쟁 및 운영주체의 다원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적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된 총량제가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공급자 간 경쟁이 가격이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입소자 유치를 둘러싸고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영리 사업자의 비급여 서비스를 통한 수익 확대 동기,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공급자 경쟁이 비급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10) 전술한 해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경쟁과 가격 간 부(-)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국가별로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도가 상이하므로, 이러한 해외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 시설급여 시장에서의 경쟁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Ⅲ. 분석 방법
1. 분석 모형
본 연구는 경쟁도 또는 집중도가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비급여 서비스 시장은 공급자가 시설 소재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하므로 완전경쟁시장이라기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인정자는 특정 요양시설의 서비스에 대해 선호를 가질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자신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경쟁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완전경쟁시 장에서 개별 기업의 가격은 생산비용, 시장 전체 수요의 가격탄력성11), 개별 기업 수요의 가격탄력성12), 그리고 개별 기업의 가격 변화에 대한 여타 기업의 대응변화, 즉, 상호의존적 변이(conjectual variation)에 의해 결정된다 (Cubbin, 1974; Nyman, 1994). 본 연구는 경쟁도와 가격 간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전술한 이론 모형에 근거하여 추정 모형을 구축하되,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통제하기 위해 Nyman(1994), Forder and Netten(2000), Forder and Allan(2014) 등 기존 연구에서 요양시설의 경쟁도와 가격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시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pricei는 시설 i의 비급여 가격을, Compj는 시장 j의 경쟁도를 나타낸다. Xi는 시설 i의 비급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수요 및 생산비용과 관련된 설명변수 벡터로서, 해당 시군구의 후기고령자 수, 시도 표준공시지가, 상급 침상수, 업력, 규모(침상수), 입소율, 운영주체 등을 포함한다. regioni는 시도 고정효과를, ϵi는 임의오차와 미관측 특성을 포착한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 모형에 반영되지 않은 생산비용과 수요 측면의 요인 등을 포착하기 위해 시도 고정효과를 사용한다.
과점시장 이론에 따르면, 시장 집중도가 높을수록 가격-비용 마진이 증가하나(Cowling & Waterson, 1976),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는 실증연구에서는 집중도 변수의 내생성 문제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집중도 변수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내생성 문제를 가진다(Evans et al., 1993). 먼저, 시장구조가 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시장성과도 시장구조에 미치는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및 동시성 편의(simultaneity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수익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기업의 진입이 활발하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일수록 퇴출이 활발할 개연성이 있다. Demsetz(1973)는 집중도 및 시장지배력이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보다는 소수 기업의 높은 효율성이 이윤율과 집중도를 높인다고 보았다. 즉, 소수의 기업이 어떤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용을 가질 경우 이들의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산업의 평균 비용이 감소하여 이윤율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집중도 지표는 대개 매출액의 함수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가격과 생산량이 내생적이므로 매출액을 토대로 산출된 집중도 지표도 내생변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에 대응하여 집중도와 가격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존 연구에서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나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다만, Forder and Netten(2000)은 시장구조 및 시장규모가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개별 기업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사소하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도 지표를 외생변수로 간주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장기요양 시장에서 개별 시설의 수입의 대부분은 가격이 통제된 급여요양비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비급여 항목의 수입, 그중에서도 식사재료비는 시설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13) 따라서 개별 시설이 시장구조에 반응하여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으나, 개별 시설의 식사재료비 가격이 시장 경쟁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기요양 시장에서 개별 시설의 비급여 식사 재료비 가격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미미하다는 점에서 경쟁도 지표를 외생변수로 간주한다.
분석에 이용된 비급여 가격은 1끼당 식사재료비이다.14)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사 용료, 이미용비, 경관영양유동식비, 간식비 등으로 구성된다. 대개 일반침실을 이용하는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은 급여요양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공통으로 제공되고 입소자 입장에서는 제공 여부 및 빈도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식사재료비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이후 최종 업데이트된 비급여 가격을 이용하되, 식사재료비에 간식비를 포함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시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경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요양시설일수록 수요대체성(demand substitutability)이 높고, 요양시설 진입 및 퇴출에 대한 규제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시군구 단위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를 시장으로 정의한다.15) 장기요양시설의 시장 경쟁도를 HHI(Hirschman-Herfindahl Index)로 측정하되, 공급자 수와 공급자 밀도를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HHI는 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며 경쟁도의 대리지표로 사용된다. HHI 산출 시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사용되나, 시설별 매출액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매출액이 침상 수에 대체로 비례한다는 점에서, 시군구의 전체 시설 정원에서 각 시설의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HHI 산출에 사용하였다(Forder & Allan, 2014; Allan & Nizalova, 2020).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급자의 매출액(가격)으로 측정한 경쟁도 지표는 내생변수로 볼 수 있다. HHI 대신 공급자 수를 사용함으로써 내생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급자 수는 공급량 또는 매출액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HHI 또는 공급자 수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밀도는 요양시설 간 경쟁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요양시설 1개당 시장규모를 의미한다(Forder & Netten, 2000). 여기에서는 분석 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공급자 밀도를 시장 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또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1만 명당 요양시설 수로 측정한다.
시장수요는 경쟁도와 개별 시설의 가격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높을수록 요양시설의 진입이 활발하여 경쟁도가 증가하는 한편, 수요가 높을수록 가격을 높게 설정할 개연성이 있다. 시장 간 수요 차이를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 수와 고유오차항 간 정(+)의 상관관계가 발생하여 공급자 수와 가격 간 부(-)의 관계가 일정 부분 상쇄됨으로써 경쟁의 효과가 과소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경쟁효과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시장수요를 통제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수에 로그를 취하여 시장수요를 대리한다.
가격은 시장구조 또는 시장수요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생산비용의 함수이다. 요양시설의 생산비용 관련 요소는 수급자, 시설, 그리고 시장 수준에서 존재한다. 요양필요도 등 수급자의 특성, 요양·간호·치료 인력 1인당 입소자 수, 상급침실 수, 임대료 및 지가 등 시설의 특성은 모두 비급여 서비스 가격에 반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입소자의 특성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생산비용과 관련된 시설 특성으로 시도 단위 표준공시지가, 상급침실 수, 업력, 정원 기준 시설규모 등을 사용한다.
소재지의 지가는 비중이 큰 생산비용으로서 개별 시설의 비급여 가격에 반영될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정원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할 수 없고 이를 소유하도록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소재지의 지가는 시장 진입 여부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지가가 높을수록 공급자 수는 감소하여 비급여 가격이 높아지는 한편(HHI는 증가하고), 지가가 높을수록 개별 기업의 비급여 가격은 높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더해, 지가는 생산비용의 지표로서 경쟁도와 비급여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수준의 지표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Nyman, 1994; Forder & Allan, 2014).16) 지가를 통제함으로써 경쟁도의 추정계수는 최대한 경쟁도 자체의 효과를 포착한다. 지가는 시도 단위 표준공시지가 평균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측정한다.
다음으로, 1·2인실로 구성된 상급침실 수가 많을수록 시설의 전반적인 물적·인적 서비스 수준이 높을 개연성이 있고 이는 높은 생산비용을 통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요양시설의 업력이 길수록 초기 투자비용 회수의 유인이 낮고 경험에 기반한 운영 효율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게 설정할 개연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침상수가 많을수록 요양시설 지정을 위해 요구되는 인적·물적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규모까지는 생산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 가격을 높게 설정할 개연성이 있다.
그밖에 개별 시설의 비급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단위 특성으로는 입소율과 운영주체를 들 수 있다. 시장구조, 시장규모, 또는 생산비용에 상관없이 개별 시설의 입소율은 비급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입소율이 낮은 시설일수록 비급여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입소자를 추가 유치할 유인을 가진다. 또한, 운영주체별로 이윤 추구의 동기가 상이하고 이는 개별 시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양시설의 운영주체는 정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으로 구분 가능하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리성을 가진 영리법인이나 개인은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 및 지자체에 비해 비급여 가격을 높게 설정할 개연성이 있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를 위해 2024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시설별 상세정보조회서비스에서 각 기관의 유형, 주소, 지정일자, 설치일자 등 일반정보를 비롯하여 인력, 시설, 입원 인원, 비급여항목 가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분석 대상이 시설급여 제공기관이므로, 자료 추출 시 대상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한정하였다. 휴·폐업 및 불성실 공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보 게재 최종일자가 2020년 이전인 시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일반 정보가 공시된 시설은 총 6,181개로, 이 중 식사재료비 가격이 공시된 기관은 5,834개이다.17) 식사재료비에 간식비를 포함하여 공시한 시설, 시설 및 인력 구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시설, 정원 및 현원 정보가 부정확한 시설,18) 영리·비영리로 구분되는 운영주체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시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한 시설은 총 5,154개이다. 표본의 지역별 구성을 살펴보면, 강원 277개, 경기 1,791개, 경남 204개, 경북 362개, 광주 88개, 대구 218개, 대전 122개, 부산 107개, 서울 379개, 세종 19개, 울산 49개, 인천 426개, 전남 259개, 전북 211개, 제주 62개, 충남 309개, 충북 271개이다.
표본의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1끼당 비급여 식사재료비는 평균 2,897원으로, 166~5,600원에 분포한다. 평균 식사재료비는 노인요양시설이 2,905원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875원)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19) 식사재료비 평균은 지역별로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가 4,200원으로 가장 높고 전북 장수군이 1,500원으로 가장 낮다. 군 소재 시설의 식사재료비 평균은 2,441원으로, 시구 소재 시설 (2,978원)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광역시도별로는, 서울(3,614원), 경기(3,230원), 인천(3,078원) 순으로 높고 경북(2,200원), 전남(2,250원), 전북(2,291원) 순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평균 식사재료비는 2,586원으로 그 외 운영주체(2,979원)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식사재료비가 단순히 실제 소요비용만을 반영하 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표 1
기술통계량
| 구분 | 평균 | 중앙값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식사재료비(원) | 2,897.7 | 3,000 | 635.0 | 166.7 | 5,600 |
| 식사재료비_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원) | 2,875.2 | 3,000 | 657.4 | 833.3 | 4,700 |
| 식사재료비_노인요양시설(원) | 2,905.2 | 3,000 | 627.2 | 166.7 | 5,600 |
| HHI# | 1,531.3 | 977.3 | 1,656.3 | 93.1 | 10,000 |
| 공급자 수(개)# | 24.8 | 18 | 25.9 | 1 | 182 |
| 공급자밀도_인정자(개)# | 57.5 | 49.7 | 36.2 | 4.5 | 210.3 |
| 공급자밀도_75세 이상(개)# | 15.2 | 13.5 | 10.1 | 1.2 | 61.8 |
| 75세 이상 고령자(명)# | 15,803.9 | 9,288.4 | 14,146.5 | 1,083.5 | 47,738.5 |
| 상급침실수(개) | 4.4 | 2 | 7.2 | 0 | 140 |
| 시도 표준지가(원) | 1,449,154 | 1,120,993 | 1,318,964 | 363,120 | 6,062,169 |
| 업력(년) | 7.3 | 7 | 4.9 | 0 | 15 |
| 정원(명) | 40.0 | 29 | 34.6 | 5 | 389 |
| 입소율(%) | 85.5 | 90.7 | 17.1 | 0 | 100 |
| 비영리법인* | 0.21 | 0 | 0.41 | 0 | 1 |
| 군 소재지* | 0.15 | 0 | 0.36 | 0 | 1 |
주요 경쟁도 지표인 HHI는 평균 1,531로,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시장은 어느 정도 집중된 시장에 해당한다.20) HHI가 1,000 미만인 시군구는 131개, 1,000~1,800인 시군구는 55개, 1,800 이상인 시군구는 64개이다. 시군구 내 요양시설은 평균 25개이며, 장기요양 인정자 1만 명당 57개, 75세 이상 고령자 1만 명당 15개이다. HHI와 식사재료비간 단순 상관관계 계수는 –0.186으로, 경쟁이 증가할수록 식사재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식사재료비는 HHI가 1,000보다 작으면 평균 2,930원, 1,000~1,800이면 2,769원, 1,800 이상이면 2,660원으로,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식사재료비가 낮게 나타난다. 그 외 경쟁도 대리변수인 공급자 수와 공급자 밀도 등이 증가할수록, 즉 경쟁이 증가할수록 식사재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군구 내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는 평균 15,803명으로, 1,084명(경북 울릉군)~47,739명(경기 남양주시)에 분포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잠재적 시장규모가 시군구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후기고령자수와 식사재료비 간 상관 관계 계수는 0.337로, 후기고령자가 많은 시군구일수록 식사재료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시설별 상급침실수는 평균 4.4개로, 상급침실이 없는 시설이 1,370개에 이른다. 시도 표준공시지가는 평균 1,449,154원으로, 363,120원(전남)~6,062,169원(서울)에 분포하며 식사재료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계수 (0.492)를 보인다. 장기요양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평균 업력은 7.3년으로 업력과 식사재료비 간 음의 상관관계 (-0.279)를 보인다.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평균 40명으로, 표본의 요양시설은 정원 기준 10인 미만 24.9%, 10~29 인 미만 33.8%, 30~49인 미만 16.4%, 50~100인 미만 19.9%, 100인 이상 5%로 구성된다. 입소율은 평균 85.5%로, 입소정원 또는 입소율이 높을수록 식사재료비가 높은 경향이 있다.
Ⅳ. 분석 결과
<표 2>는 경쟁이 장기요양 비급여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표 2>의 모형 (1)~(4)는 경쟁도 지표로 HHI, 공급자 수, 장기요양 인정자 1만 명당 요양시설 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1만 명당 요양시설 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경쟁도 지표에 상관없이,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모든 추정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HHI가 낮아질수록(경쟁이 증가할수록), 요양시설 수가 증가할수록, 장기요양 인정자 1만 명당 또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1만 명당 요양시설 이 많을수록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1)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품질이 함께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이 증가하더라도, 식사재료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입소자 유치를 위해 식사재료비를 경쟁적으로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2
공급자 경쟁이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1) HHI | (2) 공급자 수 | (3) 공급자 밀도 _인정자 | (4) 공급자 밀도 _75세 이상 | |
|---|---|---|---|---|---|
| 경쟁도 | 0.034*** (0.012) | -1.272*** (0.266) | -1.045*** (0.192) | -3.548*** (0.649) | |
| 후기고령자 | 121.142*** (17.043) | 152.387*** (18.637) | 94.252*** (13.916) | 95.402*** (13.92) | |
| 상급침실수 | 3.402*** (0.927) | 3.271*** (0.926) | 3.323*** (0.925) | 3.317*** (0.925) | |
| 시도표준지가 | 231.531*** (15.979) | 213.66*** (16.623) | 219.328*** (16.076) | 218.503*** (16.109) | |
| 업력 | -16.054*** (1.532) | -16.516*** (1.534) | -16.595*** (1.533) | -16.633*** (1.533) | |
| 시설 규모 더미 | 10~29인 | 27.374 (16.865) | 24.36 (16.83) | 25.978 (16.818) | 26.338 (16.818) |
| 30~49인 | 98.643*** (20.477) | 90.126*** (20.446) | 92.438*** (20.411) | 93.233*** (20.407) | |
| 50~99인 | 196.605*** (21.042) | 191.445*** (21.019) | 192.143*** (20.999) | 192.777*** (20.996) | |
| 100인 이상 | 141.622*** (33.276) | 134.602*** (33.268) | 135.617*** (33.23) | 136.461*** (33.223) | |
| 입소율 | 2.096*** (0.375) | 1.991*** (0.375) | 1.949*** (0.375) | 1.953*** (0.375) | |
| 비영리법인 | -94.055*** (20.384) | -87.294*** (20.255) | -95.516*** (20.285) | -95.04*** (20.279) | |
| 상수 | -1401.924*** (246.562) | -1354.334*** (240.849) | -828.558*** (251.208) | -841.608*** (250.364) | |
| 시도더미 | 예 | 예 | 예 | 예 | |
| R2 | 0.51 | 0.512 | 0.512 | 0.512 | |
| 관측치 수 | 5,154 | 5,154 | 5,154 | 5,154 | |
장기요양서비스의 잠재적 수요자인 후기고령자가 많은 시장에 소재한 요양시설일수록 식사재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쟁도가 동일한 상황에서 잠재적인 수요자가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시장 가격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상급침실이 많을수록, 요양시설이 소재한 시도의 표준지가가 높을수록 식사재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급침실 수와 소재지의 표준지가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생산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급 침실이 많은 시설일수록 입소자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 보다 고가의 양질의 식사재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재지의 표준지가가 높을수록 식사재료의 실제 조달비용이 증가하거나, 가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식사재료를 제공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운영비가 식사재료비에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요양시설의 업력이 짧을수록, 입소정원의 규모가 대체로 클수록, 입소율이 높을수록, 개인 또는 영리법인일수록 식사재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길수록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등 경험에 기반한 운영 효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식사재료비가 낮아지거나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가격을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입소정원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식사재료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식사재료비는 입소정원 10인 미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는 입소정원의 규모가 클수록 식사재료비가 증가하다가 100인 이상 시설에서 감소하는 역U자 형태를 보인다.22) 입소정원 30인 미만 시설은 운영자가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할 의무가 없으므로, 초기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낮아 입소자 유치를 위해 식사재료비를 보다 낮게 설정할 여력이 있을 수 있다.23) 반면, 100인 이상 시설에서는 식사재료 조달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 경쟁 수준과 상관없이 해당 시설의 입소율이 낮을수록 입소자 유치를 위해 식사재료비를 낮게 부과할 유인이 존재한다. 비급여 서비스에 대해 실제 소요비용만을 부과토록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요양시설 일수록 식사재료비에 일정 수준의 마진을 반영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식사재료비를 부과하거나, 값비싼 양질의 식사재료를 제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장기요양 시설급여 공급자 간 경쟁이 비급여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시설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시군구를 시장으로 획정하여 HHI, 요양시설 수, 공급자 밀도 등을 경쟁도 지표로 정의하고 요양시설 5,154개의 비급여 식사재료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자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총량제와 같은 진입규제를 통해 공급자 수를 제한할 경우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자에 의한 경합가능성이 차단되면서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상승하고, 기존 공급자들은 보다 높은 마크업(markup)을 누릴 수 있다.
비급여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이고 향후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도 및 집중도가 비급여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그러나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하거나 대납한 실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24) 장기요양보험이 요양급여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보편적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비급여 및 기타 실비 항목을 두는 것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인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력, 교육 수준, 건강 수준, 일과 경험 등에서 기존 노인층과는 다른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대거 편입됨에 따라, 양질의 다양한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성장과 실손형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등장은 비급여 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범위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생명보험회사의 치매 및 장기간병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2,598억 원에서 2023년 1조 6,054억 원으로, 불과 6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회사들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판정되면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충형 장기간병보험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 7월에는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실손보장상품이 출시되었다.25) 동 상품은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후 시설 및 재가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금액(시설급여 월 70만 원, 재가급여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하고, 상급침실료 월 60만 원, 식사재료비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한다. 이미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실손형 간병보험 가입은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이 인하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장기요양 수급자의 비급여 이용량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윤희숙, 2008 ).26) 이에 따라 시설급여 공급자는 비급여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요컨대, 향후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비급여 서비스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자 간 경쟁이 비급여 식사재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정책 수단인 경쟁 촉진 또는 공급 규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급자 간 경쟁은 식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격을 통해 식재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공급자는 입소자를 유치하기 위해 식재료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인하하거나,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식재료 품질도 함께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경쟁의 품질 제고 효과는 가격이 고정된 규제 가격 하에서는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에서는 모호하다(Ma & Burgess, 1993; Gaynor, 2006). Ma and Burgess(1993)에 따르면, 품질에 고정비용이 존재하여 기업들이 품질을 결정한 후 가격을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품질 열세를 가격 인하로 보상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가격 조정은 더 높은 품질로 인한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기업들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은 경쟁사들이 이후에 어떠한 가격을 설정할지 예측하면서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과 품질이 동시에 결정될 경우 가격 경쟁을 고려하여 품질 투자를 줄이는 전략적 상호작용이 억제됨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품질 수준을 제공한다. Forder and Allan(2014)은 영국 요양시장에서 경쟁이 증가할수록 요양서비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요양 품질도 낮아짐을 보였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서도 경쟁이 증가할수록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격 하락이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양급여 서비스와 달리 개별 비급여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지표가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급여 항목 중 식사재료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급자 간 경쟁이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상급침실 또는 이·미용 서비스와 달리 식사 서비스는 이용 여부를 입소자가 선택할 수 없고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에서 식사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실 기준 높은 편이어서, 식사재료비가 수급자의 요양시설 접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식사재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다만, 경쟁이 비급여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상급침실료나 이·미용비 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상급침실의 경우 이용 여부와 공급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이 상급침실 가격 뿐만 아니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식사재료비와 공급자 간 경쟁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고유의 특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설 고유의 미관측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경쟁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록
부표 1
변수 설명 및 출처
| 변수명 | 설명 | 출처 |
|---|---|---|
| 비급여 식사재료비 | 1식당 비급여 식사재료비(원) |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상세정보조회서비스 |
| HHI | 시군구별 정원 기준 시설별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값 | |
| 공급자 수 | 시군구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수 | |
| 공급자밀도_인정자 | 시군구별 장기요양 인정자 1만 명당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수 |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상세정보 조회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 공급자밀도_75세이상 | 시군구별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1만 명당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수 | |
| 후기고령자 | ln(시군구별 75세 이상 주민등록연앙인구 수) | 주민등록인구 현황 |
| 상급침실수 | 시설별 1·2인실 수 | |
| 업력 | 2023년-장기요양기관 지정연도 | |
| 시설규모 더미 | 시설의 침상수가 10인 미만이면 1, 10인 이상 30인 미만이면 2, 30인 이상 50인 미만이면 3, 50인 이상 99인 미만이면 4, 100인 이상이면 5 | |
| 입소율 | 시설별 입소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 | |
| 비영리법인 | 시설의 운영주체가 비영리법인이면 1, 아니면 0 |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상세정보 조회서비스 |
| 시도 표준지가 | ln(2023년 시도별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평균 가격) | 노인복지시설 현황 |
Notes
2010~2022년 기간 동안 재가기관 수는 19,947개소에서 36,660개소로 1.8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751개소(정원 116,782명)에서 6,150개소(정원 234,444명)로 1.6배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3등급 인정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일반실에 입소할 경우, 30일 기준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은 총 742,800원이며, 이는 급여요양비 본인 일부 부담금 442,800원(20%), 식사재료비 270,000원, 간식비 30,000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는 본인부담금의 40.4%를 차지한다. 해당 수급자에 대해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급자 본인으로부터 월 2,514,000원을 수납하며, 이 중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11.9%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서울요양원의 경우 정원 122명 중 100명이 일반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3등급 일반실 기준으로 입소자 본인부담금에서 식사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6%에 달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가격에 관한 연구는 경쟁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 공시 강화의 효과 측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Clement et al.(2012)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위스콘신 주 요양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설평가 결과의 공시가 중상위 등급 요양시설의 가격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하위 등급 기관에서는 가격 상승을 초래함을 확인하였다. 하위 등급 시설의 경우, 평가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품질 개선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Huang and Hirth(2016)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뉴욕, 텍사스 주 내 주립 요양시설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평가 결과의 공개(CMS의 5개 별점 등급)가 전액 본인부담 시장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설평가 결과의 공개로 인해 상위 등급 시설의 가격이 하위 등급 시설에 비해 훨씬 더 크게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 간의 가격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이 많은 저집중 시장일수록 정보 공시에 대한 반응이 더 적극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가격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운영주체별 구성비는 2019년 기준 영리시설 83%, 비영리시설 13%, 지방정부 및 NHS 4%이다(UK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2017).
2021년 기준으로 요양시설의 운영주체별 구성비는 영리시설이 33%, 비영리시설이 56%, 정부가 11%를 차지한다(Australian Aged Care Financing Authority, 2021).
경쟁의 영향을 다룬 것은 아니나, 권진희 외(2012; 2019)는 장기요양시설의 비급여 가격을 분석하였다. 권진희 외(2012)는 장기요양보험 시설 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양시설에서 이용자에게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바탕으로 전체 장기요양비용 중에서 비급여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크기와 내용, 그리고 비급여 본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권진희 외(2019)는 2013년 10월 시설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의 보호자 가운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2,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자료에 다층 모형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수급자 특성(성별, 연령, 장기요양수급자격, 요양등급), 가족주수발자의 특성(성별, 연령, 관계, 교육 수준, 가구소득, 비용부담자), 그리고 기관 특성(민영 여부, 침상수, 지역)이 식사재료비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요양시설의 식사재료비는 수급자의 특성보다는 가족주수발자의 교육 수준, 가구소득, 그리고 요양시설의 설립주체, 규모, 소재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즉 가격의 미세한 변동이 수요의 큰 변화를 초래할 때, 기업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인 가격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기업은 더 큰 가격결정력을 가지게 되어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도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의 가격탄력성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연도에 따르면, 입소자 1인당 시설급여 요양비용은 1,889만 원(공단부담금 1,704만 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웹페이지에서 추출한 비급여 식사재료비 평균은 1끼당 2,897원으로 1인당 연간 시설급여 이용일수 기준 233만 원으로, 급여요양비의 12.4%를 차지한 다.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요양서비스 시장이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경계(예를 들어, county)를 이용하거나, 환자 유입 및 포착 지역(patient flows and catchment areas) 기법에 근거해 반경(예를 들어, 25km 이내)을 지정하여 시장을 정의하고 공급자 수 또는 HHI 등 경쟁도 지표를 산출한다(Bowblis & North, 2011; Bowblis, 2013; Forder & Allan, 2014 등). 또는 시장을 정의하지 않은 채 다른 경쟁자와의 거리에 기반하여 경쟁도를 측정하기도 한다(Gravelle et al., 2016; Zhao, 2016). 이처럼 시장을 정의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경쟁도 지표에 상관없이 경쟁도 산출 시 기본적으로 지리적 범위 또는 거리가 고려된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타 시군구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을 시군구 단위로 정의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Forder and Allan(2014)은 소재지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집중도와 가격이 낮아질 개연성이 존재하는 한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 및 가격이 높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경쟁도의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련된 변수를 최대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익명의 심사자는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식사재료비는 노인요양시설보다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22년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이호용 외, 2023)에 따르면, 31일 기준 평균 식사재료비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62,105원(1식 2,818원), 노인요양시설 247,728원(1식 2,664원)이다. 2019년(이호용 외, 2020)에는 각각 225,099원, 216,512원, 2021년(이호영 외, 2022)에는 243,615원, 232,482원이다. 즉,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평균 식사재료비는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높다. 다만,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는 “패널 구축 당시 장기요양기관이 재정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패널로 구축이 가능한 적정 장기요양기관을 조작적으로 정의(이호용 외, 2020, pp. 15-16)”함에 따라 표본이 전체 모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는 최소 3년간의 운영 실적이 있고,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행정처분이 없고,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이 A~D이고,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인 이상)인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3개소, 노인요양시설 223개소에 근거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감소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요양 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에서 집계한 식사재료비는 전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식사재료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2015~2023년 기간 동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150개소(정원 18,580명)에서 1,701개소(15,071명)로 대체로 감소세에 있는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2,935개 소(140,788명)에서 4,568개소(231,406명)로 증가세에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시장이 소수의 공급자에게 집중될수록, 즉 경쟁도가 낮을수록 HHI가 커진다. <표 2>에서 HHI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이는 집중도가 증가할수록 식사재료비가 증가하거나, 집중도가 낮을수록(즉, 경쟁도가 증가할수록) 식사재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익명의 심사자는 “정원 10인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보다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식사재료비가 유의미하게 높고, 특히 입소정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식사재료비가 커진다는 분석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식사 재료비는 노인요양시설보다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시설규모 더미 변수의 추정계수는 경쟁도, 후기고령자 수, 시도 표준 지가 등 시장 상황과 상급 침실 수, 업력, 운영주체 등 시설 특성을 통제한 후 시설규모와 식사재료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이는 두 변수 간 단순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의 시설 유형별 식사재료비에 대해서는 각주19의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5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신고 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2008. 6. 19.)의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따르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 시 비용,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각종 프로그램 비용 등을 기타 실비로 수납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실손형 간병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타 보험상품 대비 높은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 시점 간 분산이 어려운 위험의 존재, 낮은 해약률 등으로 보험회사는 실손형 장기간병보험 판매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감소로 의료이용을 늘리는 것을 사후적 도덕적 해이라 하며, 다수의 실증연구가 보험 보유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실손형 간병보험이 상급병실비를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면, 무보험 시에는 4인실을 이용할 수급자가 유보험 시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보험으로 인해 수급자의 지급여력이 상향됨에 따라 공급자는 상급병실의 공급을 늘리거나, 상급병실료를 인상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실손형 간병보험에서 식사재료비를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면 유보험 시 식사재료비 및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수급자의 부담이 줄며, 공급자는 수급자의 지급여력이 늘어남에 따라 침실 공급량을 늘리거나 식사재료비를 인상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3-15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7-08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08-02

- 2291Download
- 5435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