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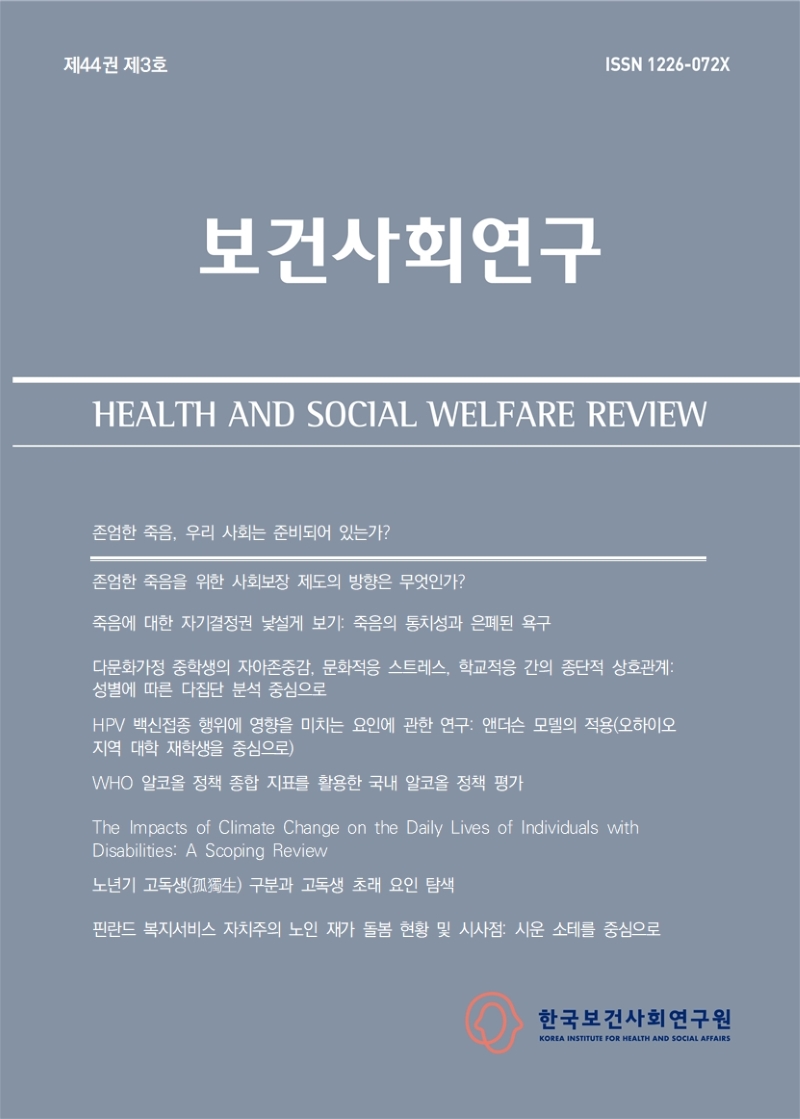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효과: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upporting Single Parents’ Housing, Life, and Child Care Policies for Unmarried Adolescents: Effects on Self-Assessment of Parenting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어린 나이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부의 지원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청소년 한부모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자녀를 키우는 데 정부는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청소년 한부모에게 주거, 생활, 자녀돌봄 정책 지원 항목이 많을수록 부모로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높일 수 있었으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효과는 낮아졌다. 즉, 지속되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운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있어 물리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청소년기라는 생애주기를 고려해 자아정체감과 부모효능감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1:1 사례관리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영국은 국가가 주도해 각 지역에서 청소년 부모를 위해 임신 초기부터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의 신체적, 정서적 돌봄 등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국가는 정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돕게 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도 적용이 가능한 지원체계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variables influencing self-evaluation of parenting among adolescent single parents, focusing on their economic situation, child care situation, and policy support benefit status. The analysis used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on the Birth and Parenting of Unmarried Mothers', examining 252 'unmarried adolescent single parents' under the age of 24, with statistically verified data. Several findings emerged. First, most single adolescent parents were relying on government subsidies, with many not receiving child support from the fathers of their children. These young single parents typically lived with one preschool child and expressed high demands for support in areas such as childcare and education expenses,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both children and mothers, flexible working hours for counseling and leave for childcare and work compatibility, and support for care facilities and services. Second, in terms of policy support, the benefit rat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childcare fees was high, and satisfaction was also high. The child care service had a low benefit rate compared to the recognition rate but high satisfaction. Third, the level of self-evaluation of parenting was higher among those who were physically healthier and who received more policy support benefits. However, high levels of life stress weakened the positive effect of policy support on the self-evaluation of parenting. The research suggests that policy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 parents should include structured, step-by-step interventions along with counseling for psycho-emotional stability and stress management to enhance self-identify and parental efficacy.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 상황과 자녀돌봄 상황, 그리고 정책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지원이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변인의 비교 검토와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내용이다.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24세 이하의 대상을 ‘미혼 청소년 한부모’라 지칭하고 해당하는 252명의 자료를 검증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대부분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고,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다수가 미취학 자녀 1명과 살고 있었으며,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자녀와 엄마를 위한 상담과 교육, 양육과 일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유연화와 휴가, 돌봄 시설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둘째, 정책 지원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육료의 수혜율이 높고 만족도도 높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인지율에 비해 수혜율은 낮았지만 만족도가 높았다. 직접적인 비용 지원과 돌봄 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셋째,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정책 지원 수혜 항목 수가 많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 스트레스가 크면 정책의 지원 효과가 약해져 양육에 대한 자기 평가 수준이 높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미혼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은 이들의 자아정체감과 부모효능감의 동시 발달을 위해 심리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과 병행하여 구조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입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출산 장려는 국가의 중요한 의제로 정책화되고 있으며(대한민국정부, 2020),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수용적 태도도 과거와 다른 모습이나(여성가족부, 2024a),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출산과 가족 유형이 있다. 바로 미혼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다.
한국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2.5%로, 40.5%인 미국과 62.2%인 프랑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OECD 국가들 중 하위에 속한다(OECD Family Database, 2024). 그러나 한국은 혼인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사실은 은폐되기 쉬워 상기의 통계치가 정확하다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과거 미혼모 혹은 미혼부라 지칭했던, 어린 나이에 자녀를 낳아 키우는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수는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데 「장래가구추계」로 예측은 가능해 2024년 시점을 살펴보면 24세 이하 한부모가구는 1만 4천여 가구로 나타난다. 이 중 70%는 모자가구일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24).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가까이 접했던 관계자나 연구자들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지지 이상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학습권과 부모권, 노동권 등의 권리 보호가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김혜영 외, 2009; 문희영, 2010; 김지연, 2013; 이유진 외, 2018; 김영정, 구화진, 2019). 정부 또한 2010년부터 비혼의 어린 부모로만 바라보던 대상들을 ‘청소년 한부모’라 지칭하고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여성가족부, 2024b), 2011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령 내에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명시함으로써(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2021) 정책의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시적인 지원은 한부모가족사업 내에서 부모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학업과 양육, 자립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매해 정해진 사업비 항목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방식인데(여성가족부, 2024b)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될 수 있는 결핍과 빈곤 예방을 위한 기초선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나 정책 지원들이 자립의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지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살펴보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은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부모로서의 양육 효능감이 향상되면서 취업에 관한 준비나 참여의지가 생겨 자립을 위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즉 주변의 인적자원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를 매개로 자립의지를 높이는 것이다(이은희, 최광선, 2012; 이용우, 양호정, 2017; 박화옥, 2022). 한편, 정부의 양육비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원가족 스트레스나 가사노동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학업지속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더욱 효과가 커져 정규직 취업 가능성도 높이고 있었다. 반면 아동양육비는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그 효과가 약해지고 있었다(이윤정, 2017, 2019). 즉,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정책 지원은 임신과 출산 전후로 소원해졌거나 단절된 원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망 결핍을 일부 보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정책 지원은 학업지속 의지를 높일 만큼의 효력 발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로서의 정체감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일반 부모들과는 달리 일상과 자녀돌봄의 과정에서 성장통 이상의 부담감과 두려움, 불안을 느낀다. 특히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부담은 불안의 핵심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장 우선되는 과제는 생활과 양육에 관한 것이다. 진로와 학업은 그다음 단계의 고민인 것이다(이동귀 외, 2019). 이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은 그 효과를 위해 단계별 개입이 필요하며 근거가 될 수 있는 검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는 희소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구 대상의 발견과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그들의 삶의 배경과 어려움, 사회적 지지를 주제로 한 질적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발견된다. 이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검증을 위한 모형 설계에는 논리적 구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투입변인들의 관계나 영향력 예측에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질적 연구 외에 정책의 유의미한 지원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양적 자료의 축적은 후속 연구를 위해서나 실천적 개입 근거로써 의미가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주거를 비롯한 생활 영역과 자녀 양육을 위한 돌봄 정책들이 부모로서의 양육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립의지 향상에 앞서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이에 기반한 검증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책 지원 설계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의 일부로, 24세 이하의 대상만을 추출하여 수행한다. 원자료의 응답 대상은 모두 미혼으로 홀로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어머니들이다. 연구자는 이들을 ‘미혼 청소년 한부모’로 지칭하고 생활과 양육, 정책 지원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연구 목적과 관련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 상황과 자녀돌봄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와 생활, 자녀돌봄 정책 지원 수혜 상황은 어떠한가?
셋째,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와 생활, 자녀돌봄 정책 지원은 효과적인가? 양육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한부모 현황
청소년 한부모는 일탈적 존재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사회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정책 대상자로 발굴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하정화, 허두진, 2012), 청소년 한부모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에서는 2024년 시점으로 가구주 연령 24세 이하인 모자가구(모+미혼자녀) 수를 10,275가구, 부자가구(부+미혼자녀) 수를 4,272가구로 표기하고 있어 총 14,547가구(통계청, 2024) 규모일 것으로 예측되나 이 수치도 과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 다수가 경험하는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과 홀로 돌봄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 인적 자원이나 시간 부족 등의 문제, 편견과 배제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학업을 중단할 경우 ’빈곤‘계층이 될 수 있어 그 위험이 자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에 경제적 자립, 자녀양육, 학업에 있어 3중고를 겪게 되는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취약위기 대상에 속한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여성가족부(2021)는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중 미혼이 71.5%, 이혼이 24.6%로 미혼자가 다수이고, 학력 수준은 90% 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첫 출산 연령은 18세 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0.9%로, 임신 당시 과반 이상이 ’학령기‘에 있었지만 비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속해 있었다. 건강에 대해서는 스스로 양호하다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우울감(27.7%)과 외로움(69.3%)을 느끼고, 자살생각(13.7%)을 하는 비율도 적지 않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1명이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살펴보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모자가구의 비율(86.5%)이 부자가구보다 많으며,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72%이다. 정규직 취업자는 31.9%였고 비취업자 비율은 47.9%인데,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비율은 79.2%로 높고, 그들과 83%는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해 홀로 자녀를 양육함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6%가량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월세나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비율은 50% 이상이었는데,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제외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주거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43.2%) 정부지원(30.7%)을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취업자들은 다수 정부지원금이 주된 소득원이라 답하였다. 월지출은 평균 116만 원 정도로 저축을 한다고 한 비율은 42.7%였고, 부채가 있다고 한 비율은 31.6%였다. 부채 금액은 평균 1,296만 원이었다(여성가족부, 2021). 자녀돌봄은 과반 이상이 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직접 돌보는 경우는 27.6%였는데, 소득 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그룹에서 자녀를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를 경험하던 시기에 조사된 내용이라 자녀의 학습과 교육 등의 부담과 돌봄기관이나 교육기관 휴원 시 돌봐줄 사람이 없어 힘들다고 한 응답이 많았다. 현재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은 83.4%였다. 그러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난다(48%)고도 하고, 아이 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16%)고 한 이들도 꽤 있어 부모로서 효능감 수준을 높이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자가구에 비해 모자가구가 자녀의 학습이나 교육 등에 부담을 더 느끼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의 격차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여성가족부, 2021).
실태조사에서도 일부 드러나지만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정보 부족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선택지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김영정과 구화진(2019)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 후 여러 의사결정 상황에서 임신의 지속과 중단, 출산 후 입양과 양육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낙태 비용부담으로 인해 선뜻 감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해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부모됨‘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 속해 있지 않아 준비되지 못한 임신과 출산에, 자립과 양육은 두려움과 갈등 속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 문제 해결도 어려워 학업 준비나 취업계획은 더 막연해진다.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을 면담하며 불안과 욕구를 연구한 이동귀와 그의 동료들(2019)은 자립의 필요 요인으로 주관적 안녕감, 물적 지원 등의 사회적 지지를 강조하였다. 불안을 구성하는 2개의 축(정서적 요인 및 물질적 요인, 개인으로서의 여성 및 엄마로서의 여성)을 설명하면서, 문제 상황을 피상적으로 예견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특성과 경제적 자립에 있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당면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또 향후 이들의 발달과업이기도 한 ’이성교제‘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불안감,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학업이나 취업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고민하기보다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양육과 현재의 생활을 우선순위의 과제로 두어 ’진로‘를 다음 순위로 고민한다고 하였다. 또, 욕구에 있어서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포용해 줄 사람에 대한 요구가 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자립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생각해 계획과 준비를 구체화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교육은 이러한 불안과 욕구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
현재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들은 학업이나 자립패키지 사업 등에서 일부 발견되나 당사자들이 우선시하는 주거와 생활, 자녀돌봄에 관해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집중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 한부모가족이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해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 한부모들이 수혜 가능한, 가구 상황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개입하는 선별적 성격의 주거 및 생활 지원과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성격의 자녀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을 정리하였다.
가. 주거 및 생활 지원 (선별적 성격의 정책)
주거관련 지원은 시설 입소, 임대주택, 주거급여, 자금대출에 관한 항목으로 <표 1>의 내용과 같이 일정 자격 기준을 요구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는 4개의 생활시설 유형이 있는데, 2023년 12월 말 기준 출산지원시설 26개소, 양육지원시설 38개소, 생활지원시설 48개소, 일시지원시설 9개소가 포함되어 총 121개소가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24b). 임대주택은 전세임대나 장기전세에 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지급하면서 운영기관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여성가족부, 2024b). 입주자 1순위는 미혼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부자가족, 3순위는 모자가족으로 미혼모를 우선한 주거 정책이다(여성가족부, 2024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이 근로능력이나 연령 등과는 무관하게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모든 가구이다(국토교통부, 2024).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들도 지원 대상에 속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4).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그 복지급여(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등)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동시 수급도 가능하다(국토교통부, 202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지원도 있는데, 두 항목 모두 정부지원 대출로, 부부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미혼 청소년 한부모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1
청소년 한부모 수혜 가능 주거 및 생활 지원
출처: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시도교육청)”, 교육부, 2023.
“202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국토교통부, 2024.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a.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24b.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2024b,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생활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서는 한부모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의 경우 그 자녀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시설 입소가구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나 학용품비 등의 복지급여와 자립촉진수당이 해당된다(여성가족부, 2024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생활지원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조사 후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한다. 가구나 개인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받게 되는데,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에 통합신청을 할 수도 있고 급여종류별로 선택신청도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만 선택해 신청할 경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급여를 지급한다(교육부, 2023).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경우, 교육급여 지원액이 많으므로 우선 적용하고 한부모가족 학용품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자녀돌봄 지원 (보편적 성격의 정책)
자녀돌봄 지원은 일정 연령 범위 내에 속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모두가 대상이므로 보편적 성격을 지닌다. 수당 지급 형식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이 있고, 서비스나 장소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이 있다. 지원 대상과 특징은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청소년 한부모 수혜 가능 자녀돌봄 지원
| 자녀돌봄 지원 | 대상 및 특징 |
|---|---|
| 부모급여 | |
| 아동수당 | |
| 가정양육수당 | |
| 보육료 | |
| 유아학비 | |
| 아이돌보미 | |
| 공동육아나눔터 |
출처: “2024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4b.
“정부지원 신청안내”, 아이돌봄서비스, 2024, https://www.idolbom.go.kr/front/srvcGuide/prttm
수당 지급 형식의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모두가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연령 별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오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해 보육료를 신청하는 경우 금액이 부모급여 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중앙부처 정부24, 2024a). 아동수당은 2018년에 도입해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적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가 대상이다. 자녀의 상황과 연령에 따라 10만~20만 원을 매월 지급받는다(중앙부처 정부24, 2024b). 보육료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0~5세 영유아로, 소득과 관계없이 0~2세의 자녀를 둔 전계층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며 3~5세 자녀의 경우에는 매월 28만 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24b).
유아학비는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아동이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과정 지원금(특성화 활동비 제외)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2024). 이때 한부모가족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우선 입소 대상이며,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소장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4b).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가사활동이 추가된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있다. 한부모가정에는 정부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아이돌봄서비스, 2024).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중심의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을 지원하려고 설치한 장소이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이다. 육아 경험과 정보 공유, 장난감, 도서의 이용과 대여가 가능하며, 그룹활동이나 프로그램, 놀이 공간으로도 이용가능 하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4).
정리해보면, 청소년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주거 및 생활, 자녀돌봄 정책은 부재하다.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등에서 대상의 연령 범위를 낮추고 기준소득 구간의 범위를 확대해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상황이다. 물론, 자녀양육 가정을 위한 돌봄부담 완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최근의 보편적 정책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긍정적 요소가 된다. 그러나, 부모가 되기까지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지속되는 양육관련 어려움들은 일반 양육 가정 부모와 다르며, 생애주기상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내에서도 특수한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이른 부모됨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의 지원 효과
우리나라에서 한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별도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10년이며(여성가족부, 2024b), 한부모가족지원법령 내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것은 2011년이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2021). 이후 2012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하며, 이들의 부모로서의 삶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 지원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정부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정책의 대상으로, 또 다른 ‘가족’ 의 형태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수립해 개입해 나갔는데(여성가족부, 2024b) 학계에서도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부모들과 그 자녀에 대해 어린 ‘미혼모’로만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양육 주체로서 그들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논점을 쟁점화하기도 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 효과를 검증하기 시작하였다(김지연, 백혜정, 2014; 이윤정, 2017, 2019; 김영정, 2020).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이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그 효과를 검증한 해외 연구들은 매우 희소하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에서도 그 중요성이 거론될 정도이다. Laurenzi et al.(2020)이나 Smiley et al.(2023)은 청소년기의 임신과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과 위기적 요소를 조명해 연구하면서 심리사회적 개입이나 정책에 대한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하며 기초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주제의 해외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Angley et al.(2015)은 미국에서 산후 6개월 된 청소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들 연구에는 사회적 지원 범주에 정책 지원 일부와 가족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또 Patiño et al.(2024)은 멕시코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경험한 이후의 자아존중감, 부모 효능감, 사회적 지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임신 중 불안과 우울 병력을 지닌 이들에게서 더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모 효능감이 나타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해 더 많이 불만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자녀의 아버지, 친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가 사회적 지지 변수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Smiley et al.(2023)은 워싱턴 DC에서 21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조사를 통해 육아, 식품, 주택보조금,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임시 지원, 실업보험 등의 사회적 지원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바 있다. 그들은 청소년 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 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미국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연구가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에 기초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Smiley et al, 2023).
국내에서는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기반해 효과 검증이 시도되고 있어 이러한 연구들로 주요 변인들의 관계 예측이 가능하다(김지연, 백혜정, 2014; 이윤정, 2017, 2019). 김지연과 백혜정(2014)은 청소년 한부모의 개인 특성과 환경요인이 부모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출산 후유증이 적을수록, 육아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시설에 거주할 경우 부모효능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가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주목했는데,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 접근에 용이하다는 점과 재가의 경우 생계와 양육, 자립에 대한 부담감이 양육에 대한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들어 청소년 한부모의 시설 퇴소 이후의 지원과 지지체계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윤정(2017)은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동 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이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여 아동양육비 지원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속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지원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원가족 스트레스나 가사노동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학업의 중단 가능성을 낮추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아동양육비의 지원 효과는 감소해 학업 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졌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지원은 오히려 학업 중단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즉,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정책의 지원 효과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개입되어야 한다. 한편 이윤정(2019)의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이 청소년 한부모의 취업 가능성을 3.8배나 높이고 있었는데, 학력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게 되면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화옥(2022)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는데, 미혼모가 느끼는 높은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 향상을 통해 자립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자립의지에 대한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양육효능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영유아를 키우는 양육미혼모의 자립의지는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도록 고안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가 가족, 친구, 주요 지인의 범주에 국한되어 연구결과를 정책의 지원 효과로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은희와 최광선(2012)도 같은 맥락으로 과거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양육모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음을 보고하였고, 이용우와 양호정(2017)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투자와 노력에 저해 요인임을 밝히고 있어, 자녀 양육 관련 스트레스와 효능감은 양육 미혼모의 자립준비 과정과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연구하며 그들의 불안과 욕구에 중점을 둔 사회적 지원과 교육 설계를 주장했던 이동귀 외(2019)의 언급과 같이, 당사자들에게 시급한 과제로 생활과 양육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자신의 진로와 학업 등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별 자립지원 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영정(2020)은 청소년 한부모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으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당사자들을 심층면접하여 실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한부모’ 정책만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통해서도 적극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제언들이다. 또한 김영정(2020)은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관련 기관들의 자원 연계를 강조했으며, 단기 수습 차원이 아니라 장기 계획을 통해 진로 설계를 위한 정보제공과 준비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기의 균형적 삶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요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기본권을 누리며 주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도록, 성교육, 임신초기 지원,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단계적인 개입과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 정책의 지원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최근 10여 년간의 관련 연구를 검색해 보면 당사자의 삶의 배경과 어려움, 사회적 지지를 주제로 한 질적 연구들이 보다 쉽게 발견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구 대상의 발견과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질적 연구를 통한 깊이 있는 탐색과 더불어 정책의 지원 효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점에 주목한다. 특히 주거와 생활, 자녀돌봄 영역에서의 지원이 대상의 불안과 욕구에 대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검증하여, 향후 청소년 한부모 정책이 상황에 기초하고 효과성 예측이 가능한 실천 모형으로 구조화되는 데 고려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 기초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의 일부가 사용되었다. 이 데이터는 2019년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기기입식의 온라인 응답 방식을 활용해 수집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데이터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과정을 거쳐 입수하였다. 데이터 수집 과정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모집단의 수가 분명하지 않아 표본 설계에 한계가 있어 대표성 있는 표본과 대상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수집 당시 미혼모 당사자만이 가입 가능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홍보하거나, 미혼모 관련 단체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미혼모협회 I’m MOM 등의 시설과 거점기관을 통해 담당자가 미혼모에게 직접 조사 참여 URL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변수정 외, 2019). 또한 온라인 조사의 한계를 인지하고,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자가 시간을 두고 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에러 방지의 노력과 조사 대상인 미혼모만 조사에 응하도록 조사의 특성을 알리고 솔직한 답변과 양심적인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안내 절차를 거쳐 컴퓨터 혹은 개인 휴대전화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변수정 외, 2019). 조사할 때 생애적 관점에서 미혼모가족을 논의하기 위해 15세 이상부터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한 연령을 두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그중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 24세 이하인 대상만을 추출해 분석하였다. 이에 최종 252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대상자 모두 미혼의 여성들이다.
2. 주요 변인
가.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정책 지원 영역에 속하는 항목들로, 주거지원에는 모자관련 시설 입소(보호, 자립,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임대주택(전세임대, 장기전세 등), 버팀목 전세자금 및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총 4개 항목이 포함되고, 생활지원에는 한부모가족사업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총 2개 항목이 속한다. 생활지원의 2개 항목은 동일 시점을 기준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1개 항목에만 응답할 수 있다. 자녀돌봄 지원에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자가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급), 보육료(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유아학비(유치원), 공동 육아나눔터 총 6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주거지원은 각 항목들의 인지 여부와 수혜 경험, 그리고 수혜자들이 느끼는 도움 정도를 파악하고, 생활지원은 조사 시점에서의 수혜여부와 비수혜자들의 과거 수혜 경험여부, 그리고 조사 시점 당시와 과거 수혜자들만을 대상으로 스스로 느끼는 도움 정도를 파악하였다. 자녀돌봄 지원도 인지 여부와 수혜 경험, 수혜자들이 느끼는 도움 정도를 파악하였다. 지원 영역들의 항목에서 수혜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은 ‘1’로, 비경험자들은 ‘0’으로 하여 재코딩한 후, 지원 영역들의 수혜받은 항목 수를 합산해 주거·생활 정책 지원, 자녀돌봄 정책 지원 변수로 만들고, 총합하여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에 주거와 생활 정책 지원 수혜 항목 수는 범위가 0에서 6까지, 자녀돌봄 정책 지원 수혜 항목 수 역시 범위는 0에서 6까지이다. 즉, 숫자는 청소년 한부모가 수혜받은 정책 항목들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0’일 경우는 수혜 항목이 없음을 ‘6’은 해당 항목들을 모두 지원 받았음을 말한다. 총합의 범위는 0에서 12까지이다. 수혜 항목 수를 합산해 만든 정책 지원 변수들은 회귀분석 시 조절변수로 투입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그룹을 나누어 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원 항목의 평균값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나. 생활 스트레스와 신체적 건강
생활 스트레스는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은 ‘거의 느끼지 않는다’를 1점, ‘대단히 많이 느낀다’를 4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체적 건강은 ‘현재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설문 문항을 활용해 5점 척도로 측정된 답변 중 ‘건강이 매우 안 좋다’를 1점, ‘매우 건강하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다음의 <표 3>의 내용과 같다. 연령을 기준으로 성년여부를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의 평균 연령은 21.4세로, 미성년은 35명으로 13.9%, 성년은 217명으로 86.1%였다.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178명으로 70.6%였고, 중졸 이하는 58명으로 23%였다. 대졸 이상은 16명으로 6.3%였다. 학업 중단자는 207명으로 82.1%였으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은 45명으로 17.9%였다. 검정고시 준비는 14명(6.8%)만 하고 있었다. 이들이 자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응답 비율이 과반을 넘어 132명, 52.4%에 달하였다.
표 3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 (N=252) | ||||||||
|---|---|---|---|---|---|---|---|---|
| 내용 | 응답자 수 | 비율 | 내용 | 응답자 수 | 비율 | |||
| 성년여부 평균 21.4세(SD=2.2) | 미성년 | 35 | 13.9 | 주거지 | 나의 집(전/월세 등) | 59 | 23.4 | |
| 성년 | 217 | 86.1 | 가족/친인척 집 | 89 | 35.3 | |||
| 합계 | 252 | 100.0 | 친구/지인 집 | 11 | 4.4 | |||
| 학력 | 초등졸 | 8 | 3.2 | 모자관련 시설 | 82 | 32.5 | ||
| 중졸 | 50 | 19.8 | 기타 | 11 | 4.4 | |||
| 고졸 | 178 | 70.6 | 합계 | 252 | 100.0 | |||
| 대졸이상 | 16 | 6.3 | 주택 소유 형태 | 자가 | 1 | 1.7 | ||
| 합계 | 252 | 100.0 | 전세(월세 없음) | 14 | 23.7 | |||
| 학업중단 여부 | 학업 중단 | 207 | 82.1 |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 40 | 67.8 | ||
| 학업 지속 | 45 | 17.9 | 보증금 없는 월세 | 4 | 6.8 | |||
| 합계 | 252 | 100.0 | 합계 | 59 | 100.0 | |||
| 검정고시 준비 여부 | 예 | 14 | 6.8 | 경제 활동 | 지난 1주일간 경험 | 경험 있음 | 72 | 28.6 |
| 아니오 | 193 | 93.2 | 경험 없음 | 180 | 71.4 | |||
| 합계 | 252 | 100.0 | 합계 | 252 | 100.0 | |||
| 자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학력 | 고졸 | 34 | 13.5 | 근로 형태 | 시간제 | 51 | 70.8 | |
| 전문대졸(2-3년제) | 77 | 30.6 | 전일제 | 21 | 29.2 | |||
| 대졸 | 55 | 21.8 | 합계 | 72 | 100.0 | |||
| 무응답 | 86 | 34.1 | 취업 의향 | 있음 | 163 | 90.6 | ||
| 합계 | 252 | 100.0 | 없음 | 17 | 9.4 | |||
| 자녀 수 | 1명 | 238 | 94.4 | 합계 | 180 | 100.0 | ||
| 2명 | 12 | 4.8 | 저축 여부 | 저축함 | 113 | 44.8 | ||
| 3명 | 2 | 0.8 | 저축하지 않음 | 139 | 55.2 | |||
| 합계 | 252 | 100.0 | 합계 | 252 | 100.0 | |||
| 첫 자녀 취학 여부 | 미취학 | 248 | 98.4 | 부채 여부 | 부채 있음 | 108 | 42.9 | |
| 취학 | 4 | 1.6 | 부채 없음 | 144 | 57.1 | |||
| 합계 | 252 | 100.0 | 합계 | 252 | 100.0 | |||
이들의 자녀 수는 다수가 1명(94.4%, 238명)이었고, 98.4%(248명)가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었다.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집에 살고 있는 수가 89명으로 35.3%였고, 모자 관련 시설에 머물고 있는 수는 82명으로 32.5%, 전세와 월세 등 ’나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59명으로 23.4%였다. ‘나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주택 소유 형태는 반전세를 포함해 보증금 있는 월세 형태가 가장 많아 40명으로 67.8%였고, 다음으로 월세 없는 전세가 14명으로 23.7%로 나타났다. 보증금 없는 월세는 4명으로 6.8%, 자가는 1명으로 1.7% 였다.
지난 1주일간의 경제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71.4%(180명)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28.6%인 72명만이 경제활동을 했다고 답하였다. 경제활동을 한 이들 중 시간제 형태로 일한 이들은 51명으로 70.8%, 전일제 로 일한 이들은 21명으로 29.2%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 중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한 이들은 163명으로 90.6%에 달하였다.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 중 저축을 하고 있는 이들은 113명으로 44.8%였으며, 부채를 지닌 이들은 108명으로 42.9%에 달하였다.
다음은 분석 대상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주요 결과는 <표 4>의 내용과 같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신체적 건강 수준은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3.1점이었으며, 스트레스 수준은 4점 척도로 측정해 평균 2.8점이었고,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4점 척도)은 평균 2.6점으로 나타났다.
표 4
분석 대상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
| (N=252) | |||||||
|---|---|---|---|---|---|---|---|
| 내용 | 범위 | 최솟값 | 최댓값 | 첨도 | 왜도 | 평균 | 표준편차 |
|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신체적 건강 수준 | 1~5 | 1 | 5 | -0.7 | 0.1 | 3.1 | 1.0 |
| 생활 스트레스 수준 | 1~4 | 1 | 4 | -0.6 | -0.0 | 2.8 | 0.8 |
|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 | 1~4 | 1 | 4 | 0.1 | -0.5 | 2.6 | 0.7 |
4. 분석 방법
분석은 SPSS V.20 통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정책 지원의 수혜 현황 비교와 조절효과의 시각화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으로,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자녀돌봄 상황, 정책 지원의 수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통계분석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생활 스트레스 수준, 신체적 건강 상태,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와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수혜 항목 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상황이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토대로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시 통제변인은 투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 부채 등 개인 및 경제적 특성에 따른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누적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무리한 통제변인 투입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효과 분리를 방해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과 권고사항(Bernerth & Aguinis, 2016; 박원우 외, 2023)을 수렴하여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의 효과 검증은 초기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지는 않았다.
이에 조절효과는 스트레스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신체적 건강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책 지원 변인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상호작용항 생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연속형 변인들은 모두 평균중심화(Meaning Centering)하여 활용하였다.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은 그 범위가 모두 1에 가까워(1.007~1.227)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상호 작용항은 그 효과를 시각화하여 그래프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정책 지원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효과를 확인하도록 지원 항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 점수의 차이가 선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경제 상황과 자녀돌봄 상황
가. 경제적 상황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상황으로 월평균 소득과 부채 총액, 지출 상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항목 응답 비율과 평균 금액 비교를 위해 소득과 지출 상황을 시각화하여 [그림 1]과 [그림 2]로 나타내었다.
월평균 총 소득 수준은 응답자 평균 약 106만 원이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한 비율은 42.9%로 평균 858만 원 정도의 규모였다.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의 월평균 소득 항목을 살펴보면, 73.8%(186명)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 으며 그 액수는 평균 68만 7천 원 정도였다. 38.5%(97명)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미혼모 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금액은 평균 23만 1천 원 정도였다. 형제자매나 부모님 등 가족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는 약 29.4%(74명)로 월평균 32만 8천 원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25.8%(65명)로 평균 102만 1천 원 정도를 벌고 있었다.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8.7%(22명)에 불과했는데 그 수준은 월평균 44만 원 정도였다.
다음으로 월평균 총 지출 금액은 응답자 평균 78만 4천 원 정도였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86.1%(217명)가 생활비로 월평균 41만 2천 원 정도를, 41.7%(105명)는 주거비에 월평균 28만 7천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자녀 양육 및 교육비로 지출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103명)였는데 그 금액은 평균 12만 7천 원 정도였다. 응답자들의 19%(48명)는 자녀돌봄비로 매월 평균 17만 원을, 13.9%(35명)는 자녀 사교육비로 9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66.7%(168명)는 본인을 위해 월평균 13만 4천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24.2%(61명)는 매월 평균 22만 4천 원을 대출이자나 부채상환 등을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나. 돌봄 상황과 요구도
분석 대상 다수가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어 이들만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상황을 <표 5>의 내용과 같이 살펴보았다. 자녀는 민간시설에 맡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 109명으로 44%에 해당하였고, 다음으로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아 81명으로 32.7%에 달하였다. 국공립시설에 맡긴다고 응답한 이들은 36명으로 14.5%였다. 자녀돌봄 상황에 만족하는지 물어본 질문(5점 척도)의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표 5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돌봄 상황(미취학 자녀 대상, 총 252명)
| 응답 내용 | 응답자 수/ 평균 | 비율/ 표준편차 | 응답 내용 | 응답자 수 | 비율 | ||
|---|---|---|---|---|---|---|---|
| 자녀를 돌보는 사람(곳) | 민간시설 | 109 | 44.0 | 자녀 양육 시 힘든 점 | 양육비/교육비 부담 | 84 | 33.9 |
| 본인 | 81 | 32.7 |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 57 | 23.0 | ||
| 국공립시설 | 36 | 14.5 | 시간 부족 | 33 | 13.3 | ||
| 친인척 | 13 | 5.2 | 생활태도 지도/훈육의 어려움 | 22 | 8.9 | ||
| 기타 | 9 | 3.6 | 차별/따돌림/부적응에 대한 걱정 | 17 | 6.9 | ||
| 가족 상황을 설명/이해시키는 일 | 13 | 5.2 | |||||
| 합계 | 248 | 100.0 |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음 | 18 | 7.3 | ||
| 돌봄 상황 만족도 (5점 척도) | 3.3 | 0.9 | 기타 | 4 | 1.6 | ||
| 합계 | 248 | 100.0 | |||||
자녀 양육 시 힘든 점은 ‘양육비나 교육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 83명으로 33.9%였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라고 답한 비율은 그다음으로 57명, 23%였다. ‘시간 부족’을 언급한 비율도 33명으로 13.3%에 해당되어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시간에 관해 자녀 양육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답하였다. 자녀의 ‘생활 태도를 지도하거나 훈육하는 데 어렵다’라고 답한 이들도 22명이나 되어 8.9%로 나타났는데,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에 관한 정보나 주변 인적자원의 도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차별이나 따돌림, 부적응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은 6.9%였으며(17명),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일이 힘들다고 한 비율은 5.2%(13명)였다.
다음은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녀돌봄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았다(표 6). 먼저, 자녀돌봄에 있어 ‘희망하는 사람 혹은 돌봄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국공립시설에서 자녀를 돌봐주었으면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응답자의 34.3%(85명)가 희망하였고, 다음은 민간시설을 선호하고 있었다(31.5%, 78명). 본인이 직접 돌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1명으로 20.6%였다.
표 6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돌봄 요구도
| 응답 내용 | 응답자 수 | 비율 | 응답 내용 | 응답자 수 | 비율 | ||
|---|---|---|---|---|---|---|---|
|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희망하는 사람(곳) | 국공립시설 | 85 | 34.3 | 자녀 성장에 필요한 지원 | 양육비/교육비 지원 | 114 | 45.2 |
| 민간시설 | 78 | 31.5 | 돌봄 시설 및 서비스 | 28 | 11.1 | ||
| 본인 | 51 | 20.6 | 정서 안정을 위한 아이상담 서비스 | 19 | 7.5 | ||
| 엄마의 정서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 15 | 6.0 | |||||
| 친인척 | 21 | 8.5 | 양육/훈육/교육 등의 엄마 대상 교육 | 17 | 6.7 | ||
| 기타 | 13 | 5.2 | 일하며 돌보도록 근무시간 유연화, 휴가 등 | 49 | 19.4 | ||
| 합계 | 248 | 100.0 | 아이생활에 편견 없는 환경 | 10 | 4.0 | ||
| 합계 | 252 | 100.0 | |||||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 성장에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항목 1순위는 경제적인 면으로 ‘양육비나 교육비 지원’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다(114명, 45.2%). 그다음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하며 돌보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화하거나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49명, 19.4%),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세 번째로 11.1%(28명)였다. 다음 순으로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아이 상담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었고(19명, 7.5%), 자녀 ‘양육이나 훈육, 교육 등에 있어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이들은 6.7%(17명)였다.
2. 정책 지원의 수혜 현황
다음은 미혼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정책들의 수혜 상황과 실제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주거·생활 지원에 6개 항목, 자녀돌봄 지원에 6개 항목을 살펴보았는데, <표 7>에서와 같이 분석 대상의 수혜 항목 수 평균은 주거·생활 지원은 2.21개 항목, 자녀돌봄 지원은 2.50개 항목이었다.
표 7
분석 대상의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수혜 항목 수(총 252명)
| 정책 지원 영역 | 최솟값 | 최댓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주거·생활(항목 수=6) | 0 | 5 | 2.21 | 1.37 |
| 자녀돌봄(항목 수=6) | 0 | 6 | 2.50 | 1.33 |
주거·생활 지원, 자녀돌봄 지원의 인지율과 수혜율, 도움 정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8>, <표 9>와 같다.
표 8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생활 정책의 인지 및 수혜 현황(총 252명)
| 주거 지원 항목 | 인지 여부(응답자 수(비율)) | 수혜 경험(응답자 수(비율)) | 수혜자의 도움 정도(5점) | |||
| 모름 | 인지 | 비수혜 | 수혜 | 응답 자수 | 평균 (표준편차) | |
| 모자관련 시설 입소(보호, 자립, 공동생활가정 등) | 57(22.6) | 195(77.4) | 75(38.5) | 120(61.5) | 120 | 4.1(0.9) |
|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 68(27.0) | 184(73.0) | 59(32.1) | 125(67.9) | 125 | 4.2(0.9) |
| 임대주택(전세임대, 장기전세 등) | 91(36.1) | 161(63.9) | 123(76.4) | 38(23.6) | 38 | 4.0(1.0) |
| 버팀목 전세자금,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 181(71.8) | 71(28.2) | 70(98.6) | 1(1.4) | 1 | 5.0 |
| 생활 지원 항목 ※ 중복 지원되지 않음 | 현재(응답자 수(비율)) | 현재 비수혜자 중 과거의 경험 (응답자 수(비율)) | 수혜자*의 도움 정도(5점) | |||
| 수혜 | 비수혜 | 응답 자수 | 평균 (표준편차) | |||
| 한부모가족지원 | 53(21.0) | 199(79.0) | 136(68.3) | 비수혜 | 116 | 3.8(1.0) |
| 63(31.7) | 수혜 | |||||
| 국민기초생활보장 | 129(51.2) | 123(48.8) | 96(78.0) | 비수혜 | 156 | 4.2(0.9) |
| 27(22.0) | 수혜 | |||||
표 9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돌봄 정책의 인지 및 수혜 현황(총 252명)
| 자녀돌봄 지원 항목 | 인지 여부 (응답자 수(비율)) | 수혜 경험 (응답자 수(비율)) | 수혜자의 도움 정도(5점) | |||
|---|---|---|---|---|---|---|
| 모름 | 인지 | 비수혜 | 수혜 | 응답 자수 | 평균 (표준편차) | |
| 아동수당 | 23(9.3) | 225(90.7) | 8(3.6) | 217(96.4) | 217 | 4.1(1.0) |
| 가정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자가 가정양육 시) | 46(18.5) | 202(81.5) | 24(11.9) | 178(88.1) | 178 | 4.0(1.0) |
| 보육료(어린이집) | 70(28.2) | 178(71.8) | 51(28.7) | 127(71.3) | 127 | 4.6(0.7) |
| 아이돌봄서비스 | 72(29.0) | 176(71.0) | 100(56.8) | 76(43.2) | 76 | 4.3(0.8) |
| 유아학비(유치원) | 156(62.9) | 92(37.1) | 69(75.0) | 23(25.0) | 23 | 4.2(1.1) |
| 공동육아나눔터 | 198(79.8) | 50(20.2) | 40(80.0) | 10(20.0) | 10 | 3.8(0.4) |
주거 지원에서 보호/자립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모자관련 시설 입소 지원 항목은 인지율이 77.4%(195명)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지원 항목의 인지율은 73%(184명)였다. 전세 임대나 장기 전세 등의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인지율은 63.9%(161명)였다. 이 3개 항목은 알고 있는 이들의 수가 모른다고 한 수보다 많았다. 반면,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항목은 인지율이 낮은 편으로 28.2%(71명)만 알고 있었다. 수혜경험에 있어 주거급여는 수혜율이 67.9%(120명)였고, 모자관련 시설 입소의 수혜율은 61.5%(125명)여서 과반 이상이 수혜 경험자들이었다. 반면, 임대주택의 수혜율은 23.6%(38명)였고,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의 수혜율은 1.4%(1명)에 불과했다. 주거지원 수혜자들만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이었다. 수혜자가 1명뿐이었으나 도움 정도는 5점으로 답하였다. 주거급여의 경우는 4.2점, 모자관련 시설 입소는 4.1점, 임대주택은 4.0점으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이들의 수와 수혜 경험자의 수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항목은 임대주택 지원과 버팀목 전세자금 및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지원이었다.
생활 지원 2개 항목은 현재의 수혜 여부와 비수혜자 중 과거 수혜경험 여부, 그리고 현재와 과거 수혜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조사 당시 수혜자의 비율은 21%로 53명 이었는데, 비수혜자 중 과거 수혜 경험자들의 비율은 31.7%로 63명이 수혜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와 과거 수혜 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3.8점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은 조사 당시 51.2%인 129명이 수혜자였는데, 비수혜자 중 과거 수혜 경험이 있는 이들은 22%로 27명이 해당되었다. 현재와 과거 수혜자들만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느 정도로 도움 되었는지 5점 척도로 파악한 결과 평균 4.2점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으로 자녀돌봄 지원에서 아동수당의 인지율은 90.7%(225명), 보육시설 미이용자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받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인지율은 81.5%(202명), 보육료는 71.8%(178명), 아이돌봄서비스는 71%(176명)로 분석 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관련 항목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유아학비(37.1%, 92명)나 공동육아나 눔터(20.2%, 50명)에 관한 지원은 알고 있는 이들의 수가 40% 미만이었다. 수혜 경험율은 아동수당의 경우 96.4%(217명), 가정양육수당은 88.1%(178명), 보육료는 71.3%(127명)여서 이 항목들은 과반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나, 아이돌봄서비스(43.2%, 76명)나 유아학비(25%, 23명), 공동육아나눔터(20%, 10명)는 수혜 경험율이 45% 미만이었다. 수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도움정도를 살펴본 결과(5점 척도), 아동수당은 4.1점, 가정양육수당은 4.0점, 보육료 지원은 4.6점이었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4.3점, 유아학비는 4.2점으로 나타났다. 공동육아나눔터 수혜자들은 평균 3.8점이었다.
3. 정책의 지원 효과
미혼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정책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이들의 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신체적 건강,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과 주거·생활지원 및 자녀돌봄 수혜 항목 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0).
표 10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정책 수혜 항목 수 간의 상관관계(총 252명)
| 생활 스트레스 수준 | 신체적 건강 상태 |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수혜 항목 수 | |
|---|---|---|---|---|
| 생활 스트레스 수준 | 1 | |||
| 신체적 건강 상태 | -.377** | 1 | ||
|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 -.139* | .215** | 1 | |
|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수혜 항목 수 | .060 | -.073 | .205** | 1 |
신체적 건강 상태는 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부적 상관을(r=-.377, p<.01),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와는 정적 상관을 (r=.215, p<.01) 나타내고 있으며, 생활 스트레스 수준은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와 낮은 부적 상관을(r=-.139, p<.05) 나타내고 있었다. 주거·생활 지원 및 자녀돌봄 지원 수혜 항목 수는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와 정적 상관을(r=.205, p<.01) 보이고 있었다.
<표 11>은 회귀분석 결과로, 생활 스트레스가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책 지원이 효과적인지 살펴본 내용이다.
표 11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의 지원 효과(총 252명)
| 구분 | 변인 | 모형 11) | 모형 22) | 모형 33) | 모형 44) | 모형 4-14-1) | |||||
|---|---|---|---|---|---|---|---|---|---|---|---|
| β | t | β | t | β | t | β | t | β | t | ||
| 생활 스트레스 수준 | -.068 | -1.013 | -.081 | -1.257 | -.069 | -1.04 | -.076 | -1.169 | -.033 | -.503 | |
| 신체적 건강 상태 | .190 | 2.847** | .201 | 3.109** | .198 | 2.985** | .203 | 3.117** | .178 | 2.750** | |
| 정책지원 영역 | 주거·생활 | 0.247 | 4.104*** | ||||||||
| 자녀돌봄 | .140 | 2.288* | |||||||||
|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지원 | .225 | 3.717*** | .201 | 3.335** | |||||||
| 상호 작용 | 생활 스트레스*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 -.198 | -3.191** | ||||||||
| 신체적 건강*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 .025 | .411 | |||||||||
| R2 | .050 | .111 | .070 | .100 | .138 | ||||||
| 수정된 R2 | .043 | .100 | .059 | .090 | .121 | ||||||
| F | 6.590** | 10.286*** | 6.213*** | 9.225*** | 7.891*** | ||||||
모형 1에는 생활 스트레스와 신체적 건강 상태 변인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모형 2는 모형 1의 변인들에 선별적 정책으로 주거·생활 지원 수혜 항목들을 합한 변수를 투입하였다. 모형 3은 모형 1에 보편적 정책으로 자녀돌봄 지원 수혜 항목들을 합한 변수를 투입하였다. 모형 4는 모형 1의 변인들에 선별적 정책과 보편적 정책 지원 수혜 항목 모두를 합한 수를 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 4-1는 모형 1의 변인들과 정책 지원 수혜 항목 모두를 합한 수를 조절변수로 투입하고, 모형 1에 투입된 변수와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정책의 지원 효과를 파악하였다.
모형 1에서 투입된 변수들 중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신체적 건강 상태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β=.190, p<.01). 모형 1의 설명력은 4.3%였다. 모형 2는 선별적 정책으로 주거·생활 지원 변수가 투입되었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β=.201, p<.01), 주거·생활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β=.247, p<.001)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형 2의 설명력은 10%였다. 모형 3은 모형 1에서 투입된 변수와 보편적 정책으로 자녀돌봄 지원 변수가 투입된 것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β=.198, p<.01), 자녀돌봄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β =.140, p<)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형 3의 설명력은 5.9%였다. 모형 4는 모형 1에 선별적 정책과 보편적 정책 수혜 항목 수 모두를 합한 변수를 투입한 것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β=.203, p<.01),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β=.225, p<.001)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형 4의 설명력은 9.0%였다. 모형 4-1은 모형 1에 투입된 변수들과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총합을 조절변수로 투입해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에 따른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에 미치는 정책의 지원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신체적 건강 상태가 미치는 영향력(β=.178, p<.01)과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이 미치는 영향력(β=.201, p<01)은 그대로 유의미한 가운데, 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정책 지원의 상호작용으로 조절효과를 보이면서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β=-.198, p<01). 모형 4-1의 설명력은 12.1%였다. 상호작용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조절효과를 시각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와 높을 때에 정책 지원 수혜 항목 수가 적은 그룹과 많은 그룹의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정책 지원을 많이 받는 그룹은 생활 스트레스가 적을 때에는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정책 지원을 적게 받는 그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하향세로 나타나 정책 지원을 적게 받는 그룹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조절변수인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이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양의 값(모형 4에서는 β=.225, 모형 4-1에서는 β=.201)으로 나타났지만 생활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항에서는 음의 값(β=-.198)을 보이는데, 이는 정책 지원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억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생활 스트레스가 크면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의 효과가 억제되어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을 높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 상황과 자녀돌봄 상황, 그리고 정책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지원이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의 비교 검토와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내용이다.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 24세 이하의 대상을 ‘미혼 청소년 한부모’라 지칭하고, 해당하는 252명의 자료를 추출해 통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결과를 요약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은 월평균 소득이 106만 원이었고 지출은 78만 원이었다. 대상자의 78%가 정부지원 금(평균 69만 원)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 의존하는 비율도 39%(23만 원)나 되었다.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돈을 버는 이들의 비율은 26%(102만 원)로 경제적 자립도는 낮은 편이고, 외부 의존도가 높았다. 응답자들이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9%에 불과했다.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은 생활비와 주거비로 월평균 7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자녀 양육비와 교육, 돌봄비로는 30만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다. 즉, 소득의 대부분을 기본적인 생활과 양육에 지출하고 있었다. 다수가 미취학 자녀 1명과 생활하고 있었는데, 실제 민간시설 (44%)에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33%) 돌보며 지내고 있었다. 국공립시설에 맡기는 비율은 15%였다. 희망하는 돌봄 기관은 국공립시설이 우선이었고(34%) 다음은 민간시설(32%)이었다. 직접 돌보고자 하는 이들은 21%였다. 자녀를 양육함에 비용부담과 맡길 곳 찾기, 시간부족으로 힘들다고 한 비율이 70%로, 같은 맥락으로 양육비나 교육비(45%), 자녀상담이나 엄마의 심리상담 및 교육(20%), 양육과 일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유연화와 휴가(19%), 돌봄 시설과 서비스(11%)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경제적 지원 다음으로 양육에 필요한 심리정서적 지원 요구가 많아 이동귀 외(2019)의 연구와 같이 현재의 생활과 양육이 우선순위의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책에 있어 주거·생활 영역에서는 평균 2.2개 항목, 자녀돌봄 영역에서는 평균 2.5개 항목을 지원받고 있었다. 주거 영역에서 모자시설입소를 제외하고 인지율과 수혜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거급여였으며, 임대주택은 인지율에 비해 수혜율이 낮은 항목이었다. 주거 영역의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이었는데, 전세자금이나 내집마련 대출은 인지율도 낮고 수혜율은 1명에 불과했지만, 만족도는 5점이었다. 생활 영역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 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의 수가 많았고,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돌봄 영역에서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모두 인지율과 수혜율이 70-96%로 높은 편이며, 만족도 역시 4점 이상이었다. 그 중 보육료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4.6점이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인지율에 비해 수혜율이 낮았지만, 자녀돌봄 영역 중 보육료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인지율과 수혜율은 모두 낮은 편으로 만족도 역시 하위에 속했는데,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은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나 돌봄 지원을 선호하며, 일반 부모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나 만남을 통한 지원은 접할 기회도 적고 선호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주거·생활 지원 항목이 많을수록, 자녀돌봄 지원 항목이 많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선별적 성격의 지원이나 보편적 성격의 지원 모두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 이었다. 그러나 모든 지원 항목을 총합해 조절효과를 파악한 분석에서는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정책의 지원 효과는 약해지고 있었다. 즉, 정책 지원을 많이 받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스트레스가 적을 때에는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지원 항목 수가 적은 이들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취약해져 여러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어도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일부 정책 지원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한 이윤정(2017)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이는 여러 항목을 지원받고 있는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편적 성격의 지원 외에 선별적 성격의 지원 항목 수가 많은 이들은 미혼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도 취약위기 그룹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정책 지원의 관련성이 없는 것에도 스트레스가 경제적인 면 외에 돌봄, 가사, 원가족과 자녀의 아버지, 친구 등과의 관계적인 면, 학업, 진로나 미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모형에서 다뤄진 지원만으로는 해소가 쉽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 이전에 학업이나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또래와 다른 환경에 처했던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여성가족부, 2021), 어떠한 스트레스냐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이나 취업 상태에 개입되는 정책의 지원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이윤정, 2017, 2019). 이에 임신 이전,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연속되는 갈등과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상황에 따라 정책 지원 요구는 달라짐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도 임신 중 불안과 우울 병력을 지녔던 청소년 산모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 산모에 비해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리정서적으로 더 취약해지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도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Patiño et al, 2024)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입단계에서부터 대상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천 현장에서는 그들의 심리정서 상태와 스트레스 유발원에 대한 파악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적이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정책적‧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은 1:1 사례관리 형식의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은 본인의 생애주기에서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연속해 마주하면서도 자아정체감과 부모효능감을 동시에 발달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 지원은 궁극적으로 자립을 목표로 하되, 부모의 생애주기가 ‘청소년기’에 속함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과정목표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영국의 국가 지원 체계와 구조를 참고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중보건차원에서 10대 부모를 위한 지원체계가 있으며(Public Health England, 2024), 국가가 영국 전 지역을 지원하는 형식의 가족간호사 파트너십(Family Nurse Partnership, FN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NP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보건사회복지부가 주도하여 지역별로 꾸려진 FNP팀을 지원한다. FNP팀은 훈련된 가족 간호사, FNP 감독자, 품질지원 담당자로 구성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가족간호사는 청소년 부모의 임신 초기부터 자녀의 연령이 2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대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부모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돌봄과 부모 역할, 자기 효능감, 교육과 취업, 주거 문제 등 생활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 또는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가족간호사는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는 FNP 시스템에 입력되어 청소년 부모가 개별적, 지역 적,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로 활용된다(Family Nurse Partnership, 2024). FNP는 영국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불가리아, 호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 한부모와 동일 연령대의 젊은 부모를 지원하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예방적 차원의 지원도 가능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원 정책 수립과 실천적 개입에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분석대상은 모두 미혼 여성이므로, 혼인 경험이 있거나 부자가구 형태의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과 요구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 분석 시 활용한 변수는 지원받은 정책 항목 수의 합산 값으로, 항목 간 배타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정책 지원의 효과는 그 구조와 기능 면에서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바람직하나 자료 내에서 생성할 수 있는 변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수혜자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지원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도움 정도를 추가해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셋째,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는 수많은 외생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제하지 않고 개인요인으로 생활 스트레스와 신체적 건강 수준만을 투입하였기에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를 논함에 제한을 지닌다.
본 연구는 한부모 유형 중에서도 취약위기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미혼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주거, 생활, 돌봄 정책에 집중해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효과를 검증해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적 개입을 위한 실천을 논하였다. 원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변인의 한계로 해석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정책의 지원 효과를 검증하는 데 본 연구의 분석 방법에 지적과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지원에 대한 논의와 효과 검증은 초기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가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원자료에서는 추출하기 어려웠던 정책의 선별성과 보편성을 보다 세밀히 다루어 궁극적으로 정책 지원이 어떠한 과정과 유형에서 효과를 나타내는지 심층적으로 다루기를 기대한다. 돌봄에 있어 보편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대상에 부합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 (2024. 4. 21.). 정부지원 신청안내. https://www.idolbom.go.kr/front/srvcGuide/prttm .
. (2024. 4. 21.). 유아학비 지원안내. https://www.childschool.go.kr/ .
. (2024a). 내집마련디딤돌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
. (2024b).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
. (2024a). 가정양육수당.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60 .
. (2024b). 부모급여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
. (2024. 4. 23.). 장래가구추계-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vw_cd=MT_ZTITLE&list_id=A11_2015_1_10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 (2024. 4. 21.). 공동육아나눔터. https://ggfc.familynet.or.kr/web/lay1/S1T431C456/contents.do .
(2024. 6. 30.). Guidance: Family nurse partnership programme. https://www.gov.uk/guidance/family-nurse-partnership-programme .
(2024. 4. 27.). The structure of families -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f all birth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8242 .
(2024. 6. 30.). A framework for supporting teenage mothers and young father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eenage-mothers-and-young-fathers-support-framework .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4-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8-14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08-22

- 1565Download
- 2678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