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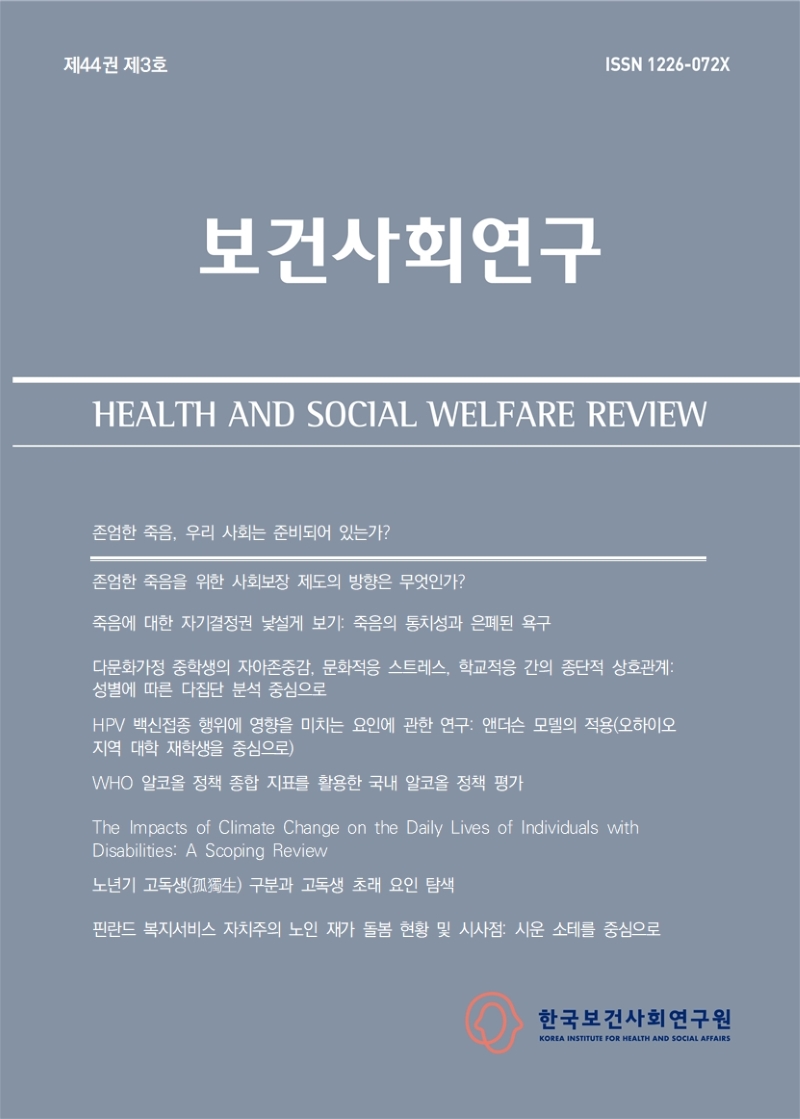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고용 위협과 건강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A Scoping Review of the Impact of Negative Employment Change on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hoi, Jaeyun1; Shin, Jeonghoon2; You, Myoungsoon1*
보건사회연구, Vol.44, No.3, pp.252-272, 2024
https://doi.org/10.15709/hswr.2024.44.3.252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코로나19 팬데믹은 역학적 준비 외에도 정책적인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변화시킨 고용 지형을 재구성하고 이로 인한 건강 결과가 논의되어 온 방식을 종합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체계적으로 수집한 47편의 문헌을 국가, 자료 수집 시기, 연구 방법과 활용한 변수를 중심으로 주제 범위를 분석한 결과 고용은 좁은 의미의 실직 위주로, 건강은 우울과 불안을 비롯한 정신 건강 위주로 연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구조적 차별과 관련된 고용과 건강의 요인이 다루어진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재난의 고용 및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그리고 연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구축된 인프라가 필요하다. 공공 수준에서 건강 회복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해 고용 정책의 건강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has induced unprecedented shifts in employment dynamics, yet a comprehensive review of its impact on health remains scarce. This study aims to delineate the landscape of research regarding the repercussions of negative employment changes on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erving as a roadmap for future research endeavors. Following the methodology outlined by the Joanna Briggs Institute (JBI),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up to February 29, 2024, was analyzed. Forty-seven pertinent documents were selected and categorized by country, data collection timing, research methodology, and variables employed. This review revealed the multifaceted nature of negative employment changes and health outcomes, spanning economic deprivation, social support, and stress theories to elucidate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on long-term impacts and physical health effects were found to be lacking, alongside gaps in research on employment and health disparities among marginalized groups. Moving forward, there is a pressing need to undertake robust investigations into the employment and health outcomes of public health crises, guiding evidence-based policy responses.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 변화를 촉발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인구사회학적 조건과 건강이 맺는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 위기와 구분된다. 그러나 그 특수성에 관한 문헌의 종합적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위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지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고찰을 위해 2024년 2월 29일까지 발표된 국내외 문헌을 Joanna Briggs Institute(JBI)에서 제시한 단계를 따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47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 국가, 자료 수집 시기, 연구 방법과 활용 변수를 파악하고, 고용 위협과 건강의 주제 범위를 확인하였다. 고찰 결과, 실업의 건강 영향을 설명하는 경제적 박탈,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이론 관점을 확인하였다. 장기적 영향 및 신체 건강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했으며, 구조적 차별을 받는 집단의 고용과 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의 공백이 확인되었다. 향후 증거 기반의 위기 대응 정책을 위해 공중보건 재난의 고용과 건강 영향 연구가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Ⅰ. 연구 배경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어왔다(Avendano & Berkman, 2014). 고용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조명한 초기 연구는 고용 중단의 충격이 유발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노동자의 의사와 반하게 유급 고용에서 탈락하는 ‘비자발적 실직’과 경기 변화로 인한 일시 해고 후 복직을 발령받지 못하는 ‘해직’을 중심으로 건강 영향을 평가한 실증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비경제적 자원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비롯한 요인이 고용의 긍정적 효과와 관련이 있었다(Avendano & Berkman, 2014).
고용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노동 시간과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며 등장한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은 고용과 건강 연구의 또 다른 주제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 상황은 소득 감소, 가정 해체와 같이 건강에 불리한 조건을 동반하여 고용 탈락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한다. 2007년부터 2008년의 경기 침체 기간과 관련된 건강 영향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대규모 경기 침체는 거시적 및 개인 수준에서 고용 관련 후유증을 남겼고, 이는 출생 감소 및 낮은 주관적 건강, 심리적 고통 및 자살 증가와 관련되었다(Margerison-Zilko et al., 2016). 그러나 이전의 대규모 경기 침체 기간 관찰된 실업의 건강 영향은 현대에서의 실업의 건강 영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복지체계로 대표되는 사회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Bambra, 2010).
팬데믹이라는 독특한 상황은 고용 변화와 건강의 관계에 관한 더 확장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이는 첫째, 각 국가에서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봉쇄(lockdown), 사회적 거리두기 및 원격 근무와 같은 조치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전보다 고용 변화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며, 둘째, 감염병 재난이라는 상황이 기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이 맺는 관계를 조절했기 때문이다. 우선 팬데믹 기간의 고용 변화는 양적으로도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종류와 강도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커뮤니티 내에서 52개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른 집단보다 더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근로자는 불안정 고용 상태(precarious employment), 비공식 부문 노동자(informal work), 실업자(unemployed) 순으로 나타났다(Tamin et al., 2021). 또한 체계적 문헌고찰 6건을 대상으로 한 우산 리뷰 연구에 의하면 의료종사자가 아닌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며 지역사회 내 다른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도 높게 나타났다 (McNamara et al., 2021). 이처럼 팬데믹은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고용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경로가 다양해졌다. 본 연구가 기반을 두고 있는 재난 취약성 이론(Disaster vulnerability theory)은 재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개인, 집단, 지역사회, 국가의 민감성(susceptibility)을 설명하고자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사회 복지의 관점에서 재난은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안녕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에 전통적인 의미의 재난은 조직과 사업체를 파괴하거나 지역 외부로 영구적으로 이전하게 만들어 실업 문제를 가중시켰다(Tierney, 2007). 또한 재난 상황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계급, 인종,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Bolin and Kurtz(2018)에 의하면 실업자는 재난 지원 대상에서 흔히 배제되는 집단 중 하나이다.
두 번째 논지인 팬데믹 상황 중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건강이 맺는 관계를 조절한다는 증거도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취약성과 '동시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co-occurring stressor)'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악영향은 '상승효과(synergistic)'를 보였다(Trub et al., 2023). 다른 위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변화가 동반하는 효과는 인구 집단 간에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불안정 고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하위집단에 따른 차이를 종합한 문헌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했으며, 젊은 연령층과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을 탐색한 경우가 제한적으로 발견되었다(Gray et al., 2021). 저소득층에서의 실직은 생산성 감소와 소득 감소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거나,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심리적 고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Baird et al., 2022). 그러나 개개인의 자원과 채택된 정책에 따라, 건강 행동 유인을 강화하거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줄여 고통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aird et al., 2022).
재난 취약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 및 인구학적 속성은 재난 취약성과 관련이 있지만 취약성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갖춘 조건과 역량을 통해서만 다양한 수준의 취약성으로 표현된다(Zakour & Gillespie, 2013). PAR(Pressure and Release) 모델에 따르면 취약성은 사회적 과정의 지배를 받으며, 이는 근본 원인(root cause)을 안전하지 않은 조건(unsafe condition)으로 변환시키는 동적인 압력(dynamic pressure)을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Wisner et al., 2004, Zakour & Gillespie, 2013에서 재인용). 안전하지 않은 조건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국가와 정부의 대응으로 강화된다. 예컨대 Wisner et al.(2004)에 의하면 경제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저소득 가구가 재난으로 인해 손실된 자산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고용 변화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를 지도화하고, 재난 취약성 이론의 논의에 비춘 지식 격차를 확인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경기침체 또는 대규모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증거 기반 정책 개발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고용 위협이 건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건강에 불리한 고용 조건'을 고용 위협으로 개념화하였다.
주제 범위 문헌 고찰 연구는 특정 주제, 분야, 개념 또는 이슈에 대한 증거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지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증거 종합 연구의 한 가지 유형이며, 주제와 관련한 문헌의 주요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방법론을 포함하여 개념과 관련된 주요 특성 또는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Munn et al., 2022). 정확한 문헌 탐색과 종합을 위해 사전 프로토콜에 따른 연구 단계를 따를 것이 권고되는바, 본 연구는 Joanna Briggs Institute(JBI)에서 제시한 전략 설정, 자료 추출, 분석과 보고의 단계를 참고하여 설계하였다(Peters et al., 2020).
2. 연구 질문과 선정 기준
본 연구는 연구 시점인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위협의 건강 영향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주제 범위를 확인하고, 논의의 공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고용 위협이 건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의 특성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며, 주제 범위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고용 위협이 건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서 다루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협’의 범위는 무엇인가?
-
(2)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고용 위협이 건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서 평가한 ‘건강 영향’의 종류와 평가 도구는 무엇인가?
-
(3)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고용 위협이 건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서 활용한 매개 및 조절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 질문에 적합한 문헌을 검색 및 추출하기 위해 JBI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 참여자(participants), 개념(concept), 맥락(context), 근처 출처의 유형(types of evidence source) 측면의 문헌 포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특별한 의학적 요구가 없는 성인 인구 집단으로, 의료 기관 환경에서 대상자가 모집된 경우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임산부, 장애인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은 ‘고용 위협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개인 수준에서 탐색한 연구’로 개념을 설정하였고, 이때 적용된 맥락은 국내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근거 출처 유형은 횡단과 종단연구를 포함한 관찰연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한 질적 연구로 한정하였다.
3. 문헌 검색
가. 데이터베이스 선정
국내외 문헌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기 위해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영문 및 국문으로 공개적으로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문 연구는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와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국외 연구는 SCOPUS, Web of Science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술 분야에 걸친 문헌을 수집하였다.
나. 검색 용어 및 방법
검색은 2024년 3월 1일부터 10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국내 문헌 검색 시 ‘코로나19’, ‘고용’, ‘일’, ‘실업’, ‘실직’, ‘해직’, ‘건강’이라는 검색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국외 문헌 검색 시 ‘COVID-19’,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job loss’, ‘labor underutilization’, ‘layoff’, ‘job displacement’, ‘health’, ‘well-being’ 용어를 사용하였다. 검색어는 2023년 11월 기획 단계에서 진행한 파일럿 연구에서의 결과와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토대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문헌을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검색 시에는 수집하고자 하는 문헌에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AND와 OR 연산자를 활용하여 검색 구문을 이용하였다. 일례로, SCOPUS에서 활용한 검색 구문은 TITLE-ABS-KEY(COVID-19 AND(unemployment OR underemployment OR(job AND loss) OR(labor AND underutilization) OR(layoff) OR(job AND displacement)) AND(health OR well-being)) AND(LIMIT-TO(SRCTYPE, “j”)) AND(LIMIT-TO(PUBSTAGE, “final”)) AND(LIMIT-TO(OA, “all”)) AND(LIMIT-TO(DOCTYPE, “ar”)) AND(LIMIT-TO(LANGUAGE, “English”))이다.
다. 문헌 선정
선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3,158건(SCOPUS 1,808건; Web of Science 1,277건; RISS 37건; KISS 36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서지 정리 프로그램 Endnote 21을 활용하여 중복된 연구 750건을 제외한 뒤, 2,408건의 문헌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연구 대상과 개념, 맥락, 근거 출처의 유형이 기준에 맞지 않는 문헌 2,339건을 제외하였다. 이후 69건의 문헌에 대해 전문을 확인하여 앞선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연구자 간의 교차 확인을 통해 일관성 있는 선정 및 제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문 검토 과정에서는 총 22건(기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이 기준에 맞지 않은 문헌 1건; 코로나19가 촉발한 고용 위협을 식별할 수 없는 연구 11건; 연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맥락이 반영되지 않은 연구 2건; 개인 수준에서 고용과 건강을 탐색한 연구가 아닌 문헌 8건)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47건의 문헌이 대상 문헌으로 선정되었으며, 검토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PRISMA-ScR)의 흐름도에 따라 제시하였다.
검색 과정에서 임산부, 2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자폐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고용 경험과 건강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각각의 인구 집단이 가진 건강 관리 요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제하였다. 또한 건강에 밀접한 환경 영향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예컨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과 같은 사회적 건강의 경우, 건강(health)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거나 소진을 겪는 경우에도 건강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고용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제되었다.
4. 자료 추출
최종 선정한 문헌을 대상으로 Microsoft Excel Sheet를 활용해 문헌의 일반적 특성과 주제 범위 특성을 정리하였다. 자료 추출 시 PCC Framework(population, concept, context)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자료 수집 전 마련한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문헌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저자, 출판 연도, 학술지, 연구 대상 국가, 분석 대상, 연구 방법을 포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양상과 정책이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 시기를 추가하였다.
주제 범위 특성으로는 연구 목적에 맞춰 고용 위협의 범위, 건강 영향의 종류와 내용, 건강 영향 평가 도구,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활용한 매개 및 조절 변수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문헌의 일반적 특성
최종 연구 대상으로 포함된 문헌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선정 문헌 요약
| 저자 및 연도 | 국가 | 자료 수집 시기 | 고용 위협의 종류 | 건강의 범주 | 건강 관련 문항 | 건강 영향 평가 도구 | 매개 및 조절 변수 |
|---|---|---|---|---|---|---|---|
| 강은정 (2022) | 대한민국 | 2020년 5월 | 고용 불안감, 소득 불안감 | 건강행태 | 음주빈도변화(증가/변화 없음/감소) | - | - |
| 고태은, 이승윤 (2022) | 대한민국 | 2021년 9-11월 | 불안정 노동 | 신체건강, 정신건강, 건강행태 | 음주, 피부염, 만성질환(근골격계), 우울감 | - | - |
| 이수비 (2021) | 대한민국 | 2019- 2020년 | 고용 상태 변화 | 정신건강 | 우울 | CESD-11 | 연령 |
| Abrams et al.(2022) | 미국 | 2020년 4-5월 | 실직, furlough, 근로시간/수입 감소 | 정신건강 | 삶의 만족도, 우울, 불안, 외로움 | CES-D, BAI, 3-item UCLA Loneliness Scale | - |
| Alaminos-T orres et al.(2022) | 스페인 | 2020년 10월 | 실직, furlough | 정신건강 | 일반 정신건강 | GHQ-12 | - |
| Arena et al.(2022) | 호주 | 2021년 8-9월 | 실직 | 정신건강 | - | - | - |
| Baird et al.(2022) | 미국 | 2013- 2016년, 2018- 2020년 | 실직, 근로시간 감소, 실업 유지 | 정신건강 | 심리적 고통 | K6 | 재정적 문제 |
| Baranov et al.(2022) | 파키스탄 | 2019년 10-12월, 2020년 7월 | 실직 | 정신건강 | 심리적 고통 | K10 | - |
| Bogliacino et al.(2023) |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 2020년 4-5월 | 임금/수입 변화 | 정신건강 | 스트레스, 불안, 우울 | DASS-21 | - |
| Brown et al.(2022) | 미국 | 2020년 8월- 2021년 5월 | 근로시간 감소, 실직 |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 | 우울 증상, 자기 평가 건강, 식량 안전 보장(food security status) | CESD-10 | - |
| Burdett et al.(2023) | 영국 | 2020년 6-9월 | furlough 또는 유급휴가, 실직, 수입감소, 희망퇴직 | 정신건강 | 일반 정신건강 장애 (common mental disorder) | GHQ-12, AUDIT | - |
| Chatterji et al.(2021) | 인도 | 2021년 2-3월 | 일 변화(임금 없음) | 정신건강 | 일반 정신건강 | WHO WMH-CIDI | - |
| de Miquel et al.(2022) | 스페인 | 2020년 6월 | 실직, 일시 해고, 소득감소 | 정신건강, 건강행태 | 범불안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PTSD, 물질 남용, 자살 생각 및 행동 | PHQ-8, GAD-7, PCL-5, WMH-ICS, CAGE-AID, C-SSRS | 지각된 재정적 스트레스 |
| Donnelly et al.(2022) | 미국 | 2020년 4-7월 |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고용 불안정성 | 정신건강 | 우울, 불안 | PHQ-2, GAD-2 | - |
| Ferry et al.(2021) | 영국 | 2020년 4월 | 근로시간 감소 | 정신건강 | 일반 정신건강 | GHQ-12 | - |
| Foremny et al.(2024) | 스페인 | 2020년 4월- 2022년 4월 | 실직 | 정신건강 | 일반 정신건강 | - | 노동시장 상황 |
| Görlich & Stadelman n(2020) | 독일 | 2020년 4월 | 실직에 대한 두려움 | 정신건강 | 우울, 불안, 스트레스 | DASS-21 | - |
| Grandey et al.(2021) | 미국, 영국 | 2020년 2월, 4월, 6월 | 실직, furlough, 근로시간 감소 | 정신건강, 신체건강 | 긍정 및 부정 정서, 신체화 증상, 불면증 | - | - |
| Griffiths et al.(2021) | 호주 | 2020년 3-6월 | work loss(실직, 일시 해고, furlough) | 정신건강, 신체건강 | 심리적 고통, 신체건강 지수 | K6, SF-12 | 사회적 상호작용 , 재정적 자원 |
| Griffiths et al.(2022) | 호주 | 2020년 3-12월 | work loss(실직, 일시 해고, furlough) | 정신건강, 신체건강 | 심리적 고통, 신체건강 지수 | K6, SF-12 | - |
| Guerin et al.(2021) | 미국 | 2020년 6월 | 실직, furlough, 근로시간 감소 | 정신건강 | 우울, 불안 | GAD-2, PHQ-2 | - |
| Gunn et al.(2022) |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미국, 칠레 | 2020년 11월- 2021년 6월 | 실직 또는 furlough, 종사상 지위 변화 | 정신건강 | 우울, 불안 | EQ-5D-5L QOL | - |
| Han et al.(2023) | 대한민국 | 2021년 3-7월 | 실직 | 정신건강 | 우울, 불안, 자살생각 | PHQ-9, GAD-7 | 지각된 사회적 지지 |
| Hecker et al.(2022) | 프랑스 | 2020년 3월- 2021년 7월 | 근로시간 감소 또는 부분 실직, 강제 휴직, 무직 | 정신건강 | 우울, 불안 | ASEBA-ASR | - |
| Kavanaugh et al.(2022) | 미국 | 2020년 5월, 2021년 5월 | 실직, 근로 시간 감소 | 의료이용 | 코로나19 관련 성 관련 의료이용 지연 | - | - |
| Lee et al.(2021) | 미국 | 2020년 4월, 5월 | 실직, 근로 시간 감소 | 정신건강 | 우울, 불안 | GAD-2, PHQ-2 | - |
| Majumder et al.(2022) | 방글라데 시 | NA | 고용 불안정성 | 정신건강 | 일반 정신건강 | - | - |
| May et al.(2023) | 영국 | 2021년 5-12월 | 실직, 소득감소 | 정신건강 | 웰빙 | - | - |
| McDowell et al.(2021) | 미국 | 2020년 4월 | 실직 | 정신건강 |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긍정적 정신건강 | - | - |
| Mojtahedi et al.(2021) | 영국, 아일랜드 | 2020년 4-5월 | 실직, furlough | 정신건강 | 우울, 불안, 정신적 강인함(Mental toughness) | STAI, DASS21, MTQ48 | - |
| Monk et al.(2023) | 영국 | 2020년 8-9월 | 고용 안정성, furlough | 건강행태 | 알코올 | AUDIT-C | - |
| Nelson et al.(2020) | 미국, 캐나다, 유럽 | 2020년 3-4월 | 실직, 소득감소 | 정신건강 | 우울, 불안, 코로나19 불안 (COVID-19 concern) | GAD-2, PHQ-2 | - |
| Nesoff et al.(2021) | 미국 | 2020년 4-5월 | 실직, furlough, 가구원의 근로시간 감소 | 건강행태 | 알코올 이용 | WHO risk drinking level | - |
| Pan et al.(2023) | 중국 | 2021년 | 근로 시간 변동 폭 | 정신건강 | 일반 정신건강 | SF-12 | 일-가정 갈등의 증가 |
| Pompili et al.(2022) | 이탈리아 | 2020년 3-5월 | 실직 | 정신건강 | 자살 생각 및 위험, 정신건강 상태, 일반적 고통(스트레스, 불안, 우울), 회복탄력성, 지각된 지지 | GHQ, DASS-21, CD-RISC, MSPPS, SIDAS | - |
| Posel et al.(2021) | 남아프리 카공화국 | 2020년 5-6월, 7-8월 | 실업 상태 지속, furlough, 유급 휴가 | 정신건강 | 우울 | PHQ-2, CES-D 10 | - |
| Ruengorn et al.(2021) | 태국 | 2020년 4-5월 | 실직, 소득 감소 | 정신건강 | 우울 증상,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 PHQ‐9, GAD-7, PSS-10 | - |
| Sampson et al.(2021) | 미국 | 2020년 3-4월 | 실직, 소득 감소 | 건강행태 | 신체활동, 수면, 건강한 식습관 감소, 흡연 증가, 전자담배 이용 증가, 음주 | - | - |
| Settels & Böckerman (2023) | 유럽 27개국 | 2020년 6-8월 | 실직, 해고, 폐업 | 주관적 건강, 정신건강 | 자기 평가 건강, 우울 증상 여부, 불안 증상 여부 | - | 재정적 상황, 사회 활동 |
| Sun et al.(2022) | 미국 | 2020년 5월 | 고용주 파산, 고객 상실, 임금 감소, 해고 또는 재계약 실패 | 건강행태 | 비약물적 치료(NPIs) | - | 심리적 고통(K6) |
| Umucu et al.(2022) | 미국 | 2020년 5-6월 | 실직 | 정신건강 | 우울 및 불안 가능성, 코로나19 시기 관련 스트레스, 외로움 | PHQ, PCL-5, short-form UCLA Loneliness scale | - |
| Wang et al.(2022) | 영국 | 2020년 4월 | 실직, furlough, 부분고용 유지, 부분고용으로 전환 | 정신건강 | 정신건강의 변화 | GHQ-12 | - |
| Witteveen & Velthorst (2020) |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독일 | 2020년 3-4월 | 실직, 소득감소, 업무감소 | 정신건강 | 우울한 감정(feelings of depression), 외로움, 건강 불안 | - | - |
| Wörn et al.(2023) | 노르웨이 | 2020년 3월 | 실직, furlough | 정신건강 | 우울 증상 또는 불안 증상 | SCL-5 | - |
| Wright et al.(2021) | 미국 | NA | 실직 | 정신건강, 의료이용 | 감정 조절(emotion regulation), 정신건강 관리(mental health care) | - | - |
| Zamanzadeh et al.(2024) | 중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 2020년 4월 | 실직, 자영업 중단 | 정신건강 | 불안, 지루함, 불면증, 외로움 | - | - |
| Zheng et al.(2023) | 중국 | 2020년 | 실업위험 인식 |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행태 | 만족도, 우울증, 체질량 지수(BMI), 주관적 건강, 신체활동 참여,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screen time), 불충분 수면, 흡연, 음주 | CES-D | - |
출판 연도는 2020년이 3건, 2021년이 14건, 2022년이 19건, 2023년이 9건, 2024년이 2건으로, 2022년에 출판된 문헌이 가장 많았다. 비교적 출판된 학술지는 총 32종류로, 단일 학술지 중 가장 많은 문헌이 포함된 곳은 BMC Public Health(4건)와 Frontiers in Psychology(4건)이었다. 이 외에도 경제학, 정치학, 정책학, 작업 의학, 역학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가 확인되었다.
단일 연구 대상 국가로 가장 많았던 곳은 미국(13건)과 영국(5건)이었다. 8개 연구는 1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다국적 연구는 주로 유럽에서 이루어졌다. 대륙별 비교 시 유럽(16건), 북아메리카(13건), 아시아(10 건) 순으로 많았다. 이외 대륙에서는 남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건 포함되었다(Posel et al., 2021). 대한민국을 단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서 3건, 해외 학술지에서 1건을 찾을 수 있었으며, 여러 대륙에 걸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4건 있었다.
표본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연구가 45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명시되지 않은 질적 연구 1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건으로 확인되었다. 표본 수집이 종료된 시기는 2020년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2022년 4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2021년에 자료 수집이 종료된 연구는 10건이었으며, 자료 수집 시기가 코로나19 초기 등으로 자세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2건 있었다.
특정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7건으로, 항공 산업 종사자 2건(Alaminos-Torres et al., 2022; Görlich & Stadelmann, 2020), 버스 운전 노동자 1건(고태은, 이승윤, 2022), 접객 및 레저 관련 종사자 1건(Grandey et al., 2021), 금융업 종사자 1건(Majumder et al., 2022), 퇴역군인 2건(Burdett et al., 2023; Umucu et al., 2022)이 있었다.
문헌에서 채택한 연구 방법으로 구분 시 질적 연구는 4건이 포함되었으며, 심층 면접 기법을 활용하였다(고태은, 이승윤, 2022; Arena et al., 2022; May et al., 2023; Wright et al., 2021).
2. 주제 범위 특성
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변화의 형태는 각 연구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한 고용 위협에 주목하여, 고찰 범위에 포함된 고용 변화 형태를 크게 (1) 기존의 실업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2) 새롭게 실직한 경우, (3) 일시 해고, 비자발적인 유급 휴가 또는 furlough의 대상자가 된 경우, (4) 근로 시간과 임금이 줄어든 경우, (5) 종사상 지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6) 고용 안정성에 위협을 지각한 경우와 (7) 그 외의 변화로 범주화하였다.
기존 실업 상태의 장기화는 연구 시점 이전에 실업 상태였던 대상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었다. 양적 연구의 경우 대부분 후술할 다른 고용 상태의 변화와 함께 연구되었으며, 질적 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장기 실업 상태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여기는 대상자를 표집 하여 진행한 연구가 포함되었다(Wright et al., 2021).
새롭게 실직한 경우는 가장 좁은 의미의 실업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로서 채택하고 있었다. 실직에 대한 설명은 ‘no longer working(Baird et al., 2022)’, ‘job loss’, ‘lost or change in job(Nelson et al., 2020)’, ‘being out of work(Griffiths et al., 2022)’, ‘layoff’로 표현되었다.
일시 해고, 비자발적 유급 휴가와 furlough는 실직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변수였다. 정책적으로 furlough 제도가 도입되었던 영국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furlough라는 용어를 설문지에 직접 인용하여 대상자를 구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urlough가 직접 사용된 연구는 14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일시 해고(temporary lay-off)를 다룬 문헌이 확인되었다(de Miquel et al., 2022).
근로 시간 및 임금 감소는 함께 측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로 시간 감소의 정의를 제시한 경우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Wang et al., 2022). 비슷한 사례를 ‘시간 관련 부분 실업(hour-related underemployment)’으로 직접 표현한 문헌이 있었다(Lee et al., 2021). 자신을 포함한 가족 중 실업, furlough, 근로시간 감소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은 문헌도 확인되었다(Nesoff et al., 2021). 그 밖에 코로나19 이후의 임금 또는 수입 변화를 직접 물은 문헌이 있었다(Bogliacino et al., 2023).
종사상 지위의 변화는 각각 상용직, 자영업, 실업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한 경우를 다룬 국내 문헌이 1건 있었으며, 실직 상태에서 비정규직(non-standard employment)으로 변화, 정규직(standard employment)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 비정규직에서 다른 비정규직으로 변화한 경우를 다룬 국외 문헌이 1건 있었다(Gunn et al., 2022).
총 7건의 문헌에서 고용 불안정을 변수로 다루었다. 고용 불안정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에 관한 문항(“I think I might lose my job in the near future if pandemic continues” 등)에 동의하는 정도 또는 12개월 이내 직업을 잃거나 직장이 폐업할 가능성에 대한 0~100% 사이의 응답으로 구분하였으나(Majumder et al., 2022; Zheng et al., 2023), 불안정노동의 경험을 직접 수집한 경우도 확인되었다(고태은, 이승윤, 2022).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의 근로 상태를 확인한 뒤 고용 변화 여부에 따라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s를 구분한 경우도 있었다 (Foremny et al., 2024). 실직에 대한 두려움(fear of job loss)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로 고용 불안을 판단한 문헌이 1건 있었으며(Görlich & Stadelmann, 2020), 대부분 문헌에서 ‘고용 불안정성(job insecurity)’ 또는 ‘고용 안정성 (job secur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가운데 자신을 포함한 가구원의 고용 불안감(“Do you expect that you or anyone in your household will experience a loss of employment income in the next 4 weeks”)을 포괄적으로 측정한 사례가 있었다(Donnelly et al., 2022).
그 외에 1건의 문헌에서만 확인된 고용 관련 변화는 고용주 파산, 고객 상실, 임금 감소, 해고 또는 재계약 실패(Sun et al., 2022), 폐업(Settels & Böckerman, 2023), 희망퇴직(voluntary redundancy)(Burdett et al., 2023), 근로 시간의 변동 폭(working time variation)(Pan et al., 2023)이 있었다. 이 중 근로 시간의 변동 폭은 지난달 가장 많이 일한 주의 근로 시간과 가장 적게 일한 주의 근로 시간의 차이를 통해 식별하였다. 앞서 구분한 형태의 고용 변화를 ‘일 감소(reduced working)’로 통합하여 건강 영향을 측정한 경우도 있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근무 시간 감소, 유급 휴가, 해고, 인원 감축, 가족 돌봄 참여, 자가격리 및 질병의 사유를 모두 포함한 응답을 수집하였다(Ferry et al., 2021). 실직, 일시 해고와 furlough를 통합하여 ‘일 상실(work loss)’로 표현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Grandey et al., 2021; Griffith et al., 2022; Griffith et al., 2021).
나. 건강 영향의 종류와 평가 도구
문헌에서 평가한 건강 영향은 신체 건강,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 건강행태, 의료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총 9건의 문헌이 두 개 영역 이상의 건강을 종속 변수로 다루고 있었다. 한 개 영역의 건강을 다룬 나머지 38건의 문헌에서 확인된 종속변수는 건강 행태가 5건, 의료이용이 1건, 정신건강이 32건이었다.
1) 신체 건강
신체 건강을 평가한 연구가 5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건에서 모두 다른 건강의 영역과 함께 측정되어, 단일하게 신체적 건강 영향만을 측정한 문헌은 발견되지 않았다. 활용된 변수 또한 SF-12 Physical Health Component Score가 2건이었으며(Griffith et al., 2022; Griffith et al., 2021), 다른 연구에서는 BMI를 평가하거나 신체화 증상, 불충분한 수면을 평가하였다(Zheng et al., 2023). 불면증을 신체 건강으로 범주화한 연구가 1건 있었다(Grandey et al., 2021). 신체적 건강 영향을 평가한 질적 연구 중에는 자가 보고를 통해 피부염과 근골격계 만성질환 사례를 수집한 문헌과 ‘전반적인 신체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을 수집한 문헌이 있었다(고태은, 이승윤, 2022; May et al., 2023).
2) 정신 건강
일반적 정신건강. 대부분 문헌이 정신건강 영향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신건강 영향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자살 생각의 임상적 정신건강에서부터 스트레스, 외로움, 삶의 만족도, 지루함(boredom), 근심을 비롯한 감정 및 정서적 웰빙에 이르는 넓은 범주의 건강 개념이 활용되었다. 포괄적인 정신건강을 측정한 경우, General Health Questionnaire-12(GHQ-12)가 가장 흔히 사용되었으나, The World Mental Health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WMH-ICS)를 활용한 문헌도 확인하였다. 자가 보고로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I am getting mentally sick since the outbreak of corona virus”)을 활용한 연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외 코로나19와 관련된 걱정(COVID-19 concern)과 스트레스(probable COVID-19 era-related stress)(Nelson et al., 2020; Umucu et al., 2022), 건강 불안(health anxiety)을 측정한 사례가 발견되었다(Witteveen & Velthorst, 2020). 스트레스를 평가한 경우 Perceived Stress Scale(PSS-10)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었으며, Umucu et al.(2022)는 PTSD Checklist(PCL-5) 도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시기 관련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외로움은 3-item UCLA Loneliness Scale을 통해 측정되었다. 긍정적 측면의 정신건강은 회복탄력성(Pompili et al., 2022), 지각된 지지와 긍정적 정신건강(positive mental health)(McDowell et al., 2021), 정신적 강인함(mental toughness)(Mojtahedi et al., 2021)이 측정되었고, 이 중 회복탄력성을 평가한 문헌에서는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를, 정신적 강인함은 Mental Toughness Questionnaire(MTQ48) 척도를 활용하였다.
심리적 고통. 정신건강과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을 구분하거나 정신건강 범주로서 심리적 고통을 측정한 연구가 모두 확인되었다. Hopkins Symptom Checklist를 활용하여 우울과 불안 증상을 측정한 후 이를 심리적 고통으로 개념화 한 사례가 있었다(Wörn et al, 2023). 측정 도구는 Kessler Psychological Distress Scale(K6) 이 대부분이었으나, K10이 1건에서 활용되었다(Baranov et al., 2022). 이 외 일반적 고통(general distress)으로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측정한 사례가 있었다(Pompili et al., 2022).
임상적 정신건강. 임상적 진단에 가까운 정신건강을 평가한 경우 우울 또는 우울과 불안을 함께 측정한 문헌이 가장 많았다. 우울 측정 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10, CESD-11), Patient Health Questionnaire(PHQ-8, PHQ-9, PHQ-2), Symptom Checklist(SCL-5) 척도가 활용되었으며, 불안은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GAD-7, GAD-2), Beck Anxiety Inventory(B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통해 평가한 문헌이 발견되었다. 자살생각을 측정한 문헌에서는 Columbia-Suicide Severity Rating Scale(C-SSRS) 또는 Suicidal Ideation Attributes Scale(SIDAS)이 활용되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동시에 측정하는 도구인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21(DASS-21),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인 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ASEBA-ASR)가 활용된 문헌도 확인할 수 있었다(Hecker et al., 2022). 이 외에 PTSD를 측정한 문헌 1건은 PCL-5를 활용하였으며(de Miquel et al., 2022), 불면증을 정신건강 증상으로서 측정한 사례가 1건 확인되었다(Zamanzadeh et al., 2024).
3)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건강 수준을 “Poor, Fair, Good, Very Good”의 4단계 로 수집한 문항이 활용되었다(Settels & Böckerman, 2023). 신체적 건강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만을 변수로 측정한 문헌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기 평가 건강을 신체적 건강에 포함한 문헌이 1건 확인되었다(Zheng et al., 2023).
4) 건강행태
건강행태는 물질 이용을 비롯한 건강 위험 행동과 감염 예방 행동이 모두 등장하였다. 가장 광범위한 물질 이용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과 음주를 포함하였고(Sampson et al., 2021), 이 외에도 물질 남용(substance abuse) 여부를 측정한 사례가 있었다(de Miquel et al., 2022). 건강 위험 행동은 부적절한 수면, 신체활동 감소,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screen time)이 측정된 문헌이 있었다(Zheng et al., 2023). 물질 이용과 건강 위험 행동은 응답 시점의 수준을 평가한 경우와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의 변화 여부를 활용한 경우가 모두 발견되었다. 이 외 비약물적 치료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문항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예방 행동을 측정한 문헌이 1건으로, (1) 모임을 취소했는지, (2)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했는지, (3) 거리두기를 준수했는지, (4) 사람이 모인 곳을 피했는지 (5)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평가한 문헌이 있었다(Sun et al., 2022).
알코올 이용은 WHO risk drinking level(Nesoff et al., 2021),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Concise(AUDIT-C)를 활용하거나(Monk et al., 2023), 자가 보고한 음주 빈도 변화를 증가, 변화 없음, 감소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활용한 문헌을 확인할 수 있었다(강은정, 2022). 물질 사용은 CAGE-Adapted to Include Drugs(CAGE-AID)를 활용한 문헌이 1건 확인되었다(de Miquel et al., 2022). 흡연의 경우 모든 문헌에서 자가 보고를 통해 흡연량의 변화 또는 금연 여부를 확인하였다.
5) 의료이용
의료이용은 2건의 문헌에서 확인되었다. 근로 시간 감소에 따라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의료이용을 못 하거나 미룬 경험을 수집한 1건의 문헌이 있었다(Kavanaugh et al., 2022). 다른 질적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본인의 사회·정서적 건강을 위해 어떤 도움을 구했는지의 경험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Wright et al., 2021).
다. 고용 위협과 건강 영향의 매개 및 조절 변수
매개 및 조절 변수는 9건의 문헌에서 고용 위협과 건강 영향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고찰에 포함된 문헌에서 보고된 변수들로는 연령(이수비, 2021), 경제 관련 변수(financial concern, perceived financial stress, labor market conditions, financial resource, financial circumstance)(Baird et al., 2022; de Miquel et al., 2022; Foremny et al., 2024; Griffiths et al., 2021; Settels & Böckerman, 2023), 사회적 관계 관련 변수(social interaction, perceived social support, increased work-family conflict, social activity)가 있었다(Griffith et al., 2021; Han et al., 2023; Pan et al., 2023; Settels & Böckerman, 2023). 1건의 문헌이 K6를 통해 측정한 심리적 고통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고용 불안정과 코로나19 예방 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였다(Sun et al., 2022).
Ⅳ.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위협의 건강 영향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주제범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취약성 이론을 바탕으로, 건강 연구에서 식별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건강에 불리한 고용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고용 위협으로 개념화 하였으며, 그에 따른 건강 영향 논의를 종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수준의 연구로 제한하여 각 연구에서 활용한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였다.
문헌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총 47건 중 2021년 이후에 수집이 종료된 자료를 활용한 문헌이 11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2022년 이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료 수집 시기의 분포는 실업률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인구 10만 명당 실업률은 2019년 191.93명에서 2020년 235.2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21년 216.4명, 2022년 205.2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2023년 실업자는 10만 명당 208.2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ILO, 2023).
재난 취약성 이론에 의하면 고용 위협과 건강 영향은 모두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어야 한다. 본 연구 문헌에 포함된 연구 배경 중 미국의 경우 실직이 보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것이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경로로서 연구되었다(Sampson et al., 2021). 또한 식량 사막(food desert)이 건강상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식품 안전 보장(food insecurity)이 미국 연구에서 변수로 다뤄진 것이 확인되었다 (Brown et al., 2022).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근위적인 제도 상의 차이를 제외한 각 국가의 특수한 맥락에 근거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연구 지역의 종교나 식습관, 네트워킹 방식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는 정량화 하기가 어렵고, 측정에 있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팬데믹 기간 지역사 회와 신뢰성 높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여건상의 어려움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성은 다른 요인과 선형적인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Zakour & Gillespie(2013)는 재난이 지역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악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실업률과 사회적 자본이 부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저소득 상태를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소득 감소 여부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소득 상실(income loss)을 다룬 연구가 확인되었다(de Miquel et al., 2022; Ruengorn et al., 2021; Witteveen & Velthorst, 2020). 이는 실업의 건강 영향이 고용이 주는 경제적 편익의 박탈(economic deprivation)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의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된다(Feather, 1997).
건강 관련 주제 범위에서는 신체적 건강 대상 연구가 현저히 적었다. 이는 고용 위협이 신체적 건강 증상으로 즉각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연구 기간에서 오는 편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비교적 즉각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정신건강의 경우 정신장애 진단, 기분(mood), 인지적 평가, 정서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가 있었다. 이는 의료이용과 건강행태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앞선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확인된 경향과도 일관된 결과이다(Picchio & Ubaldi, 2023).
조절 및 매개변수에서는 실업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는 기존의 사회학적 및 심리학적 전통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사회적 지지 모델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실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나, 실업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완충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한다(Janlert & Hammarström, 2009). 연구 대상 문헌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업 상황에서의 심리적, 물질적 지원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와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결과가 더 나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모두 확인되었다(Chatterji et al., 2021; Guerin et al., 2021; Han et al., 2023). 한편 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심리·사회적 자극은 생리학적인 스트레스 메커니즘을 통해 질병을 초래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대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Janlert & Hammarström, 2009). 연구에 포함된 심층 면접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응답에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개인의 대처 양식을 측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rena et al., 2022).
한편 구조적 차별과 관련된 논의에는 공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에서 겪는 차별 또한 고용 과정에 개인이 겪는 위협이자, 건강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다. 30건의 실증 연구를 대상으로 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률이 구조적 차별 위험과 함께 증가하며, 특히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 노동자가 위험이 높은 직종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Côté et al., 2021). 다른 연구에서도 불안정 고용 상태, 비공식 부문 노동, 실업자에 이어 전문가들이 제시한 불이익 위험 집단은 이주 노동자였다(Tamin et al., 2021). 그러나 종합한 문헌에서 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또는 불공평한 고용 변화를 변수로 다룬 문헌, 또는 이주 노동자를 표본으로 삼은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Ⅴ.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발생한 고용 위협은 개인의 건강에 복잡한 형태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의 특징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공중보건 위기, 또는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연구와 정책 개입 시 다각도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신속히 설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에 대한 단편적인 기술에서 확장하여, 개인의 역량, 구직 부담, 개인이 생각하는 노동 시장 전망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먼저, 재난의 고용 및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의 기간은 분명 충분하지 않으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개선을 위해서는 초기 영향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할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별적 시도가 아닌 사전 구축된 보건 사회 연구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다. 고용 변화 및 건강 영향이라는 주제어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있음에도, 감염 대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 에서는 연구자의 개별적 시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필요한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긴급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학계 연합의 긴급 연구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상향식 접근이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대상자로서의 개인의 미시적인 경험을 탐색하여 제도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고용 정책과 그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제안한다. 국가마다 다르게 시행된 고용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전략을 종합하고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위기 상황이 공중보건 및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2022). 코로나19 유행 초기 경제적 불안감 변화와 음주 빈도 변화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6), 530-540. https://www.riss.kr/link?id=A108180788
, . (2022). COVID19 재난시기 버스운전노동자가 경험하는 다층적 불안정노동. 한국사회정책, 29(3), 207-242. https://www.riss.kr/link?id=A108280764
. (2021). 코로나19 전후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12(3), 1213-1225. https://kiss-kstudy-com-ssl.libproxy.snu.ac.kr/Detail/Ar?key=3893073
(February 23, 2023). Number of unemployed persons worldwide from 1991 to 2024 (in millions) [Graph]. In Statista. Retrieved September 18, 2024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6414/unemployed-persons-worldwide/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4-19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7-27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08-28

- 1072Download
- 2794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