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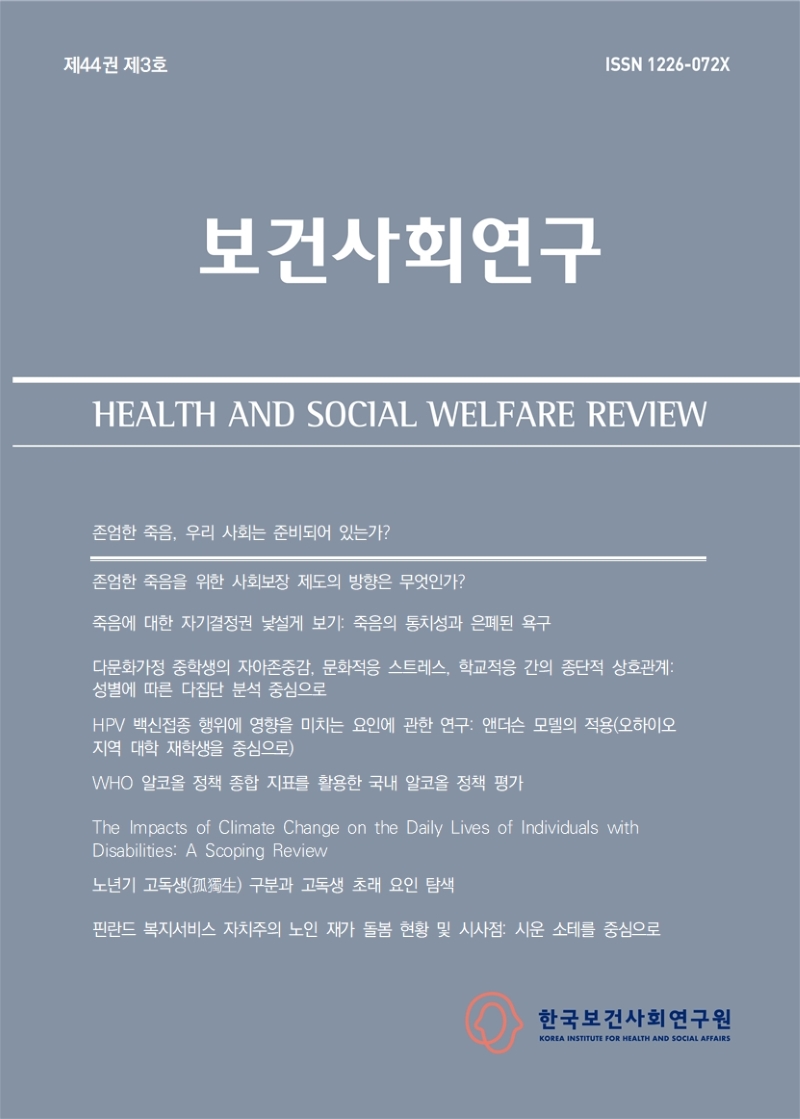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대형양육시설에서 소규모아동시설로의 업무전환 초기의 보육사 경험
Caregivers’Experiences in the Early Stages of Transitioning from a Large Residential Childcare Facilities to Small-Scale Home-Style Childcare
Kim, Jin Sook1; Jung, Sun Wook2*; Chung, Ick-Joong3; Kang, Hee Ju3; Yun, Eun Young3; Joo, Hwijin3
보건사회연구, Vol.44, No.3, pp.315-338, 2024
https://doi.org/10.15709/hswr.2024.44.3.315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형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보호해 왔다. 그러나 시설의 환경은 일반가정의 환경과 차이가 많아 아동발달에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아 지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급적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흐름이 생겼다. 이에 대형아동양육시설을 소규모 가정형으로 전환해보는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이 사업에 참여한 보육사의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소규모 가정형 보호에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대형양육시설이 소규모 가정형으로 전환될 때,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소규모 가정형 보호가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시설보다는 낫다고 평가되었지만, 여전히 가정 같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또한, 변화한 환경에 대해 아동도 보육사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며, 보육사들에게 오히려 업무가 늘어났으며, 그런 상황에서 좋은 양육자로서 익숙한 통제적 양육 방식을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중심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앞으로 아동양육시설을 기능전환하고 소규모 가정형으로 변화를 가져 오고자 한다면, 아동과 보육사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계를 양과 질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변화한 환경에 필요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행정적 지원과 교육, 시설화문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ecessary preparations for adapting to changes in residential childcare facilities,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caregivers participating in the “Small-Scale Home-Style Childcare Pilot Project” in Seoul.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participants with experience in a residential child facility and small-scale family-style child care settings.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mprehensive thematic analysis, revealing 30 subcategories and 8 major themes: 'Expectations of environmental changes', ‘Adaptation needed by all’, ‘Positive changes in children brought about by the space’, ‘Better than a facility, but not like a home’, ‘Increased workload’, ‘Balancing roles as caregivers’, ‘The pitfalls of a career in a facility’, and ‘Caring differently from facility methods’.
Based on these experiences, the study points out that the time and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and children needs to be review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that administrative support, education, and institutional cultures need to be improved.
초록
이 연구는 서울의 한 기초지자체와 양육시설에서 실시한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 과정에 참여한 보육사들이 시설전환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아동 양육시설의 변화에 대비하여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육사 중 아동양육시설과 소규모 가정형 보호 둘 다 경험한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반기에 개별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중심주제분석을 참고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27개의 하위범주와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 ‘모두에게 필요한 적응’, ‘공간이 불러온 아동들의 긍정적 변화’, ‘시설 보다 낫지만 가정 같진 않음’, ‘늘어난 업무’, ‘대리양육자로서 중심 잡기’, ‘시설경력의 굴레’, ‘시설과 다르게 양육하기’ 등 8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에 있어 보육사와 아동이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계의 양적, 질적 수준, 행정적 지원과 교육, 시설화문화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Ⅰ. 서론
2023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아동정책에는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이 포함되었다. 이는 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대형 아동양육시설로 배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보호체계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필요하지만 미뤄두었던 오래된 과업에 시동을 건 것이다. 현재 보호아동 발생과 조치 현황를 살펴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보호아동은 2,289명이 발생하였고, 이들 중 일시보호를 제외한 1,881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913명이 시설보호 조치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가정위탁과 입양으로 보호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통계상 시설보호조치에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가 포함된다. 영국, 미국, 스웨덴 등 아동복지 선진국들에서는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40여 년 전부터 친가족 보존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분리가 되더라도 입양이나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형 보호를 강조하며(이상정 외, 2018),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한해 시설보호를 선택하고 있다(오정수 외, 2006).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설보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보호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Frank et al., 1996; Johnson et al., 2006; Hart, 2008; Groza & Bunkers, 2017). 노혜련과 장정순(1998)의 연구는 정서적 문제를 가진 시설아동 비율이 일반아동에 비해 15배나 됨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요인으로 부모와의 분리, 일반가정과는 다른 형태와 규모의 시설, 보육사가 부족한 시설의 여건, 보육사의 양육 방법과 잦은 이직 등을 꼽았다. 이는 시설아동의 부정적 특성은 시설의 환경적 특성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대형양육시설의 특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국내 연구지만, 시설보 호에 대한 제도나 환경이 바뀐 현재 상황과 많은 부분에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보호아동에게 긍정적인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연구가 필요한 영역일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규모가 작고 일반적인 주거 형태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좀 더 집중하고 반응하며, 일반가정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것을 보호아동도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 아동의 일상에 있어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등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적 요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정과 유사한 환경은 수십 명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보다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에서 실현되기 쉽다. 아동양육시설은 보육사의 수가 많아 보육사의 공백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아동보호에 있어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호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성의 장점이 있으나(강현아 외, 2011)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고, 일부 시설에서 행해지는 억압, 통제, 자율성 제한 등이 아동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de Valk et al., 2016). 이는 여러 장점을 한꺼번에 상쇄시킬 만큼 주요한 단점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Dobrova-Krol et al., 2010; Sonuga-Barke & Kreppner, 2012; Sheridan et al., 2012; Mota et al., 2023). 이제는 아동 대안양육에 있어 단순히 의식주와 안전,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대안양육의 질과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보장으로 아동보호 논의의 중심을 옮겨 아동보호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때인 것이다. 사실 그간에도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다기능화, 탈시설 등 시설의 변화가 논의되고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의 논의는 물리적 환경이나 행정적 규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시설 내에서 아동 양육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동과 생활해야 하는 보육사의 업무나 생활 조건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거나 논의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탈시설화에 의해 아동양육시설이 소규모화한다면, 직접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보육사의 직무는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 것인가, 혹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뿐 아니라, 소규모화의 목적인 아동 양육의 질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진행된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육사들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이 시범사업은 양육시설의 기능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로 제시되는 ‘소규모화’로 1년간 시범사업 후 양육시설의 더 많은 아동이 지역사회 내 더 작은 규모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곳으로 이사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 시범사업의 주체 중 한 곳인 아동양육시설은 조금 더 나은 보호 형태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을 상정하였다. 아파트나 주택 등 일반거주지에서 명패나 간판 없이 외양적으로 시설임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양육시설의 집단적 양육보다 아동과 보육사의 친밀한 관계,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대한 대응, 개별적 공간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손경숙 외, 2007)고 평가되어 왔다. 그에 따라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 시범사업 동안 각각 3명의 보육사와 함께 2개의 공동생활가정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되었다. 이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 해당 시설의 운영 법인, 아동양육시설의 행정가, 같이 생활하는 보육사, 아동 등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평가가 중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육사의 관점에서 전환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동 양육에 있어 일차적인 핵심 관계가 보육사와 아동의 관계라는 점과, 실제 아동과 생활하는 보육사가 연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가장 많은 관찰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시범사업의 확장에 있어 아동보다는 성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보육사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변화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들이 고용승계되거나 경력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환 방식이나 전환과정에 따라 바람직한 대리양육 주체로서 준비하고 갖춰야 할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소규모 가정형 시설로 업무전환을 겪은 보육사의 초기 경험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Ⅱ. 문헌 검토
1. 시설종사자의 역할과 경험
국내외에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종사자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종사자의 역할이나 양육경험, 시설종사자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소진을 포함한 시설종사자의 어려움(양육스트레스, 소진 등)이나 근무 여건, 애착을 포함한 보육사와 아동과의 관계 등이 고찰되었다.
먼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경험은 생활지도원의 직무경험(이나래, 2023 김기화, 양성은, 2017), 남성 생활지도원의 경험(김서현 외, 2015), 근무제도의 변화에 따른 경험(권지성 외, 2006; 정선욱 외, 2023)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공통적인 경험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나래(2023)의 연구에서는 생활지도원 5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기대와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존중받지 못하며 그로 인해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느끼지만 버티고 있다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김기화와 양성은의 연구(2017)에서는 생활복지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양육자’와 ‘롤모델’로 규정하며, 시설생활에 대해 아동에게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사회적 낙인’, ‘대리양육자와의 애착형성 문제’, ‘집단생활로 인한 수동적 태도’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동과의 갈등’과 ‘열악한 처우’를 꼽았다. 김서현 외(2015)의 연구에서 남성 생활지도원들은 성별 고정관 념이라는 사회적 맥락하에서 생활지도원으로서의 보편적인 경험과 남성 생활지도원으로서의 고유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생활지도원으로서는 ‘긍정성’을 경험하고 남성 생활지도원으로서는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편향적 역할기대로 인한 ‘부정성’을 경험하였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 생활지도원의 ‘긍정성’ 경험은 직무수행에 따른 보람, 긍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버지처럼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 변화에 뿌듯함을 느끼며, 나를 발견하는 경험으로 아이들과 가족처럼 존재하고 싶다는 소망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대규모 보호에서 소규모 보호와 같은 공간의 변화는 아니나. 제도적 변화에 따른 종사자의 경험은 근무제도의 변화로 인한 종사자들의 업무경험 변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보육사들은 근무시간이 길수록 아동과 애착도 스트레스도 크다고 느꼈으며, 근무제도가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돌봄 스트레스 조절이 가능해져 돌봄의 질이 좋아진 것 같지만,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관찰과 소통이 줄어들고, 보육사 수가 늘면서 아동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며, 아동들과 관계형성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은 아동을 돌보는 업무에 있어 모순적인 상황을 발생시키고 아동과의 돌봄관계에 있어서 딜레마를 발생시켰다.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경험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경험을 보여준다. 청소년을 양육하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의 경험은 (1) 대리 부모와 직업적 관계의 경계선, (2)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함께 보내기, (3) 금지된 체벌, (4) 청소년 양육과 소진, (5) 그룹홈 청소년들의 원 가족으로 인한 갈등, (6) 그룹홈 청소년들의 롤모델 등의 주제로 나타났으며(송승민 외, 2015), 보육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은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 정서적 지원과 교육을 포함하는 양육자, 훈육자, 시설 내 아동끼리 갈등에 대한 중재자,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슬 기, 양성은, 2017)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해 시설종사자들이 아동 및 청소년과 애착을 형성한다면 이들의 회복탄력성, 또래관계, 학교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낙관성을 매개로 심리사회적응을 발달시킬 수 있다(김정미, 2014; 이수천, 김형태, 2012). 그러나 입소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나 시설의 업무환경은 시설종사자들의 소진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김재희 외, 2021; 김성중 외, 2021)는 것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의 연구는 제도적으로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에 의해 역시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아동복지에 있어 제도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연구를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 학습자료와 기회, 보육사의 롤모델링, 자립성 증진, 규율, 친밀감, 보육사의 수용 등이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 자기가치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습자료와 기회, 롤모델링, 자립성 증진, 규율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아동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보였다(Zhang et al., 2018).
이상을 정리하면, 보육사들은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등 가정외 보호 형태에 따라 아동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 본 연구들은 있으나 각 보호 형태에서 양육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연구는 없다. 선행연구들은 보육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호 형태가 달라질 때 양육태도나 방법을 포함한 양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보육사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2. 대형시설의 소규모화, 혹은 탈시설화 과정에서 실무자의 경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혁신(변환)은 장애인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가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장애인 탈시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의 경우 탈시설 개념에 대한 인식(박숙경, 2018),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과정 경험(김민철, 김경미, 2017),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욕구와 영향 요인(박광옥 외, 2019) 등으로 연구 주제가 다양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종사자를 연구참여자로 한 경우는 장애인 탈시설 영역에서도 많지 않다.
그러나 몇몇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종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경험을 다룬 연구를 통해, 대규모 시설에서 지역 사회 내의 작은 공동생활가정으로 삶의 공간이 바뀐 상황에서 일하는 보육사(생활지도원)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 분야에서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라는 것도 종사자에게 기존의 시설 중심의 보호와는 다른 업무(실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 종사자의 경험을 다룬 연구를 고찰하였다.
우선, 탈시설 장애인이 초기에 머무르는 자립생활주택에서 전담으로 일하는 전담사회복지사의 업무 경험을 다룬 연구(전지혜 외, 2022)에 의하면, 전담사회복지사는 탈시설 장애인의 자율적인 생활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자기결정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지만, 탈시설 장애인을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들을 자립주체로 인식하는데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머리로는 자립생활 철학, 자립생활주택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실제 운영(지원)은 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차영란 외(2022)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시설 재입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종사자는 탈시설의 의미, 자립생활의 의미, 탈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생각을 갖거나 혹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잘 모르는 상황은 업무 이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함과 연결된다. 김주옥과 염태산(2022)은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에서 강조되는 ‘주체적 선택권’이라는 자립이념이 활동지원사의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자립이념,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고 활동지원을 시작하는 활동지원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준비 없이 현장에 참여하여 당사자를 밀접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또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장애당사자에게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김주옥, 염태산, 2022 재인용).
좋은 이념(예를 들어, ‘주체적 선택권’)이 좋은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것과 바람직한 것 간의 경계를 성찰하면서 스스럼없이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김주옥, 염태산, 2022). 그러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이런 기회는 매우 제한된다. 종사자 각자가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종사자 간의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 성찰하면서 서로 토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이념을 현장에 구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 조건은 종사자 간 회의, 교육, 슈퍼비전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업무 시간에 대한 관점 변화도 필요하다. 김주옥과 염태산(2022)에서, 행정업무 처리로 인한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행정업무 처리 시간을 별도로 고려한 추가 시간 급여를 제안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특히나 시설의 변화를 둘러싸고 새로운 역할을 실천하게 되는 종사자가 자신의 실천을 성찰하고 동료와 나누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으로 배우고 익힐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발생한 현장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서울의 한 자치구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법인의 협약에 따라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정원 60명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정원 5명의 소규모 가정형 보호1) 2개소의 보육사들 중 일부이다. 이들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동양육시설에서 보육사 혹은 보육사 대직자로 근무하였고, 시범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소규모 가정형 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소속은 그대로 아동양육시설이며 근무지만 분리된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시범사업의 장소는 일반거주지에 지어진 5층 규모의 건물로 1층과 2층은 지역주민의 이용공간, 3층과 4층은 성별에 따라 구분된 소규모 가정형 생활공간, 5층은 자립체험 공간으로 구성된 곳이다. 건물에는 별다른 표지판이나 간판은 없었으며, 각 생활공간은 화장실이 딸린 방 6개와 거실 겸 부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5개의 방은 입소아동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사용하였고, 1개의 방은 보육사의 사무실 겸 취침실이 되었다. 시범사업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실시되었다. 입소아동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 각각의 생활공간에서 교대근무하는 보육사 3명과 함께 생활하였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1년의 기간을 거쳐 소규모 가정형 운영모델을 만들어 해당 양육 시설의 더 많은 아동을 지역사회 내 작은 규모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이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1년간의 시범사업으로 종료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면접이 진행된 때는 시범사업 7개월 차로, 아동의 생활 기준으로 학기와 방학을 한 주기씩 경험하고 난 시기이다.
2.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시범사업을 기록한 다양한 자료 중에서, 전환과정을 경험한 보육사의 개별면접 자료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을 소규모 가정형으로 전환해보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육사는 총 8명(퇴사자 포함)이었다. 이들 중 아동양육시설에서 종사하다가 시범사업에 자원한 아동과 함께 소규모 가정형 생활공간으로 분리되어 나와 근무를 함으로써, 대형양육시설과 소규모 가정형시설 양측을 모두 경험한 4명의 개별면접 자료만 활용하였다. 해당 보육사에 대한 개별면접은 2023년 3월에 실시되었으며, 모두 1회의 면접이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아동양육시설 본원의 상담실과 소규모 가정형 생활공간 내 거실 등에서 진행되었다. 이 시점은 아동들이 새 학기를 맞아 등교하기 시작한 이후로 방학보다는 보육사의 아동돌봄 업무시간이 줄어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며, 가장 힘든 기간이었던 방학 기간을 거쳐 보육사 모두 할 이야기가 많은 상황이었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질문은 1) 소규모 가정형 생활공간에서의 생활이나 업무에 대한 기대, 2) 양육시설과의 차이점, 3) 달라진 점과 다르게 일해야만 하는 것, 4) 가정 같은 양육환경이 되기 위한 조건, 5) 보육사의 가정과 소규모 가정형 보호의 차이, 6) 보육사 자녀들의 생활과 돌보는 아동들의 생활 차이, 7) 양육시설에서와 다르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 등이었다. 이러한 질문들은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대형양육시설과 소규모 가정형 보호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신청과 권유에 의해 동의하고 참여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양육경험이 양육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변화한 환경에서 좋은 실천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질문들이 종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위해 주어졌다. 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40대와 50대의 여성 4명으로 1명은 미혼, 3명은 기혼이다. 이들은 8년에서 20년까지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경력이 있었으며, 대형양육시설의 근무 경력은 1년 미만에서 10년 사이였다.
3. 자료 분석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Braun& Clarke(2006)의 주제분석법(thematic anlaysis)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은 특정 인식론이나 절차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연구 현장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태도나 개념 등을 귀납적 논리에 따라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기술하고, 발견된 주제들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질적분석 방법으로 여러 질적분석 방법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절차이다.
이 방법에 따라 인터뷰 녹음 내용을 그대로 전사한 녹취록을 의미단위로 분석하였고, 의미단위를 범주로 묶어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다. 범주화 과정은 전환 과정을 경험한 보육사들의 진술에 대해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단위-하위범주-상위범주로 이어지도록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7개의 하위범주, 8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4. 연구의 엄격성
이 연구는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 보육사들에게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 관찰되고, 기록되며, 면접 등의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고 동의를 받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사전에 안내받았다. 사전 안내와 동의가 있었지만, 심층면접 전에 다시 한번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철회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연구참여자의 제반 권리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개별면접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수당을 지급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윤리를 지키고,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료검토, 연구참여자 확인 등을 활용하였다.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동연구자들이 함께 자료 수집부터 분석까지 함께하였으며, 공동연구자들의 그룹채팅방 등을 통해 즉각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함께하였다. 연구참여자 확인은 연구 결과 분석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석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Morse et al., 2002)는 점에서, 연구참여자들 뿐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자들에게도 분석과정과 1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통해 엄격성을 높이고자 했다. 본 논문에 제시된 연구 결과는 1차 분석된 연구 결과에서 약간의 범주화가 수정되었다.
Ⅳ.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인 보육사의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설전환과정에서 보육사들의 경험은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 ‘모두에게 필요한 적응’, ‘공간이 불러온 아동들의 긍정적 변화’, ‘시설보다 낫지만 가정 같진 않음’, ‘늘어난 업무’, ‘대리양육자로서 중심 잡기’, ‘시설경력의 굴레’, ‘다르게 양육하기’ 등 8개 범주로 구성되었다(표2 참조).
표 1
연구참여자의 시설전환 과정의 경험
| 상위범주 | 하위범주 | 의미단위 |
|---|---|---|
|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 | 새로운 보호 형태에 대한 기대 | 돌봄의 질이 좋아지리라 기대함/아동에게 소규모시설이 더 좋다고 판단함/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지원/도전이 됨/보람 있을 것 같아 시작함/새롭게 시도하고 싶었음/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음 |
| 아동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 간식을 많이 만들어 먹이기/따뜻한 집밥을 먹이고 싶었음/공감있게 들어주는 것/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엄마 마음으로 옴/끝까지 같이 가고 싶음/ 아이들을 위해 힘이 되어주고 싶었음 | |
| 신뢰할 수 있는동료관계 | 힘이 되어주는 동료, 선임을 믿고 지원함 | |
| 모두에게 필요한 적응 | 보육사 간 갈등의 소지 | 살림 스타일이 맞지 않음/보육사들 간 양육 방식의 차이/다른 보육사와 합을 맞추기가 쉽지 않음/보육사 간 보이지 않는 경쟁/파트너의 업무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부담. |
| 시간이 필요한 관계 형성 | 적응기간이 필요함/새로운 보육사와 관계 형성에 시간이 필요한 아동들/시간이 지나서야 편하게 얘기하는 아동들/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함 | |
| 일관성 있는 양육의 어려움 | 보육사 간 차이로 아동과 갈등 발생/짧은 기간동안 양육자가 변경됨/인수인계할 것이 많지만 시간이 부족함 | |
| 공간이 불러온 아동들의 긍정적 변화 | 공간 변화에 대한 만족감 | 개인공간에 대한 만족감/아동들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만족 |
| 아동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기회 | 스스로 계획할 기회가 주어짐/친구들을 초대할 기회가 생김/보고 배우는 게 일반가정과 같음/심부름해 볼 기회가 생김/스스로 준비해 보는 기회가 됨/일상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짐 | |
| 아동들의 변한 모습 | 밝아짐/욕을 덜 함/정서적으로 안정됨/아프거나 예민한 상황이 감소함/약속이나 규칙을 정할 일이 적어짐/느슨해진 아동들/하고 싶은 게 생김/여유가 생김/말수가 늘어남/샘을 덜 냄 | |
| 시설보다 낫지만 가정 같진 않음 | 여전한 집단식 프로그램 | 진로지도 프로그램, 멘토링, 캠프, 구청 프로그램 등 시설아동으로서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 많음 |
| 좋기만 하지는 않음 | 대화시간이 부족함/모일 공간이 없음/개인 방에 있는 시간이 긺/함께하는 활동이 적음/마음 편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함/서로 지지체계가 되지 못함 | |
| 가정 같을 수 없음 | 가사업무와 행정업무가 양립해야 함/보육사에겐 가정과 다름/가정 분위기를 내기에 보육사가 너무 분주함/양육의 논리보다 노동의 논리가 적용됨 | |
| 늘어난 업무 | 일이 많아짐 | 업무가 많아 바쁨/살뜰히 챙기기엔 너무 많은 인원/시설에서보다 업무가 늘어남/방학 동안에는 돌봄이 늘어남 |
| 행정업무가 많음 | 식사 준비에도 서류가 필요함/담당아동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담당보육사가 작성해야 함/뭐든 서류로 증빙해야 함/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함/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함 | |
| 시간이 더 필요한 개별화와 공감 | 행정보다 돌봄에 초점을 두고 싶음/힘들어도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일은 해야 함/공감을 해주려다 보니 뭐든 시간이 오래 걸림/아이들 개별 상황에 맞추려니 인원은 줄었어도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됨 | |
| 급하게 돌아감 | 촉박한 시간 내 해내야 하는 일/여유가 없는 업무시간/기한이 있는 일 | |
| 대리양육자 로서 중심 잡기 |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아동들 | 아동들과 시간이 잘 안 맞음/아동과의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움/여유가 없어짐/대화할 시간이 부족함/아동들의 일정을 챙기기 어려움/아동양육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
| 청소년기 아동 양육의 어려움 | 아동과 관계형성의 어려움/지도가 안 되는 아동들/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아이/훈육이 필요함/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 | |
| 양육자로서 역할범위에 대한 고민 | 아이들을 대신해줘야 하는 일이 생김/엄마라면 다 해줬을텐데 라고 생각됨/보육사로서 각을 잡아야 함 | |
| 핵심업무는 아동돌봄 | 아동양육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함/아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중요함/아동양육이 우선되어야 함/아동돌봄과 상담까지가 보육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 |
| 아동양육의 목표 세우기 | 능동적인 아동/감사함을 아는 아동/삶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아동/자립하는 아동으로 키우고 싶음 | |
| 시설경력의 굴레 | 통제 중심의 양육 | 용돈과 후원금을 통한 아동 통제/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음/어른도 지키기 힘든 규칙을 적용/일상생활에 조건이 많이 달림/일상의 많은 부분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 |
| 아동에 대한 결핍 중심의 이해 | 물질적으로는 풍요함/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함/뭐든 허락을 받아야 함/수용 경험이 적음/또래 절친이 없음/낙인이 되었던 시설경험/정형화된 시스템 안에서 살던 아동들/자신감이 없는 아동들/대형시설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아동들/길들여진 아동들/거절의 경험이 많음/혼자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스스로 하지 못하는 아동들/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아이들/무기력해 보이는 아동 | |
| 시설과 다르게 양육하기 | 아동에 대한 개별화 | 개별화가 필요함/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함/생활에 대한 아동 성별 차이를 이해해야 함/아동의 상황에 맞추기/아동들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함 |
| 관계를 깊게 하기 | 먼저 다가가기/더 좋은 양육을 위해 노력하기/애정과 지식을 기반으로 양육하기/기다려주기 | |
| 유연한 규칙적용 | 가정에도 규칙은 있음/취침 시간을 늦춰줌/토요일엔 늦잠 자게 함/식사시간의 융통성/규칙을 조정하려는 노력 | |
| 아동 의견을 반영하기 | 형식적이지 않은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함/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함/아동들과 의논할 것이 많아짐/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한 식단/아동 중심으로 결정하기/가족회의의 안건이 달라짐 |
1.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
가. 새로운 보호 형태에 대한 기대
보육사들은 각자의 개인적 동기와 아동보호의 질이 향상되리라는 공공 목표에 공감하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아동에게는 소규모시설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돌봄의 질이 좋아지리라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이는 새로운 시도이자 개인적으로는 도전이 되었으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마음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참여 전 가사업무가 추가된다는 점과 참여자들 중 소규모 가정형 보호를 해본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나. 아동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보육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해주고 간식을 많이 만들어 먹이는 등 일상에서의 부모, 특히 엄마처럼 지내고 싶었다고 한다. 관계적 측면에서는 공감해 주고,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감정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이 시범사업이 잘 돼서 정착되면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관성 있는 양육의 희망을 표현했다.
2. 모두에게 필요한 적응
가. 보육사 간 갈등의 소지
연구참여자들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 간에 신뢰감과는 별개로 갈등의 소지도 있음을 진술하였다. 가사업무를 나누어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살림 스타일이 맞지 않거나, 다른 보육사와 양육 방식이나 훈육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매 순간 논의가 필요한 부담과 내적 갈등을 야기한다. 파트너의 업무역량에 따라 내 업무의 과중이 달라지며, 때로는 아동과의 애착을 둘러싼 보육사 간 경쟁 구도가 생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나. 시간이 필요한 관계형성
소규모 가정형 보호로의 전환은 기대와 희망이 전제된 긍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동과 보육사에게는 생활환경 혹은 근무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아동이나 보육사 모두에게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한다. 양육시설에서 안면은 있었으나 같이 생활하지 않았던 보육사와 새롭게 관계형성을 해야 하는 아동의 입장에서도, 편하게 다가오지 않는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보육사 입장에서도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 일관성 있는 양육이 어려움
양육자가 여러 명일 경우 아동양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양육, 훈육이 중요한데 보육사 간 차이는 아동과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짧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양육자가 변경될 때마다 양육자간 조화와 일관성이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일관성 있는 양육의 중요성을 알기에 보육사들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작은 것도 모두 인수인계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시간이 필수적이다. 한편 보육사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공감하였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양육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는 또다른 범주의 논의점을 발생시켰다.
3. 공간이 불러온 아동들의 긍정적 변화
가. 공간변화에 대한 만족감
연구참여자들은 아동들이 공간변화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 함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주어진 개인공간에 대해 가장 좋아하였으며, 외형이 시설 같지 않아서 그런 점에서도 아동들이 만족해한다고 전했다.
“(본원은) 지금 한 방에서 기본 세 명 작은 방에서 두 명이 두 명 정도 쓸 거예요. 기본 세 명 정도 같은 방을 쓰고 그니까 이불을 깔고 자더라도 애들이 다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치이고 그니까 이게 이제 뭐 침대를 다 기관이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도 막 뭐 굴러다닌다고 나한테 온다고 밀고 이게 다반사예요 아이들이 생활에서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거 자체가 자기 마음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없잖아요 그니까 그런 일단 그런 자잘한 스트레스 자체가 일단 사라져서 그런지 일단 아이들이 여유가 있어진 건 저도 전 확실한 거 같아요.”(참여자 2).
나. 아동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기회
보육사들은 소규모 가정형 보호를 통해 아동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스스로 계획 하고 준비해 보는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었고,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일반가정처럼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심부름할 기회가 생겼고, 간식이나 식사의 메뉴, 먹는 시간 등에 있어 선택할 기회가 늘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시설 명패가 없고 개인 방이 있는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등하교 시 자연스럽게 오고갈 수 있는 것도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하였다.
다. 아동들의 변한 모습2)
보육사들은 소규모 가정형 공간에서 아동들은 밝아졌고, 말수가 늘어났으며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보고하였다.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들은 다른 아동에 대해 샘을 덜 내었고, 아프거나 예민한 상황이 감소했다고도 하였다. 욕하는 행동이 감소한 것도 관찰되었고, 아동들에게 여유가 생기고 느슨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약속이나 규칙을 정할 일이 적어졌고 전반적으로 정서적 안정되어가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런 거를 변화되는 걸 보고...아이들이 여기 와서 욕을 많이 안 했어요. (전에 대형양육시설에서) 욕을 애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했던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과 라포 형성인 것도 있지만 아이들하고 일단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중략)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서 애들한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면에 소통하다 보니까, 그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욕을 안 하게 되고”(참여자 1)
4. 시설보다 낫지만 가정 같진 않음
가. 여전한 집단식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은 소규모 가정형 보호가 시설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가정 같지는 않다고 느꼈다. 일상생활 면에서 일반가정의 아이들과는 달리 진로지도, 멘토링, 캠프, 후원자행사, 구청프로그램 등 시설아동으로서 다 같이 해야 하는 활동이 여전히 많았고 그로 인해 아동들은 분주했다.
나. 좋기만 하지는 않음
연구참여자들은 소규모가정형 보호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개인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 함께하는 활동이 적어졌고, 대화시간도 부족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주어진 자유가 생활을 흩트리기도 하고, 아동의 행동 면에서 좋지 않은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각각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누군가는 해당 거주지의 구조적 특성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동에게 자유를 주고 규제하지 않은 결과라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언급된 아동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자율적인 조절 과정이나 아동의 발달단계 특성으로 이해하는 연구참여자는 적었다. 반면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동이 아프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육사나 다른 아동에게 마음 편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구성원들이 서로 지지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 가정 같을 수 없음
연구참여자들은 소규모 가정형 보호의 강점을 살린 돌봄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정처럼 양육하기는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먼저 가사업무와 행정업무가 양립해야 하고 가정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해도 보육사가 너무 분주하며, 직업과 근무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육사에겐 가정과 명백하게 다른 환경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동양육이 가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과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도 애착이나 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양육의 논리보다는 돌봄노동자로서의 노동의 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5. 늘어난 업무
가. 일이 많아짐
보육사들은 이전 시설에 비해 소규모 가정형 보호에서 업무가 더 많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대형양육시설에서는 보육사가 하지 않았던 업무가 소규모 가정형 보호에서는 보육사의 업무로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방학 동안에는 식사 준비로 거의 모든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돌봄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보육사 1인당 아동수는 아동양육시설보다 적지만, 3조 2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내내 혼자서 아동돌봄과 행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나. 행정업무가 많음
연구참여자들은 늘어난 업무뿐 아니라 모든 절차에 필요한 서류 업무가 부담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식사 준비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요리뿐 아니라 식단과 구매영수증 처리 등 필수적인 서류작업들이 뒤따라 발생하였다. 담당 아동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담당 보육사가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덜 신경 쓰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뭐든 서류로 증빙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다. 시간이 더 필요한 개별화와 공감
보육사들은 이 사업의 시작이 아동과의 관계나 돌봄의 질이 더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시작하였기 때문에 행정업 무보다 돌봄업무에 더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소규모 가정형 보호에서의 아동양육의 강점은 개별화라고 생각하였고, 관계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 경청과 공감을 신경 써 실천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이 행동하고 변화하기까지 기다려 주기를 반복하고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아동들의 학원시간 등 개별적 상황에 맞추려다 보니 방학 중에는 식사를 3번 이상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원은 줄었어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 많아져 더 바빠졌다고 보고하였다.
6. 대리양육자로서 중심 잡기
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아동들
연구참여자들은 위와 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아동들과의 시간은 뒤로 밀리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3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학교 및 학원, 본원 스케줄로 바쁜 아동들과 시간이 잘 맞지 않거나 시간 확보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대화할 여유가 없어지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을 야기한다고 하였으며, 행정업무 등으로 아동양육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며 이로 인해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소년기 아동 양육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아동 양육의 어려움도 토로하였다. 기본적으로 청소년기 아동과 관계형성이 어렵고, 잔소리나 훈육이 필요하나 잘 안되고, 지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아동에 비해 ADHD, 경계선아동 등 특별 요구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모두 부족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꼈다. 아동양육에 있어 필수적인 가사 지원, 아동의 정서적 발달, 교육 등 모두 보육사의 역할이고 일반가정에서 부모로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사 중 일부는 자신의 자녀양육 경험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아동들 대하기도 하였다.
다. 양육자로서 역할범위에 대한 고민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보육사가 대신 해줘도 되는 일인지 아동 스스로 하게 해야 하는 일인지 고민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한 대응이 보육사마다 달라 더욱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다. 병원을 동행하거나, 야식 준비, 학교와 학원 시간 사이에 먹을 도시락 준비 등 일반가정이었다면 당연히 양육자가 해주었을 일을 아동이 혼자 스스로 하도록 두는 것에 대해 보육사마다 대응이 다르고 보육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라. 핵심업무는 아동돌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나 시설의 사명에 대해 아동돌봄을 핵심업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중요하며, 아동양육이 우선되어야 하고, 아동양육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마. 아동양육의 목표 세우기
연구참여자들은 양육자로서의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확실하게 기술을 익히고 퇴소하게 하는 것이나 인성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이고 감사함을 알게 하는 것, 삶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등 각자의 지향을 표현하였다.
7. 시설경력의 굴레
가. 통제 중심의 양육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대형양육시설의 훈육 방식이 소규모 가정형 보호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용돈과 후원금, 장학금 등 돈을 통해 아동이 통제되고, 일상생활에 많은 조건이 부과되며, 많은 규칙을 통해 아동의 자율성 보장이 제한된다고 평가하였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때로 그 규칙들은 어른도 지키기 힘든 것임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하였다.
“저희가 규칙을 정해 놨잖아요. 응 규칙이라는 규칙을 정해 놓은 게 아침에 기상 시간, 그다음에 기상에서 식사 시간, 뭐 텔레비전 보는 시간, 뭐 이런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거를 처음에는 저는 이제 허용을 해주고 싶은 거죠. (중략) 처음부터 또 이 시간까지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 못 일어나잖아요. 그니까 그런 과정들이 힘들었어요. 딱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그걸 제가 지키는 게 힘들었어요.”(참여자 3)
나. 아동에 대한 결핍 중심의 이해
연구참여자들은 아동들에 대해 시설에서 자란 아동들의 특성이 배어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동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낙인이 되었던 시설경험과 양육자가 자꾸 바뀐 환경에서 또래 절친을 만들지 못하고, 뭐든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정해주는 대로 혹은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생활하면서 시스템에서 벗어난 또래의 행동을 일러바치거나, 경직된 시스템안에서 거절의 경험이 쌓이고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는 아동이 되었다고 성장의 맥락을 이해하였다. 동시에 부과되는 조건과 규율이 강조되면서 그에 따라 아동들이 시스템에 길들여지고, 능동적이지 않으며, 같이 살지만 서로에게 지지체계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8. 다르게 양육하기
가. 아동에 대한 개별화
연구참여자들은 소규모 가정형 보호가 대형양육시설보다 강점인 양육의 특성으로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아동의 성별, 연령,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아동의 일상생활, 가족적 상황, 스케줄 등 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하고 맞추어 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나. 관계를 깊게 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소규모 가정형 보호를 통해 더 좋은 양육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아동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서 애정과 지식을 기반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양육시설에서부터 아동들을 알고 있던 연구참여자들도 소규모 가정형 보호에서 더욱 아동을 이해하게 되고 친밀해졌다고 하였다.
“얘기 들어주는 것들. 와 그랬구나! 좀 더 잘해 보자고 하든가 학교에 선생님이랑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얘기 거기서 본원에서 하지만 들어주긴 하지만, 여기서 좀 더 공감 있게 들어주는 것들”(참여자 1)
다. 유연한 규칙적용
보육사들은 대형양육시설의 양육을 규칙이 많아 시스템화된 생활이라고 특징지으며, 규칙의 적용 수준에 대해서 보육사 간 차이는 있었지만 소규모 가정형 보호에서는 규칙이 완화됨을 보고하였다. 일반가정에도 규칙은 있지만 모든 상황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진술한다. 취침 시간, 기상 시간 등은 다음날 일정을 위해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토요일엔 늦잠을 자도록 허용하기도 하였다. 식사 시간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정해진 규칙도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하였다.
라. 아동 의견을 반영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형양육시설에서도 아동의견조사가 실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가정형 보호에서는 더 많은 상황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가족회의의 안건이 달라지기도 했으며, 식단, 간식의 메뉴, 여행지 등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아동들과 의논할 것이 많아졌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기차로 갈 것이냐,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이런 걸로 회의 통해서 같이 의논하니까 아이랑 같이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참여자 1)
이상과 같은 보육사들의 경험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소규모 가정형 보호로 업무가 전환되면서 ‘새롭고 다르게 관계에 기반한 양육’에 도전하였으나 더 많아진 행정적 과업, 청소년기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 보육사간 충분하지 않은 의사소통 등의 한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3조 2교대로 파생한 근무 경험도 보육사의 소규모 가정형 보호의 경험에 중요한 제도적 맥락이 되었다.
V. 논의 및 제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연구에 참여한 보육사들은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 가정형으로 전환과정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보육사나 아동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적응’을 느끼게 되었고, 소규모 공간은 ‘아동들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기대만큼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시설보다 낫지만 가정 같진 않았으 며’, 종사자 수가 많아 업무분장이 세부적이었던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3명의 종사자가 모든 업무를 나누어 감당해야 하면서 ‘늘어난 업무’에 힘이 들었다. 또한, 아동양육이라는 본질적 업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듯한 상황을 체감하면서 ‘대리양육자로서 중심 잡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힘에 부칠수록 익숙해진 아동양육시설의 시스템을 소규모 가정형 시설에도 자꾸 적용함으로써 ‘시설경력의 굴레’를 느꼈다. 그럼에도 소규모 가정형 전환과정이 추구하던 목표인 ‘다르게 양육하기’를 시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보육사들의 경험은 시설보호에 비해 소규모 가정형 보호가 보호아동의 이익에 기여함을 확실히 알려준다. 다만 그 이익의 크기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환경적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동의 발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양육시설을 소규모 가정형으로 소규모화하거나 기능전환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물리적 혹은 제도적 환경에 따라 과거 대형양육시설의 양육 방식과는 다른 양육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시범사업처럼 양육환경이 변경되거나 일부 아동을 선발해야 할 경우에는 연령, 성별, 아동의 의사 뿐 아니라, 기존 종사자와 아동의 애착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성격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양육시설과 소규모 가정형 시설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보육사 간 조율, 대형양육시설의 운영 방식을 답습하지 않도록 시설화된 양육 방식에 대한 성찰, 새로운 시도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시설화문화(institutional culture)의 문제 해결도 포함된다. 오욱찬 외(202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규모 가정형 보호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시설적 요소, 즉 시설화문화를 없애고 어떻게 ‘다르게 양육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공동생활가정도 규모만 다른 또 하나의 시설화된 시설일 뿐이다.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아동들의 가시적인 긍정적 발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긍정적 발달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Zhang et al., 2018)는 연구 결과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기능전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육사와 아동 간 좀 더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사의 업무지원이 필요하다. 소규모화되어 보호 아동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보육사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규모의 경제, 규모의 행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사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는 훨씬 증가한다. 그동안의 아동보호체계가 효율성에 입각한 보호였다면 이제는 효과성으로 초점이 이동해야 한다. 이는 업무지원 체계 구축 등 행정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포함한다. 소규모 가정형 보호에서 보육사의 업무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응원직원, 가사 도우미, 양호 주임 등의 지원 인력을 두고 있다(조정우, 2022). 비상근직원이나 직원의 병가, 휴가, 연수 등 긴급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육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전원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조성하여 회의 및 동료 수퍼비전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보육사 간 기준을 일치시키고 정보공유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지지와 합의가 가능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아동과 상호작용 시간의 질적 확보이다. 이는 아동양육의 전문성과 연결되는데,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중 하나는 교육이다. 보육사에게 많은 보수교육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동발달 단계별로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문제 등에 대해 적절한 양육 방식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보육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특화된 지식을 쌓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아동 발달이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특성과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도 제한적이다. 통상적으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에 국한되는데, 이 과목들은 주로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실제 아동양육현장에서 아동을 훈육하거나 지도, 상담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육사들이 아동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자녀양육 경험 등)을 활용하여 아동양육과 생활지도를 하게 된다. 혹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익숙한 양육 방식이나 통제 중심의 양육 방식으로 회귀하기 쉽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수퍼비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차이, 개인적 가치, 양육관 등의 차이로 인해 교대근무자 간 양육 방식에 대한 차이와 근무자 간 갈등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일관된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 면서 조율의 기회가 없어 경직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아동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을 통해 아동양육시설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았다. 다만 시범사업이 1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전환과정의 안정화 시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전환과정의 초기단계 경험에 한정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집단의 발달단계에 있어 혼란과 갈등이 가장 많은 시기가 초기과정이므로 연구참여자의 경험 에서 많은 의미단위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를 기반으로 시설의 전환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향후 후속연구는 전환과정의 준비단계, 정착단계, 발전단계 등 단계별 필요한 요건과 시설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통제적 양육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좋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Notes
References
. (2014). 그룹홈청소년의 생활지도 교사와의 애착과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회복탄력성과 또래지지를 매개로. [석사학 위논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dCollection@yongmoon https://yongmoon.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000002262735_20240513123225.pdf
. (2023. 6. 26).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76885&tag=&nPage=1
. (2023).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dColl ection@ewha. https://dcollection.ewha.ac.kr/public_resource/pdf/000000202390_20240513114751.pdf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7-29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9-11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09-12

- 982Download
- 3489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