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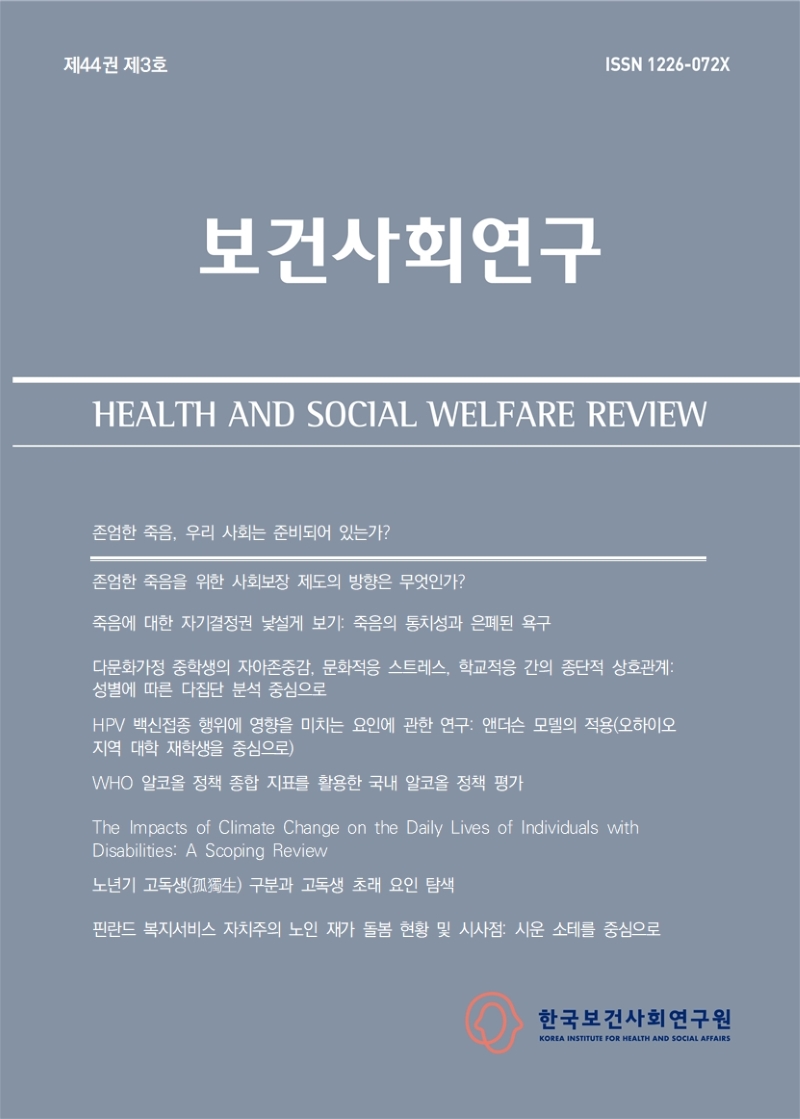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청년의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가?
How Does Instability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ffect Young People’s Views of Social Mobility Within and Across Generations?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만 주목하였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심리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의 정책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청년 ‘취약성’의 대리지표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주목하여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세대 내 사회이동성 전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험이 사회안전망일 뿐 아니라 심리안전망으로서도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사회보험의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효과까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이론적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청년이 경험하는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청년의 사회보험 적용과 가입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instability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mong young people aged 19 to 34 affects their views about social mobility, both within their generation and across generations, using the raw data from the 2023 Social Integration Survey. Our ordered-logit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social insurance instabilit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spects for social mobility within the young people's generation. However, it di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utlook for social mobility between generations. Specifically, compared to young people participating in all four social insurance schemes, those participating in none were about 78% more likely to be pessimistic about upward socioeconomic mobility in their children's gener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address gaps in social insurance coverage for young people, such as expanding childbirth and military service credits, and for developing measures to alleviate the economic burden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This study is of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focuses on instability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as an indicator of the vulnerability of young people's lives in the context of low growth and employment shocks, and that it expands on and demonstrates the effect of social insurance as both a social safety net and a psychological safety net.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만 19~34세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세대 내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소득계층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년의 취약성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주목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청년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대 사회보험에서 모두 배제되어 극심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청년은 사회보험을 안정적으로 가입한 청년에 비해 약 79%가량 자신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상향 이동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험의 심리사회적 정책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확장의 필요, 청년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 추진, 청년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저성장과 고용 충격의 최전선에 놓인 청년 삶의 취약성을 대리하는 지표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주목하였다는 점,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심리안전망인 사회보험의 정책효과를 확장하여 실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Ⅰ. 서론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사람은 26.4%로 2년 전보다 1.2%p 상승하였다. 그러나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 기간 대비 0.2%p 감소하였다(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3. 11. 8.).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나,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은 다소 비관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인구집단 중 하나로 꼽히는 청년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층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에 하나의 지표로 측정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개인이 보유한 자원과 객관적인 여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인식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Jackman & Jackman, 1973). 따라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객관적,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금현섭, 백승주, 2011).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객관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위에 대한 전망인 사회이동 가능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사회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에 대한 인지적 판단으로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수준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은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불안정한 청년의 고용이력은 기여와 급여가 긴밀히 연계된 사회보험의 안정적인 가입을 저해하며, 노후, 질병, 실업, 산재라는 대표적인 사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만든다. 즉,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 불안정성은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다루었다면, 기본적인 사회적 위험을 넘어 ‘1차 사회안전망’으로 일컫는 사회보험의 배제가 청년이 자신과 미래세대의 삶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은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이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기제로서 ‘심리적 안전망(psychological safety net)’이라는 ‘2차적 역할’도 담당한다(금현섭, 백승주, 2011, p. 63). 즉, 사회위험 발생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과 같은 완충장치(buffer)의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기대와 같은 심리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보험의 정책효과를 주로 빈곤 예방, 소득 유지와 같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만 주목하였으며, 삶의 안정감, 현재와 미래 전망에 대한 인식 등 사회보험의 심리적 안전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까지는 확장하지 못했다(금현섭, 백승주, 2011, p. 8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대리하는 지표로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주목하고, 사회보험의 2차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기능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관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생애과정 초기의 경험은 이후의 삶에 누적적,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Duncan et al., 2011), 청년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이동성을 저하시키는 제약을 파악하여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는 사회통합의 과정이며,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차원에서도 사회통합,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용관, 2018; 정해식, 2020a). 만일 청년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자녀세대의 삶을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 주축을 담당할 청년들이 인식한 사회이동, 사회통합을 확인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에 중요한 결과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향 이동 가능성 즉,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지 검토하고자 다음과 같이 논의를 구성하였다. 먼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 및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청년층이 경험하는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세대 내, 세대 간 상향이동성에 대한 전망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
사회이동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수직적, 수평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직적 차원의 개념으로서 사회이동성은 Ravazzini and Chávez-Juárez(2018)의 정의에 따라 한 ‘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social ladder)’를 오르거나 내려갈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한 사회 내에서 ‘상향 이동’하거나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수직적인 차원에서 사회이동성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수평적 차원의 개념으로서 사회이동성은 크게 ‘세대 내 이동성’, ‘세대 간 이동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대 내 이동은 개인의 소득계층, 직업, 일 경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출발 지점으로부터 이동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세대 간 이동은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지위와 자신의 성취를 통해 도달한 지위 간의 변화를 의미한다(한준, 2016). 즉, 세대 내 이동성은 개인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 세대 간 이동성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회이동성에 관한 연구의 학문적 배경은 주로 사회학과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경제학에서는 소득계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로 주관적인 사회이동성보다는 객관적인 사회 이동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한준, 2016; 김석호, 2018).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청년 세대의 상향 이동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음을 보고하면서 청년이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주관적인 사회이동성’을 살피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김석호, 2018). 따라서 청년의 객관적인 사회이동성이 아닌 주관적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세대 내, 세대 간에 사회이동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현황 파악과 사회이동 가능성을 전망하는 인식에 대한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청년의 실제 사회이동과 별개로 어떻게 자신과 미래세대의 미래를 그리는지는 사회에 대한 주관적인 진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은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주관적 계층의식(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의 개념과도 중첩된다. 주관적 계층의식이란 한 사회 내에서의 위계적, 서열적 위치에 대한 인지적 판단으로서 소득, 직업, 교육 등 객관적 조건들의 지위와 이 지위에 대해 상호작용하여 내린 개인의 평가 혹은 인지를 의미한다(Jackman & Jackman, 1973). 즉, 타인의 지위, 과거 자신의 지위, 자신의 기대했던 기준 등과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주관적인 개인의 인식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현섭, 백승주(2011)는 개인은 자신의 계층을 평가할 때 소득, 재산, 교육 수준 등 절대적인 기준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자신의 지위를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조동기, 2006)에서 주관적 계층에 대한 인식 역시 객관적인 요인 못지 않게 정책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사회이동성 혹은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성별(Simpson et al., 1988; 금현섭, 백승주, 2011; 김나연 2020), 거주지역(이은우, 2016; 이용관, 2018), 주관적 계층 인식(김나연, 2020),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병훈, 2017)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직업 위세(Jackman & Jackman, 1983), 고용 형태(김나연, 2020) 등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보험 수급 여부(금현섭, 백승주, 2011)와 같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 불안정성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은 복지국가의 근간으로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는 4대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노령, 질병, 실업, 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사회안전망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가입과 적용에 있어 광범위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한국 복지국가 성숙에 있어 과제로 남아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인구집단으로 여성, 고령자와 함께 청년이 꼽힌다(정인영 외, 2018).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15세 이상 사회보험 적용 비율은 국민연금 76.2%, 건강보험 99.2%, 고용보험 69.7%이며, 15~29세 청년층의 경우 각각 77.4%, 98.0%, 70.4%로 나타났다(김유빈, 2022). 표면적인 통계 결과만 살펴보면 청년을 사회보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집단으로 규정하긴 어렵다.1) 그러나 다변화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 비전형 고용 형태 확대의 흐름 속에서 기여와 급여가 긴밀히 연계된 사회보험 특성상 전통적인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에서 집중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은 청년층임을 주지하여야 한다(이승윤 외, 2017). 특히,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은 고용불안정에서 비롯된 단순한 사회안전망의 적용과 가입의 사각지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여유가 없어서"라는 점에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단순히 ‘고용의 질’ 차원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 자체의 취약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정해식, 2020b). 따라서 현세대 청년이 경험하는 취약성의 대리변수로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 청년의 사회보험 불안정, 배제, 사각지대의 규모나 정도를 살펴보고, 그러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의 원인과 그 경제적인 영향을 검토한 연구(정인영 외, 2018; 정해식, 2020b; 김규혜, 2020 등)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청년이 직면한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취약성의 대리변수로서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사회보험이 단순히 국민에게 사회적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안전망(psychological safety net)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금현섭, 백승주, 2011, p. 67). 가령, 공적연금의 정책효과는 직접적인 노후소득보장뿐 아니라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염려 감소, 삶의 안정감, 생활 만족, 안정적인 심리사회적 상태 등도 포함될 수 있다(이상록, 이순아, 2016; 권혁창, 조혜정, 2019). 따라서 지금까지 사회보험의 정책효과를 주로 경제적 편익에 국한해 논의해 온 경향에서 벗어나, 사회보험의 심리사회적 정책효과를 주목하여 이론적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과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
사회보험의 배제, 사각지대, 불안정한 가입 상태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의 어려움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전망을 검토한 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문제의 의식과 가장 유사하게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금현섭, 백승주(2011)의 “사회보험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동”이다. 동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8~11차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제도의 편익을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만 초점을 두었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심리적 편익으로서 “주관적 계층의식(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의 변동(mo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보험의 수급이 계층의식의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계층의식 하락은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다. 저자는 사회보험의 목적 자체가 소득하락을 방지하고 이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승보다는 ‘하락 방지’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외에도 균등화 소득, 생활 만족도, 주관적 건강 상태, 성별, 교육 수준, 연령은 계층의식 상승에, 주관적 건강 상태, 실업 여부, 임금근로자 여부는 계층의식 하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해당 연구는 사회보험의 정책효과를 소득보장이라는 경제적 편익에 국한 시키기보다 심리사회적인 편익까지도 확대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세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기존 사회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정인영 외 2018; 김승연, 박민진, 2021) 중장년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이 경험하는 현재의 불안정성은 단순히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 세대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내 사회이동성뿐만 아니라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여와 급여가 긴밀히 연계된 특성을 갖는 사회보험의 배제에서 비롯된 불안정성을 명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 여부에 비기여형의 보훈연금을 포함한 반면, 소득보장의 효과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핵심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청년층의 취약성에 따른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이라는 사회심리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기여형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보장의 필수 요소인 건강보험 역시 반드시 포함하여 정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론 및 자료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세대 내(자신), 세대 간(자신의 자녀)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동 조사는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가구원 중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가장 빠른 자를 응답자로 선정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약 4,000가구의 표본을 구축하며, 2023년 조사 자료의 유효표본은 3,950가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과 청년이 인식한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고용 형태,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일반적 특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청년이라는 인구집단을 포착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그 외에도 행복,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 신뢰, 갈등, 불평등에 대한 인식 등 사회통합과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자신의 자녀 세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어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사회이동성 전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연구가설을 과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6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주요 변수
분석에서 활용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사회이동성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문항을 역코딩한 ‘세대 내 사회이동성’과 자신의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예상하는 문항을 역코딩한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다. 사회이동성에 대한 변수는 매우 낮다(낮아질 것이다) 1점, 약간 낮다(약간 낮아질 것이다) 2점, 약간 높다(약간 높아질 것이다) 3점, 매우 높다(매우 높아질 것이다) 4점으로 총 4개의 서열 속성을 갖는 범주형 변수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표 1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정의
| 변수 | 변수의 정의 | ||
|---|---|---|---|
|
|
|||
| 종속변수 | 주관적 사회 이동성 전망 | 세대 내 사회이동성 (자신) |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
| 매우 낮다 = 1 | |||
| 약간 낮다 = 2 | |||
| 약간 높다 = 3 | |||
| 매우 높다 = 4 | |||
|
|
|||
| 세대 간 사회이동성 (자녀 세대) |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 ||
| 매우 낮아질 것이다 = 1 | |||
| 약간 낮아질 것이다 = 2 | |||
| 약간 높아질 것이다 = 3 | |||
| 매우 높아질 것이다 = 4 | |||
|
|
|||
| 독립변수 |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 | 4개의 사회보험 중에서 하나라도 배제된 경우 | |
|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 없음 = 0 | |||
|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 하 = 1 | |||
|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 중하 =2 | |||
|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 중상 = 3 | |||
|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 상 = 4 | |||
|
|
|||
| 통제변수 | 성별 | 남성=0, 여성=1 | |
|
|
|||
| 거주지역 | 비수도권=0, 수도권=1 | ||
|
|
|||
| 주관적 소득계층 | 하층=1 | ||
| 중하층=2 | |||
| 중간층=3 | |||
| 상층=4 | |||
|
|
|||
|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 직업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직업 위세) | ||
| 매우 낮다 = 1 | |||
| 낮은 편이다 = 2 | |||
| 보통이다 = 3 | |||
| 높은 편이다 = 4 | |||
| 매우 높다 = 5 | |||
|
|
|||
| 소득 수준 | 균등화 가구 총소득 | ||
|
|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1, 고졸=2, 대졸 이상=3 | ||
|
|
|||
| 고용 형태 |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1 | ||
| 자영자, 고용주 =2 | |||
| 상용직 임금근로자 =3 | |||
독립변수인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사회보험 가입 개수에 따라 불안정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 이승윤 외(2017), 김규혜(2020)의 방식을 차용하였다. 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가입한 경우 불안정성 없음을 ‘0’, 미가입한 경우 불안정성 있음을 ‘1’로 코딩하였다. 4대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 된 경우 불안정성 ‘없음’, 1개의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경우 불안정성 ‘하’, 2개의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경우 불안정성 ‘중하’, 사회보험 3개에서 배제된 경우 불안정성 ‘중상’, 4개의 사회보험 모두 배제된 경우 불안정성 ‘상’으로 정의하였다.
통제변수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검토에 따라 성별, 거주지역, 주관적 소득계층,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 교육 수준, 고용 형태를 투입한다. 주관적으로 인식한 소득계층은 하층인 경우 1, 중하층인 경우 2, 중간층인 경우 3, 상층인 경우 4의 값으로 코딩했다.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위상 혹은 위세에 대한 사회의 시선으로, 매우 낮은 경우 1, 낮은 편인 경우 2, 보통 3, 높은 편인 경우 4, 매우 높은 경우 5로 정의하였다. 소득은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주어 균등화 가구 소득을 활용하였다.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 형태의 경우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자영자 및 고용주, 상용직 임금근로자라는 세 가지로 재범주화하여 구성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STATA 17.0을 사용하였으며,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자신과 자신 자녀의 사회이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순서로짓회귀분석은 3개 이상의 항목을 가진 범주형 종속변수의 선택 확률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항로짓회귀분석(Multinominal logit regression analysis)와 유사하다. 다만, 종속변수의 속성에 서열 혹은 순위가 존재하는 경우 순서로짓회귀분석이 다항로짓회귀분석에 비교하여 더 적합하다(Hanushek & Jackson, 2013).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는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이 “매우 낮다(매우 낮을 것이다)”부터 “매우 높다(매우 높을 것이다)” 까지 순서화된 형태로 분포하며, 이산적(discrete)이므로 순서로짓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순서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귀계수 값이 종속변수의 각 범주마다 동일하다는 평행선 가정(parellel lines assumption)이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종속변수의 각 범주가 관측 대상 간에 이질적인 경우 평행선 가정이 기각된다. 순서로짓회귀분석의 평행선 가정이 기각된 경우, 가정을 완화하여 일반화된 순서로짓모형(Generalized 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avolainen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회귀계수의 값이 종속변수의 범주별로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토대로 평행선 검증을 통해 순서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평행선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한 후 순서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우도비 검증(Likelihood ratio test)를 통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독립변수인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과 그 외 통제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상술한 연구의 방법에 대한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방법 개요
| 분석 목적 | 모형 | 분석 대상 | 분석 전략 | 분석 방법 |
|---|---|---|---|---|
|
|
||||
|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청년의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지 검토 | (모형 1) 세대 내 사회이동성 전망 | 2023년 6월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자신, 자신의 자녀세대 사회경제적 상향 이동 전망에 미치는 영향 실증 | 순서로짓회귀분석 |
| (모형 2) 세대 간 사회이동성 전망 | *비경제활동인구,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제외 | |||
Ⅳ.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의 약 54%는 남성, 약 46%는 여성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약 46%,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약 54%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대학 중퇴를 포함한 고졸이 약 23%, 대학 수료 및 대학원을 포함한 대졸 이상이 약 77%이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하층’으로 응답한 경우가 약 6%, ‘중하층’이 약 43%, ‘중간층’이 약 47%, ‘상층’은 약 4%로 나타나 대다수 청년이 자신을 중하층 혹은 중간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정보로서 자신의 직업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응답에 ‘매우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 1%, ‘낮은 편’인 경우 19.48%, ‘보통’인 경우 61.35%,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약 16.99%,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우 1.18%였다. 고용 형태의 경우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인 청년은 약 17%, 자영자 혹은 고용주인 경우 약 10%,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 약 73%로 압도적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균등화 가구 총소득의 경우 약 342만 원이다. 소득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이 0.45%, 100만~200만 원 미만이 8.22%, 200만~300만 원 미만이 30.64%, 300만~400만 원 미만이 32.88%, 400만~500만 원 미만이 17.19%, 500만~600만 원 미만이 7.32%, 600만 원 이상이 3.29%이다. 즉, 상당수의 청년이 200만~400만 원 사이에 소득 수준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분석 대상 일반적 특성
| (단위: %) | ||
|---|---|---|
| 구분 | 전체(N=669) | |
| 성별 | 남성 | 53.82 |
| 여성 | 46.18 | |
| 소계 | 100.00 | |
| 거주지역 | 비수도권 | 46.01 |
| 수도권 | 53.99 | |
| 소계 | 100.00 | |
| 교육 수준 | 고졸(대학 중퇴 포함) | 22.78 |
| 대졸 이상(대학 수료 및 대학원 포함) | 77.22 | |
| 소계 | 100.00 | |
| 주관적 소득계층 | 하층 | 5.99 |
| 중하층 | 42.87 | |
| 중간층 | 46.88 | |
| 상층 | 4.26 | |
| 소계 | 100.00 | |
|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 매우 낮다 | 1.00 |
| 낮은 편이다 | 19.48 | |
| 보통이다 | 61.35 | |
| 높은 편이다 | 16.99 | |
| 매우 높다 | 1.18 | |
| 소계 | 100.00 | |
| 고용 형태 | 임시 및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 16.78 |
| 자영자, 고용주 | 9.84 | |
| 상용직 임금근로자 | 73.38 | |
| 소계 | 100.00 | |
| 소득 수준 | 균등화 가구 총소득(월평균) | 342만 원 |
| 100만 원 미만 | 0.45 | |
| 100만~200만 원 미만 | 8.22 | |
| 200만~300만 원 미만 | 30.64 | |
| 300만~400만 원 미만 | 32.88 | |
| 400만~500만 원 미만 | 17.19 | |
| 500만~600만 원 미만 | 7.32 | |
| 600만 원 이상 | 3.29 | |
| 소계 | 100.00 | |
출처: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 주요 요인 특성
분석 대상에 포함된 청년의 주요 요인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은 약 7%가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40%는 ‘약간 낮다’고 응답하였다. 청년의 52.05%는 자신의 사회이동성을 ‘약간 높다’고 인식하며,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1% 수준이었다. 즉, 청년의 절반은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긍정적(‘약간 높다’ 혹은 ‘매우 높다’)으로,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매우 낮다’ 혹은 ‘약간 낮다’)으로 전망한다. 한편, 청년의 자녀 세대에 대한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가 약 4%, ‘약간 낮아질 것이다’가 약 37%로 부정적 전망이 약 41% 수준이었다.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해 청년의 약 57%는 ‘약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1.41%는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약 59%의 청년이 미래세대의 사회이동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청년은 자신의 사회이동성보다 자신의 자녀세대의 사회이동성을 약 6%p 더 높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살펴보면, 불안정성이 없는 청년이 75.5%, 불안정성의 정도가 ‘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2.51%, ‘중하’는 9.14%, ‘중상’은 10.52%, 가장 불안정성이 높은 ‘상’이 2.33%로 나타났다. 즉, 청년의 약 1/4은 적어도 1개 이상의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불안정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분석 대상 주요 요인 특성
| (단위: %) | |||
|---|---|---|---|
| 구분 | 전체(N=669) | ||
| 사회이동성 | |||
| 세대 내 (자신) | 매우 낮다 | 6.95 | |
| 약간 낮다 | 40.09 | ||
| 약간 높다 | 52.05 | ||
| 매우 높다 | 0.91 | ||
| 소계 | 100.00 | ||
| 세대 간 (자신의 자녀) | 매우 낮아질 것이다 | 4.29 | |
| 약간 낮아질 것이다 | 36.94 | ||
| 약간 높아질 것이다 | 57.36 | ||
| 매우 높아질 것이다 | 1.41 | ||
| 소계 | 100.00 | ||
| 사회보험 가입 불안정성 | |||
| 없음 | 75.50 | ||
| 하 | 2.51 | ||
| 중하 | 9.14 | ||
| 중상 | 10.52 | ||
| 상 | 2.33 | ||
| 소계 | 100.00 | ||
출처: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3.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 불안정성의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 전망
순서로짓모형을 적용하기에 앞서, 종속변수의 모든 범주에 대해 회귀계수의 값이 동일하다는 평행선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2) 그 결과,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모형 1)과 (모형 2)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범주의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평행선 가정을 충족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서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표 5).
표 5
순서로짓모형의 평행선 가정 검정 결과
| 구분 | (모형 1) 세대 내 사회이동성 전망 | (모형 2) 세대 간 사회이동성 전망 |
|---|---|---|
| 검정통계량(X2) | 12.35 | 12.41 |
| df | 16 | 16 |
| P-value | 0.7198 | 0.7150 |
출처: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상기 평행선 가정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순서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즉,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대한 순서로짓회귀분석 결과
| 구분 | (모형 1) 세대 내 사회이동성 | ||||
|---|---|---|---|---|---|
| (모형 1-1) | (모형 1-2) | ||||
| OR | S.E. | OR | S.E. | ||
|
|
|||||
| 사회보험 불안정성 (ref. 없음) | 하 | 1.4123 | 0.7686 | ||
|
|
|||||
| 중하 | 1.2091 | 0.4101 | |||
|
|
|||||
| 중상 | 1.4396 | 0.4968 | |||
|
|
|||||
| 상 | 0.4336 | 0.2427 | |||
|
|
|||||
| 성별 (ref. 남성) | 여성 | 0.7289* | 0.1157 | 0.7132* | 0.1140 |
|
|
|||||
| 거주지역 (ref. 비수도권) | 수도권 | 0.9477 | 0.1532 | 0.9857 | 0.1614 |
|
|
|||||
| 교육 수준 (ref. 고졸) | 대졸 이상 | 1.0429 | 0.2255 | 1.0781 | 0.2347 |
|
|
|||||
| 주관적 소득계층 (ref. 하층) | 중하층 | 2.9100** | 1.0041 | 3.2237*** | 1.1364 |
|
|
|||||
| 중간층 | 3.1500*** | 3.4366*** | 1.0977 | 1.2226 | |
|
|
|||||
| 상층 | 8.7992*** | 5.0159 | 10.5972*** | 6.1810 | |
|
|
|||||
|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ref. 매우 낮다) | 낮은 편이다 | 3.2660 | 2.6956 | 2.4581 | 2.0727 |
|
|
|||||
| 보통이다 | 4.7256 | 3.8978 | 3.6472 | 3.0673 | |
|
|
|||||
| 높은 편이다 | 6.8201* | 5.7951 | 5.2533 | 4.5497 | |
|
|
|||||
| 매우 높다 | 7.9106 | 8.9568 | 5.7965 | 6.6754 | |
|
|
|||||
| 고용 형태 (ref. 임시, 일용, 특고) | 자영자, 고용주 | 1.1372 | 0.3844 | 0.9559 | 0.3590 |
|
|
|||||
| 상용직 임금근로자 | 1.4791 | 0.3621 | 1.5359 | 0.4460 | |
|
|
|||||
| 소득 수준 | 균등화가구총소득 (월평균) | 0.9999 | 0.0007 | 0.9999 | 0.0007 |
|
|
|||||
| Likelihood X2 | 133.82*** | 138.57*** | |||
|
|
|||||
| df | 13 | 17 | |||
|
|
|||||
| Log likelihood | -580.2234 | -577.8469 | |||
|
|
|||||
| Pseudo R2 | 0.1034 | 0.1071 | |||
출처: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표 7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순서로짓회귀분석 결과
| 구분 | (모형 2) 세대 간 사회이동성 | ||||
|---|---|---|---|---|---|
| (모형 2-1) | (모형 2-2) | ||||
| OR | S.E. | OR | S.E. | ||
|
|
|||||
| 사회보험 불안정성 (ref. 없음) | 하 | 0.6562 | 0.3662 | ||
|
|
|||||
| 중하 | 1.2464 | 0.4436 | |||
|
|
|||||
| 중상 | 0.6718 | 0.2342 | |||
|
|
|||||
| 상 | 0.2150** | 0.1200 | |||
|
|
|||||
| 성별 (ref. 남성) | 여성 | 0.9702 | 0.1606 | 0.9474 | 0.1590 |
|
|
|||||
| 거주지역 (ref. 비수도권) | 수도권 | 1.0856 | 0.1831 | 1.1319 | 0.1941 |
|
|
|||||
| 교육 수준 (ref. 고졸) | 대졸 이상 | 0.9576 | 0.2149 | 0.9231 | 0.2104 |
|
|
|||||
| 주관적 소득계층 (ref. 하층) | 중하층 | 2.5448** | 0.9080 | 2.8232** | 1.0282 |
|
|
|||||
| 중간층 | 3.2192*** | 1.1669 | 3.4815*** | 1.2841 | |
|
|
|||||
| 상층 | 3.7977* | 2.1352 | 4.4659** | 2.5725 | |
|
|
|||||
|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ref. 매우 낮다) | 낮은 편이다 | 1.3951 | 1.2786 | 1.0865 | 0.9708 |
|
|
|||||
| 보통이다 | 2.4961 | 2.2792 | 2.1116 | 1.8786 | |
|
|
|||||
| 높은 편이다 | 2.4467 | 2.2901 | 1.9811 | 1.8110 | |
|
|
|||||
| 매우 높다 | 2.8472 | 3.3632 | 2.6816 | 3.1541 | |
|
|
|||||
| 고용 형태 (ref. 임시, 일용, 특고) | 자영자, 고용주 | 1.1239 | 0.3789 | 0.8018 | 0.3008 |
|
|
|||||
| 상용직 임금근로자 | 1.3091 | 0.3283 | 0.9261 | 0.2820 | |
|
|
|||||
| 소득 수준 | 균등화가구총소득 (월평균) | 1.0004 | 0.0007 | 1.0002 | 0.0007 |
|
|
|||||
| Likelihood X2 | 113.68*** | 123.58*** | |||
|
|
|||||
| df | 13 | 17 | |||
|
|
|||||
| Log likelihood | -529.8819 | -524.9309 | |||
|
|
|||||
| Pseudo R2 | 0.0969 | 0.1053 | |||
출처: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먼저,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대한 순서로짓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우도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증값은 (모형 12) 의 경우 138.57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약 10.71%(Pseudo R2 =0.1071)이다. 독립변수인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투입하기 전 (모형 11) 의 우도비 검증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Pseudo R2값이 소폭 증가하여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청년의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대한 순서로짓회귀모형에 투입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모형 11), (모형 12) 모두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 주관적 소득계층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2) 를 기준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할 확률 즉, 승산(Odds ratio)은 약 29% 정도 낮다.3) 또한, 주관적 소득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한 청년보다 ‘중하층’인 경우 약 222%,4) ‘중간층’인 경우 약 244%,5) ‘상층’인 경우 약 960%6) 가량 자신의 사회이동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순서로짓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우도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증값은 (모형 22) 의 경우 123.58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약 10.53%(Pseudo R2 =0.1053)이다. 독립변수인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투입하기 전 (모형 21) 의 우도비 검증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Pseudo R2값이 소폭 증가하여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청년의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대한 순서로짓회귀모형에 투입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모형 21), (모형 22) 공통적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소득계층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의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할 승산(Odds ratio)은 주관적 소득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한 청년보다 ‘중하층’인 경우 약 182%,7) ‘중간층’인 경우 약 248%,8) ‘상층’인 경우 약 347%9)가량 자신의 사회이동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 (모형 22) 에서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했을 때, 앞선 세대 내 사회이동성 결과와는 달리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없는 청년에 비해 4개의 사회보험에서 모두 배제된 청년은 약 79%가량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10) 즉, 어떠한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향 이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래에 자신 자녀의 사회경제적 상향 이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년이 1차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후세대의 계층이동 사다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계층이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 인식에 대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재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소득계층 외에도 청년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인식 전망에 대해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는 기존에 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심리적안전망으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지 확인하고자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내 사회이동성의 경우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소득계층’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소득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한 청년에 비해 ‘중하층’, ‘중간층’, ‘상층’을 인식한 경우 최소 2배 이상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향 이동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신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전망에는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세대 내 사회이동성 전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 수급이 세대 내 주관적 계층의식의 하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뿐 계층의식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달리(금현섭, 백승주,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보험의 불안정한 가입 상태가 세대 간 사회경제적 상향 이동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험이 ‘사회안전망’일 뿐 아니라 ‘심리안전망’으로서도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과 심리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의 기능적 관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그동안 주로 빈곤 예방, 소득 보장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사회 보험의 정책효과를 사회이동성 전망이라는 심리사회적 측면까지 확장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안정적인 사회보험의 가입은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본연의 역할 외에도 현재와 미래 삶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같은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인식이나 전망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제적 정책효과 외에 고려하지 못했던 사회심리적 효과까지도 포괄하여 제도를 평가하려는 노력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보험이 세대 내, 세대 간의 연대(solidarity)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을 전망하게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사회보험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효과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시도가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청년들이 경험하는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는 앞다투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현실의 지표들은 이 같은 정책들이 청년들이 경험하는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관적 소득계층이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을 전망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청년이 소득, 교육, 직업 등의 객관적 조건을 타인, 자신의 과거, 그리고 기대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식한 결과가 자신과 자녀 세대의 삶을 전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혹은 주관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조건들에 청년들의 ‘노력’ 혹은 ‘능력’으로 해결 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이 내재 되어 있다면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은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가족, 교육,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긴 힘들 것이다.
셋째, 청년의 사회보험 적용 및 가입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적용과 가입의 사각지대 축소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2023. 10. 27.)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의 확대는 출산과 자녀 양육, 군복무라는 생애 사건을 경험하는 청년이 추가적인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안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에 비해 자신의 사회이동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못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주목한다면, 여성 일자리의 저임금화, 고용과 승진에서의 암묵적인 차별 관행이 실재하는 노동시장에서 살아가는 여성 청년에게 출산과 돌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둘째아부터 인정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인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복지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돌봄크레딧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유호선, 김아람, 2020).11) 한편, 남성 청년에게 해당하는 군복무크레딧 역시 지속적으로 군 병사 월급이 인상되고 있다는 점, 2024년 기준 국민연금 A값의 50%에 해당하는 약 149만 원은 약 206만 원인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A값 기준 인정 소득비율을 인상하여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여유가 없어서’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지원 기간,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류재린 외, 2022). 또한, 표준적 고용 관계에 있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에서 배제되기 쉬운 영세 자영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근로자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이승윤 외, 2019; 김규혜, 2020; 류재린 외, 2022). 가령,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청년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포괄하도록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기간 역시 현행 생애 12개월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최소 36개월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이동성 관련 연구들이 주로 본인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확인함에 그쳤던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차 사회안전망’이자 ‘심리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사회보험에서 집중적으로 배제된 청년, 즉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이들이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동시에 그동안 소득보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여 논의하였던 사회보험의 정책효과를 심리사회적 측면까지 확대했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이 약화되는 주요한 이유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노동 절약적 기술 발전에 있으며, 이는 그 어느 집단보다도 청년층에게 대단히 불리한 일자리를 공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한준, 2016), 저성장과 고용 충격의 최전선에 서 있는 청년이 직면한 취약성을 대리하는 지표로서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을 주목했다는 데 이론적 의미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대졸자, 상용직인 청년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이들은 비교적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도 내부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사실상 청년의 다수가 미취업청년이며(정인영 외, 2018), 최근 니트(NEET)청년, 고립·은둔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청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비관적인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감안할 때,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을 포함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Notes
한편, 고용노동부가 최근 보도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이 청년층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전년 동월 대비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확인한 결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한 고용보험 가입률이 떨어진 것은 초기 청년이라 할 수 있는 29세 이하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전년 동월 대비 4만 4천 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으나 2022년 11월부터 2만 9천 명이 감소, 2023년 11월에는 무려 3만 1천 명의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3. 12. 11.).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유럽 복지국가에서 자녀 양육, 중증 장애 혹은 질병을 가진 가구원에게 돌봄을 제공한 기간에 대해 최소 2년에서 4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유호선, 김아람, 2020).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7-29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9-13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09-13

- 731Download
- 971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