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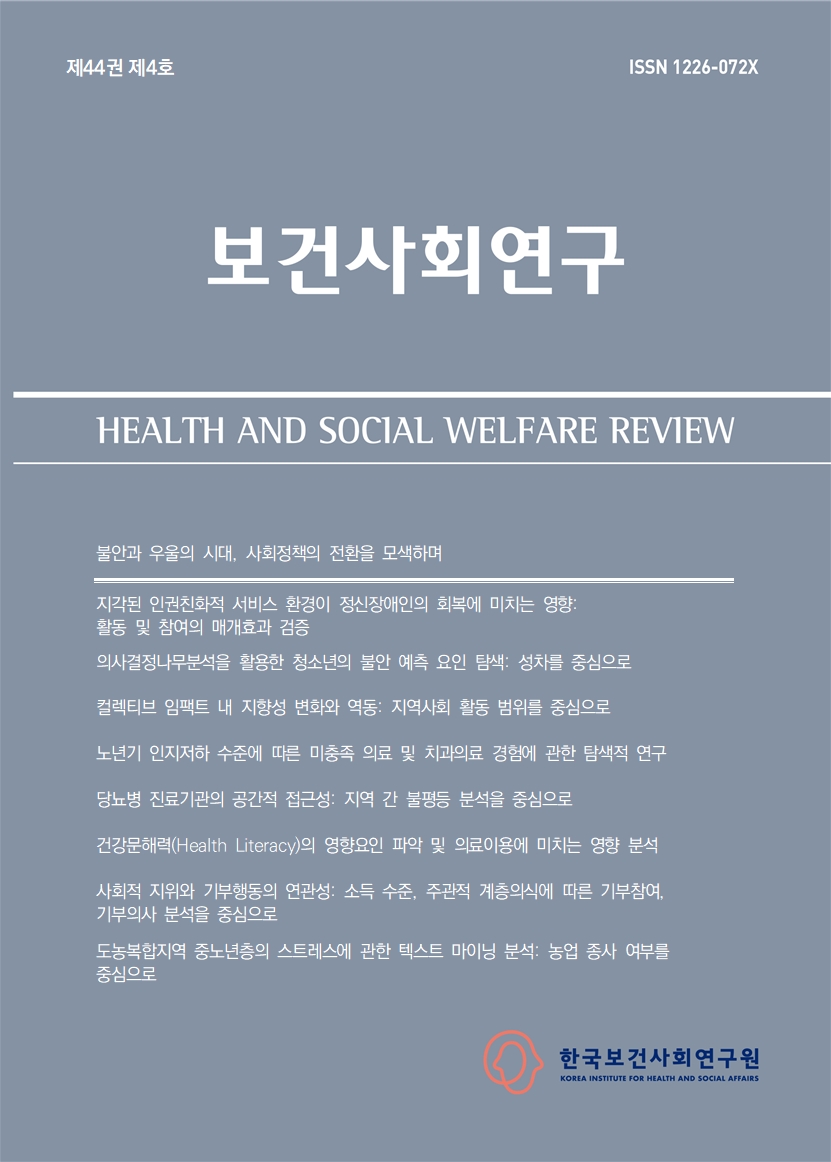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노년기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정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코로나19 확산 시기의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 and Self-Esteem in Older Adults: Comparing One-Person with Multi-Person Househol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ung, Eun Hye1
보건사회연구, Vol.44, No.4, pp.220-248, 28 November 2024
https://doi.org/10.15709/hswr.2024.44.4.220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노년기는 노화로 인해 신체적 약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면서 관계망이 축소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및 이동 제한 등 국가 정책이 사회적 고립을 양산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기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회적 고립의 위험수준이 높은 1인 가구를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코로나19 확산시기의 노년층은 1인 가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경로를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가 높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이 낮았다. 더불어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작았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고립이 심화되었던 코로나19 시기를 보낸 노년층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의 감소,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요하다. 실천현장에서는 노년층에게 사회적 관계 형성 기술 교육,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상호작용 증진, 정서지원 서비스, 사회적 지지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은 정책적 차원의 제도 마련과 실천현장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인 가구의 취약성 고려가 필요하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전문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Abstract
Late adulthood is often characterized by the social isolation attributable to physical weakness, reduced social networks, and increased susceptibility to mental health issues―factors that worsen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explored the structural paths mediated by negative emotions and self-esteem. We also compared one-person households, at increased risk of isolation, with multi-person household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based on data from those aged 60 or older in the 2021 Korea Media Panel Survey, revealed that social isolation, negative emotion and self-esteem all affected life satisfaction, and that negative emotion and self-esteem mediated the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one-person households, social isolation exerted greater nega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while self-esteem had smaller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Based on these findings, we have made several sugges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o address social isolation among older adults.
초록
노년기는 신체적 약화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며 정신건강 차원에서 취약한 시기로, 코로나19는 이와 같은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의 관계 사이에서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고립의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와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다인 가구를 비교하여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2021년에 조사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중 60세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 자아존중감은 모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크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으며(남상훈 외, 2024), 많은 매체에서 노년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청년기부터 이미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TV, 뉴스 등의 매체에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관리가 주로 보도되고 있으며(김경필, 2023; 윤해리, 2023), 노후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및 개인적, 관계적, 집단적 차원의 삶의 만족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노년기 경제적 문제는 풍요로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사회 구조의 개선을 통한 장기적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노년기를 맞이하며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사회적 관계 맺음과 정신건강 차원의 삶의 의미를 찾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남석인 외, 2019).
노년기는 노화로 인해 신체적으로 약화되고 사회적 위치의 변화로 인해 관계망이 축소되어 고립감을 느끼게 되며,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취약한 시기이다(강희경, 2023).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이 증가 하면서 국가의 관계부처들도 노인의 신체적 질환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노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현상으로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고독감, 외로움 등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김춘남 외, 2018), 우울을 형성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 매우 부정적 요인이다(김영범, 2020). 우울 뿐 아니라 외로움과 같이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은 자살 외에도 모든 종류의 사망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Perissinotto et al., 2012),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 위험군 판별을 위한 검토 항목에도 포함되고 있다(고숙자 외, 2023).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및 이동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노년층은 사회적 고립감을 비롯하여 복합적 문제를 경험하였으며(남궁은하, 2021), 고독사와 같은 고위험 상황이 증가하였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고숙자 외, 2023)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2년에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독사 인식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71.1%가 노년기를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준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 지원되어야 하는 계층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노년층에게 사회적 고립 예방과 같이 고독사를 발생시키는 상황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기에 나타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노인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노인들이 같은 연령대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주 장소로 활용하였던 복지관, 경로당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오랜기간 이용이 제한되었고,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과 만남을 기다렸던 명절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질병관리청, 2022). 노년기를 위해 기존에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던 방문돌봄 서비스도 대면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고(오종석 외, 2023), 홀로 거주하는 노년기 1인 가구와 빈곤계층 노인들은 직접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은 유럽과 비교해 코로나19 시기에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최혜진, 2023)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련된 부정적 감정은 더욱 증가되었다(예운, 김경오, 2022). 선행연구에서도 고립된 삶이 아닌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분노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Hunter & Linn, 1981), 반대로 고립된 생활을 하게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증가하고 무기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류주연 외, 2023) 코로나19 노년층의 상황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시기 감염병에 취약했던 노년층은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를 뿐 아니라 스스로 타인과 만남을 자제하는 등(박지현, 이미혜, 2021) 다른 계층에 비해 강하게 고립된 생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노, 부정적 생각, 무기력 등 부정정서도 함께 양산되었을 것이다. 사회적 고립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감정인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보고된다(김상길, 2023).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판단으로(Rosenberg, 1965),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취약으로 인해 자신에 관한 가치 상실을 느낄 수 있는 노년기에 중요한 감정이다(장서영, 2015).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정정서,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건강 관련 요인들은 노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Wilhelmson et al., 2013), 노년기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관련 연구 중에는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보고한 경우도 있지만(이은희, 이양수, 2023) 사회적 고립이 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상길, 2023; 손희주 외, 2023). 즉, 사회적 고립과 정서, 자아존중감은 서로의 영향력에 관해 양방향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시기에 증가한 사회적 고립이 원인이 되어 부정정서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까지 이르는 영향력의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1인 가구는 전통적으로 돌봄을 담당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형태의 가구로, 코로나19 시기에는 영유아, 아동,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면서 1인 가구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기 때문에(김성아 외, 2023) 그들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영역 외에 1인 가구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다(박민진, 김성아, 2022).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안현찬 외, 2022)에서는 1인 가구의 62%가 외로운 상태로 조사되고 있으며,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 취약, 경제적 취약, 관계성 취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취약성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노년기 1인 가구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취약성까지 가진 집단으로 (고숙자 외, 2023) 사회적, 정책적으로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계가 발견되면서 노년기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고립예방서비스 발굴의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하였다(김성아 외, 2023). 통계청(2023)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3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노년기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 60대는 16.4%, 70세 이상은 18.1%의 분포를 보여 전체 1인 가구 중 34.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35.3%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1년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24.7%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노년기 1인 가구의 비중이 인구 분포 대비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감이 고조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가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1인 가구의 현황을 다인 가구와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한 사회적 고립 현상은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김성아 외, 2024), 이 시기에 사회적 고립의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부정감정과 자아존중감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중 취약성을 가진 노년기 1인 가구를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확산 시기의 노년기 사회적 고립감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 차원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및 접촉이 없거나 드문 상태를 의미하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지어 있지 못해 외롭다고 느끼는 주관적 인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Lehmann, 2022). 따라서 객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은 이웃, 친구, 가족 등의 접촉 빈도와 같은 정량적 수치로 측정하지만(Valtorta et al., 2016), 주관적 차원의 고립은 사회적 관계망이나 주변과 관계 및 접촉 빈도에 관한 만족도와 같이 개인의 인식이나 감정을 측정한다(김영범, 2020). 객관적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과 같은 감정과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지만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다수의 연구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Valtorta et al., 2016; 백지혜, 류병주, 2024), 주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 차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외로움, 고독감 등의 심리상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김재희, 박은규, 2016). 사회적 고립은 일반적인 타인이 아닌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으로 정의되곤 하는데(Hortulanus et al., 2006), 김춘남 외(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감소가 비자발적인 상황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개인, 지역사회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종국에는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 이르러, 고독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객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인 사회적 관계망 감소가 주관적 차원의 감정인 고독감,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주관적 관점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사회적 관계망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노년기의 감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고독감, 외로움과 유사한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노년기는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은퇴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이 변화되는 시기로 사회활동에서 맺어왔던 관계들이 약화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게 된다(Miyawaki, 2015). 노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시기로 보고되고 있으며(이은희, 이양수, 2023),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의 제한은 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축소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배고은, 2022).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노년기 은둔 및 사회적 고립 집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혜진, 2023). 감염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5월, 1단계로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로 모임과 교류를 차단하였으며 2021년 11월이 되어서야 백신접종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도되었기 때문에(질병관리청, 2022), 2021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자발적 관계 단절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재가노인의 경우 돌봄을 제공해 줄 가족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방문이 차단되고,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외부와 단절되어 가족들조차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정홍원 외, 2023). 이처럼 노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른 계층보다 강도 높게 경험하고 감염의 취약성 등의 문제로 외부활동을 크게 자제하면서 더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최혜진, 2023).
남궁은하(2021)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의 60% 이상에서 모든 외부 활동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특히 노년층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시설 이용은 89.6%가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타인과의 접촉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정서적 지원체계 부족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1인 가구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부재한 상황에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해 온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겼을 뿐 아니라 기존에 사귄 친구가 있어도 만나지 못하며 비자발적으로 집안에 고립되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외로움이 일상이 되어(박지현, 이미혜, 2021)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는 대면 중심의 접촉 문화를 온라인 중심의 문화로 변화시켰고, 비대면으로 상호작용하는 문화가 일상화 되었지만(김승보 외, 2021) 노인들의 집안 활동 증가 경향을 살펴보면, 온라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보통신 기기의 이용율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적고, 일방향적인 TV 시청과 같은 활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남궁은하, 2021). 이러한 결과는 정보통신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와 디지털 소외현상 보도 등이 자주 등장하여 왔기 때문에 정보통신기기 발달로 인한 환경변화에서 노인이 꾸준히 소외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박소영, 정순둘, 2019).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세계적으로 대면을 통한 상호작용을 대신하는 소셜미디어,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가속화되고, 스마트폰의 사용 및 원격근무 등이 증가하면서(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2023)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결국 디지털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 이상 지나 조사된 2021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에서도 60세 이상 3,211명 중 스마트기기 활용의 능숙도를 묻는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인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을 확인한 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관련 열람 및 확인이 18.1%, 작성 및 발신은 26.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문자메시지를 대신하여 활발하게 사용되는 인스턴트 메신저의 열람 및 확인은 34.5%, 작성 및 발송은 38.5%가 능숙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노년기 4명 중 1명 이상은 문자메시지 수발신에, 3명 중 1명 이상은 인스턴트 메신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래한 언택트 시대는 비대면이 배려가 되었고, 상황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배워야하는 디지털 문화에 괴리감을 느끼는 노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버거워하였다(박지현, 이미혜, 2021).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호작용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사람과 교류하는 수단인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이 쉽지 않아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는 노년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고립의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은 사망과도 관련이 있어(Perissinotto et al., 2012)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전문가들은 노년기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외로움과 고립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배은경 외, 2023).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고숙자 외, 2023)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2020년의 고독사 사망자는 3,279명으로 2019년보다 12% 정도 증가하였으며, 2021년은 3,378명으로 3% 정도 추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동일한 시기에 60세 이상인 대상의 고독사 사망자 추세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42.6%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46.3%, 2021년에는 47.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노년기의 취약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2.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자율성과 대인관계 측면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Moreno-Tamayo et al., 2019), 노년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고독감 등은 과거 국내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이명희, 2019; 이현지 2012),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국내, 국외 다수의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를 밝히고 있다(Liu et al., 2021; Skałacka et al., 2022; 윤동경 외, 2022; 이종운, 이미애, 2024). 김성아 외(2024)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결과를 검토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한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친 영향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고립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관계 제한이 발생하면서 심리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박주연 외, 2022). 특히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키며(김영범, 2020) 사회적 지지의 감소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저하해 미래에 관한 희망을 상실하여 변화에 대한 대응이 아닌 삶을 종료하는 자살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이금룡, 조은혜, 2013). 따라서 사회적 고립감이 부정정서,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정정서는 개인의 부정적 감정에 기반한 변수로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차원으로 본다(Hills & Argyle, 2001). 부정정서는 용어 그대로 ‘부정적’인 정서로 ‘짜증’, ‘분노’와 같은 감정을 포함하며(박홍석, 이정미, 2016),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영한 연구에서는 ‘무기력’을 포함하여 설명되기도 한다(양혜진, 2020).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의 직접적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정신의학에서는 우울장애를 슬픔, 공허함, 짜증스러운 기분을 동반하는 장애로 죄책감 및 죽음이나 자살과 같은 부정적 사고, 의욕과 즐거움 감퇴, 불쾌한 기분으로 인한 분노 폭발의 반복 등 부정정서의 증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권석만, 2014),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이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부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우울과 우울장애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우울이 우울장애를 진단하는 주요 기준임을 고려할 때, 우울이 강하면 부정정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울이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다수의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으며(류지연, 2022; 성혜연, 2021; 윤춘모, 박재학, 2020), 코로나19 시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이석환, 전용호, 2022).
노년기는 은퇴를 하는 시기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형성했던 익숙한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는 이와 같은 관계망과 대면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어 객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이 유발되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과 함께 발생한 고립감은 두려움, 짜증, 분노 등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추가적으로 발현시켰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예운, 김경오, 2022). 부정정서는 개인의 경험에 관한 평가와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조은영, 임정하, 2014).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는 부족하지만 부정정서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는 다양한 대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 직장인, 고등학교 교사 등에서 부정정서와 삶의 만족 간 관계를 밝히기도 하였으며 (권대훈, 2018; 오옥선, 2014; 이종만, 오상조, 2015), 대학생의 부정정서가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과거부터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강영걸, 김종호, 2009; 정은교, 2023; 조은영, 임정하, 2014). 그러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부정정서와 삶의 만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리정서적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져 왔으며, 자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판단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성인기까지 증가하다가 노년기가 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Shaw et al., 2010).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취약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성인기에 왕성한 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노년기가 되면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와 같은 노년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취약성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장서영, 2015), 노년기는 생애주기 중 특별히 자아존중감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노년기 사회적 고립감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상길, 2023), 노년기에 느끼는 외로움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zcześniak 외, 2020). 국내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노년기의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순분, 이재모, 2021; 윤춘모,박재학, 2020)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로도 보고되고 있다(김상길, 2023; 엄인영, 이외승, 2022; 정은혜, 윤명숙 2018). 한편, 낮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고립감 발생의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 되고 있지만(이은희, 이양수, 202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 현상이 두드러진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고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이 선행되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년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은혜, 윤명숙(2018)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검증하였는데, 가족과 이웃의 지지가 노년기 장애인의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여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고립감 감소와 관련이 있는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부정정서의 증상을 갖는 우울은 감소시키며 자아존중감은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노년층의 삶의 만족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연구 중 류지연(2022)의 연구에서는 노인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교육수준, 거주 지역, 성별, 근로유무, 연령, 소득을 살펴보았고, 왕연연 외(2022)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형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각 변수들이 초깃값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노년기 삶의 만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논의를 이어왔지만 코로나19 시기의 노인의 삶의 만족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선행연구를 통해 외부활동이 제한된 코로나19 시기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높아졌으며(배고은, 2022),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정서적 상태가 그들의 삶에 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로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시기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적 고립감이 노인의 정서적 부분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구조를 분석하여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3. 노년기 1인 가구와 다인가구
노년기 1인 가구는 “독거노인”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빈곤하며,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고, 건강에 취약하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강은나, 이민홍, 2018; Miyawaki, 2015). 노년기는 시기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위험 수준이 높다. 더욱이 돌봄을 제공하거나 정서적 지원을 해줄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박민진, 김성아, 2022), 사회적 고립에 더욱 취약한 노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과거부터 노년기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Shimada 외(2014)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사회적 고립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25.7%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 노인의 경우 31%, 가족과 동거할 경우 24.1%로 나타나고 있어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발표된 국내 노년기 고독사 위험과 관련한 이상우(2024)의 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고독사 위험 인식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수준과 자살생각 또한 독거노인 집단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어 고립과 관련된 인식과 정신건강 측면에서 노년기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대면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영유아, 아동, 노인과 같은 돌봄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던 사회복지서비스의 한계가 드러났고,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없는 대상에게 돌봄 문제와 사회적 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1인 가구는 그 자체로 잠재적 위험 계층으로 부각되었다(정홍원 외, 2023).
노년기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 관련 연구에서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차이가 발견된다. 독거노인에 비해 비독거노인이 우울은 낮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최정현, 최소연, 2021) 코로나19 시기에도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높은 우울과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석환, 전용호, 2022). 이처럼 노년기 1인 가구는 노화와 독거라는 취약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다인 가구와 차이를 보인다.
노년기의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한 연구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꾸준히 차이가 발견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 우울,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 등과 같은 내용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강은나, 이민홍, 2018; 강해자, 2012; 김선애 외, 2019; 김혜경, 박완경, 2022; 남석인 외, 2019; 서인균, 이연실, 2014; 이상우, 2024) 코로나19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1인 가구의 고립 문제가 대두되면 서 코로나19와의 관련성에 관심을 둔 연구도 진행되었다(김이레, 오설미, 2022; 이석환, 전용호, 2022). 박지현, 이미혜(2021)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을 고립감과 사회 연결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였는데, 연구 결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화된 외로움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의 특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코로나19 시기가 관련 취약성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수준까지 확장되지는 못하였으므로 노년기 사회적 고립과 부정정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확인하는 본 연구에서 가구형태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및 대상
이 연구는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정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1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동일 표본을 추적하고 있다. 이 중 삶의 만족도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조사는 2013년, 2017년, 2021년 시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이며 자아존중감과 고립감 관련 문항들이 추가된 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21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기존 패널에게 5월~8월의 방문 일정을 안내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시하면서 가구 방문을 통한 1:1 면접의 설문을 주요 방식으로 유지하였다(고세란 외, 2021). 또한 2021년 조사는 12차년도 조사로 장기간 이어온 대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데이터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관련 문항에서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존중감 관련된 문항을 추가 조사하여 코로나19 시기의 고립과 정서를 확인하기 적합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더불어 2021년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의 다음 해로 변이의 출현과 확산이 시작된 시기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적절한 시기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회적 고립감과 유사개념인 외로움은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2020년보다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된 2021년에 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김성아 외, 2023) 해당 시점을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법적 노인은 주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노년학자들은 60세부터 연소 노인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강희경, 2023), 노인복지법 제33조의 2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대상자 중에는 초고령 노인도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할 뿐 아니라 면접원에게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응답 과정을 실사, 검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고세란 외, 2021) 결측없이 응답에 참여하였다면 특정 연령을 제외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노년기 응답자는 총 3,211명이다.
2.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 삶의 만족 및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주요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받으며(김상길, 2023; 예운, 김경오, 2022),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김상길, 2023; 이현지 2012; 정은교, 2023),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생성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 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포함되기도 하며(이은희, 이양수, 2023),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의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상호연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박민진, 김성아, 2022),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적 고립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고립감이 선행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변수 간 직접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는 간접적 영향력까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한계를 보고하고 있어(윤춘모, 박재학, 2020), 국내 노년기 삶의 만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개인소득을 확인하였고(류지연, 2022; 왕연연 외, 2022), 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변수들의 관계에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집단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경로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였다. 소득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나 가구소득을 확인할 경우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노인 당사자에게 일반적 수입, 이자소득,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의 변수로 통제하였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가. 사회적 고립감
사회적 고립감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외로움, 사회적 교류 부족, 소외 등과 같이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감정을 묻는 주관적 고립을 측정하였으며, ‘전혀 느끼지 않았다’를 1점, ‘자주 느꼈다’는 4점으로 측정한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사람들과의 교류/교제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혼자인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누구와도 가깝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다’,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상길(2023)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문항을 사회적 고립감의 척도로 활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α 값 .862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정정서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 중 부정적인 내용으로 ‘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 ‘화가 나는’의 4문항을 제시하고 있어 부정정서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부정정서는 긍정정서와 구분되는 독립된 개념으로(Hills & Argyle, 2001)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정서를 확인하고자 부정정서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Watson 외(1988)가 개발하고 박홍석과 이정미(2016)가 번안한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에는 부정정서로 ‘짜증 스러웠다’, ‘화가 났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제시하고 있고, 양혜진(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에 ‘무기력’이 포함되어 있다. 서은국, 구재선(2011)의 연구에서는 동양 문화의 부정정서를 고려하여 고각성 정서, 중간 각성 정서, 저각성 정서를 대표하는 정서로 ‘짜증’, ‘부정적인’, ‘무기력함’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화남’은 고각성 정서의 문항 중 하나로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된 4문항은 부정정서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Cronbach`α 값 또한 .908로 좋은 신뢰도를 보였다. 변수의 측정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1점, ‘항상 느꼈다’가 7점으로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중 긍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긍정 문항 5개와 부정 문항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문 참여자들이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 변수가 포함된 대규모 조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척도의 신뢰도 검사 결과 부정 문항은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모형의 주요 변수 내에 부정정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의 긍정성을 강조하고자 긍정 문항 5개를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측정은 ‘별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α 값 .842로 적합한 수준이었다.
라.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서은국, 구재선(2011)이 제시한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적 측면은 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계적 측면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집단적 측면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본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만족을 확인하고 있다. 응답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고,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경우 7점을 부여하는 7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α 값 .906으로 매우 적합하였다.
마. 통제변수
삶의 만족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요 변수들의 명확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인구사회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투입된 변수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개인소득으로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와 고등학교(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하였고, 개인소득은 소득의 유무를 확인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한 후 활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결혼상태, 가구형태 등의 요인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성혜연, 2021) 이 연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통제변수에서 해당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수의 측정 요약
| 변수명 | 측정 문항 구성 | 측정 방법 | Cronbach`α | |
|---|---|---|---|---|
| 사회적 고립감 | 지난 한 달 동안의 고립과 관련된 감정 6문항 (나는 혼자인 것 같다,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다 등) | 전혀 느끼지 않았다~자주 느꼈다 4점 리커트 척도 | .862 | |
| 부정정서 |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부정적 감정 [4가지 감정]: 짜증 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 화가 나는 | 전혀 느끼지 않았다~항상느꼈다 7점 리커트 척도 | .908 | |
| 자아존중감 |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중 긍정적 평가를 하는 5문항 | 별로 그렇지 않다~항상 그렇다 4점 리커트 척도 | .842 | |
| 삶의 만족 |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 만족도 |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7점 리커트 척도 | .906 | |
|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 여자: 0, 남자: 1 | |
| 연령 | 조사 당시 연령 | |||
| 학력 | 중졸 이하: 0, 고등학교1) 이상: 1 | |||
| 개인소득 | 소득 없음: 0, 소득 있음: 1 | |||
4.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6.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사회적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현황을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규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여 평균값을 제시하였으며, 두 집단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1단계로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과 모델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측정모형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였다. 2단계로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기반하여 주요 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구조모형을 구성하였고, 외생변수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최종모형을 분석하였다.
최종모형에는 간접효과가 포함되어 있어,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감정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부정감정과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 영향력을 각각 제시하고자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활용하여 효과 분해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사이에 이러한 구조적 관계의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측정모형을 통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고, 다중집단분석 결과의 비교를 위해 대응별 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 방법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1인 가구에서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조사 시점 기준의 만 나이를 확인하였으며, 전체 대상자 중에는 60대가 가장 많았으나, 1인 가구에서는 80대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 대상자의 연령의 평균은 71.8세(SD=8.73)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모두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인 가구가 초졸 이하의 비율이 높았다. 결혼 상태는 1인 가구의 경우 사별이 많았으며, 다인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86%로 다수였다. 직업은 전체 대상자의 46.5%가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인 가구에서 직업을 가진 비율이 약간 높았다. 소득은 다인 가구의 경우 개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1인 가구는 소득은 있지만 100만원 미만의 소액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대상이 67.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 구성은 1인 가구가 50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5.6%로 확인되었으며, 다인 가구에서는 노년기 세대로만 이루어진 1세대 가구가 49.9%로 가장 많았다.
표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단위: 명(%) | ||||
|---|---|---|---|---|
| 구분 | 빈도(%) | |||
| 1인 가구 (N=502) | 다인 가구 (N=2,709) | 전체 (N=3,211) | ||
| 성별 | 남자 | 75(14.9) | 1,315(48.5) | 1,390(43.3) |
| 여자 | 427(85.1) | 1,394(51.5) | 1,821(56.7) | |
| 연령 | 60~69세 | 102(20.3) | 1,378(50.9) | 1,480(46.1) |
| 70~79세 | 174(34.7) | 862(31.8) | 1,036(32.3) | |
| 80~89세 | 200(39.8) | 409(15.1) | 609(19) | |
| 90세 이상 | 26(5.2) | 60(2.2) | 86(2.7) | |
| 최종학력 | 초졸 이하 | 342(68.1) | 825(30.5) | 1,167(36.3) |
| 중졸 이하 | 80(15.9) | 607(22.4) | 687(21.4) | |
| 고졸 이하 | 73(14.5) | 1,002(37.0) | 1,075(33.5) | |
| 대졸 이하 | 7(1.4) | 262(9.7) | 269(8.4) | |
| 대학원 이상 | - | 13(.5) | 13(.4) | |
| 결혼 상태 | 미혼 | 9(1.8) | 3(.1) | 12(.4) |
| 배우자 있음 | 17(3.4) | 2,331(86.0) | 2,348(73.1) | |
| 사별 | 446(88.8) | 333(12.3) | 779(24.3) | |
| 이혼 | 30(6.0) | 42(1.6) | 72(2.2) | |
| 직업 | 직업 있음 | 173(34.5) | 1,319(48.7) | 1,492(46.5) |
| 직업 없음 | 329(65.5) | 1,390(51.3) | 1,719(53.5) | |
| 소득 없음 | 47(9.4) | 805(29.7) | 852(26.5) | |
| 50만 원 미만 | 151(30.1) | 473(17.5) | 624(19.4) | |
| 50만~100만 원 미만 | 186(37.1) | 276(10.2) | 462(14.4) | |
| 100만~200만 원 미만 | 97(19.3) | 523(19.3) | 620(19.3) | |
| 200만~300만 원 미만 | 16(3.2) | 391(14.4) | 407(12.7) | |
| 300만~400만 원 미만 | 4(.8) | 146(5.4) | 150(4.7) | |
| 400만~500만 원 미만 | 1(.2) | 56(2.1) | 57(1.8) | |
| 500만 원 이상 | - | 39(1.4) | 39(1.2) | |
| 가족 구성 | 1인 가구 | 502(100.0) | - | 502(15.6) |
| 1세대 가구 | - | 1,353(49.9) | 1,353(42.1) | |
| 2세대 가구 | - | 978(36.1) | 978(30.5) | |
| 3세대 가구 | - | 283(10.4) | 283(8.8) | |
| 기타 | - | 95(3.5) | 95(3.0) |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사용한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강한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으로 측정되고 있다. 삶의 만족은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존중감은 1~4점의 4점 척도, 부정정서와 삶의 만족은 1~7점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감은 1.92점, 부정정서는 2.62점으로 척도의 중간값보다 약간 낮았으며, 자아존중감은 2.63점, 삶의 만족은 4.63점으로 척도의 중간값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요 변수들의 왜도, 첨도는 모두 절댓값이 1보다 낮으므로 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규분포로 판단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변수명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왜도 | 첨도 |
|---|---|---|---|---|---|---|
| 사회적 고립감 | 1.92 | .58 | 1 | 4 | .373 | -.304 |
| 부정정서 | 2.62 | 1.09 | 1 | 7 | .442 | -.264 |
| 자아존중감 | 2.63 | .55 | 1 | 4 | -.030 | -.234 |
| 삶의 만족 | 4.63 | .97 | 1 | 7 | -.257 | .115 |
주요 변수가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고립감은 노년전기보다 노년후기가, 고교이상의 학력에 비해 중졸이하의 학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부정정서는 학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종졸이하에 비해 고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이 더 높은 부정정서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은 성별, 연령, 학력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노년후기보다 노년전기가, 중졸이하에 비해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표 4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값 차이
| 변수명 | 평균(표준편차) | t값 | 평균(표준편차) | t값 | 평균(표준편차) | t값 | |||
|---|---|---|---|---|---|---|---|---|---|
| 남자 (N=1,390) | 여자 (N=1,390) | 75세 미만 (N=2,024) | 75세 이상 (N=1,187) | 중졸 이하 (N=1,854) | 고교 이상 (N=1,357) | ||||
| 사회적 고립감 | 1.9 (.58) | 1.93 (.57) | -1.713 | 1.86 (.56) | 2.01 (.59) | -7.039*** | 1.95 (.59) | 1.87 (.55) | 4.076*** |
| 부정정서 | 2.61 (1.10) | 2.63 (1.09) | -.488 | 2.61 (1.09) | 2.64 (1.10) | -.766 | 2.56 (1.08) | 2.7 (1.11) | -3.663*** |
| 자아존중감 | 2.68 (.54) | 2.58 (.55) | 4.974*** | 2.7 (.53) | 2.49 (.56) | 10.538*** | 2.56 (.55) | 2.71 (.53) | -7.797*** |
| 삶의 만족 | 4.71 (.97) | 4.57 (.97) | 4.127*** | 4.74 (.92) | 4.45 (1.03) | 7.975*** | 4.52 (1.00) | 4.78 (.91) | -7.729*** |
주요 변수의 평균값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나누어 집단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는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은 다인 가구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값 비교의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세부문항에 따른 비교도 모든 문항의 평균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의 세부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문항들이 상이하였는데 사회적 고립감은 1인 가구에서 “나는 혼자인 것 같다”라는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다인 가구에 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교제가 부족한 것 같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부정정서는 1인 가구에서는 “무기력한” 이 가장 높은 점수였으나, 다인 가구에서는 “짜증 나는”이 가장 점수가 높았다.
표 5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주요 변수 및 세부 문항 평균값 차이
| 변수명 (최솟값~최댓값) | 세부문항 | 평균(표준편차) | t값 | |
|---|---|---|---|---|
| 1인 가구 (n=502) | 다인 가구 (n=2,709) | |||
| 사회적 고립감 (1~4) | 사람들과의 교류/교제가 부족한 것 같다 | 2.24(.79) | 2.09(.75) | 3.999*** |
| 나는 혼자인 것 같다 | 2.37(.85) | 1.95(.77) | 10.368*** | |
| 나는 더 이상 누구와도 가깝지 않다 | 1.97(.77) | 1.84(.71) | 3.905*** | |
|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다 | 1.94(.78) | 1.76(.73) | 5.120*** | |
|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1.93(.77) | 1.82(.73) | 3.130** | |
|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 2.07(.77) | 1.85(.72) | 6.211*** | |
| 부정정서 (1~7) | 전체 문항 평균 | 2.09(.61) | 1.88(.56) | 6.986*** |
| 짜증 나는 | 2.94(1.26) | 2.75(1.19) | 3.272** | |
| 부정적인 | 2.65(1.21) | 2.5(1.18) | 2.566* | |
| 무기력한 | 3.03(1.44) | 2.57(1.32) | 6.977*** | |
| 화가 나는 | 2.69(1.21) | 2.49(1.19) | 3.401** | |
| 전체 문항 평균 | 2.83(1.12) | 2.58(1.08) | 4.675*** | |
| 자아존중감 (1~4)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2.55(.66) | 2.74(.64) | -5.961*** |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2.45(.73) | 2.67(.71) | -6.338*** | |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 2.37(.78) | 2.57(.76) | -5.432*** | |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2.53(.71) | 2.68(.7) | -4.229*** | |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2.4(.74) | 2.62(.71) | -6.244*** | |
| 전체 문항 평균 | 2.46(.57) | 2.66(.54) | -7.347*** | |
| 삶의 만족 (1~7) | 개인적 측면 만족도 | 4.26(1.14) | 4.69(1) | -7.929*** |
| 관계적 측면 만족도 | 4.35(1.14) | 4.72(1.05) | -6.706*** | |
| 집단적 측면 만족도 | 4.31(1.11) | 4.67(1.04) | -6.887*** | |
| 전체 문항 평균 | 4.31(1.04) | 4.69(.95) | -7.694*** | |
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부정정서는 4문항, 삶의 만족은 3문항으로 측정되고 있어 각 문항을 관측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존중감은 항목묶기를 통해 3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항목묶기는 다변량정규성 가정을 충족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항목 대 개념 균형법을 사용하였다(배병렬, 2017). 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표준화계수 .6이상이며, AVE 값도 모두 .5 이상이고, CR 또한 모든 변수에서 .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별타당도는 AVE 값이 각 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검토하는데(배병렬, 2017), 변수들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07~.30의 분포를 보여 AVE 값보다 낮게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측정모형 분석 결과
| 개념 | 항목 | 비표준화계수(B) | 표준화계수(β) | 표준오차 | t값 | AVE | CR |
|---|---|---|---|---|---|---|---|
| 사회적 고립감 | 사회적 고립감1 | 1 | .884 | - | - | .707 | .878 |
| 사회적 고립감2 | .903 | .841 | .040 | 22.823*** | |||
| 사회적 고립감3 | .869 | .795 | .041 | 21.158*** | |||
| 부정정서 | 짜증 나는 | 1 | .861 | - | - | .712 | .907 |
| 부정적인 | 1.039 | .931 | .036 | 28.834*** | |||
| 무기력한 | .902 | .676 | .052 | 17.316*** | |||
| 화가나는 | .991 | .884 | .037 | 26.609*** | |||
|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1 | 1 | .755 | - | - | .630 | .836 |
| 자아존중감2 | .904 | .776 | .055 | 16.294*** | |||
| 자아존중감3 | .925 | .848 | .054 | 17.077*** | |||
| 삶의 만족 | 개인적 | 1 | .846 | - | - | .777 | .913 |
| 관계적 | 1.06 | .893 | .042 | 25.305*** | |||
| 집단적 | 1.039 | .904 | .04 | 25.699*** |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값은 p값이 .05 이하로 나타났으나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지수이므로 다른 절대적합지수를 검토하였는데 GFI가 .95 이상, RMSEA .6 이하로 확인되었으며 CFI, TLI도 모두 .95 이상이고 측정 척도에 영향을 받는 RMR 값을 표준화하여 보완한 SRMR 값 또한 .5 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4. 구조모형 분석
연구모형에 따라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의 주요 변수 간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감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부정정서를 높이며, 삶의 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정정서는 삶의 만족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감에서 시작되는 경로의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감에서 자아존중감으로 향하는 경로는 -.463, 부정정서로의 경로는 .477로 상당히 높은 절댓값을 보이고 있다. 노년기 사회적 고립감, 부정 정서,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다른 변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 자아존중감은 모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는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화계수는 사회적 고립감 -.134, 부정정서 -.183, 자아존중감 .460으로 나타났다.
표 8
구조모형 경로계수
| 경로 | 비표준화계수(B) | 표준오차 | t값 | 표준화계수(β) | ||
|---|---|---|---|---|---|---|
| 사회적 고립감 | → 자아존중감 | -.436 | .019 | -22.374*** | -.463 | |
| → 부정정서 | .830 | .033 | 24.926*** | .477 | ||
| → 삶의 만족 | -.205 | .033 | -6.154*** | -.134 | ||
| 부정정서 | → 삶의 만족 | -.160 | .016 | -9.721*** | -.183 | |
| 자아존중감 | → 삶의 만족 | .745 | .035 | 21.517*** | .460 | |
| 통제 변수 | 성별 | → 삶의 만족 | .007 | .030 | .227 | .004 |
| 연령 | → 삶의 만족 | -.004 | .002 | -2.388* | -.044 | |
| 최종학력 | → 삶의 만족 | .107 | .033 | 3.238** | .061 | |
| 개인소득 | → 삶의 만족 | .055 | .032 | 1.715 | .028 | |
구조모형의 적합도 또한 χ2값은 p값이 .05 이하로 나타났으나 GFI, TLI, GFI가 모두 .95 이상, RMSEA .6 이하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을 보였고, SRMR은 .052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로 판단되는 .05는 약간 초과하였으나 .08 미만이므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표 9
구조모형 적합도
| χ 2(df) | CFI | TLI | GFI | SRMR | RMSEA |
|---|---|---|---|---|---|
| 1039.548(104), (p=.000) | .968 | .958 | .962 | .052 | .051 |
경로계수에서는 각 경로의 직접효과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간접경로를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효과 분해하였으며 경로의 유의성은 붓스트레핑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를 분해한 간접효과 또한 사회적 고립감이 부정정서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사회적 고립감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부정정서를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경로를 통해 삶의 만족을 감소시킨다고 해석 될 수 있다.
표 10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효과 분해
| 효과 구분 및 경로 | 비표준화계수(B) | p | |
|---|---|---|---|
| 직접효과 | 사회적 고립감 → 삶의 만족 | -.205 | .003 |
| 간접효과 | 사회적 고립감 → 부정정서 → 삶의 만족 | -.133 | .002 |
| 사회적 고립감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 | -.325 | .001 | |
| 총효과 | -.663 | .002 | |
5.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주요 변수의 평균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므로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은 둘 이상의 집단에서 경로계수의 차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분석으로(우종필, 2012) 이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나타난 모든 경로를 비교하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두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을 먼저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시한다. 따라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집단의 측정모형에서 비제약 모델과 각 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모델을 비교하였다. 두 모델의 자유도 차이는 9이고, χ2 값의 차이가 14.228로 분포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16.92보다 작으며, 그 외의 적합도 차이 또한 미비한 수준이므로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11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집단의 측정동일성 검증
| 구분 | χ2(df) | CFI | TLI | GFI | SRMR | RMSEA |
|---|---|---|---|---|---|---|
| 비제약 모델 | 605.702(118), P=.000 | .982 | .976 | .970 | .047 | .036 |
| 요인부하량 제약모델 | 619.930(127), P=.000 | .982 | .977 | .970 | .043 | .035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별 모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표준화계수의 절댓값을 비교한 결과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감은 삶의 만족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표준화계수의 절댓값이 다인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구원 간 교제를 대신하여 외부활 동으로 삶의 만족을 채워왔던 1인 가구 노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고립을 경험하고 답답함과 우울감이 증폭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박지현, 이미혜, 2021). 1인 가구 대상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은 중요한 변수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으며(윤지영, 이소영, 2022) 홍성표, 임한려(2022)의 연구에서는 2017~2020년까지의 중고령층을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구분없이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차이는 뚜렷하지는 않으나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미치는 영향력의 수치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집단의 경로계수 비교
| 경로 | 1인 가구 | 다인 가구 | 집단 간 차이 t값 | ||||||
|---|---|---|---|---|---|---|---|---|---|
| 비표준화 계수(B) | 표준화 계수(β) | t값 | 비표준화 계수(B) | 표준화 계수(β) | t값 | ||||
| 사회적 고립감 | → 자아존중감 | -.450 | -.500 | -9.623*** | -.421 | -.439 | -19.380*** | .566 | |
| → 부정정서 | .946 | .541 | 11.577*** | .809 | .457 | 21.744*** | -1.517 | ||
| → 삶의 만족 | -.482 | -.309 | -5.190*** | -.157 | -.103 | -4.421*** | 3.269** | ||
| 부정정서 | → 삶의 만족 | -.106 | -.119 | -2.432* | -.159 | -.185 | -9.087*** | -1.122 | |
| 자아존중감 | → 삶의 만족 | .555 | .320 | 6.104*** | .772 | .486 | 20.683*** | 2.206* | |
| 통제 변수 | 성별 | → 삶의 만족 | -.220 | -.082 | -2.067* | .011 | .006 | .337 | 2.076* |
| 연령 | → 삶의 만족 | -.001 | -.008 | -.190 | -.004 | -.044 | -2.201* | -.620 | |
| 최종학력 | → 삶의 만족 | .088 | .033 | .772 | .089 | .053 | 2.611** | -.418 | |
| 개인소득 | → 삶의 만족 | .116 | .035 | .907 | .061 | .033 | 1.795 | .011 |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각각 효과 분해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표 13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집단의 효과 분해
| 효과 구분 및 경로 | 1인 가구 | 다인 가구 | |||
|---|---|---|---|---|---|
| 비표준화계수(B) | p | 비표준화계수(B) | p | ||
| 직접효과 | 사회적 고립감 → 삶의 만족 | -.482 | .002 | -.157 | .002 |
| 간접효과 | 사회적 고립감 → 부정정서 → 삶의 만족 | -.101 | .016 | -.129 | .002 |
| 사회적 고립감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 | -.250 | .002 | -.325 | .002 | |
| 총효과 | -.832 | .002 | -.611 | .002 | |
Ⅴ. 결론 및 제언
김성아 외(2023)의 연구에서는 노년기가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률이나 사망률이 높은 시기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으로 발생한 주요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한은 취약성이 높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어왔음을 밝히고 있다. 2020년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의 94%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게 되었고, 정책적인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타인과 만남을 자제하기도 하였다(박지현, 이미혜, 2021). 이후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길어지고, 타인과 만남이 차단된 삶은 지속되었으며 고립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노년기의 취약성을 강화시킨 2021년을 특정하여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고립에 더욱 취약한 1인 가구를 함께 사는 가구원이 있는 다인 가구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가 높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1인 가구가 생애주기의 특성에 따른 어려움뿐 아니라 가구형태로 인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은나, 이민홍(2018)의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혼자 생활하는 것은 신체적, 인지적 건강보다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 또한 1인 가구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제1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정부의 1인 가구 노년층 대상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은둔형 독거노인 사례관리 강화 등 심화된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현재 제2차 기간(2018~2022년)이 종료되었으므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과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등 해당 기간에 추진되었던 다양한 사업들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에 효과를 보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실천적 수행이 함께 협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고립감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은퇴 후 부적응, 가정환경, 도움 지원 체계의 부족 등 다양한 지지체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며, 고립의 상태가 지속되고 사회적 관계에 실패하는 경험이 누적되면 사회적 고립은 만성화된다(고숙자 외, 2023). 또한 나이가 들어 노년기를 향해 갈수록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의 강도는 강해지게 된다(Pettigrew et al., 2014). 코로나19 시기에는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었으며(김성아 외, 2023) 이미 형성되어 있던 관계들도 교류가 줄어들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제한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도 차단되었다(박지현, 이미혜, 2021). 이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던 항목은 1인 가구에서는 “나는 혼자인 것 같다”, 다인 가구에서는 “사람들과 교류/교제가 부족한 것 같다”로 나타나 사회적 교류와 관계 맺음 차원에서의 고립감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으며,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서 느끼는 사회적 고립이 다른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1인 가구 노인의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년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형태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인 가구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해 독거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고립감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23년 5월, 우리나라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이 있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력이 잔재해 있으며,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잠재적 위험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김성아 외, 2023).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관계적 위기와 코로나19 기간에 더욱 취약해진 노년층의 관계망 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의 사회적 고립감은 만성화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 감소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직접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의 노인은 스스로 혼자라고 느끼는 감정을 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수준이 다인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1인 가구 노년층에게 더욱 집중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경상남도 고성의 한 지역 신문(고성시사신문, 2022)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던 2022년 3월 말,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사회관계망 향상을 위한 독거노인 관계 형성 프로그램 ‘다시봄 어깨동무’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단순한 단체 여가활동이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짝꿍 맺기, 약속 정하기, 약속 실천하기 등 직접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해 가는 과정을 훈련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요리교실에서도 본인이 요리를 하고 개인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 밑반찬 나누기를 통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지나가며 인사만 하던 관계가 친구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학습하고 이웃과 관계 맺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비스 제공 실천 현장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단체활동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면, 노년기 사회적 관계의 실패를 줄이고 고립의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 사회적 고립감 감소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두 번째 제안은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큰 변화 중 하나는 비대면의 일상화로, 코로나19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일상적 비대면 생활양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시되어왔다(김승보 외, 2021). 정보통신기기는 비대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며, 노년층을 위한 활용의 유용성은 지역사회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대면 상호작용을 확대한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노년층을 위한 ICT 기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관한 이슈는 복지와 과학의 융합 영역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 국내에서 진행된 ICT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 국제 심포지엄 자료(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8)에서는 노년층의 고립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현황과 전망, 한국형 모델 개발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례 중에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된 토이봇 “효돌”이 소개되었는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알람뿐 아니라 감성적인 음성 대화가 가능하며, 보호자 육성의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정서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외로움 해소와 삶의 만족 향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감 항목 중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높았던 1인 가구 노인들이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감소하고 더불어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 가구에 비해 다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연구 결과의 맥락을 고려하면 독거노인을 위한 토이봇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토이봇 외에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상호작용은 코로나19 시기 노인에게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지인들과 연결해주는 대체 수단이 되었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대면과 비대면 혼합방식을 선택하면서 기관 이용률이 높은 노년층의 정보통신기기 활용이 크게 확산되었다(김성아 외, 2023).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이아영,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SNS 이용량이 증가하였는데 노년층은 증가의 이유로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대면 만남이 비대면 만남으로 전환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가족과의 만남을 비대면 만남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가족 간 비대면 만남인 화상 통화를 활용한 상호작용은 외로움 감소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Tsai et al., 2020), 비대면으로라도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상황은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는데 어유경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은 단기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이 감소하였으며, 일부 이용자에게는 외로움 감소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노년층은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비대면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기기 활용 방법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사회복지 현장은 온라인 화상교육 및 모임을 실시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개별 방문을 통해 디지털 기기의 활용법을 교육하는 등 더욱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배움터 등과 같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기기 개발 과정에서도 노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왔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3). 비대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만 구성된다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노력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학습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초고령 노인과 같은 대상에게 비대면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면 교류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Dahlberg, 2021) 이를 인식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보조적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정서지원을 인간이 아닌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대면적 사회관계를 차단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숙고해야할 것이다(Cross et al., 2019).
셋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고립감과 삶의 만족 사이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고립감이 감소되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도 노년기의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을 고려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로들은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가구 형태에 상관없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1인 가구에 비해 다인 가구에서 그 영향력이 컸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홍성표와 임한려(202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2016~2020년까지의 종단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한 최정현과 최소연(2021)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가장 큰 차이는 조사 시기이므로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요인이 결과의 차이를 작동시킨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돌봄 변화를 살펴본 보고서(김성아 외, 2023)에서도 1인 가구의 돌봄 공백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다인 가구의 돌봄 공백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공적서 비스 접근성이 유지되었지만 다인 가구에서는 가족 돌봄의 의존도가 높아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미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며 공적서비스 지원을 받아온 1인 가구와 다르게 가족 의존도가 높았던 다인 가구의 노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공백을 크게 경험하게 되면서 돌봄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 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다수의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독거노인의 취약성 고려가 분명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다인 가구의 노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까지 독거노인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전환 및 통합되어 획일적 대상이 아니라 조손, 고령부부 가구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대상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4).
앞서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관해 모색하였지만, 노년층이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험하는 은퇴, 지인들의 사망 등으로 인한 주변 관계 변화 상황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차단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된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고립 상황이 오더라도 높은 부정정서가 표출되지 않고, 자아존중감이 충분하다면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삶의 만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부정정서 감소와 자아존중감 증가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노력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고립 위기 상황에서도 노년층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기의 부정정서를 축소하고 자아존중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서지원에 초점을 맞춘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부정정서에 관한 다른 특징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으로 1인 가구에서 부정정서가 높지만 1인 가구에서는 “무기력한”의 정서가, 다인 가구에서는 “짜증 나는”의 부정정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부정정서는 개인이 가진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정서적 접근은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중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의 정서지원 서비스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21)에서는 고립 고위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 위기개입 지원 등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정서지원 특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이를 확대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화서비스는 가족, 이웃과 단절되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위험군을 발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담사회복지사가 개별 맞춤형 방문 및 상담을 진행하면서 6개월 단위로 이용자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재사정과 종결은 사례실무회의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4).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년기는 청년기에 비해 인지적 재해석을 사용하여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므로(Opitz et al., 2012), 노인의 정서를 지원하는 인력은 노년층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상담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에서 제시하는 단순한 양적확대 차원의 정책적 제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 현장에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투입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4)에 따르면 전담사회복지사 의 인건비는 경력 4년 이상이 되면 모두 동결되고 있어 경력직 종사자 채용 및 전문성이 축적된 장기 근속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운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전담사회복지사와 투입 인력에게 제공되는 교육 또한 제한적인 수준이다. 물론 특화서비스의 이해가 포함된 필수 직무교육이 존재하지만, 진행되는 교육들은 대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배움터”라는 종사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면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을 보인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서비스인 정서지원은 일반적으로 호칭하는 말벗 서비스이며, 허수정(2023)의 연구에서는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말벗과 안전 확인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일반 돌봄군의 81.9%가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정서지원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생활지원사이지만, 노인일자리 인력 등 지원인력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있도록 제시하고 있어(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4),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서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지원사의 정서지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 지원인력의 방문 전 교육이 필수적이다. 현재 일률적 비대면 교육으로 제공되는 직무교육은 종사자들의 교육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질 높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실습이 포함된 대면 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4)에서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현장에 직접 투입될 수 있다고 제시된 만큼 현재 서비스 제공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인력이 실제 현장에 투입하기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노인 돌봄지원기관과 광역지원기관이 관련 교육들을 개발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 운영비 지원과 함께 현장의 적극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예컨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관한 종사자의 욕구를 검토하여 현장 중심형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의 서비스 효과성을 점검할 수 있는 척도와 지침을 제시하여 수행기관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서비스 제공 숫자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차원의 효과성을 검토함으로써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아통합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보고되고 있으므로(남상훈 외, 2024), 종사자의 지원 역량강화를 통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정서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
노년기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실제 노년층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는 아동, 청소년기에 활발하게 논의되며 노년기에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인지적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이 더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년기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현장의 적용은 예술치료, 운동이나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준으로 수행 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제한적으로 효과성을 밝혀왔다(곽아람 외, 2015). 그 외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엄인영, 이외승, 2022; 장경오, 2023), 자원봉사(민장배, 송진영, 2021)와 같은 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감이 자아존중감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실천적으로는 노년층의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줄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노년기 삶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관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노년기 자살과 고독사의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나라로 전환되 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심각했던 코로나19 확산 시기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여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제한점도 존재한다.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물론, 이를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해당 요인들을 포함하였으나 이미 구축된 패널데이터라는 한계로 포함되지 못한 변수들이 존재하며 통제변수의 수준으로는 해당 요인으로 인한 차이를 분석해내기 어렵다. 특히, 노년기는 전기와 후기의 특성이 다르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성혜연, 2021) 관련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향후 진행된다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기적 제한으로 인해 2021년을 코로나 확산기로 지정했을 뿐 종단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관련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관련 조사는 4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2025년에는 코로나19 안정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 조사된 다양한 자료들은 2024년 이후 순차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과 확산기, 안정기의 노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 자아존중감 등 정신건강 차원의 현황을 확인하여 노년층의 삶의 만족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2022. 4. 1,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다시봄 어깨동무’ 프로그램 시행, 고성시사신문, , https://www.gsc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52, .
. 2023. 1. 25,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 '제2의 인생' 노후 대비법, JTBC,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2152, .
. (2018. 10. 5). ICT 기반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http://www.1661-2129.or.kr/sub04/detail040303.do?page_index=1&b_seq=6708&b_detail=title&b_search=
. (2023. 11. 27.). 은퇴 후 '이만큼' 있어야... 노후 준비의 현실. YTN. https://www.ytn.co.kr/_ln/0134_202311271108122442
. (2021. 1. 27). [기획] SNS와 코로나19 이후 인간관계.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https://hrcopinion.co.kr/archives/17482
. (2023. 12. 12).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list_no=428414&act=view&mainXml=Y
. (2023. 10. 9). 연구자가 직접 댓글에 대답합니다! 노인비대면사회서비스 댓글 Q&A [동영상]. 한국보건복지인 재원 홈페이지.. https://csp.kohi.or.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73&q_bbscttSn=20231009224003393
, , & (2008). Animal-assisted therapy and loneliness in nursing homes: use of robotic versus living dog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9(3), 173-177. [PubMed]
(2021). Lonelin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ging& Mental Health, 25(7), 1161-1164. [PubMed]
, & (1981). Psychosocial differences between elderly volunteers and non-volunte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3), 205-213. [PubMed]
(2022). Soziale Isolation: Ursachen, Folgen & Tipps gegen Einsamkeit. https://www.selfapy.com/magazin/depression/soziale-isolation
, , , , & (2021). The Roles of Life Satisfaction and Community Recreational Facil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Clinical Gerontologist, 45, 376-389. [PubMed]
, , , & (2019). Social isolation undermines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32, 1283-1292. [PubMed]
(2023). Our epidemic of loneliness and isolation.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on the Healing Effects of Social Connection and Community 2023.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surgeon-general-socialconnection-advisory.pdf
, , , & (2012). Prefrontal mediation of age differences in cognitive reappraisal. Neurobiology of aging, 33(4), 645-655. [PubMed]
, , , & (2014). Older people's perceived causes of and strategies for dealing with social isolation. Aging & mental health, 18(7), 914-920. [PubMed]
, , , , , & (2014). Prevalence of Social Isolation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by Differences in Household Composition and Related Factors: From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in Urban Japan.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6(5), 807-823. [PubMed]
, , &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7-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4-11-19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11-28

- 6133Download
- 6751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