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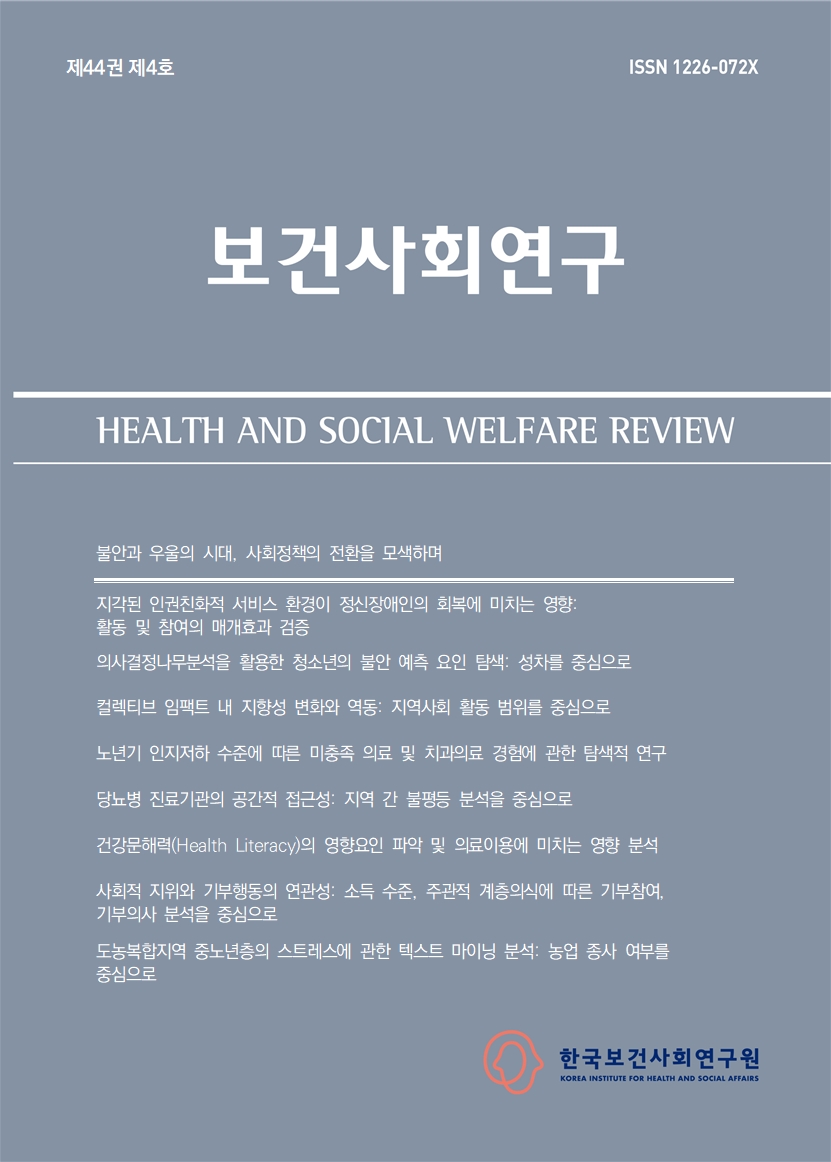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Blood Redonation and Repeated Blood Donation
Kang, Chulhee1; Cho, Juhee1*
보건사회연구, Vol.44, No.4, pp.249-271, 29 November 2024
https://doi.org/10.15709/hswr.2024.44.4.249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본 연구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발전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총 37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헌혈 및 반복헌혈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의약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론적 기반은 계획된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제한되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 및 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기 특성 요인, 경험·만족 요인, 가치·비용 요인, 환경적 요인, 기타 헌혈 촉진 요인, 부작용 요인 등 7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영향요인들이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과 행동 사이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기도 하고, 상반된 방향의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헌혈 지속성을 둘러싼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과 행동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반영한 보다 엄밀하고 정교한 새로운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chie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blood redonation and repeated blood donation. Major social science databases were used for the literature search, which was conducted from July 22 to August 16. The inclusion criteria were : (i) studies involving participants with at least one blood donation experience, (ii) studies in which blood donation intention and behavior were designat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iii) empirical studies on blood donation intention and behavior. Following the PRISMA guidelines, 37 articles were selected through the screening process and included in the analysis after a QualSyst evalua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 Research on blood redonation and repeated blood donation has been actively conducted since the 2000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t was also observed that studies often measured intention and behavior using singleitem questions or by focusing solely on donation behavior. After analyzing seven major categories of influencing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tended to be similar and different between the intention and behavior to the blood redonation and repeated blood donation. This study is limited by the fact that the criteria for the literature search were se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which may have excluded some relevant literature. Neverthel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and summarizes the body of research on blood redonation and repeated blood donation, enabl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suggesting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초록
본 연구는 이타적 행동의 가장 순수하고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헌혈, 그 중에서도 헌혈의 지속성을 대표하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주목하면서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종합적 이해를 모색한다. 문헌 검색을 위해 주요 사회과학문헌 DB를 활용하였고,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였다. 선정기준은 ① 1회 이상 헌혈 참여자 대상 문헌 ② 헌혈 의향 및 행동을 종속변수로 다룬 연구 ③ 실증적 연구였다. PRISMA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별과정을 통해 37편이 선정되었으며, QualSyst 평가를 통해 37편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재헌혈 및 반복헌혈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계획된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향과 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단일문항 또는 행동 여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영향요인을 크게 7가지로 범주화해서 분석한 결과,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과 행동 사이에서 영향요인들이 유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차이를 갖는 경향도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 검색 과정에서 그 기준을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했다는 점에서 누락된 문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그간 진행되어온 재헌혈 및 반복헌혈 연구들을 분석·정리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Ⅰ. 서론
이타적 행동이란 타인을 위한 배려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동(Baston, 1998; Krebs & Van, 1994; Thompson & Gullone, 2003)을 의미한다. Titmuss(1970)가 강조하듯이, 이타적 행동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이란 결과를 가져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확장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발전의 근간이 되는 행동이다. 즉 타인에게 유익함을 제공하는 이타적 행동은 개인의 나누는 기쁨과 공동체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사회의 전체적 안녕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타적 행동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형태의 타인 유익 행동 중 헌혈은 건강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타인을 살릴 수 있는 생명 나눔으로서 직접적 보상 없이 자신의 혈액을 타인을 위해 기증한다는 측면에서 기부나 자원봉사와는 다소 다른 속성의 이타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Titmuss(1970)는 그의 저서 ‘선물관계’에서 미국과 영국의 헌혈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헌혈이 돈으로 사고파는 교환이 아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의의 행동으로 행해질 때, 보다 높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논의한다. 더 나아가서 자발적 헌혈이 가장 순수하고 전형적인 이타적 행동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오늘날 다양한 질병과 인구 고령화 등을 이유로 혈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학 기술의 발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물질로 대체하기 어려운 혈액 확보의 문제와 관련해서 헌혈은 여전히 타인의 건강회복과 생명에 기여하는 타인 유익의 대표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혈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대표적 나눔행동이다. 2023년 한 해 총 헌혈실적은 2,776,291 건이고, 헌혈자 수는 1,330,774명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감소세이긴 하나(대한적십자사, 2023), 여전히 작은 규모의 참여가 아니다. 헌혈의 양상을 국민 헌혈률1)로 보면 5.41%이고, 헌혈가능인구 대비 헌혈자 비율2)로 계산하면 3.35% 정도이다.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적정 보유량(5일)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으로 제시되는 5.7일 정도인 상황이다3).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4)해서 다수가 헌혈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반복적으로 헌혈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강조되나, 헌혈에 대한 이해의 체계가 온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재헌혈 혹은 반복헌혈 의 중요성이 큰데, 이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재헌혈 혹은 반복헌혈의 영향 요인을 엄격하게 파악해 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간 헌혈 경험자의 헌혈 지속성과 관련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고, 각 연구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논의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연구들이 어떤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어떠한 측정 방식과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관련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헌혈 행동과 관련된 이해를 제고시키면서 향후 과제들을 정리해 볼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연구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헌혈 경험자의 지속적인 헌혈 및 반복적 헌혈 행동에 초점을 두면서 국내외 연구들을 수집하여 전반적 특성과 더불어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해보고자 한다. 개별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은 기존 연구물 각각이 제시하는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시키고 이해의 저변과 깊이를 확장 및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Cumpston et al., 2019). 특히 헌혈 행동의 지속성, 구체적으로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5)에 초점을 두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의 연구는 주제에 대한 지식의 통합을 통해 재헌혈 및 반복헌혈 행동에 관한 향후 연구의 논리적 토대로도 작용할 수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을 선택한 본 연구가 포괄하는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문헌들의 일반적 특성을 연도, 저자, 분야, 국가, 연구설계 및 자료유형, 표본크기, 종속변수, 분석 방법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이전 연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구축한다. 둘째, 연구 대상 문헌에서 적용한 이론적 기반을 검토한 후 측정 방식 및 도구에 관해 정리하면서 이전 연구의 이론 기반과 측정에 대한 이해를 구축한다. 셋째,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피는 과정에서 종속변수를 헌혈 의향 및 행동으로 세분화시킨 후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정리하여 이전 연구에서 제시되는 핵심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적 노력과 정리를 통해 그간 진행되어온 재헌혈 및 반복헌혈 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함의와 연구 방향 및 과제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헌혈 행동 이해의 패러다임 : 순수 이타적 행동과 비순수 이타적 행동
헌혈 행동은 전통적으로 순수한 이타심에서 비롯되는 행동으로 이해된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가 바로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인 Titmuss이다. Titmuss(1970)는 헌혈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 행해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으로서 타인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이타적 행동이라 말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타인 유익의 행동은 사회의 건강함과 발전을 이끄는 유익함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화시키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프레임의 설계에서 순수함의 창출에 보다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부 행동과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설명에서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Pure Altruism Model’ 즉 순수 이타성 이론이 헌혈 행동에 대한 이해의 패러다임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즉 헌혈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타인 유익 행동은 타인과 사회의 유익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공익을 제고 및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공익을 향한 순수한 이타적 행동이란 것이다.
그러나 1990년 순수한 이타성에 대한 교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에서 주도적으로 제시되는 ‘Warm Glow Theory’ 즉 따뜻한 빛 이론(Andreoni, 1989 & 1990; List et al., 2019)은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혈뿐만이 아니라 기부나 및 자원봉사 등의 자선 활동을 할 때, 그들 행동의 이면에서 타인을 돕거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에서 얻는 정서적 만족감이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즉 ‘따뜻한 빛’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으로부터 얻는 정서적 보상을 중심으로 그러한 행동을 실행하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돕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따뜻한 느낌이 헌혈과 같은 행동의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라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헌혈 등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나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란 것이다. 구체적으로 ‘따뜻한 빛’ 이론은 사람들이 헌혈 등의 타인 유익 행동을 하는 그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동인이 행동의 저변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정서적 보상이다. 사람들이 헌혈 등의 행동을 통해 받게 되는 감정적 만족감이나 긍정적인 기분이 타인 유익 행동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 사람들이 헌혈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로,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도덕성을 확인하고, 스스로가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인정이다. 종종 사람들이 헌혈 등의 행동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를 갖고 타인 유익 행동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헌혈자들은 자신이 기여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사회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거나 명성을 쌓으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이타적 행동 이론, 즉 ‘순수 이타성’ 패러다임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행복을 위한 순수한 관심을 토대로 공익적 목적을 갖고 타인 유익 행동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에 반해, ’따뜻한 빛’ 패러다임에서는 헌혈 등의 타인 유익 행동은 자신의 정서적 만족 추구 과정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즉 후자 패러다임의 경우에는 헌혈 등의 행동이 순수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되기보다는 ‘joy of giving’ 즉 나누는 기쁨이 발현되어 행해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impure altruism’ 즉 순수하지 않은 이타성 패러다임으로 명명된다.
Ⅲ. 헌혈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동향
이타적 행동의 일환인 헌혈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헌고찰 연구들도 진행돼 오고 있다. 다음에서는 헌혈과 관련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먼저 Ferguson(1996)은 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헌혈 행동을 예측해 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들을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헌혈 행동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이론적 틀을 도출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문헌고찰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서 정리하는 바와 같다. 성별이라는 특정 요인에 주목하면서 성별에 따른 헌혈 행동 차이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해보는 연구(Bani & Giussani, 2010; Carver et al., 2018), 헌혈 관련 문헌에서 논의되는 헌혈의 주요 동기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보는 연구(Bagot et al., 2016; Rodrigues et al., 2023),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가 헌혈 행동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보는 연구(Chell et al., 2018; Niza et al., 2013), 특정 국가 혹은 소수 인종의 헌혈 유지 저해 혹은 촉진 요인에 초점을 두어 이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하는 연구(Alanazi et al., 2023; Klinkenberg et al., 2019; Makin et al., 2019), 혈장 헌혈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서 이를 전혈 헌혈 연구결과들과 비교해보는 연구(Beurel et al., 2017),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헌혈에 대한 태도나 인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헌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보는 연구(Getie et al., 2021; Santos et al., 2019; Thorpe et al., 2024), 헌혈을 촉진하는 다양한 개입의 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Godin et al., 2012; Southcott et al., 2022)등이 발표되어 왔다.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헌혈 및 수혈 절차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국내 문헌을 토대로 최일영 외(1990)가 수행한 문헌고찰 연구가 헌혈에 대한 유일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헌혈 행동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의 연구들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들 연구는 대체로 헌혈 참여에 초점을 두며 참여의 결정요인을 정리하는 연구 및 헌혈 참여 활성화 모색을 위한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헌혈 유지 및 지속과 관련된 문헌고찰 연구들도 일부 실행되긴 했으나 이들 연구는 주로 특정 국가의 상황 혹은 특정 요인의 영향에 주목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즉,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모색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성을 지닌다. 따라서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헌혈 행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이해 구축의 토대가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
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헌 선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포괄적인 문헌 검토를 위하여 게재 시점에 대한 별도 제한은 두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선정의 체계성과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과정의 국제적 표준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삼았다. 문헌 선별 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문헌 식별(Identification) 과정을 거쳐 해당 문헌을 확인하였다. 문헌 검색을 위해서는 국내외 주요 사회과학 문헌 데이터베이스인 교보문고 스콜라, DBpia, Google 스콜라, KISS, RISS, Scopus를 활용하였으며6), 검색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였다. 문헌검색을 위한 검색어 및 조건은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먼저, 검색 키워드는 국문 문헌의 경우 ‘재헌혈’, ‘반복 and 헌혈’, ‘헌혈 and 유지’, ‘헌혈 and 지속’, ‘헌혈 and 재참여’ 설정하였고, 해외 문헌의 경우 ‘blood and redonation’, ‘repeat/repeated and blood donation and blood donors’, ‘frequent and blood donation’, ‘experienced and blood donors’, ‘retention and blood donation’ 등을 조합하여 검색어 중 하나라도 그 내용을 포함한 문헌을 선정하였다. 검색조건은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 등이 포괄된 전체로 설정하였으며, 논문 게재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검색 대상이 되는 논문의 게재 기간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단, 검색 기간을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로 한정할 때 해당연도의 모든 관련 학술자료가 포괄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하기에, 2024년 논문은 제외하였다.
표 1
검색어 및 검색조건
| 검색어 | 국내논문 | ‘재헌혈’ ‘반복 and 헌혈’ ‘헌혈 and 유지’ ‘헌혈 and 지속’ ‘헌혈 and 재참여’ |
| 해외논문 | ‘blood and redonation’ ‘repeat/repeated and blood donation and blood donors’ ‘frequent and blood donation’ ‘experienced and blood donors’ ‘retention and blood donation’ | |
| 검색조건 | 전체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 등 포괄) | |
| 검색기간 | 별도 설정하지 않음 (2024년 논문은 제외) | |
검색 결과에 따라 최초 확인된 문헌은 국문 논문 26편, 해외 논문 330편으로 총 356편이었다. 이후 중복된 문헌 42편과 회색문헌(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연구보고서 등) 12편,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헌 54편, 2명의 저자가 제목 및 초록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 내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문헌 93편을 제외하였다.이런 방식을 통해 선정된 총 155편의 문헌에 대해 2단계인 ‘선별(Screening)’ 과정을 거쳤다. 원문이 확보되지 않은 9편의 문헌7)을 배제한 후, 총 146편의 문헌에 대해 문헌 선정 및 배제기준을 토대로 원문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문헌 115편을 추가적으로 배제하였다. 선정기준에서는 ① 1회 이상헌혈에 참여한 헌혈자를 연구 대상에 포함한 문헌 ② 헌혈 의향 및 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 ③ 헌혈 의향 및 행동에 대한 통계적 영향력 혹은 연관성을 파악한 실증연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문헌의 배제기준에서는 ① 비헌혈자(일반시민 등)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문헌 ② 헌혈 의향 및 헌혈 행동이 아닌 제3의 변수만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 ③ 헌혈과 관련된 정책, 동향 분석, 문헌연구 및 질적연구 등 실증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눈덩이 표집(snow balling) 전략도 사용하여 문헌을 추가하였다. 즉, 선별 과정에서 포함된 문헌의 참고문헌 중 연구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이전 단계에서 배제된 논문을 재검토하여 6편의 문헌을 추가로 포함했다. 문헌 선정을 위해 2명의 저자가 독립적으로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선정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연구자 간 합의 방식을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지게 했다. 마지막 3단계인 ‘포함(Included)’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총 37편의 문헌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 문헌 선정의 전 과정과 그 결과는 [그림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2. 논문의 질 평가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문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캐나다 의료연구재단 AHFMR(Alberta Heritage Foundation for Medical Research)에서 개발한 비뚤림 위험 평가 도구인 QualSyst(checklist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quantitative studies)를 활용하였다. QualSyst는 양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 다양한 연구 설계에 적용 가능하며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어 있다.
QualSyst 평가 도구는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항목은 연구의 주요 측면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평가 항목에는 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설계, 대상자 선정 및 기술, 표본 크기, 측정 도구, 분석 방법, 혼란 변수 통제, 결과 보고, 결론 등에 대한 적절성 및 충분성을 포괄하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해 기준을 충족하면 2점, 부분적으로 충족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총점을 구하고 이를 항목의 수로 나누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QualSyst 평가를 위해 먼저 최종 선정된 문헌 중 5편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평가자 간 일치도를 확인하고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를 조율하였다. 이후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37편의 문헌에 대해 QualSyst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자 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일치도는 Cohen’s Kappa 계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0.8 이상의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평가 결과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두 연구자가 함께 해당 문헌을 재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문헌에 대한 최종 QualSyst 점수를 계산한 결과, 37편의 문헌 모두 QualSyst 최저 한계점수인 0.55점8)을 상회하여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37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적용된 이론적 모델, 측정 방식 및 도구 그리고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을 실행하였다.
3. 분석 방법
재헌혈 및 반복헌혈을 다룬 국내‧외 문헌 37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여 관련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먼저,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헌 추출 작업을 수행하였다. 각 문헌의 저자, 게재연도, 제목, 국가, 연구설계, 분석 방법 등의 기본 정보들을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교차 검증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37편의 문헌에 대해 9가지 기준, 즉, 게재연도, 저자, 연구 분야, 국가, 연구 설계, 자료 유형, 표본크기, 종속변수 및 통계적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각 속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재헌혈 및 반복헌혈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문헌의 이론적 기반과 측정 방식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속 변수를 헌혈 의향과 실제 헌혈 행동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영향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에 초점을 두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Ⅴ.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최종 분석에 포함된 문헌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분석 대상인 37편의 문헌은 모두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으로 해외 논문 30편, 국내 논문 7편으로, 해외 논문이 네 배 정도 더 많았다. 국가별로 정리해보면, 총 14개국에서 발간되었는데, 미국이 9편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7편, 네덜란드 4편, 중국, 캐나다와 호주 각 3편, 가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 이란, 이탈리아, 탄자니아, 프랑스 각 1편이었다. 게재연도를 살펴보면, 헌혈센터에 등록된 헌혈자를 중심으로 반복 헌혈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1988년도 논문이 시작점이었고, 이후 논문은 1990년대 1편, 2000년대 12편, 2010년대 18편, 2020년 이후 게재된 것은 5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 분야를 보면, 의약학(간호학, 임상의학 등) 27편, 사회과학(사회학, 심리학, 지리학 등) 7편, 공학(산업공학) 2편, 복합학(학제간 연구) 1편이었다. 즉, 의약학 분야의 연구 비중이 가장 높긴 하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설계의 내용을 보면 횡단연구 21편, 종단연구 16편으로 횡단연구의 비중이 더 높다. 그럼에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재헌혈 및 반복헌혈의 속성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종단연구가 비중 있게 실행되어져 왔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자료유형에서는 1차 자료 연구가 29편으로 2차 자료 연구(8편)보다 현저히 많았다. 표본크기를 보면, 1차 자료를 활용한 경우, 최소 165명에서 최대 7,905명 수준으로 넓게 분포했다. 구체적으로는 500명 미만의 유효 표본을 갖는 연구가 16편, 50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의 연구 6편,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연구 6편, 5,000명 이상 연구 1편으로 대체로 500명 미만의 표본크기를 지닌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2차 자료를 활용한 경우, 대체로 헌혈센터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많았다. 그 규모는 최소 791명에서 최대 879,816명까지로 매우 다양했다. 10,000명 미만의 표본에 기반한 연구가 3편, 10,000명 이상의 표본은 5편이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라 할 수 있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의 의향 및 행동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결과, 헌혈 의향을 다룬 연구는 11편이었고 실제 헌혈 행동을 다룬 연구는 24편이었다. 그리고 헌혈 의향과 헌혈 행동을 모두 다룬 연구도 2편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는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로지스틱 회귀분석 10편, 다중회귀분석 8편, 베이지안·콕스·포아송·프로빗 각 1편)이 22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헌혈 의향 및 행동의 선행 요인과 매개 요인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8편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외에도 카이제곱검정(4편), 상관관계(2편), ANOVA(1편) 등이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들 연구는 통제변수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 관계에 대한 추론적 분석만을 수행한 것이어서 연구의 의미가 상당 수준 제한될 수 있다.
표 2
연구 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n=37)
| 번호 | 연도 | 저자 | 분야 | 국가 | 연구설계 | 자료유형 | 표본크기 | 종속변수 | 분석 방법 |
|---|---|---|---|---|---|---|---|---|---|
| 1 | 2023 | Epifani et al. | 공학 | 이탈리아 | 종단 | 2차 | 5,937 | 반복헌혈행동 | 베이지안 |
| 2 | 2023 | Schröder et al. | 사회과학 | 네덜란드 | 종단 | 2차 | 15,090 | 반복헌혈행동 | 포아송회귀 |
| 3 | 2022 | Hu et al. | 의약학 | 중국 | 종단 | 1차 | 751 | 반복헌혈행동 | ANOVA |
| 4 | 2022 | Pan et al. | 의약학 | 중국 | 횡단 | 1차 | 670 | 재헌혈의향 | 구조방정식 |
| 5 | 2020 | Chen et al. | 공학 | 중국 | 횡단 | 1차 | 246 | 반복헌혈행동 | 구조방정식 |
| 6 | 2019 | Ferguson et al. | 사회과학 | 영국 | 횡단 | 1차 | 309 | 반복헌혈행동 | 다중회귀 |
| 7 | 2019 | 박주영 외 | 의약학 | 한국 | 횡단 | 1차 | 165 | 재헌혈의향 | 다중회귀 |
| 8 | 2018 | Mohammed et al. | 의약학 | 가나 | 횡단 | 1차 | 350 | 반복헌혈행동 | 카이검정 |
| 9 | 2018 | 최은희, 이현수 | 복합학 | 한국 | 횡단 | 1차 | 262 | 재헌혈의향 | 다중회귀 |
| 10 | 2017 | 전신현 | 사회과학 | 한국 | 횡단 | 1차 | 293 | 재헌혈의향 | 다중회귀 |
| 11 | 2016 | Abril | 사회과학 | 미국 | 횡단 | 2차 | 791 | 재헌혈의향 | 구조방정식 |
| 12 | 2015 | Kheir & Alibeigi | 사회과학 | 이란 | 종단 | 2차 | 846 | 반복헌혈행동 | 로지스틱회귀 |
| 13 | 2015 | Mauka et al. | 의약학 | 탄자니아 | 횡단 | 1차 | 454 | 반복헌혈행동 | 로지스틱회귀 |
| 14 | 2014 | Sénémeaud et al. | 의약학 | 프랑스 | 종단 | 1차 | 410 | 재헌혈행동 | 로지스틱회귀 |
| 15 | 2014 | Wevers et al. | 의약학 | 네덜란드 | 횡단 | 1차 | 2,005 | 재헌혈행동 | 로지스틱회귀 |
| 16 | 2013 | France et al. | 사회과학 | 미국 | 종단 | 1차 | 421 | 재헌혈행동 | 구조방정식 |
| 17 | 2013 | Masser et al. | 의약학 | 호주 | 횡단 | 1차 | 1,015 | 재헌혈의향 | 다중회귀 |
| 18 | 2013 | van Dongen et al. | 의약학 | 네덜란드 | 종단 | 1차 | 1,278 | 재헌혈행동 | 로지스틱회귀 |
| 19 | 2012 | Cimaroli et al. | 의약학 | 캐나다 | 횡단 | 2차 | 30,054 | 반복헌혈행동 | 프로빗 |
| 20 | 2012 | Custer et al. | 사회과학 | 미국 | 종단 | 2차 | 665,501 | 재헌혈행동 | 로지스틱회귀 |
| 21 | 2012 | Ferguson et al. | 의약학 | 네덜란드 | 횡단 | 2차 | 12,580 | 반복헌혈의향 | 구조방정식 |
| 22 | 2012 | Masser et al. | 의약학 | 호주 | 종단 | 1차 | 256 | 재헌혈행동 | 구조방정식 |
| 23 | 2010 | Sinclair et al. | 의약학 | 미국 | 종단 | 1차 | 215 | 재헌혈행동 | 상관관계 |
| 24 | 2009 | Masser et a.l | 의약학 | 호주 | 종단 | 1차 | 182 | 재헌혈행동 | 구조방정식 |
| 25 | 2008 | Nguyen et al. | 의약학 | 미국 | 횡단 | 1차 | 851 | 재헌혈의향 | 카이검정 |
| 26 | 2008 | Schlumpf et al. | 의약학 | 미국 | 종단 | 1차 | 7,905 | 재헌혈행동 | 로지스틱회귀 |
| 27 | 2007 | France et al. | 의약학 | 미국 | 횡단 | 1차 | 227 | 재헌혈의향 | 구조정식 |
| 28 | 2007 | Godin et al. | 의약학 | 캐나다 | 횡단 | 1차 | 2,231 | 재헌혈의향/행동 | 로지스틱회귀 |
| 29 | 2006 | Chamla et al. | 의약학 | 뉴질랜드 | 종단 | 1차 | 316 | 재헌혈행동 | 카이검정 |
| 30 | 2006 | 김준현, 송현종 | 의약학 | 한국 | 횡단 | 1차 | 655 | 반복헌혈행동 | 로지스틱회귀 |
| 31 | 2006 | 정혜경 외 | 의약학 | 한국 | 횡단 | 1차 | 198 | 재헌혈의향 | 다중회귀 |
| 32 | 2005 | Misje et al. | 의약학 | 노르웨이 | 종단 | 1차 | 2,114 | 반복헌혈행동 | 카이검정 |
| 33 | 2004 | France et al. | 의약학 | 캐나다 | 종단 | 1차 | 1,052 | 재헌혈행동 | 로지스틱회귀 |
| 34 | 2003 | 홍경희, 박호란 | 의약학 | 한국 | 횡단 | 1차 | 468 | 반복헌혈행동 | 상관관계 |
| 35 | 2002 | 최미조 외 | 의약학 | 한국 | 횡단 | 1차 | 505 | 재헌혈의향 | 다중회귀 |
| 36 | 1999 | Ownby et al. | 의약학 | 미국 | 종단 | 2차 | 879,816 | 재헌혈행동 | 콕스회귀 |
| 37 | 1988 | Charng et al. | 의약학 | 미국 | 횡단 | 1차 | 658 | 반복헌혈의향/행동 | 다중회귀 |
2. 재헌혈 및 반복헌혈 관련 이론적 모델
분석에 포함된 재헌혈 및 반복헌혈 관련 37편의 문헌 중 이론적 틀을 갖고 진행한 연구는 13편이었다. 이는 다수의 연구가 미약한 수준의 이론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 연구에서 적용된 주요 이론들과 주요 개념은 <표 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3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이론적 모델
| 이론명 | 주요 개념 | 문헌번호 |
|---|---|---|
| 합리적 행동 이론 (Ajzen & Fishbein, 1980) | 태도, 주관적 규범 | [37] |
| 계획된 행동 이론 (Ajzen, 1991) |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 [3], [4], [10], [16], [18], [21], [22], [24], [27], [28] |
| 정체성 이론 (Stryker, 1968) | 역할개인 통합(roleperson merger) | [37] |
| 고객가치이론 (Kotler, 1996) | 고객 가치(제품 가치, 서비스 가치, 인적 가치, 이미지 가치), 고객 비용(금전적 비용, 시간적 비용, 정신적 ‧ 물리적 비용) | [5] |
|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 (Mcleod & Shah, 2009) | 대화 | [11] |
적용된 주요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은 1편의 문헌([37])에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합리적 행동 이론(Ajzen & Fishbein, 1980)는 개인행동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위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신념 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판단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믿는 정도 즉, 주관적 사회적 압력에 대한 인식 정도가 행동 의도를 형성함을 강조한다. Charng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이 이론을 적용하여 헌혈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재헌혈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된 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었는데, 총 10편의 논문이 이 이론(Ajzen, 1991)을 활용했다. 이 이론은 합리적 행동 이론의 연장선에 있는 이론인데, 개인의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더불어 행동의 용이성 또는 행동 수행 통제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동 의도를 형성하고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헌혈이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이 헌혈 행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연구에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와 헌혈 의향 또는 헌혈 행동과의 관계를 주로 분석하는데, 일부 연구([3], [10], [21], [22], [24], [27], [28])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확장하여 도덕적 규범, 자아정체성, 자기효능감, 예상되는 후회 등의 요인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이 이론이 적용된 연구에서는 태도([4], [10], [18], [21], [22], [24], [27])의 영향력에 대한 보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각된 행동 통제([3], [4], [16], [21], [22], [28]), 주관적 규범([16], [18], [27]) 순이었다.
행동 이론과 더불어 정체성 이론(Role Identity Theory)도 1편의 연구([37])에서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체성 이론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역할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데(Stryker & Burke, 2000), Charng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역할개인 통합(roleperson merger) 개념을 적용하여 헌혈자 정체성이 반복헌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역할개인 통합이 헌혈 의향을 통해 헌혈 행동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Kotler(1996)가 제안한 고객가치이론(Customer Delivered Value Theory)을 적용한 연구([5])도 1편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객가치이론에서는 고객에게 실제 전달되는 가치를 총 고객 가치와 총 고객 비용의 차이로 설명하면서 전달된 가치의 크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Chen, X. et al.(2020) 연구에서는 고객가치를 헌혈 맥락에 적용하였는데, 상품 가치(헌혈을 통한 정서적 경험 가치), 인적 가치 및 이미지 가치 그리고 시간적비용에 초점을 두면서 헌혈 의향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Communication Mediation Model)을 적용한 연구가 1편([11]) 있었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소비가 정치 참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화’의 매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Mcleod & Shah, 2009), Abril(2016)의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을 적용하여 헌혈 관련 대화가 헌혈 의향 및 헌혈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3.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측정 방식 및 도구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문헌에서 재헌혈 및 반복헌혈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헌혈 의향과 헌혈 행동으로 나눠서 파악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표 4>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4
재헌혈 및 반복헌혈 측정 방식 및 도구
| 개념 | 문항 수 | 측정 문항 | 문헌 번호 | |
|---|---|---|---|---|
| 의향 | 3 | 7점 Likert | [16], [24]* | |
| 3 | [27], [28] | |||
| 2 | [4] | |||
| 2 | [22]* | |||
| 행동 | 1 | 5점/4점 Likert | [7], [10], [11], [15]*, [25], [31], [37] | |
| 1 | - | [3], [14], [17], [28], [33], [36] | ||
| 1 | - | [1], [5], [6], [8], [12], [13], [14], [19], [30], [32], [34], [37] | ||
| 1 | - | [15], [20], [22], [24], [26], [29] | ||
| 1 | - | [2], [18], [23] |
먼저, 헌혈 의향을 3문항 혹은 2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향후 헌혈 의향 강도를 측정한 연구는 6편이었다. 한편, 그보다 많은 7편의 연구에서는 향후 특정 기간 내 헌혈 의향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다소 단편적인 측정 방식이라는 점에서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의 복합적인 속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상당 수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헌혈 행동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간 내 실제 헌혈을 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문헌이 6편이고, 그 전체 횟수를 측정한 문헌은 12편으로 실제 헌혈 행동으로 측정한 방식으로 연구를 행한 경우가 18편이었다. 이는 분석 대상 문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헌혈 행동에 대한 측정을 위해 일부의 연구는 헌혈 시도의 개념을 활용해서 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의학적인 이유로 헌혈을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측정은 헌혈이 실제 행해졌는지에 대한 관찰의 경우보다 헌혈 시도에 주목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특정 기간 내 헌혈 시도 여부를 측정한 논문은 6편, 그리고 시도 횟수를 측정한 문헌은 3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헌혈 시도 행동에 주목해서 이를 측정한 문헌은 총 9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관한 정리
다음에서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통계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분석 대상 문헌에서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을 크게 헌혈 의향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헌혈 행동의 측면에서 관찰하는 경향이 크기에, 다음의 정리에서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영향요인을 헌혈 의향과 헌혈 행동으로 구분해서 그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1) 헌혈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 정리
헌혈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기 특성 요인, 경험·만족 요인, 가치·비용 요인, 환경적 요인, 기타 헌혈 촉진 요인, 부작용 요인 등과 같이 7가지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요인별 하위 변수들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파악해보았다. 정리한 결과는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
헌혈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
| 구분 | 문헌 수 | 하위 변수 | 구분 | 문헌 수 | 하위 변수 |
|---|---|---|---|---|---|
| 인구 사회 학적 요인 | 5 | 자기 특성 요인 | 16 | ||
| 경험 ․ 만족 요인 | 9 | 가치 ․ 비용 요인 | 1 | ||
| 환경적 요인 | 1 | 기타 헌혈 촉진 요인 | 6 | ||
| 부작용 요인 | 3 |
주:
-
1) (+) 정적 관계, (-) 부적 관계,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n] 보고 문헌의 수.
-
2) 하나의 문헌에서 2개 이상의 영향요인을 보고한 경우가 문헌 수와 [n]의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3) [n*]은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아닌 카이제곱검증 혹은 상관관계분석 등을 통해 통계적 연관성만 보고한 문헌의 수를 의미함.
-
4) [nⁱ__]는 구조방정식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고한 문헌의 수를 뜻하며, 어떤 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함. i.e. [1ⁱ태도]는 태도라는 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보고한 문헌이 1편이라는 것을 말함.
첫째, 분석 대상 문헌에서 보고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인종, 건강 활동 등이었다. 이들 변수의 헌혈 의향에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분석 대상 논문들이 제시하는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을 위한 신체활 동만이 헌혈 의향과 유의한 영향력 혹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인종 등은 헌혈 의향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 특성 요인에 포괄되는 변수들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역할개인 통합, 도덕적 규범, 자아정체성 및 자기효능감, 헌혈 동기, 예상되는 후회 및 불안 등이었다. 자기 특성 요인을 포괄한 논문들에서는 지각된 행동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역할개인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헌혈 의향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 변수 중 특히 역할개인 통합은 헌혈 관련 대화라는 변수를 통해 그리고 도덕적 규범은 태도라는 변수를 통해 헌혈 의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와는 다르게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아정체성, 자기효능감은 헌혈 의향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관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태도, 자아정체성 및 자아효능감의 영향력의 검증 결과는 헌혈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한 논문들과 더불어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한 논문들로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혈동기는 내재적 동기를 단일차원으로 설정해서 접근하는 방식과 여러 차원으로 나눠 접근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는데, 전자의 경우 내재적 동기가 강할수록 헌혈 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타성, warmglow 및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이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 혹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관련 문헌 모두에서 외재적 동기가 강할수록 헌혈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재적 동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태도 변수를 통해 헌혈 의향에 외재적 동기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후회와 불안 수준의 경우, 예측되는 방향과 일치해서 헌혈 의향에 일관적이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경험·만족 요인은 이전 헌혈에 대한 만족도, 경험 및 횟수, 이타적 행동 참여 경험 등의 변수를 포괄하는데,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이전 헌혈 만족도와 이전 헌혈 경험은 헌혈 의향에 일관되게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전 헌혈 만족도는 태도라는 변수를 통해 그리고 이전 헌혈 경험은 헌혈 관련 대화라는 변수를 통해 헌혈 의향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전 헌혈 횟수와 이타적 행동 참여 경험 변수의 경우, 헌혈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는 문헌과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하는 문헌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가치·비용 요인과 관련해서는 고객가치이론을 기반으로 한 단 1편의 논문에서만 검증이 이뤄졌다. 헌혈 의향에 대해 헌혈 가치, 인적 가치, 이미지 가치는 정적(+)인 방향에서 그리고 시간적 비용은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가치와 비용 변수는 모두 만족이라는 변수를 통해 헌혈 의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가치, 금전적 비용, 정신적/물리적 비용은 헌혈 의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대화의 중요성을 환경적 요인으로 설정해서 그 영향력에 대해서 한 편의 연구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분석 결과 헌혈 관련 대화는 헌혈 의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헌혈 관련 대화는 정적 방향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기타 헌혈 촉진 요인 중에서는 헌혈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조언 수용이 헌혈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헌혈 관련 지식의 영향력을 검증한 논문 모두에서는 헌혈 의향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곱째, 부작용 요인에서는 헌혈 후 반응(BDR)과 바늘 통증 변수를 포괄하는데, 이들 변수는 모두 헌혈 의향에 일관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헌혈 후 반응(BDR)과 바늘 통증은 헌혈 의향에 대해 부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헌혈 후 반응은 태도라는 변수를 통해 그리고 바늘 통증은 만족이라는 변수를 통해 헌혈 의향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헌혈 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정리
헌혈 행동의 영향요인에 대한 접근은 헌혈 의향에서 관찰하는 위의 7가지 범주에 더해서 헌혈 의향 요인이 추가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즉 헌혈 행동은 총 8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각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헌혈 행동에 대한 요인별 하위 변수들의 영향력을 정리하면, <표 6>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6
헌혈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
주:
-
1) (+) 정적 관계, (-) 부적 관계,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n] 보고 문헌의 수.
-
2) 하나의 문헌에서 2개 이상의 영향요인을 보고한 경우가 문헌 수와 [n]의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3) [n*]은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아닌 카이제곱검증 혹은 상관관계분석 등을 통해 통계적 연관성만 보고한 문헌의 수를 의미함.
-
4) [nⁱ__]는 구조방정식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고한 문헌의 수를 뜻하며, 어떤 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함. i.e. [1ⁱ의향]은 의향이라는 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보고한 문헌이 1편이라는 것을 말함.
첫째, 분석 대상 문헌에서 주목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인종, 혈액형, 근무시간, 고용상태, 결혼상태, 자녀유무 및 자녀 수, 건강활동, 흡연/음주여부, 체중 등의 변수를 포괄한다. 분석 대상 논문들이 제시하는 이들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근무시간, 자녀유무, 자녀 수, 흡연/음주 여부는 헌혈 행동에 대해 부적 방향의 영향력을 갖고, 체중은 헌혈 행동에 대해 정적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혈액형, 고용상태, 결혼상태, 건강활동 등의 변수는 헌혈 행동을 설명하는 데 어느 한 방향의 일관된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인종은 관련 연구 모두에서 헌혈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기 특성 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역할개인 통합, 도덕적 규범, 자아정체성 및 자기효능감, 헌혈에 대한 신뢰, 헌혈 동기, 예상되는 후회 및 불안 등의 변수를 포괄한다. 먼저, 지각된 행동 통제, 역할개인 통합, 헌혈에 대한 신뢰는 헌혈 행동에 대해 정적인 방향에서 일관된 영향력 혹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도덕적 규범, 자아정체성 및 자기효능감은 헌혈 행동에 대해 어느 한 방향에서 일관된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는 않았다. 즉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는 논문들과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하는 논문들로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혈 동기는 앞서 살펴본 헌혈 의향 영향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재적 동기를 단일차원으로 설정해서 접근하는 방식과 여러 차원으로 나눠 접근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는데, 접근 방식에 상관없이 관련 변수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정적 방향의 영향력을 보고하였다. 다만 이타성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는 논문과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하는 논문으로 나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재적 동기의 경우 헌혈 의향에 대해 정적(+) 방향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달리 헌혈 행동에 있어서는 부적(-)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후회와 불안 수준이 헌혈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경험·만족 요인은 이전 현혈 만족도, 이전 헌혈 경험 및 횟수, 이전 헌혈 후 경과시간, 이타적 행동 참여 경험의 변수를 포괄한다. 이 요인에 속한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전 헌혈 만족도와 이전 헌혈 경험은 정적(+) 방향에서 그리고 이전 헌혈 후 경과시간은 부적(-) 방향에서 헌혈 행동에 대해 일관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타적 행동 참여 경험은 헌혈 행동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가치 ․ 비용 요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헌혈 가치, 인적 가치, 이미지 가치, 시간적 비용 등의 변수를 포괄하는 데, 헌혈 행동과 관련해서 헌혈 가치, 인적 가치, 이미지 가치가 정적(+)인 방향에서 그리고 시간적 비용은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수는 모두 만족이라는 변수를 통해 헌혈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변수 외에 서비스 가치, 금전적 비용, 정신적/물리적 비용 변수도 가치·비용 요인에 속하는데, 서비스 가치, 금전적 비용, 정신적/물리적 비용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헌혈 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피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들 변수는 모두 헌혈 행동에 일관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인의 헌혈 행동, 헌혈 장소에의 접근성, 헌혈 관련 기능적/사회적 라벨링, 헌혈 요청은 모두 헌혈 행동에 대해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헌혈에 지지적인 환경의 조성이 헌혈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섯째, 기타 헌혈 촉진 요인 중에서는 헌혈 필요성 및 헌혈 간격에 대한 인식 그리고 헌혈 지식 변수에 주목해서 관찰이 이뤄져 왔는데, 헌혈 필요성 및 헌혈 간격에 대한 인식은 헌혈 행동에 대해 정적인 방향에서 일관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헌혈 관련 지식은 헌혈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곱째, 부작용 요인에서는 헌혈 후 반응(BDR)과 바늘 통증 변수에 주목하는데, 헌혈 후 반응(BDR)의 경우 헌혈 행동에 대해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헌혈에 대한 만족 변수를 통해 헌혈 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바늘 통증은 헌혈 의향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에 반해, 헌혈 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 혹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헌혈 행동의 설명요인으로 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헌혈 의향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계를 파악하는 모든 연구는 헌혈 의향이 헌혈 행동에 대해 정적인 방향에서 일관적인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의향과 행동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Ⅵ. 논의 및 결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 중 하나인 이타적 행동의 유효성은 매우 크다. 그리고 이타적 행동의 보편적 표현 중 한 방식인 헌혈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헌혈의 중요성과 관심을 반영하여 헌혈 경험자의 헌혈 지속성을 높이는 기제들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다양한 변인들이 관련 요인으로 논의되어왔다. 헌혈 지속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헌혈의 지속성을 대표하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주목하면서 이를 다룬 국내외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발전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의 영향요인을 다룬 국내외 연구 총 37편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일반적 특성, 적용된 이론적 모델, 측정 방식 및 도구 그리고 영향요인의 경향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종합적 정리와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분석 대상 문헌들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재헌혈 및 반복헌혈 관련 연구가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헌혈 지속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약 20여년 전부터 증가되는 양상임을 보여준다. 또한, 학문영역에서는 의약학 분야뿐 아니라 사회과 학과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헌혈 행동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부터의 접근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헌혈 행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Ferguson et al., 2007). 둘째, 재헌혈 및 반복헌혈과 관련하여 이론적 기틀을 적용한 연구는 총 13편에 불과하여 관련 연구들의 이론적 기반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란 사실이 파악되었다. 또한, 적용된 이론 역시 계획된 행동 이론(Ajzen, 1991)을 중심으로 다소 제한되게 선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sser et al.(2009)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헌혈 행동이 복잡한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를 이해하는 데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데, 향후 연구에서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현상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 토대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론이 검토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과 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단일문항을 활용하거나 단순히 헌혈 행동 여부에 중점을 두어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갖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의 의향과 행동을 단차원적이고 제한적으로 축소시켜 접근하는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혈 의향과 행동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낼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과 행동 사이에서 영향요인들이 유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차이를 갖는 경향도 있다는 사실이 인식된다. 유사한 영향력의 결과를 제시하는 변수는 자기 특성 요인에서 헌혈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역할개인 통합(+), 자아정체성(+), 자기효능감(+), 이타성(+), 예상되는 후회(+), 불안(-)이었다. 경험·만족 요인에서는 이전 헌혈 만족도(+)와 이전 헌혈 횟수(+), 그리고 부작용 요인에서의 경우 헌혈 후 반응(-)이었다. 한편,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과 행동 사이에서 일부 요인은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로, 외재적 동기의 경우 헌혈 의향에서 정적인 방향에서의 영향력을 제시되는 반면에 실제 헌혈 행동에 있어서는 부적인 방향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Titmuss(1970)의 견해를 적용하여 해석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헌혈이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욕구에서 시작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혈에 대한 외적 보상이 오히려 헌혈 행동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이는 외재적 보상 방식이 순수한 이타적 행위인 헌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적정한 균형점에서만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바늘 통증의 영향력인데, 바늘 통증은 헌혈 의향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에 반해 헌혈 행동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바늘 통증의 부작용 요인이 재헌혈 및 반복헌혈을 고려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행함에 대해서는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과 행동 사이에서 유사성과 차이를 고려하면서 보다 엄정한 모형 설정을 통해 정교한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다섯 째, 분석 대상 문헌에서 재헌혈 및 반복헌혈의 의향과 행동을 자기 특성 및 경험 혹은 만족 요인 등의 헌혈자 개인의 심리적·경험적 특성에 주목하며 영향력 살펴보는 연구가 많은 반면, 환경적 요인에 속한 변수들은 다소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비록 소수의 연구에서 다루어졌긴 하나, 환경적 요인은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 및 행동에 있어 일관된 유의미한 영향력이 보고된다. 이러한 결과는 헌혈이 용이한 환경의 조성이 헌혈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이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이해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온 헌혈자 개인 차원의 요인들에 대한 고려와 함께, 헌혈 의향과 행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관련해서도 향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균형있게 이해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전체 분석 대상 문헌 37편 중 15편이 분석모형에서 통제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요인들의 단순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거나 혹은 통계적 연관성만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문제점에서 논의되듯이, 통제변수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된 변수들의 영향력은 통제 이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해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인과적 추론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통제변수의 포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통제변수를 위한 신중한 선택과 더불어 혹시라도 누락시킨 변수(omitted variables)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분석 대상 문헌에서 횡단연구로 설계된 문헌이 더 많았는데, 이런 경향성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종류나 그 크기를 논의하는 데 유용할 순 있으나 시간 변화에 따라 재헌혈 및 반복헌혈 행동이 어떤 영향요인과 관련성을 갖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헌혈 의향이나 행동 관련 영향요인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역동적인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시계열적 분석 방식의 접근이 모색될 필요성이 크다. 재헌혈 및 반복헌혈의 기간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전의 횟수를 반영하면서 관련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영향요인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양질의 연구를 선정하기 위해 학술지 게재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즉 연구보고서나 학위논문 등의 회색문헌은 배제하였다. 헌혈 지속성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연구보고서나 학위논문 등의 다양한 유형의 연구 문헌도 포괄해서 비교의 관점에서 헌혈 지속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헌혈 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하면서 헌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효과 크기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PRISMA 가이드라인을 따라 문헌 검색을 진행했으나, 검색어와 검색기준, 선정 및 배제기준을 연구자가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하며 확보하는 과정에서 누락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수도 있다. 특히 국내외 주요 사회과학분야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문헌 검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학분야 등의 인접학문 영역의 관련 문헌들을 완벽하게 포괄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 주제와 부합된 자료임을 확인하였으나 학술정보원에서도 끝내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문헌도 존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장기간의 검색 및 선정 과정을 통해 대상 논문의 포괄성을 좀 더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의 영향요인에 대한 정리과정에서 분석 대상 논문들에서 다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유사한 특성 변수들을 유목화시키는 방식으로 요인들을 구분하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기 특성 요인, 경험·만족 요인, 가치·비용 요인, 환경적 요인, 기타 헌혈 촉진 요인, 부작용 요인 등으로 범주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영향요인 구분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요인 구분 과정에서 요인 유목화의 외적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자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내는 방식의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 학술지에서 발표된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연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연구의 토대로 작용하며 연구가 지향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보다 엄밀한 새로운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축적되길 기대한다.
Notes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헌혈의 지속성을 재헌혈과 반복헌혈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다루었음. 재헌혈은 이전에 헌혈한 이후 특정 기간 내에 다시 헌혈을 하기 위해 돌아오는 행동으로서 주로 재헌혈 여부로 측정되며, 반복헌혈은 특정 기간 내 최소 2회 이상 반복해서 헌혈을 하는 행동으로서 대체로 횟수로 측정됨.
References
. (2024). 혈액관리본부. https://www.bloodinfo.net/knrcbs/main.do
, , & (2016). How can we improve retention of the first-time donor? A systematic review of the current evidence. Transfusion medicine reviews, 30(2), 81-91. [PubMed]
, , , & (2017). Determinants of plasma don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nsfusion clinique et biologique, 24(3), 106-109. [PubMed]
, , , & (2018). What motivates men to donate blood?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Vox sanguinis, 113(3), 205-219. [PubMed]
, , & (2006). Eliciting repeat blood donations: tell early career donors why their blood type is special and more will give again. Vox sanguinis, 90(4), 302-307. [PubMed]
, , , & (2018). A systematic review of incentives in blood donation. Transfusion, 58(1), 242-254. [PubMed]
, , , & (2012). Individu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blood donation frequency with a focus on clinic accessibility: a case study of Toronto, Canada. Health & place, 18(2), 424-433. [PubMed]
, , , & (2012). Exploring the pattern of blood donor beliefs in firsttime, novice, and experienced donors: differentiating reluctant altruism, pure altruism, impure altruism, and warm glow. Transfusion, 52(2), 343-355. [PubMed]
, , , , & (2007). Improving blood donor recruitment and retention: integrating theoretical advances from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research agendas. Transfusion, 47(11), 1999-2010. [PubMed]
, , , & (2004). Mild reactions to blood donation predict a decreased likelihood of donor return. Transfusion and Apheresis Science, 30(1), 17-22. [PubMed]
, , & (2007). A path analysis of intention to redonate among experienced blood donors: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ransfusion, 47(6), 1006-1013. [PubMed]
, , , , & (2007). Determinants of repeated blood donation among new and experienced blood donors. Transfusion, 47(9), 1607-1615. [PubMed]
, , , & (2012). Efficacy of interventions promoting blood donation: a systematic review. Transfusion medicine reviews, 26(3), 224-237. [PubMed]
, & (2015). An analysis of first‐time blood donors return behaviour using regression models. Transfusion Medicine, 25(4), 243-248. [PubMed]
, , , & (2012). Predicting the retention of first‐time donors using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ransfusion, 52(6), 1303-1310. [PubMed]
, , , , & (2009). Predicting blood donation intentions and behavior among Australian blood donors: testing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Transfusion, 49(2), 320-329. [PubMed]
, , & (2013). Beliefs underlying the intention to donate again among first-time blood donors who experience a mild adverse event. Transfusion and Apheresis Science, 49(2), 278-284. [PubMed]
, , , & (2005). Motivation,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voluntary nonremunerated blood donors: a survey‐based questionnaire study. Vox sanguinis, 89(4), 236-244. [PubMed]
, , , , & (1999). Analysis of donor return behavior. Transfusion, 39(10), 1128-1135. [PubMed]
, , , , , , , , , , & (2008). Factors influencing donor return. Transfusion, 48(2), 264-272. [PubMed]
, , , & (2023). The social contagion of prosocial behaviour: How neighbourhood blood donations influence individual donation behaviour. Health & Place, 83, 103072. [PubMed]
, , , , , , & (2014). Labeling of previous donation to encourage subsequent donation among experienced blood donors. Health Psychology, 33(7), 656. [PubMed]
, , , & (2013). The influence of adverse reactions, subjective distress, and anxiety on retention of first‐time blood donors. Transfusion, 53(2), 337-343. [PubMed]
, , , & (2014). Return behavior of occasional and multigallon blood donors: the role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self‐identity,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Transfusion, 54(3), 805-813.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10-31
- 수정일Revised Date
- 2024-11-28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11-29

- 1234Download
- 2052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