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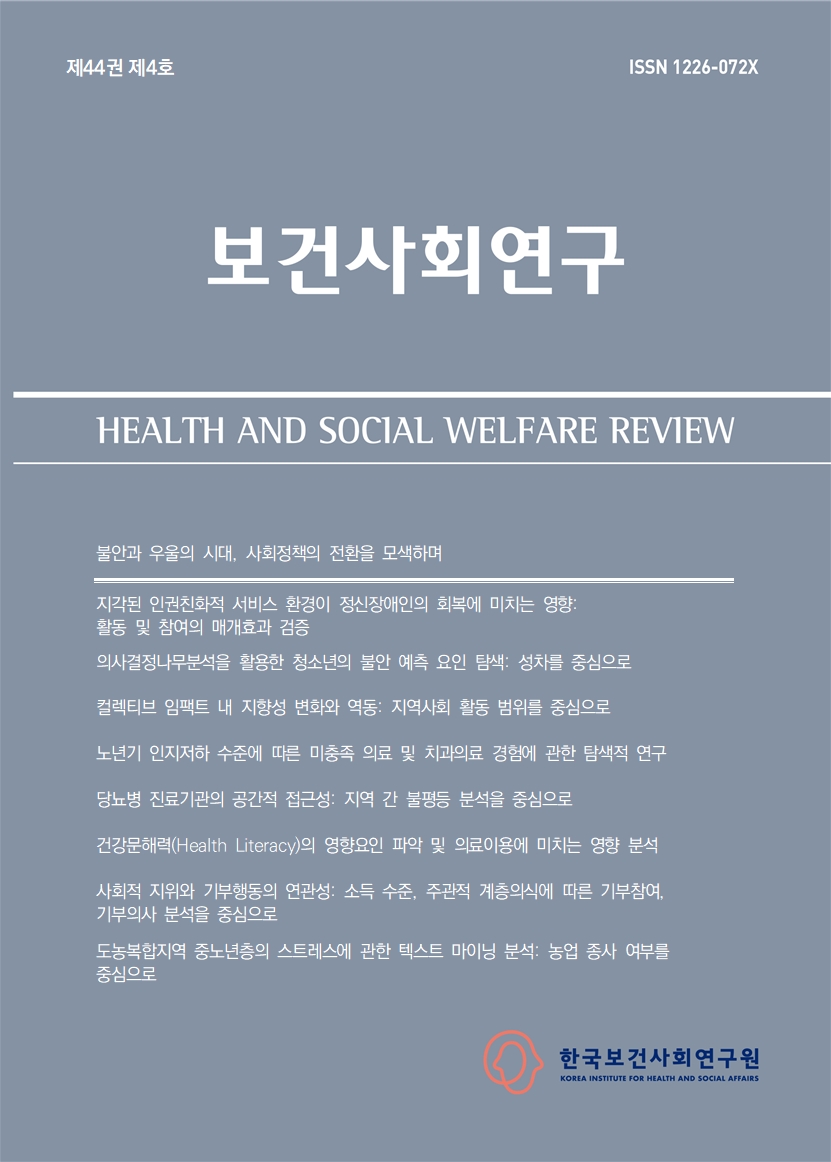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 검증
The Effect of Perceived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 on the Recovery of Individual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Activity and Participation
Park, Jong Eun1; Kahng, Sang Kyoung2*
보건사회연구, Vol.44, No.4, pp.3-28, December 2024
https://doi.org/10.15709/hswr.2024.44.4.3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정신과 입원병원과 지역 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서비스 환경이 정신장애인에게 중요한 활동 및 참여를 높여, 회복을 높이는지를 검증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입원병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제공 될수록 정신장애인의 회복 정도가 높아졌다. 특히 입원병원 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증진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받았지만, 입원병원의 서비스도 인권친화적으로 제공될 경우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복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과 입원병원의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Abstract
Since a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PDs), efforts are being made to establish such environments in inpatient hospital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Recovery memoirs of IPDs indicate that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perceived in hospitals and facilities significantly enhance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ultimately facilitating recover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nd recovery has not been systematically verified.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factors—perceived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nd recovery—using Donabedian's structure-process-outcome theory. To this e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cluding indirect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348 IPDs who participated in a 2022 survey on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friendly treatment environment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in both inpatient hospital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support for independence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have a positive total effect on recovery. In the case of the mediating effect of activity and participation, all of them showed complete or partial mediating effects except for the human-respect environ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nd promoting the recovery of IPDs are discussed.
초록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조성되어야 하므로, 국내 입원병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도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회복 수기에서도 병원과 시설에서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참여를 증진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과정이 발견된다. 그러나 실제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활동과 참여, 회복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이론에 근거하여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활동 및 참여, 회복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22년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348명의 의견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및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설에서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자립지원, 인간존중) 모두 회복에 정적으로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의 경우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설의 인간존중 환경을 제외하고 모두 완전 혹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조성, 회복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Ⅰ. 서론
정신장애인의 회복은 정신장애인이 증상이나 기능 저하에 관계없이 자기결정에 따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Anthony, 1993; Deegan, 1996). 그동안 이러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치료모델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완전히 증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재활모델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심리· 사회적 기능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제공에 주력하였다(하경희, 2019). 인권 모델에서는 치료, 재활, 사회 환경을 정신장애인의 판단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병원과 지역사회에서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인권친화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한다(강상경 외, 2020; WHO, 2012; WHO, 2019; WHO, 2021).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국제 및 국내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된 발단은 UN에서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채택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2009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부터이다(법제사법위원회, 2023; 보건복지위원회, 2023).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2016년부터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주체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으며, 병원이나 지역사회 정신 건강시설과 같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정책의 흐름을 반영하여 인권친화적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관계부처합동, 2021).
실제로 인권모델에 기반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인 2000년대 이전에는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회복에 방해가 되었다는 보고가 존재하지만(박은주, 2011; 황숙연, 2007; Deegan, 1988), 인권모델에 기반한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확인되었다(박종은, 강상경, 2021; Corrigan, 2019, p. 17). 특히 정신장애인의 회복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있는 활동이나 참여가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인권 친화적 서비스가 이러한 활동 및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은, 강상경, 2021; 송승연, 정유석, 2023; 하경희, 2022; Anthony, 1993; Inman et al., 2007). 가령 과거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퇴원계획 등의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입원 과정에서 퇴원 이후의 주거, 취업, 가족관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잘 참여하게 되고 만족스럽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시도를 위해 공간이나 수가 차원에서의 개선을 꾀하거나, 시범사업과 지침을 수립하는 등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 도입을 시도하였고(강상경, 2021; 관계부처 합동, 2021),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일부 동료지원서비스, 회복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강상경, 2021; 김성수, 2021;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 비록 인권친화적 서비스의 필요성이나 확산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지만(이화영 외, 2022),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고와 같이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참여를 촉진하여 회복을 증진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영향을 검증하는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에 근거하여 인권친화적 서비스, 활동과 참여, 회복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 이론은 그동안 의료 서비스와 교육방식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활용되어 왔다(윤동원, 최지선, 2021; Jarrar et al., 2022). 도나베디안의 이론에서 구조는 치료와 돌봄이 발생하는 환경을 의미하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과정이며 여기에서 과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서비스 이용자 혹은 환자, 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결과는 구조와 과정을 통해 나타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의미한다(Donabedian, 1966; Donabedian, 1989). 본 연구에서는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을 구조요인으로 정의하고, 활동 및 참여를 과정요인, 회복을 결과요인으로 정의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활동 및 참여를 증진하고(Borkman, 1998; Webber & Fendt-Newlin, 2017; WHO, 2021; Tjornstrand et al., 2020), 활동 및 참여는 회복의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종은, 강상경, 2021; 이예승, 이영선, 2015; Cano-Prieto et al., 2023; Hendryx et al., 2009; Hitch et al., 2022; Inman et al., 2007).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회복 간의 관계에 있어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도나베디안의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에서 활동 및 참여는 인간중심 돌봄환경과 환자의 만족도 간의 관계, 교육방식과 학습 결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윤동원, 최지선, 2021; Jarrar et al., 2022).
정리하면,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관련 법과 정책을 인권에 기반하여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Corrigan, 2019; WHO, 2021). 특히,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정신장애인이 회복을 위해 이용하는 입원병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 인권친화적 서비스가 제공될 때, 더 많은 활동과 참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회복이 촉진된다고 보고된다(박종은, 강상경, 2021; Corrigan, 2019, p. 17). 그러나 현재 국내의 입원병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 제공되는 인권친화적 서비스가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권친화적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고, 이를 통해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이론을 적용하여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활동 및 참여, 그리고 회복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1.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회복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권 모델에서 추구하는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Slade et al., 2015; WHO, 2021). 국제사회는 인권친화적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다섯 가지 권리에 기반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강상경 외, 2020; WHO, 2012).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권리는 적정생활 수준과 사생활 보장, 신체와 정신건강 보장, 지역사회통합 보장,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이 포함된다(WHO, 2012). 적정생활 수준과 사생활 보장의 경우의·식·주, 적절한 수면 환경 등을 포함하고, 정신과 신체에 대한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개별 신체 및 정신건강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사회통합 보장 서비스는 정신 장애인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교육, 직업, 주거, 소득 등 제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을 뜻한다(WHO, 2012).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자유와 존중에 근거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자기결정권 보장 서비스 환경은 정신장애인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WHO, 2012). 즉, 인권친화적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근거하여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회복에 이르게 하는 데 목표를 둔다(WHO, 2012; WHO, 2021).
이에 따라 국내 입원병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픈다이얼로그, 퇴원계획사업, 동료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점들이 확인되었다(김성수, 2021;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 전준희, 2021). 오픈다이얼로그는 정신장애인에게 정신과적 위기 상황 오기 전부터 정신장애인과 존중에 기반하여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참여도를 높이며, 향후 예견된 위기 상황에 미리 대처하는 서비스이다(김성수, 2021). 기존 치료 및 재활서비스에서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격리나 강박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오픈다이얼로그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사전에 위기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다섯 가지 권리 중 신체와 정신건강보장,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동료지원서비스는 회복한 정신장애인이 아직 회복에 이르지 못한 혹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동료의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 치료 및 재활서비스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근거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WHO, 2012; WHO, 2021), 서비스를 제공 받은 당사자들은 인권에 기반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 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더 잘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한다(하경희, 2020; Tjornstrand et al., 2020; WHO,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면서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실제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평가 이론인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을 적용할 것이며, 다음 장에서는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2.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
가.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은 1966년에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이론 으로 의사였던 코드만(codman)과 쿠싱(Cushing)의 활동에 그 기원을 둔다(Donabedian, 1989). 코드만과 쿠싱이 외과 의사로 재직한 시절 많은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Donabedian, 1989). 그들은 수술의 실패 요인이 치료진의 부족한 기술, 판단, 지식에 있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치료라는 목적하에 환자들의 사례를 진단 및 수술, 경과, 결과 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치료율을 높였다(Donabedian, 1989; Nakayama, 2022). 이후 쉽(Sheps)은 이들의 활동을 확장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돌봄의 기준, 활동의 요소, 돌봄의 결과, 치료진의 판단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였고(Sheps, 1955), 도나베디안은 코드만, 쿠싱, 쉽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을 개발하였다. 도나베디안의 이론의 경우 초기에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만 활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교육 서비스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이론으로도 활용되고 있다(윤동원, 최지선, 2021; Ameh et al., 2017; Kobayashi et al., 2011).
도나베디안이 개발한 이론은 크게 구조, 과정, 결과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요인이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따른다(Donabedian, 1966; Donabedian, 1988). 즉, 구조요인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구조요인의 영향을 받은 과정요인이 결과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 [그림 1]은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이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각 요인을 살펴보면, 구조는 치료 혹은 돌봄이 발생하는 환경의 특성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시설·장비·재원과 같은 물적 자원, 인력수·자격·기술·서비스와 같은 인적 자원, 보상 방법·동료심사의 방법과 같은 조직의 구조가 포함된다(Donabedian, 1966, Donabedian, 1989). 다음으로 과정은 앞서 설명한 구조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환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행하는 활동을 뜻한다(Donabedian, 1966; Donabedian, 1988). 가령 환자가 구조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게 되면 병원 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Donabedian, 1988). 결과요인은 구조의 영향을 받아 과정을 통해 나타난 환자 혹은 대상의 건강 상태로 정의되며, 환자의 만족도 변화 등을 포함한다(Donabedian, 1966; Donabedian, 1988). 다음 장에서는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나.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의 적용
본 장에서는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을 각 요소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구조요인의 경우 과거에는 물적 자원이나 조직의 구조를 구조로 정의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주로 시설 접근성이나 장비,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구조로 정의되었다(Ameh et al., 2017; Capitman et al., 2005). 하지만 2010년 이후 인간 혹은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환자의 서비스 경험, 인간 중심 돌봄서비스를 구조요인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윤동원, 최지선, 2021; Kobayashi et al., 2011; Chang et al., 2022). 구조요인의 정의와 동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입원병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 설에서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을 구조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과정요인은 구조를 설정한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환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역량 증진을 구조요인으로 설정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과정요인으로 투입하였으며 (Capitman et al., 2005),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향상에 목적으로 구조요인을 설정한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준비, 친밀성 등을 과정요인으로 설정하였다(Ameh et al., 2017). 본 연구와 유사하게 인간 중심 돌봄, 돌봄서비스 환경을 구조요인으로 투입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참여를 과정요인으로 정의하였다(Kobayashi et al., 2011; 윤동원, 최지선, 2021). 본 연구에서 구조요인으로 투입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원하는 직업을 갖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등의 활동 및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WHO, 2019; WHO, 2021). 이에 활동 및 참여를 과정요인으로 구성한다. 도나베디안의 이론에서는 시설 내부에서의 활동과 참여를 주로 다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론을 확장 적용하여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제공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및 참여가 증진되는지를 살펴본다.
구조 및 과정요인과 비교하였을 때 결과요인은 비교적 공통된 내용이 다뤄졌다.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결과 요인은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건강, 심리·사회적 상태, 만족도가 있다(윤동원, 최지선; 2021; Capitman et al., 2005; Kobayashi et al., 2011). 구조를 조성한 궁극적 목적에 따라 학습결과 등을 결과요인을 포함한 예도 있다(Jarrar et al., 2022). 본 연구에서 구조요인으로 투입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활동 및 참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Carpenter, 202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결과요인은 회복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요인을 적용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구조요인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에서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과정요인은 활동 및 참여, 결과요인은 회복이 해당한다. 도나베디안의 이론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다음 장에서는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 모형에 근거하여 설정한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3.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활동 및 참여, 회복의 관계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적정생활 수준과 사생활 보장, 신체와 정신건강 보장, 지역사회 통합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다섯 가지 권리에 기반한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활동 및 참여, 회복의 관계를 살펴본다.
가.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회복의 관계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중 적정생활 수준과 사생활 보장에 대한 서비스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 욕구와 관련된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욕구 충족은 정신장애인이 신체적 항상성을 유지하고 회복의 동기를 추구하는 기반이 된다(Chesters et al., 2005; Maslow & Lewis, 1987).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병원과 시설에서 사생활과 공간에 대한 보장을 잘 받으면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회복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Connellan et al., 2013; Doroud et al., Fortune, 2018), 의·식·주 보장이 잘될수록 정신건강 어려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McLaughlin et al., 2012). 신체와 정신건강 보장 관련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며(Higgins et al., 2012), 실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포함하는 개별화된 회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ok et al., 2009; Holley et al., 2011).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직업, 주거 등의 인권친화적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rrigan, 2019, p. 17).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퇴원계획 서비스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회복 인식이 높아졌고(박종은, 강상경, 2022), 앞서 살펴본 적정생활 수준과 사생활 보장, 신체와 정신건강 보장, 지역사회 통합 보장의 경우 개별 회복 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ok et al., 2009; Simon et al., 2011). 다음으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회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Mancini, 2008; Farkas et al., 2005; Piltch, 2016),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서비스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병원과 시설의 서비스에서 비강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회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이정하, 2020; WHO, 2021).
나.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
활동 및 참여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정도로 정의되며(문영임 외, 2020; Webber & Fendt-Newlin, 2017), 장애 영역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더불어 자기관리, 대인관계, 사회생활 등의 세부적인 생활 영역에 참여하는 정도나 여부를 활동 및 참여로 정의한다(김경미, 윤재영, 2010). 정신장애인에게 사회에서의 활동 및 참여는 회복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신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와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홍순태 외, 2007), 정신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된 관계, 직업 등 활동 및 참여에 복귀하는 것이 회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종은, 강상경, 2021; Anthony, 1993; Corrigan, 2019, p. 30).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해 활동 및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기존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기관들에서 활동 및 참여를 촉진하는 서비스 환경 조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은 이러한 서비스 환경을 통해 활동과 참여에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한다(송승연, 정유석, 2023; 하경희, 2022; Inman et al., 2007).
한편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이론에 근거하면, 정신장애인이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정신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인권기준이나 국제기구에서 소개된 우수사례를 참고하 였을 때도 인권에 기반한 서비스 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정신장애인의 활동과 참여가 증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WHO, 2012; WHO, 2019, WHO,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과 정신건강 관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받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취업 등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Webber & Fendt-Newlin, 2017; Tjornstrand et al., 2020),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한 계획 수립에 주체적으로 자기결정에 따라 참여한 정신장애인은 이를 더 잘 실천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Borkman, 1998; WHO, 2021). 그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직업, 사회적 교류에 기 반한 서비스를 받은 정신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정신장애인보다 활동 및 참여의 정도가 높아졌고(강은나, 맹진영, 2011; 조상은, 2018; Sanches et al., 2020), 자기의사결정에 기반하여 치료 과정을 지원받은 정신장애인의 참여도 또한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thare & Shields, 2012). 이러한 활동과 참여는 정신 장애인의 회복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활동 및 참여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이예승, 이영선, 2015; Cano-Prieto et al., 2023; Hendryx et al., 2009; Hitch et al., 2022). 특히, 직업이나 일의 차원에서 활동 및 참여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높인다고 밝혀졌다(박종은, 강상경, 2021; Inman et al., 2007).
정신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일부 연구에서도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문영임 외(2020)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경험한 차별 경험이 적을수록 활동 및 참여의 정도가 증가하고, 증가한 활동 및 참여의 정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하게 정신장애인의 차별 경험과 자기수용의 관계에서 활동 및 참여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eong & Yoo, 2022).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때 활동 및 참여의 정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증가가 정신장애인의 장애수용 증대로 이어졌다(Jeong & Yoo, 2022).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모델에 근거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 모형을 갖춘 연구들에서도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 환자가 지각한 인간중심 돌봄 환경이라는 구조와 환자의 만족도라는 결과 간의 관계를 환자의 참여가 매개하였다(윤동원, 최지선, 2021). 즉, 인간중심돌봄 환경의 정도가 높아질 수록 환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증가한 참여는 환자의 높은 만족으로 이어졌다. 또한, 학생이 경험한 교육방식 이라는 구조와 학습 결과의 관계를 학생들의 참여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 중심 참여 주도형 교 육방식에 참여한 경우 학생들의 참여 정도가 더 높았고, 이는 더 나은 학습결과를 만들어냈다(Jarrar et al., 2022).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 도나베디안의 모델에 근거한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면,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에서 지각한 인권친화적 인식이 활동 및 참여를 매개로 하여 회복을 촉진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문헌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적정생활 수준, 신체와 정신건강 보장, 지역사회 통합, 자기결정,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권고한다(WHO, 2012; WHO, 2021). 이러한 환경에서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회복에 이를 수 있게 된다(송승연, 정유석, 2023; 하경희, 2022; 박종은, 강상경, 2021; Anthony, 1993; Corrigan, 2019, p. 30; Inman et al., 2007).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다루는 데 그쳤거나, 활동과 참여의 매개 역할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Tjornstrand et al., 2020; Pathare & Shields, 2012).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에 따르면,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구조)이 정신장애인의 활동과 참여(과정)를 촉진하고, 이는 회복(결과)으로 이어지지만, 이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활동 및 참여를 통해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조요인으로 투입하는 인권친화적 서비스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참여를 촉진하여 회복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도나베디안 이론에서 언급되는 활동의 장소를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및 참여로 확장적용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당사자들의 내러티브로만 보고되었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이 과정에서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이론을 정신장애인의 맥락에 맞게 확장 적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22년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총 348명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은 최근 5년 이내 입원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이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인권기반 서비스 조항이 법령이 포함되었기 때문에(강상경 외, 2020), 최근 5년 이내 입원 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조사를 위해 전국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메일을 통해 설문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설문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하여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하여 연구 수행 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았다.
2. 연구 도구
가. 독립 변인: 지각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독립 변인은 지각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다. 먼저 지각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척도는 한국형 WHO 퀄리티 라이츠 툴킷(2012)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내용을 활용하였다(강상경 외, 2021; 강상경, 김낭희, 제철웅, 2021). 문항은 ‘다음은 가장 최근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귀하의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를 답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4점 척도(전혀 아님(0)~ 매우 그럼(3))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적정 수준과 사생활 보장 8문항, 신체와 정신건강 보장 7문항, 자기결정권 보장 7문항,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6문항, 지역사회 통합 보장 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0.945로 나타났다.
표 1
지각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척도 문항 내용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한국어로 번안한 재활 서비스 질 척도(Quality Indicator for Rehabilitative Care)에 근거한다(강상경 외, 2020). 재활서비스 질 척도는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지원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4점 척도(전혀 아님(0)~매우 그럼(3))으로 응답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이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0.926으로 나타났다.
표 2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척도 문항 내용
나. 매개 변인: 활동 및 참여
매개변인인 활동 및 참여는 김경미와 윤재영(2010)의 한국형 장애인 참여 척도로 측정되었다. 해당 척도는 ‘다음은 사회참여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제시된 사회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4점 척도(전혀 아님(0)~매우 그럼(3))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대인관계, 사회경제생활, 가정생활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0.960이었다.
다. 결과 변인: 회복
회복은 정신건강회복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신건강회복척도는 Bullock(2005)이 개발한 것으로 정신보건 서비스의 효과성과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Bullock(2005)이 개발한 내용을 송경옥 (2010)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신건강회복 척도는 ‘다음은 회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가장 동의하는 번호를 선택하여주십시오’라는 질문에 4점 척도(전혀 아님(0)~매우 그럼(3))로 응답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곤경 극복, 자기 역량 강화, 배움과 자기재정의, 기본적 기능, 전반적 생활 만족, 새로운 잠재력, 영성, 옹호/충만이라는 8개의 대범주하에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0.959로 나타났다.
라. 통제 변인: 증상, 자아존중감,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제 변인은 증상, 자아존중감,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다. 증상은 콜로라도 증상 척도(Colorado Symptom Index)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Shern et al., 1994). 콜로라도 증상 척도는 불안과 우울, 자해와 타해, 정신증이라는 3개 하위요인과 14개 세부 문항으로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다음은 귀하가 각 문항을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부분에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5점 척도(전혀 없음(0),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 이하(1), 한 달에 여러 번(2), 일주일에 여러 번(3), 거의 매일(4))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0.792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에서 자아존중감은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주십시오’라는 질문에 4점 척도 (전혀 아님(0)~매우 그럼(3))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 문항과 부정문항 각각 5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분석할 때는 부정문항 5개를 역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0.792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 유병기간, 기초생활 수급 여부, 배우자 유무, 거주 지역, 성별, 교육 수준, 진단명, 장애 정도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조사연도에서 출생연도의 차이 값을 계산하여 연구 모형에 투입하였고, 유병기간은 조사연도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생활상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한 연도의 차이 값을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기초생활 수급 여부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1’, 그렇지 않은 사람은 ‘0’으로 코딩하였고, 배우자 유무의 경우 결혼/동거를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이외 미혼/별거/이혼/사별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거주 지역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는 ‘1’, 중소도시와 농어촌 거주자는 ‘0’으로 코딩하였고,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하였다. 교육 수준의 경우 무학은 ‘0’, 초등학교 졸업 ‘1’, 중학교 졸업 ‘2’부터 대학원 졸업 ‘6’까지로 구분하였다. 진단명의 경우 중증정신질환으로 구분되는 조현병/양극성정동장애/분열정동장애를 ‘1’으로 코딩하고, 이외 진단명은 ‘0’으로 코딩하였으며, 장애 정도의 경우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0’, 경증장애로 등록한 경우는 ‘1’, 중증장애로 등록한 경우는 ‘2’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시행하고,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AMO 19.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과정에서 모형적합도 기준은 카이제곱 통계량과 절대적합지수인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증분적합지수인 Incremental Fit Index(IFI), Comparative Fit Index(CFI)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카이제곱 통계량은 사례 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하더라도, CFI 값과 IFI 값이 .90 이상일 때, RMSEA 값이 .08 이하가 기준이지만 .10 이하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을 1000회로 설정하여 실시하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하였다(Preacher & Hayer, 2008).
IV.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2.48세였고, 평균 유병기간은 17.01년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은 평균 2.69년, 입원 횟수는 평균 4.26년이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 제도의 경우 수급을 받는 사람이 204명(58.6%)으로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144명, 41.4%)보다 많았다. 배우자의 경우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30명, 94.8%), 거주 지역의 경우 대도시(245명, 70.4%)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103명, 29.6%)보다 많았다. 성별은 남성(195명, 56%)이 여성(153명, 44%)보다 많았고, 진단명은 중증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295명, 84.8%)이 중증정신질환 이외 질환(53명, 15.2%)을 진단받은 사람보다 많았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184명, 52.9%), 대학교(4년제 이상)(62명, 17.8%), 대학교(3년제 이하)(50명, 14.4%), 중학교(35명, 10.1%), 초등학교(11명, 3.2%), 대학원 이상(6명, 1.7%)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의 경우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가 가장 많고(230명, 66.1%),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74명(21.3%), 경증인 경우는 44명(12.6%)이었다.
표 3
연구참여자의 특성
| (단위: 년, 명) | |||||||
|---|---|---|---|---|---|---|---|
| 변인 | 구분 | 평균 (표준편차) | 범위 | 변인 | 구분 | 평균 (표준편차) | 범위 |
| 연령 | 42.48(11.84) | 20-72 | 입원 횟수 | 4.26(4.02) | 1-30 | ||
| 유병기간 | 17.01(10.18) | 1-52 | 입원 기간(년) | 2.69(3.93) | 1-25 | ||
| 변인 | 구분 | 연구참여자 수(%) | 변인 | 구분 | 연구참여자 수(%) | ||
|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 여부 | 비수급 | 144(41.4) | 교육 수준 | 무학 | 0(0.0) | ||
| 수급 | 204(58.6) | 초등학교 | 11(3.2) | ||||
| 배우자 유무 | 배우자무 | 330(94.8) | 중학교 | 35(10.1) | |||
| 배우자유 | 18(5.2) | 고등학교 | 184(52.9) | ||||
| 거주 지역 | 농어촌, 중소도시 | 103(29.6) | 대학교 (3년제 이하) | 50(14.4) | |||
| 대도시 | 245(70.4) | 대학교 (4년제 이상) | 62(17.8) | ||||
| 성별 | 여성 | 153(44.0) | 대학원 이상 | 6(1.7) | |||
| 남성 | 195(56.0) | 장애 정도 | 장애 없음 | 74(21.3) | |||
| 진단명 | 중증정신질환 | 295(84.8) | 경증 | 44(12.6) | |||
| 중증정신질환 이외 질환 | 53(15.2) | 중증 | 230(66.1) |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 변인인 지각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의 평균은 1.72점(SD=0.48)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의 평균은 2.09 점(SD=0.48)이었다.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0-3점 척도인 점을 고려하면, 입원병원의 경우 척도의 평균이 중간값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경우 척도의 평균이 중간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속한다. 매개 변인인 활동 및 참여의 평균은 1.77점(SD=0.49)이었는데, 활동 및 참여 척도가 0~3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값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결과 변인인 회복의 평균은 1.95점(SD=0.52)으로 나타났고, 회복 척도 또한 0-3점 척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값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요변수들은 대체로 중간값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요변수들의 왜도의 경우 절댓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는 절댓값이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표 4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정규 분포성
| 변인 | 연구참여자 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왜도 | 첨도 | |
|---|---|---|---|---|---|---|---|---|
| 독립 변인 | 지각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 348(100%) | 1.72 | 0.48 | 0.33 | 2.93 | 0.157 | 0.357 |
|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 348(100%) | 2.09 | 0.48 | 0.18 | 3.00 | -.001 | .176 | |
| 매개 변인 | 활동 및 참여 | 348(100%) | 1.77 | 0.49 | 0.15 | 3.00 | 0.166 | 0.779 |
| 결과 변인 | 회복 | 348(100%) | 1.95 | 0.52 | 0.20 | 3.00 | 0.230 | -0.074 |
다음으로 투입한 변수 중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가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각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r=0.459, p<.01), 활동 및 참여(r=0.409, p<.01), 회복(r=0.408,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활동 및 참여(r=0.552, p<.01), 회복(r=0.623,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활동 및 참여는 회복(r=0.758, p<.01)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 연구 결과
1) 측정모형 분석 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각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WHO(2021)의 퀄리티 라이츠 툴킷에 따라 다섯 가지 권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측정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카이스퀘어 값은 11.623(df=5)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IFI와 CFI가 각각 .993이고, RMSEA 값은 .08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하였다.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EU의 재활 서비스 질 척도에 근거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하였고 크게 두 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었을 때 가장 모형적합도가 좋았다. 첫 번째 변인은 자립 지원 환경으로 카이스퀘어 값이 92.722(df=27), 이고 IFI 값과 CFI 값이 0.956, RMSEA 값이 0.084로 나타났고, 두 번째 변인은 인간존중 환경으로 카이스퀘어 값이 34.822(df=14), 이고 IFI 값과 CFI 값이 0.980, RMSEA 값이 0.065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활동 및 참여는 김경미와 윤재영(2010) 연구에서 타당화된 한국형 장애인 참여 척도 요인에 근거하여 대인관계, 사회경제 생활, 가정생활, 의사소통, 이동, 시민 생활, 총체적 건강이라는 7개의 측정 변인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카이스퀘어 값은 34.82(df=14)이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IFI와 CFI가 각각 0.983이고, RMSEA 값은 0.075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회복은 송경옥(2010)의 정신건강회복척도에 근거하여 곤경극복, 자기역량강화, 배움과 자기 재정의, 기본기능, 전반적 생활 만족, 새로운 잠재력, 영성, 옹호/충만이라는 8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 결과 카이스퀘어 값이 65.760(df=20)이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IFI와 CFI 가 각각 0.977로 0.9 이상이고, RMSEA 값은 0.081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6
측정모형 분석 결과
| 변인 | Chi-square(df) | RMSEA | IFI | CFI | |
|---|---|---|---|---|---|
| 지각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 11.623(5)(p<.05) | 0.062 | 0.993 | 0.993 | |
|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 자립 지원 환경 | 92.772(27)(p<.001) | 0.084 | 0.956 | 0.956 |
| 인간 존중 환경 | 34.822(14)(p<.01) | 0.065 | 0.981 | 0.980 | |
| 활동 및 참여 | 34.82(14)(p<.001) | 0.075 | 0.983 | 0.983 | |
| 회복 | 65.760(20)(p<.001) | 0.081 | 0.977 | 0.977 | |
2) 주요 연구 결과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인 ‘당사자가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회복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결과는 총 효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총효와는 직접효과의 값과 간접효과의 값을 합한 값이다. <표 7>을 살펴보면, 지각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가 회복에 미치는 총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β=.142, p<.01). 또한,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중 자립 지원 환경(β =.218, p<.01)과 인간 존중 환경(β=.188, p<.01) 모두 회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회복의 정도도 높아졌다.
표 7
주요 연구 결과
| 경로 | 총 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간접효과 신뢰구간 | ||||||||||||
|---|---|---|---|---|---|---|---|---|---|---|---|---|---|---|---|---|
| B | β | p | B | β | p | B | β | p | ||||||||
| 지각된 입원 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 → | 회복 | .137 | .142 | .005 | ** | .052 | .054 | .168 | .085 | .088 | .002 | ** | .044~.134 | ||
|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 자립 지원 환경 | → | 회복 | .207 | .218 | .002 | ** | .098 | .103 | .058 | † | .109 | .115 | .002 | ** | .048~.218 |
| 인간 존중 환경 | → | 회복 | .190 | .188 | .006 | ** | .144 | .142 | .006 | * | .047 | .046 | .333 | -.027~.109 | ||
다음으로 [연구문제 2]인 ‘당사자가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회복의 관계를 활동 및 참여가 매개하는가?’ 에 대한 결과는 효과분해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지각된 입원 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의 경우 총 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β=.142, p<.01), 직접효과는 없었지만(β=.054, p=.168), 간접효과(β=.088, p<.01) 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활동 및 참여는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완전 매개효과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이 사라지면,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해석해보면 지각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활동 및 참여라는 매개 변인 없이는 회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입원병원에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활동 및 참여의 정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활동 및 참여의 정도는 회복의 증가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중 자립 지원 환경의 총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고(β=.218, p<.01), 직접효과도 유의하였으며(β=.103, p<.10), 간접효과의 경우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신뢰구간 검증 결과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15, p<.01). 즉, 활동 및 참여는 자립 지원 환경과 회복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부분 매개효과는 매개 변인이 없어도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 변인이 있을 때도 독립 변인이 매개 변인을 통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자립 지원 서비스 환경은 활동 및 참여를 통해 회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서비스 환경 자체로도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영향을 준다. 정리 하면, 지각된 자립 지원 환경의 정도가 높으면 활동 및 참여의 정도가 증가하고 회복의 정도도 증가한다. 활동 및 참여 변인이 없더라도 자립 지원 환경의 지각 정도가 높으면 회복 정도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간 존중 환경의 경우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총 효과가 유의하였고 (β=.188, p<.01), 직접효과도 유의하였지만(β=.142, p<.05),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046, p=.333).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존중 환경은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활동 및 참여를 통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인간존중환경의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회복의 정도가 높아지고, 인간존중환경이 활동 및 참여를 통해 회복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친화적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고 국내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에서도 일부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이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비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인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에 근거하여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활동 및 참여, 정신장애인의 회복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인 ‘당사자가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회복과 회복의 관계는 어떠한가?’ 관련하여,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으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자립 지원 환경,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간 존중 환경과 회복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모든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장애인이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활동 및 참여를 통해 회복의 정도도 높아졌다. 당사자가 지각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높아질수록 회복의 정도가 높아진 연구 결과는 그동안 입원병원에서 제공되는 퇴원계획 상담 경험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박종은, 강상경, 2022), 정신장애인의 회복 증진을 위해서는 자기결정에 기반한 치료 계획 수립(Liberman & Kopelowicz, 2005), 입원병원에서 대안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도 일치한다(Rissmeyer, 1985).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자립 지원 환경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아질수록 회복의 정도가 높아진 연구 결과는 의·식·주에 대한 보장을 받을 때 정신건강상 어려움이 적어진다는 실증연구(McLaughlin et al., 2012), 신체와 정신건강, 지역사회 통합 보장을 위한 개별화된 회복 지원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실험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Cook et al., 2009; Simon et al., 2011). 지각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 인간 존중 환경을 지각할수록 회복의 정도가 높아진 연구 결과는 당사자의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 당사자의 존중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이 중요하다는 기존 논의와 동일한 결과이다(Mancini, 2008; Farkas et al., 2005; Piltch, 2016).
둘째, [연구문제 2]인 ‘당사자가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회복 간 관계를 활동 및 참여가 매개하는가?’에 따라 매개효과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직접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지만, 활동 및 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입원병원에서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받으면 사회에서 활동과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회복도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자립 지원 환경은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활동 및 참여를 통해서도 회복에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접근이론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Donabedian, 1966; Donabedian, 1989). 도나베디안의 이론에서는 서비스 환경이 환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최종적으로 환자의 건강상 변화를 일으킨다고 설명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입원병원에서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를 촉진하고 결국 회복을 증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는 인간 중심 돌봄서비스가 환자의 참여를 통해 만족도 향상을 끌어낸다고 보고한 연구(윤동원, 최지선, 2021), 사생활 보장, 돌봄 편의라는 구조요인이 환자의 참여라는 과정요인을 통해 환자의 만족이라는 결과요인을 만들어 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obayashi et al., 2021).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간 존중 환경은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활동 및 참여를 통해서는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당사자를 존중하는 환경에 제공되었을 때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삶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가져 활동과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논의(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2) 와 사뭇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이론에 근거하여 몇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먼저, 도나베디안의 이론에 근거하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 제공하는 인간 존중 환경만으로는 정신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 유발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시설 내에서의 존중에서 더하여 후견 서비스, 절차보조 서비스 등 정신장애인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인간 존중 환경이라는 구조와 회복이라는 결과 사이에 활동 및 참여 이외에 다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겠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표본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이 표본 대부분을 구성하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활동 및 참여를 유도하는 인간 존중 환경 기반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의 부족이 활동 및 참여로 이어지는 것을 제한했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치료 및 재활모델 하에서 제공되었던 서비스의 경우 정신장애인에게 부정적 경험을 만들어 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박은주, 2011; 황숙연, 2007; Deegan, 1988),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인권에 기반하여 조성되는 경우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권에 기반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적정 수준과 사생활 보장, 정신과 신체 건강 보장,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회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적정생활 수준과 사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입원한 정신장애인이 선호에 맞는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WHO, 2012). 많은 정신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치료를 목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는데, 원하는 시간에 밥이나 간식을 먹지 못하고, 원하는 공간과 시간에 잠들지 못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모든 선호를 존중하는 데 제약이 있겠지만 적어도 비정신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같은 수준에서 선호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과 신체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개별 회복 계획 수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실천이 요구된다(WHO, 2019). 정신장애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이유로 원하는 약물을 선택하는 데 제약을 경험하고, 일부 정신장애인은 신체적 문제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제철웅 외, 2022). 정신장애인이 인간으로서 필요한 정신과 신체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결정권 침해와 학대 및 폭력 상황은 주로 환자와 직원 간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다(WHO, 2019). 최근 문제가 된 격리 및 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 역시, 정신장애인이 격리와 강박에 대해 호소하는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숨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남인순 의원실 외, 202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 관계에 스며든 직원 스스로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다(WHO, 2019).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정기적인 보수 교육과 내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지원 의사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확인 목록을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WHO, 2019). 국내 입원병원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보장 서비스의 일환으로 퇴원계획 서비스를 통해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정신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한 직후부터 퇴원계획을 수립하며, 이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직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다학제 접근을 적용하고 있다(제철웅 외, 2022).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퇴원계획을 정식 서비스로 도입하여, 입원 직후부터 필요에 따라 퇴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학제 간 협업이 요구된다(강상경 외, 2021).
둘째,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자립 지원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3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3, pp. 139-143), 정신재활시설 역시 신체 건강 보장과 퇴소 계획 수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p. 189, 191, pp. 193-200).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일부 시설에서는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관의 인력과 예산 상황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의 실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WHO(2019)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을 위해 자립 지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회복 계획 수립 도구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자립 지원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시설에서의 인간 존중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증진한 점을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을 존중하는 실천과 문화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 내에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WHO, 2019).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의 식사 시간,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 작은 일과부터 정신장애인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하고 선택에 따른 충분한 설명과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WHO, 2019). 이러한 접근은 정신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회복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인간 존중 환경을 위해 도입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사전 계획 수립이 있다(WHO, 2019). 사전 계획 수립은 정신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협의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응급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이 선호하는 대응 방법이나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포함하며, 정신장애인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치료나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문서화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WHO, 2019). 이러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해 정신장애인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복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넷째, 인권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WHO, 2019, pp. 22-23). 그러나 국내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과 입원병원의 인력으로는 양질의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정책적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축소를 지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례관리자 수 1인당 44명 혹은 106명을 사례 관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보건복지부, 최혜영 의원실, 2023),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모두 상황은 유사하다(보건복지부, 2023, p. 151, pp. 175-178). WHO에서 우수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행정직원 등 총 58명의 직원이 매월 약 400명 정도의 회원의 회복을 지원한다(WHO, 2019). 브라질의 사례가 최선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충분한 인력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 현장에서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실천 노력이 지속 및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로 사회에서 참여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원을 받는 것을 뜻한다(UN, 2006). 이에 경제활동, 대인관계, 이동, 시민 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미국 장애인법은 고용주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장애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EEOC, 2024).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와 구체적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지원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 당사자 단체, 자조 모임 등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현재 이러한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통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조윤화 외, 2022). 또한, 이동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현재 신체장애인 중심의 기준으로 되어있어 정신장애인은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때문에 이동과 건강 관련 편의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활동 지원 평가 기준이 보완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 이용표 외, 202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한계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인권 모델에 따른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을 회복 영향요인으로서 검증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근거한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간 존중 환경과 회복 간의 관계에 있어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명확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증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을 매개 변인으로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에 도나베디안의 이론을 적용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본 것에 함의가 있지만,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활동 및 참여, 회복의 관계가 시설 유형, 유병기간, 장애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분석해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권친화적 환경에 해당하는 법, 제도, 서비스 중 서비스 요인만을 인권친화적 환경으로 정의하여 검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제도 및 법적 차원에서의 인권친화적 환경의 영향력 검증이 동반되어야겠다. 본 연구의 표본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으로 대부분 구성되었고, 입원병원에서의 서비스 경험은 최근 5년 이내 경험한 내용을 회고적으로 측정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병원 입원 당시 인지한 서비스 경험이 장기적인 회복에 미치는 영향,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998). Is recovery planning any different from treatment planning?.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5(1), 37-42. [PubMed]
(2002). Mental health recovery paradigm: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Health & Social Work, 27(2), 86-94. [PubMed]
, , , , , & (2013). Stressed spaces: mental health and architecture. HERD: Health Environments Research & Design Journal, 6(4), 127-168. [PubMed]
, , , , , , , , & (2009). Initial outcomes of a mental illness self-management program based on wellness recovery action planning. Psychiatric Services, 60(2), 246-249. [PubMed]
(1989). The end results of health care: Ernest Codman’s contribution to quality assessment and beyond.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67(2), 233-256. [PubMed]
, , & (2018). Place for being, doing, becoming and belonging: A meta-synthesis exploring the role of place in mental health recovery. Health & Place, 52, 110-120. [PubMed]
(2024).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Decisions. https://www.eeoc.gov/disability-discrimination-and-employment-decisions
, , , & (2005). Implementing recovery oriented evidence based programs: Identifying the critical dimension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1, 141-158. [PubMed]
, , , , , , , , & (2012). Evaluation of mental health recovery and Wellness Recovery Action Planning education in Ireland: A mixed methods pre–post evalu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8(11), 2418-2428. [PubMed]
, , , & (2011).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ose with schizophrenia: A systema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1), 84-105. [PubMed]
, , & (2011). Patient perception of nursing service quality; an applied model of Donabedian’s structure‐process‐outcome approach theory.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25(3), 419-425. [PubMed]
, & (2005). Recovery from schizophrenia: a concept in search of research. Psychiatric Services, 56(6), 735-742. [PubMed]
(2022). Ernest Amory Codman and the End Result Idea in Surgical Quality. The American Surgeon, 89(11), 4237-4240. [PubMed]
(2016). The role of self-determination in mental health recovery.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39(1), 77-80. [PubMed]
, , , , , & (1994). Client Outcomes II: Longitudinal client data from the Colorado treatment outcome study. Milbank Quarterly, 72(1), 123-148. [PubMed]
(1955). Approaches to the quality of hospital care. Public Health Reports, 70(9), 877-886.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024642/pdf/pubhealthreporig00165-0065.pdf
, , , , , , & (2011). An online recovery plan program: can peer coaching increase participation?. Psychiatric Services, 62(6), 666-669. [PubMed]
, , , , , , & (2015). Development of the REFOCUS intervention to increase mental health team support for personal recover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07(6), 544-550. [PubMed]
(2012). WHO QualityRights Tool Kit.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1548410
(2019).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qualityrights-guidance-and-training-tools
(2021).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guidance-and-technical-packages-on-community-mental-health-services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7-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9-09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09-26

- 575Download
- 2423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