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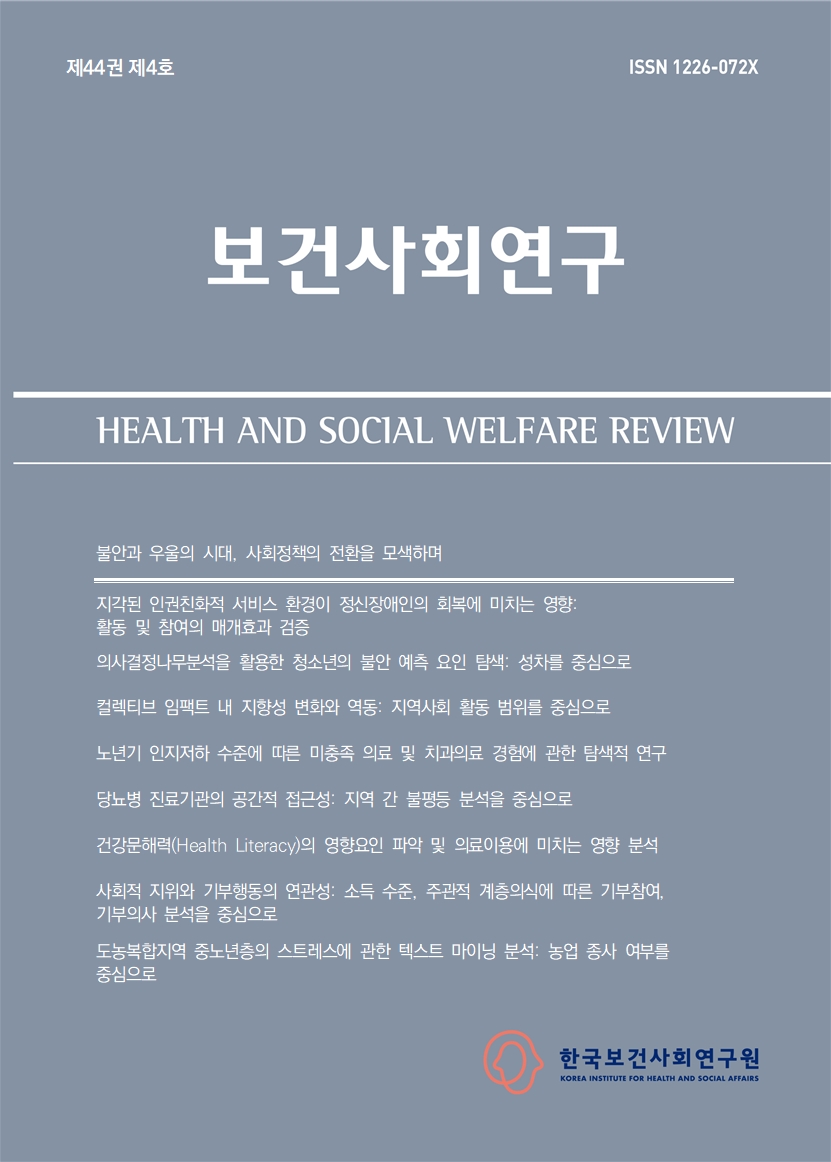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불안 예측 요인 탐색: 성차를 중심으로
A Decision Tree Analysis to Explore Predictors of Adolescent’s Anxiety: Focusing on Sex Differences
Yu, Seunghee1
보건사회연구, Vol.44, No.4, pp.29-53, December 2024
https://doi.org/10.15709/hswr.2024.44.4.29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학업 부담과 진로 탐색 등 사회적 과업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소년은 불안에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청소년 불안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가 비일관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불안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으며 부모가 일관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잘 지원해줄 때 불안이 가장 낮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족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불안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부모가 일관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 때 불안이 가장 낮았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불안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개성,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 물질만능주의, 과한 남의식, 경쟁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자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지원이 더욱 필요하며, 여자 청소년은 스트레스 관리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We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predicting anxiety in adolescents by sex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3,94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2021 Survey on the Mental Health of Teenager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r data analysis, the CHAID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 algorithm was employed as the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group with the highest anxiety among male adolescents consisted of those with low self-esteem and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In contrast, the group with the lowest anxiety among male adolescents had high self-esteem, positive family relationships, 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and strong community support. Among female adolescents, those with the highest anxiety exhibited low self-esteem and poor family relationships. Conversely, the group with the lowest anxiety among female adolescents showed high self-esteem, low stress levels, 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an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d effective and targeted action plans to alleviate symptoms in adolescents with high anxiety and prevent anxiety according to sex-specific factors.
초록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적용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불안 예측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청소년 3,94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 알고리즘인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고 지역 사회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라 불안이 높은 청소년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청소년의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청소년기는 성인과 아동의 과도기로서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변화가 크며 학업 부담과 진로 탐색 등 사회적 과업이 많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 갈등, 과제수행에 대한 성공과 실패 경험,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욕구 간의 갈등, 진로 고민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정서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김성수, 2013; 강정정애, 2016). 불안(anxiety)은 일반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고 긴장을 느끼는 상태로서, 장차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 미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어 자기 안전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도금혜, 2008; Jbireal & Azab, 2019).
한국 청소년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과 과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업 부담이 높고, 학업 성취, 외모, 사회적 지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그에 따른 평가가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강정애, 2016).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성취나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도태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낄 수 있다(김진호, 홍세희, 2012). 이러한 현상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한 사회적 비교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소영, 2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6월에 발표한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현황 분석에서 10대 청소년의 불안장애 환자수는 2017년 17,763명에서 2022년 31,701명으로 5년 새 78.5%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또한 10대 청소년 중 불안장애 환자수는 남자 13,427명, 여자 18,274명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실시된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청, 2022)에서는 범불안장애 선별도구(Seven-item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7)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중등도 이상 범불안장애 경험률이 12.7%로 2020년 11.2%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15.9%)의 범불안장애 경험률이 남학생(9.7%)보다 높았다.
적절한 불안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긴장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진호, 홍세희, 2012). 불안이 높은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과민하고 학업 수행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사회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 홍강의, 2014). 또한 청소년의 불안이 방치될 경우, 비행, 약물남용, 우울, 자살 등의 정신병리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성수, 2013; 박진아, 2001; 정혜경 외, 2003). 이에 청소년의 불안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불안 관련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불안은 성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신민정 외, 2012; 질병관리청, 2022).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불안이 높다고 보고된다(김진호, 홍세희, 2012; 도금혜, 2008; Zahn-Waxler et al., 2006). 이는 청소년기 여자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불안과 관련된 호르몬의 증가,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분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빠르게 발달하는 것, 여자에게 외모, 대인관계, 사회적 수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더 큰 것, 학교나 가정에서 여자에 대해서는 과잉 보호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남자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성별에 따른 다른 대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영주, 2020; 한민 외, 2012; Cyranowski et al., 2000; Nolen-Hoeksma, 2000). 특히 여성에게는 감정 표현이 사회적으로 더 허용되는 반면, 남성에게는 억제하도록 요구되는 문화는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불안한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남자 청소년은 불안의 감정이 겉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내면화되어 분노, 충동, 적대적 행동의 형태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한미향, 2014; Naito et al, 2005). 여자 청소년의 불안은 우울증, 사회적 위축, 회피행동, 의존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이창우 외, 2021; Simonds & Whiffen, 2003), 남자 청소년의 불안은 약물 남용이나 폭력 행동과 같은 위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정미, 양명숙, 2006; Hammerslag & Gulley, 2016). 이처럼 청소년기에 성별에 따라 생물학적 특성 및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른 불안의 수준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불안에 대한 개입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불안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심리적 요인, 가정환경, 사회환경 등이 성별에 따라 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강정애, 2016; 김성수, 2013; 한성철, 2008; 한세영, 한아름, 2018),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특성에 보다 적합한 불안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안은 유전적•생물학적 소인을 가진 청소년에게 나타날 위험이 크지만, 스트레스 상황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불안을 강화해 병리적으로 이행할 위험도 있다(Stein & Sareen, 2015). 이처럼 불안은 개인의 내적·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불안을 예측하는 데 있어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청소년의 불안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몇몇 진행되었으나(강정애, 2016; 김성수, 2013; 심혜선, 전종설, 2018; 한세영, 한아름, 2018), 주로 상관관계분석이나 다중회귀분석 통계기법을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변수들 간의 다양한 결합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불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또한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전체 데이터를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특정 값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형태의 구조로 시각화하는 기법이다(김구, 2002). 이 방법은 여러 예측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하고 각 요인의 예측력을 평가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다양한 결합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중요도를 제시할 수 있다(김구, 2002; Shmueli et al., 2011).
청소년 불안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불안의 중요한 예측 요인들을 분류하고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은 청소년 불안의 예방 및 관리 전략의 구축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청소년 불안의 예측 모형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것은 청소년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 요인과 불안의 위험집단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모형으로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청소년 불안의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효율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불안의 예측 요인을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청소년 불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식체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심리적 요인, 가정환경, 사회환경 등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이 성별에 따라 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조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변수들의 중요도, 예측 요인들의 성차 등을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불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불안 관련 요인
그동안 청소년의 불안 예측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심리적 요인, 가정환경, 사회환경 등이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애, 2016; 김성수, 2013; 한성철, 2008; 한세영, 한아름, 2018).
가. 심리적 요인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감정적 불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이 직면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불안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애, 2016; 김린 외, 2014). 청소년기는 소아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전환기로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정체성 확립, 대인관계 형성, 학업 수행, 진로 탐색 등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은 시기이다(오승환, 2016; Steinberg, 2005). 청소년들은 급격한 변화와 많은 발달과업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부담이 크고 다양한 스트레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한국의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체계로 인해 학업 부담이 크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더욱 클 수 있다. 청소년기에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불안장애로 발전하거나 기존의 불안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청소년 불안에 있어서 스트레스적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김붕년, 2007; 조성경, 최영실, 2014).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개인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Seema & Venkatesh, 2017). 다수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후남, 2007; 도금혜, 2008; 심혜선, 전종설, 2018). 현대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높은 기대와 경쟁을 요구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학업 성취, 외모,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최명섭, 이지연, 2019).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청소년은 경쟁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손재환, 2017). 따라서 청소년의 불안을 연구할 때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복합적인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가정환경
가정은 인간의 성장 발달을 위한 교육과 사회화의 기본이 되는 환경으로서, 인간은 가정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 태도, 정서적 통제 및 기타 행동의 습관을 조성하게 된다(허남순, 이칭찬, 2003). 따라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비롯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은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김갑숙, 전영숙, 2009; 이정숙, 2016; 한세영, 한아름, 2018). 가족구성원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이정숙, 2016).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형제자매 간의 지지, 부모의 애정적이고 일관된 양육 태도는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을 덜 느끼게 하는 보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김갑숙, 전영숙, 2009; 김성수, 2013; 최영숙, 김정민, 2008). 반면에 부모의 과잉간섭이나 심리적 통제, 부모 간 양육 태도의 불일치 등은 청소년의 자율성과 정서적 독립을 저해하고 불안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이정숙, 2016; 조은우, 이은희, 2013; 황예델, 이경순, 2019).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반면, 가족 내 지지 체계는 불안을 완화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김성수, 2013; 이정숙, 2016).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갈등이나 지지를 통해 외부 세계에서의 대인관계를 학습하고, 그에 따라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최영숙, 김정민, 2008). 경제적 박탈은 가족 내 갈등을 증가시키고,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청소년의 불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한세영, 한아름, 2018).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 내 의사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사회환경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개인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정애, 2016).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공감과 이해 등의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심희옥, 2000; 이은희, 정순옥, 2006).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는 청소년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를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김건숙 외, 2014). 하지만 친구들 간의 비교나 배제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배정은, 2016). 친밀한 친구가 없거나 친구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은 사회적 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심리적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강정애, 2016; Kong et al., 2020).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주요 학습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행동이 청소년의 성장 및 정서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성수, 2013).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 격려, 훈계, 조언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정서문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한성철, 2008). 실제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수, 2013). 교사의 격려와 지지는 학생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할 때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청소년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교사의 인정과 지지를 받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할 경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Kurdi & Archambault, 2018).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넓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기능과 사회적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으로서도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소년의 정체성의 일부분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최경옥, 2015; Fitzpatrick & LaGory, 2000). 지역사회 내의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은 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불안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최경옥, 2015). 가령, 지역사회의 청소년 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상담 서비스 등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경옥, 2017). 반면에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은 청소년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강현아, 2010). 가령, 범죄율이 높거나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라는 청소년은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이는 불안감으로 연결될 것이다(김세원, 2009). 이처럼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지역사회 환경은 청소년기의 불안 형성 및 발달에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불안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이들이 속한 사회적 환경과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불안의 성차
다수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호, 홍세희, 2012; 도금혜, 2008; 문경주, 오경자, 2002; Zahn-Waxler et al., 2006). 이는 성별에 따라 성호르몬과 뇌의 신경전달물질이 기분 상태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Cyranowski et al., 2000),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반추적 사고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Nolen-Hoeksema, 2000), 발달과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정신적 외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일 수 있다(Hammen & Rudolph, 2003).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은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기대와 요구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성역할은 정서의 경험과 표현, 사고방식, 가치관 등에서의 성차를 가져올 수 있다(조영주, 2020; 한민 외, 2012).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는 양육과 조화, 보살핌, 관계성을 더 많이 기대하는 반면, 남성에게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고 싸우며 장애물과 위험을 극복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성역할이 요구되어 왔다(손영미 외, 2017).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자신의 정서 표현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이 사회문화적으로 더 허용된다(Naito et al., 2005). 하지만 남자아이는 슬픔, 두려움, 불안, 수치, 죄책감 등의 정서 표현은 위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지며 억제하도록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자 청소년의 불안 수준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자 청소년이 불안한 정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표현하기 때문일 수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성역할 정체감으로 인해 남자는 재정적·심리적으로 더 독립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부모와 정서적으로 더 연결되어 있으며 부모와의 갈등에 민감하고 의존성을 보일 수 있다(박현주, 정대용, 2010; 조영주, 2020). 부모는 남아보다 여아의 행동을 더 제한하며, 능력이나 성취에 있어서는 남아에게 더 많이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Nolen-Hoeksma, 2000). 이러한 성역할과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는 청소년의 불안에서의 성차와 관련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를 분석한 문경주와 오경주 (2002)의 연구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동일하게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과잉간섭은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양육태도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남녀 청소년의 성차는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김소영, 2013; Bleidom et al., 2016),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민정 외, 2012; Moksnes et al., 2010). 또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관계지향적인(interpersonal-oriented) 성향을 나타낸다(Girgus & Yang, 2015).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가 높고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큰 책임감을 갖는다(윤태교, 이지민, 2020).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하며, 타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타인으로부터의 거부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아, 이인혜, 2016; Malat et al., 2006).
이러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성차는 불안의 성차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 불안의 성차가 명확하고 불안의 원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불안 예측 요인의 성차를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며, 있다 하더라도 연령이나 특정 양육태도 등 일부 변수들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문경주, 오경주, 2002, 신민정 외, 2012). 청소년기에 성별에 따라 생물학적 특성 및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불안의 정도, 원인 및 결과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불안에 대한 개입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가정환경·사회환경 요인들의 성차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맞춤형 개입 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불안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를 주로 평균 분석이나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문경주, 오경주, 2002, 신민정 외, 2012).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불안의 다양한 예측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고,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의 다차원적인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전통적인 통계기법이 놓치기 쉬운 비선형적 상호작용 및 복합적 요인들의 영향을 밝혀내는 데 적합하므로(김구, 2002), 이를 통해 성별 차이에 따른 불안 예측 요인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층화집락추출 방법으로 2021년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5,937명을 표집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4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성별 구성은 남자 청소년 2,048명(52%), 여자 청소년 1,892명(48%)이고, 학교급 구성은 중학생 1,959명(49.7%), 고등학생 1,982명(50.3%)이다.
가. 불안
불안은 한국형 정신건강 선별도구 불안(Mental Health Screening for Anxiety Disorder, MHS:A) 척도의 11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 간 신뢰도는 0.928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점 척도(0=결코 그렇지 않다, 1=드물게 그렇다, 2=때때로 그렇다, 3=자주 그렇다, 4=항상 그렇다)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값의 총합을 불안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불안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나. 심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10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문항 간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0.856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0문 항을 평균한 후, 2.5점 미만은 ‘낮음(=1)’으로, 2.5점 이상은 ‘높음(=2)’으로 코딩하였다. 스트레스는 지난 한달 동안 인지한 스트레스로서 한국판 청소년용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Korean Version of Perceived Stress Scale for Adolescents: KPSS-A)의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0=전혀 없었다, 1=거의 없었다, 2=가끔 있었 다, 3=꽤 자주 있었다, 4=매우 자주 있었다)로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0.849이다.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의 값들을 평균한 후, 2.5점 미만은 ‘낮음(=1)’으 로, 2.5점 이상은 ‘높음(=2)’으로 코딩하였다.
다. 가정환경 변수
가정환경 변수는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일관성), 가족관계, 가정형편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는 Skinner 외(2005)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용 부모 양육태도 척도(PSCQ_A)가 한국판으로 번안된 청소년용 부모 양육태도 척도(PSCQ_KA)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일관성 등의 6개 요인,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스함(신뢰도=0.948), 자율지지(신뢰도 =0.932), 구조제공(신뢰도=0.856), 거부(신뢰도=0.727), 강요(신뢰도=0.821), 비일관성(신뢰도=0.841)은 각각 4개의 문항들로 측정되었고,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답변이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의 문항들의 값을 평균한 다음, 2.5 미만을 ‘낮음(=1)’, 2.5 이상을 ‘높음 (=2)’으로 코딩하였다.
가족관계는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건강·안전(보호) 지표’(최인재 외, 2010)에서 제시된 ‘가족관계의 질’에 관한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의 4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0.951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문항들의 값을 평균한 후, 2.5 미만은 ‘낮음(=1)’으로, 2.5 이상은 ‘높음(=2)’으로 코딩하였다. 가정형편은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못 산다(=1)’부터 ‘매우 잘 산다(=7)’로 측정된 것을 1부터 3은 ‘낮음(=1)’, 4는 ‘보통(=2)’, 5부터 7은 ‘높음(=3)’으로 코딩하였다.
라. 사회환경 변수
사회환경 변수는 친구관계, 교사관계, 지역사회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친구관계는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건강·안전(보호) 지표’(최인재 외, 2010)에서 개발된 지표 중 친구와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3개의 문항(신뢰도=0.881)으로 측정되었고, 교사관계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태도와 친밀한 교류를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3개의 문항(신뢰도=0.892)으로 측정되었다. 지역사회 지원 변수는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지역사 회의 돌봄이나 지원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 3개(신뢰도=0.857)로 측정되었다. 지역사회 지원 정도를 측정하는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의 4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좋으며 지역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각 변인의 측정 문항들 의 값을 평균한 다음, 2.5 미만을 ‘낮음(=1)’으로, 2.5 이상을 ‘높음(=2)’으로 코딩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불안 예측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데이터 간의 관계, 규칙, 패턴 등을 탐색하고 모형화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이다(김구, 2002). 이 분석 기법의 의사결정 규칙은 재귀적 분할을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중요도를 나무구조로 도식화하여 제시하게 때문에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용이하다(Shmueli et al., 2011). 이는 유용한 독립변수를 찾아내고,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의 결합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이다(김구, 2002).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비모수적 기법으로서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으므로, 특정한 분포 형태를 따를 필요가 없다(임은정, 정순희, 2015). 이러한 비모수적 분석기법은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다수의 독립변수가 존재하거나, 이들 변수 간에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또한 비모수적 기법은 데이터의 결측치나 이상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여, 불완전한 데이터로도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가정환경·사회환경 관련 변수들 간의 조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와 예측 변수들의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밝히고자 하므로, 규칙 기반으로 분기하면서 예측을 수행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중요도 순서와 변수 간 결합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분석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 알고리즘으로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를 활용하였다. CHAID는 통계량의 유의확률을 기준으로 나무구조의 최적 분할을 위해 분리와 병합을 반복하는 기법이다(이지연, 이영주, 2021). 본 연구에서는 분리와 병합을 위한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하였다. 나무 깊이가 너무 작으면 자료를 과소적합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너무 크면 자료를 과대적합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전 가지치기(Pre-Pruning)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나무의 최대 깊이를 미리 지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나무의 최대 깊이는 노드의 개수, 규칙의 타당성,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4로 지정하였다. 또한 최소 케이스 수는 부모 노드는 100, 자식 노드는 50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와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초통계에서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의 범주에 해당하는 남녀 청소년의 빈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범주화하기 이전의 변수들의 평균값을 제시하였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남녀 청소년의 변수들의 평균값 차이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의사결정나무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불안의 평균값은 남자는 3.63, 여자는 4.98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t=-0.06, p<.001). 자아존중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t=7.02, p<.001). 스트레스는 남녀 모두 ‘낮음’이 95% 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t=-10.12, p<.001).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구분 | 변수명 | 변수값 | 남 | 여 | 독립표본 t-검정 | ||
|---|---|---|---|---|---|---|---|
| 빈도(명) | % | 빈도(명) | % | t | |||
| 심리적 변수 | 자아존중감 | 낮음 | 284 | 13.8 | 433 | 22.9 | 7.02*** |
| 높음 | 1,765 | 86.2 | 1,459 | 77.1 | |||
| 평균(표준편차) | 3.03(0.55) | 2.89(0.61) | |||||
| 스트레스 | 낮음 | 2,002 | 97.7 | 1,802 | 95.2 | -10.12*** | |
| 높음 | 46 | 2.3 | 90 | 4.8 | |||
| 평균(표준편차) | 1.19(0.77) | 1.43(0.71) | |||||
| 가정환경 변수 | 따스함 | 낮음 | 165 | 8.1 | 114 | 6.0 | -3.94*** |
| 높음 | 1,883 | 91.9 | 1,778 | 94.0 | |||
| 평균(표준편차) | 3.35(0.7) | 3.43(0.63) | |||||
| 자율지지 | 낮음 | 169 | 8.3 | 95 | 5.0 | -2.77** | |
| 높음 | 1,879 | 91.7 | 1,797 | 95.0 | |||
| 평균(표준편차) | 3.35(0.71) | 3.41(0.6) | |||||
| 구조제공 | 낮음 | 314 | 15.3 | 274 | 14.5 | 1.59 | |
| 높음 | 1,734 | 84.7 | 1,618 | 85.5 | |||
| 평균(표준편차) | 3.02(0.72) | 2.98(0.65) | |||||
| 거부 | 낮음 | 1,809 | 88.3 | 1,739 | 91.9 | 1.74* | |
| 높음 | 239 | 11.7 | 153 | 8.1 | |||
| 평균(표준편차) | 1.57(0.72) | 1.54(0.58) | |||||
| 강요 | 낮음 | 1,506 | 73.5 | 1,517 | 80.2 | 5.43*** | |
| 높음 | 542 | 26.5 | 375 | 19.8 | |||
| 평균(표준편차) | 1.94(0.74) | 1.82(0.65) | |||||
| 비일관성 | 낮음 | 1,636 | 79.9 | 1,544 | 81.6 | -0.03 | |
| 높음 | 412 | 20.1 | 348 | 18.4 | |||
| 평균(표준편차) | 1.79(0.73) | 1.79(0.64) | |||||
| 가족관계 | 낮음 | 189 | 9.2 | 150 | 7.9 | -1.88* | |
| 높음 | 1,859 | 90.8 | 1,742 | 92.1 | |||
| 평균(표준편차) | 3.36(0.68) | 3.4(0.64) | |||||
| 가정형편 | 낮음 | 208 | 10.2 | 201 | 10.6 | 2.72** | |
| 보통 | 923 | 45.1 | 942 | 49.8 | |||
| 높음 | 917 | 44.8 | 749 | 39.6 | |||
| 평균(표준편차) | 2.35(0.66) | 2.29(0.65) | |||||
| 사회환경 변수 | 친구관계 | 낮음 | 200 | 9.8 | 169 | 8.9 | -0.15 |
| 높음 | 1,848 | 90.2 | 1,723 | 91.1 | |||
| 평균(표준편차) | 3.34(0.7) | 3.34(0.67) | |||||
| 교사관계 | 낮음 | 564 | 27.6 | 626 | 33.1 | 5.09*** | |
| 높음 | 1,484 | 72.4 | 1,266 | 66.9 | |||
| 평균(표준편차) | 2.95(0.84) | 2.82(0.82) | |||||
| 지역사회지원 | 낮음 | 443 | 21.6 | 540 | 28.5 | 4.85*** | |
| 높음 | 1,605 | 78.4 | 1,352 | 71.5 | |||
| 평균(표준편차) | 3.06(0.81) | 2.93(0.85) | |||||
| 종속변수 | 불안 | 평균(표준편차) | 3.63(6.46) | 4.98(7.53) | -6.06*** | ||
| 최솟값, 최댓값 | 0, 44 | 0, 43 | |||||
| N | 2,048 | 1,892 | |||||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따스함과 자율지지는 ‘높음’이 90% 이상으로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다(t=-3.94, p<.001). 구조제공은 ‘높음’이 남녀 모두에게 85% 내외로 나타났다. 자율지지는 ‘높음’이 남녀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았다(t=-2.77, p<.01).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거부는 남자는 ‘높음’이 12%, 여자는 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높았다(t=1.74, p<.05). 강요적 양육태도는 남자의 경우 ‘높음’이 27%, 여자의 경우 20%로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t=5.43, p<.001). 비일관적 양육태도는 남녀 모두 ‘높음’이 20% 내외로 거부적 양육태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남녀 모두 ‘높음’이 90% 내외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좋은 가족관계를 나타냈다(t=-1.88, p<.05). 가정형편은 ‘보통’ 이상인 비중이 남녀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가정형편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t=2.72, p<.01).
친구와의 관계는 남녀 모두 ‘높음’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의 관계는 남자의 경우 ‘높음’이 72%, 여자의 경우 67%로 나타나, 여자에 비해 남자가 교사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t=5.09, p<.001). 지역사회 지원은 남녀 모두 ‘높음’이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여자에 비해 남자가 지역사회 지원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t=4.85, p<.001).
2. 의사결정나무분석
남자 청소년의 불안 예측모형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고,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높은 조합의 노드의 순서를 나타내는 이익도표는 <표 2>와 같다.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10-fold 교차검증을 통해 위험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차검증 결과, 훈련데이터의 성능을 의미하는 재치환 추정값과 검증 데이터에서의 성능을 의미하는 교차검증 추정값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모형은 훈련데이터에 과도하게 맞춰진 과적합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반화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송태민, 송주영, 2013). 남자 청소년의 이익도표에서 불안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노드는 6으로서 99명(4.7%)이 속하며, 이 그룹의 남자 청소년의 불안의 평균값은 11.98이었다. 노드 6 다음으로 불안 수준이 높은 노드는 노드 5(188명, 9%, 불안 평균: 7.729), 노드 4(115명, 5.5%, 불안 평균: 6.487), 노드 8(293명, 14%, 불안 평균: 3.71), 노드 10(217명, 10.4%, 불안 평균: 3.318), 노드 9(1,184명, 56.5%, 불안 평균: 1.9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 불안 의사결정나무 이익도표
| 남 | 여 | ||||||
|---|---|---|---|---|---|---|---|
| 노드 | N(명) | 백분율 | 평균 | 노드 | N(명) | 백분율 | 평균 |
| 6 | 99 | 4.7% | 11.980 | 6 | 96 | 4.8% | 17.135 |
| 5 | 188 | 9.0% | 7.729 | 10 | 68 | 3.4% | 12.941 |
| 4 | 115 | 5.5% | 6.487 | 4 | 58 | 2.9% | 11.379 |
| 8 | 293 | 14.0% | 3.710 | 9 | 287 | 14.3% | 9.467 |
| 10 | 217 | 10.4% | 3.318 | 14 | 97 | 4.8% | 6.206 |
| 9 | 1,184 | 56.5% | 1.901 | 13 | 100 | 5.0% | 4.020 |
| 12 | 299 | 14.9% | 3.773 | ||||
| 11 | 1,002 | 49.9% | 1.961 | ||||
표 3
교차검증 결과
| 남 | 여 | |||
|---|---|---|---|---|
| 방법 | 추정값 | 표준오차 | 추정값 | 표준오차 |
| 재치환 | 32.885 | 2.349 | 37.701 | 2.020 |
| 교차검증 | 33.236 | 2.385 | 39.577 | 2.143 |
나무구조의 가장 위에 위치한 네모(노드 0)는 뿌리마디로서, 예측변수(독립변수)가 투입되기 전 종속변수(불안)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뿌리마디에서 남자 청소년의 불안은 3.551로 나타났다. 뿌리마디 하단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요인이 남자 청소년의 불안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청소년의 불안이 3.551에서 9.195로 증가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불안 위험요인 중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부모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남자 청소년의 불안은 이전의 9.195에서 11.98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드 6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일관적인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은 노드 9로 청소년의 불안이 뿌리마디(노드 0)의 3.551에서 1.901 로 감소하였다. 노드 9의 의사결정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의 불안 보호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아존중감이고, 그다음은 가족관계, 일관적 양육태도, 지역사회 지원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의 남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가족관계가 좋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며 지역사회 지원이 높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불안 예측모형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고, 이익도표는 <표 2>와 같다. 여자 청소년의 이익도표에서 불안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노드는 6으로서 96명(4.8%)이 속하며, 이 그룹의 여자 청소년의 불안의 평균값은 17.135로 나타났다. 노드 6 다음으로 불안 수준이 높은 노드는 노드 10(68명, 3.4%, 불안 평균: 12.941), 노드 4(58명, 2.9%, 불안 평균: 11.379), 노드 9(287명, 14.3%, 불안 평균: 9.467), 노드 14(97명, 4.8%, 불안 평균: 6.206), 노드 13(100명, 5%, 불안 평균: 4.02), 노드 12(299명, 14.9%, 불안 평균: 3.773), 노드 11(1,002명, 49.9%, 불안 평균: 1.961) 순으로 나타났다.
뿌리마디(노드 0)에서 여자 청소년의 불안은 4.982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불안 예측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남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청소년의 불안이 4.982에서 11.623로 증가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불안 위험요인 중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가족관계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불안은 이전의 11.623에서 17.135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여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드 6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은 노드 11로 청소년의 불안이 뿌리마디(노드 0)의 4.982에서 1.961 로 감소하였다. 노드 11의 의사결정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의 불안 보호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아존중감이고, 그다음은 낮은 스트레스, 일관적 양육태도, 교사관계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의 여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스트레스가 적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며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불안 예측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가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가지는 청소년의 경우 불안 수준이 높아질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불안이 높게 나타난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후남, 2007; 도금혜, 2008; 심혜선, 전종설, 2018). 자아존 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불안은 주로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불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이준희, 조용태, 2006).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덜 의존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낮아질 수 있다(Seema & Venkatesh, 2017).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 가치, 외모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은 실패, 비판, 거절 등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초래하여 불안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호, 2013). 또한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갖게 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어 청소년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이은경, 한세영, 2016).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의 비일관성, 지역사회 지원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자 청소년 중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 불안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지지가 청소년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가족갈등이 적을수록 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최영숙, 김정민, 2008; 한세영, 한아름, 2018).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가족관계가 좋을 경우 자신의 가치를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기 개념을 더 긍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시연, 2014). 가족관계가 좋다는 것은 청소년이 가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이 스트레스나 불안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원은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가 좋으면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이 소속된 중요한 집단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김성수, 2013). 이러한 안정감은 외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소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어 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인 남자 청소년 중 지역사회 지원이 높은 경우 불안은 더욱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일관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을 덜 느끼게 하는 보호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김갑숙, 전영숙, 2009; 김성수, 2013; 최영숙, 김정민, 2008),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건전한 환경, 자원, 지지 등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강현아, 2010; Fitzpatrick & LaGory, 2000). 일관된 양육태도는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부모가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규칙을 유지하면, 청소년은 부모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때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어떤 행동이 기대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이 기대할 수 있는 반응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은경, 한세영, 2016).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청소년에게 안정감을 주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는 혼란과 불안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감정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청소년도 부모의 행동을 모델링하여 자신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chwartz et al., 2012).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포츠클럽, 정신건강사회복지센터 등과 같은 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시설,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적 기술을 배우며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정주 외, 2003).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압박, 실패와 같은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개인적인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황여정, 2012). 또한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아존중감으로 남자 청소년과 동일하였으나,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가족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관계 지향적인 성향이 강하고, 가족에게 의존적이며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조영주, 2020).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연결과 공감이 강할수록 여자 청소년은 불안한 상황에서 지지와 도움를 받는다고 느끼며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가 여자 청소년과 달리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로 나타난 것은 남자 청소년은 발달 과정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조영주, 2020). 부모가 일관되지 않은 양육 방식을 취하면, 남자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그들이 자율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와 충돌하여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은경, 한세영, 2016).
여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태도의 비일관성, 교사관계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 모두에게 자아존중감이 불안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중요하게 불안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불안을 낮추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난 변수는 남자 청소년과 달리 스트레스였다. 이러한 차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전략이 성별에 따라 다른 데서 기인할 수 있다. 가령, 남자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외향적으로 표출하거나 활동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겉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억압된 감정이 불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Zahn-Waxler et al., 2006). 또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반추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도한 생각이나 걱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불안이 더 쉽게 야기될 수 있다(Nolen-Hoeksema, 2000).
여자 청소년의 불안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족관계였고, 불안을 낮추는 보호요인에 교사관계가 포함되는 결과들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있고(Girgus & Yang, 2015), 이에 불안에 있어서 가족이나 교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윤태교, 이지민, 2020). 여자 청소년에게 교사와의 관계도 이러한 대인관계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교사의 평가나 피드백에 더 큰 정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비교를 더 많이 하며, 타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타인으로부터의 거부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교사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여자 청소년은 자기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이영아, 이인혜, 2016; Malat et al., 2006).
한편,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 중 지역사회 지원은 남자 청소년에게서만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강한데(장정윤, 2021),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운동 관련 프로그램은 남자 청소년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신체활동을 통해 불안과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적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충동적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외부로 거칠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이러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Zahn-Waxler et al., 2006).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에서 제공하는 상담, 조언,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남자 청소년은 스트레스 대처 기술, 의사소통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남자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충동적 행동이나 거친 감정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는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안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성적, 학벌, 외모, 부, 명예 등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며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자본주의적·물질만능주의적 문화 속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적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개성과 적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며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며, 부모의 기준이나 타인과 비교하여 자녀를 평가하는 자세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의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교육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의 관련성, 자녀의 개성과 적성을 존중하는 양육 방식,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법, 과한 사회적 비교와 타인의 인정 추구의 위험성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공부 이외에 학생 개개인의 개성,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발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정규 수업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팀을 이루거나 개별적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지역사회 봉사, 창업 아이디어 구상 등 실제 생활과 연계된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자아존 중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는 교내 전시회, 공연, 발표회, 창작물 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교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재능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보다 거시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 물질만능주의, 과한 남의식, 경쟁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남과의 비교, 물질적인 것을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는 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역시 자아존중감을 비롯하여 불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 워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물질적인 것보다 내면의 가치와 성숙함을 중요시하며,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성취 자체에 의미를 두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학벌주의를 줄이기 위해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교육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입시 제도를 학업 성적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들의 특기, 적성, 봉사 활동,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 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질적 성공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공공 미디어 에서 물질적 성공과 소비 지향적인 콘텐츠보다 내면의 가치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 지상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소비 교육 및 재정 관리 교육을 청소년 시기부터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과소비의 폐해를 가르치고 건전한 소비의 중요성을 알게 하며, 물질적 소유보다 내면적 가치의 중요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불안 수준이 높은 남자 청소년에게 개입할 때, 자아존중감을 우선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다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일관적일 경우 일관적으로 바꾸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일관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 처벌, 보상, 기대하는 행동 등을 변덕스럽게 제시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허묘연, 2004). 양육의 일관성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며, 자녀가 세상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에 부모의 반응이나 규칙이 일정하지 않으면, 청소년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게 되고, 이는 세상을 예측 불가능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일상 상황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커뮤니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등을 통해 제공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양육 태도 점검, 일관성 있는 규칙 설정 방법, 의사소통 기술 등의 주제를 다루며, 부모가 자녀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를 위한 1:1 코칭 및 그룹 상담 프로그램를 통해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비일관적인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나 관련 기관은 온라인 양육방식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부모들이 간편하게 자신의 양육 방식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양육 방식을 위한 맞춤형 피드백과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비일관적인 양육 방식을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불안이 가장 낮게 나온 남자 청소년 집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청소년의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자 청소년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필요가 있다. 남자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부모에게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 워크숍,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경청하고 공감하는 방법,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 나와 상대방의 생각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 등의 의사소통기술이 교육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론적 관점에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간 명확한 경계(open boundary) 설정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 간 경계가 명확하다는 것은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관심과 지지를 갖고 원활하게 상호작 용하지만,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가정 내에서 구별됨을 의미한다(김혜숙, 2016). 한국 사회는 부모가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개입하여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자녀와 부모의 역할이 혼돈된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 간의 갈등, 불안, 우울 등 불안한 정서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명확한 경계 설정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불안 감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이나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남자 청소년의 불안 예방을 위해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태도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지역사회 지원이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고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사회 내 스포츠 활동 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성인 또는 더 성숙한 청소년 멘토가 청소년과 1:1로 매칭되어 개인적인 관심, 지지,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대인관계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 수준이 높은 여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을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자 청소년에 대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가족관계이다.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가족 간 경계 설정 등의 가족치료를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한다면 불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불안이 가장 낮게 나온 여자 청소년 집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자 청소년의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 청소년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은 스트레스적 사건에 민감하고 반추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Nolen-Hoeksema, 2000),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명상, 요가, 호흡 운동, 스포츠 활동 등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자 청소년들이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머릿속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분산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호르몬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반추적 사고를 많이 하는 여자 청소년에게 전문가를 통한 인지적 재구조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사건을 긍정적·건설적으로 해석하는 사고구조를 형성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여자 청소년들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자 청소년들이 자주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여자 청소년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관성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교사와의 좋은 관계 형성이다. 여자 청소년이 대인관계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Girgus & Yang, 2015),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사와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여자 청소년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욕구와 감정 상태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과 개방적이고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선생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여학생의 발달 과정과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여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젠더 감수성, 심리적 지원, 의사소통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교사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남녀 청소년의 불안 예측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중요도와 변수들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불안이 높은 청소년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청소년의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됨으로 인해,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사회환경적 변수들만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뇌 기능, 신경전달물질, 성격, 기질 등 불안에 대한 개인의 생물학적·기질적 취약성이 불안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을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불안에 대한 개인의 생물학적·기질적 취약성을 측정한 후 그러한 변수와 심리적·사회환경적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해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의사결정나무는 작은 데이터 변동에 민감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서 매우 다른 나무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예측의 일관성을 저하시키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결과를 조합하여 분류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적합이나 잡음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앙상블 방법의 적용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시도해 볼 것을 권한다(Gupta et al., 2017).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인 SPSS는 통계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지만, 다른 데이터 마이닝 전용 프로그램(R, Python, SAS 등)에 비해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가령, SPSS에서는 R이나 Python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예: 신경망, 딥러닝, 강화학습 등)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 이어서 최신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커스텀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 또한 R이나 Python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클라우드 연동 기능이 제공되지만, SPSS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속도와 성능 면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SPSS는 기본적인 그래프와 통계 시각화를 제공하지만, R이나 Python에서 제공하는 고급 시각화 도구에 비해 시각적 표현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R이나 Python과 같은 데이터 마이닝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분석을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2023. 6. 12). ‘SNS’ 청소년 건강의 문제와 해결. 베터라이프뉴스. https://www.betterli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
, , , , , , & (2016).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 a cross-cultural window.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11(3), 396-410. [PubMed]
, , , & (2000). Adolescent onset of the gender difference in lifetime rates of major depression: a theoretical mode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1), 21-27. [PubMed]
, , & (2006).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positive self-presentation in health care. Social Science & Medicine, 62(10), 2479-2488. [PubMed]
(2000). The role of rumination in depressive disorders and mixed anxiety/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3), 504-511. [PubMed]
, , , , , & (2012). Parental behaviors during family interactions predict changes in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 59-71. [PubMed]
, & (2003). Ar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explained by gender differences in co-morbid anxiet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7(3), 197-202. [PubMed]
, & (2015). Clinical practic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73(21), 2059-2068. [PubMed]
(2005).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in adolesc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9(2), 69-74.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7-26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9-21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10-15

- 1104Download
- 8931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