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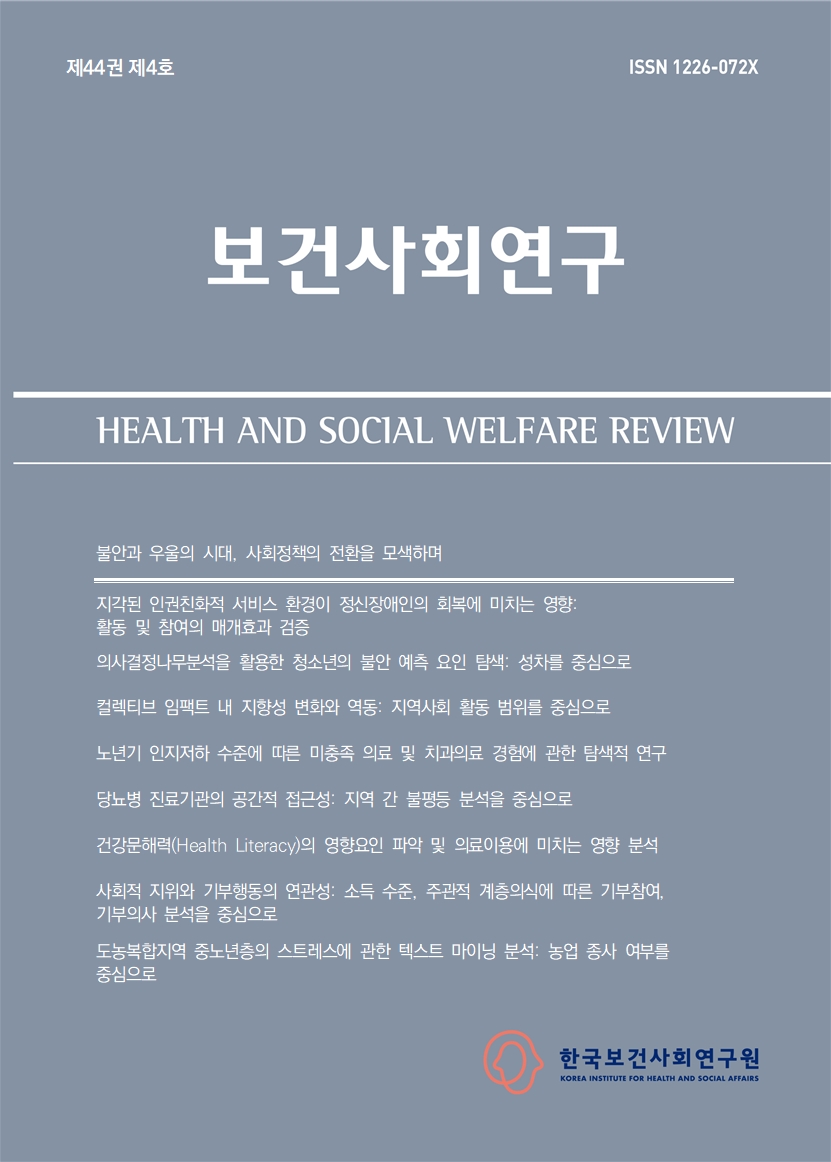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 행복성장이 그릿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piness and Happiness Growth Dur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n Grit and Sleep Quality
Lee, WooJin1; Choi, HeeChoel1; Kim, YoungMi1; Kang, HyeJin1*
보건사회연구, Vol.44, No.4, pp.392-419, 18 December 2024
https://doi.org/10.15709/hswr.2024.44.4.392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과 행복성장이 학생들의 삶에 유의한 이득(그릿, 수면의 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중·고등시기의 행복과 행복성장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행복성장 평균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1학년 시기에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고1학년 시기의 그릿(흥미유지와 노력지속)과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1학년에서 고1학년까지 행복이 지속적으로 향상될수록 고1학년 시기의 그릿(흥미유지와 노력지속)과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과 행복성장이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과 좋은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고려할 때, 중·고등학생의 초기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점진적으로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itial level) and happiness growth (rate of change) over time during the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from 7th grade to 10th grade) and investigates the effects of happiness (initial level) and happiness growth (rate of change) on grit (consistency of interest, persistence of effort) and sleep quality.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unconditional and conditional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s were tested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initial level of happiness was significant at the starting point (7th grade), and the average trajectory of happiness growth (rate of change) showed a decline over time. Second, the variances of both the initial level of happiness and happiness growth were significant. Third, greater initial levels of happiness and steeper growth trajectories of happiness from 7th to 10th grad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consistency of interest and persistence of effort in 10th grade. Fourth, higher initial happiness levels and greater growth in happiness over this period were significantly linked to better sleep quality in 10th grad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 average happiness trajectory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ends to decrease, individual trajectories vary. Given the positive influence of initial happiness and happiness growth on psychological resources (grit) and physical resources (sleep quality),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educational support to foster happiness and happiness growth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초록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 시기(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행복(초기치)과 행복 성장(변화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보고,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이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무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과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초기치)의 평균은 중1학년의 출발선에서 유의하였고, 행복성장(변화율)의 평균 궤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였다. 둘째,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의 변량은 모두 유의하였다. 셋째, 중1학년에서 고1학년까지 행복 궤적에서 행복(초기치)이 높을수록, 행복성장(변화율)이 높을수록 고1학년 시기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이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중1학년에서 고1학년까지 행복 궤적에서 행복(초기치)이 높을수록, 행복성장(변화율)이 높을수록 고1학년 시기의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들은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 평균 궤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라도, 개개인의 변화 방향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이 이들의 심리적 자원(그릿)과 신체적 자원(수면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때, 중·고등학생의 행복과 행복성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Ⅰ. 서론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국가별로 비교한 연구(염유식, 성기호. 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OECD 평균을 100점으로 설정하였을 때, 네덜란드는 115.21점으로 1위였으나, 한국은 79.50점으로 22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 청소년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 중기부터 청소년기는 정서적 격동과 스트레스(storm and stress)를 겪는 시기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Griffith et al., 2021). 특히 중·고등학생 시기의 청소년은 급격한 감정 변화를 보이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존재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지속적인 시험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상 세계와의 소통에 몰두하기도 한다. 이 시기는 또한 학교급 간 전환과 같은 환경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초등학생 시기와 다르게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오는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이 심할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 시기의 근면 대 열등 간의 갈등을 넘어, 정체성 확립 대 혼란이라는 갈등 상황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기(Erikson, 1959)여서 모든 청소년이 마냥 행복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추론을 뒷받침하듯, 중학생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행복 비교 연구 결과(한민 외, 2012)에 따르면, 중학생의 행복 수준은 대학생과 장년층(40~50대)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복에 관한 결과들은 청소년기 중·고등학생의 행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행복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역설적으로 연구자들 간에 행복의 합의된 정의가 내려지기보다 다양한 관점에 기반한 다양한 정의들이 공존하고 있다. 자기실현적 안녕과 쾌락적 안녕이 대표적이다(Disabato et al., 2016). 자기실현적 안녕은 Aristotle의 관점에서 유래하며, 좋은 삶이란 덕이나 탁월성을 발휘하는 삶이라고 한 것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으로 정의된다(Waterman, 1993). 한 연구 (Disabato et al., 2016)는 다양한 측면의 인간 잠재력이 잘 기능하는지를 측정하는 Ryff(1989)의 심리적 안녕으로 측정된 자기실현적 안녕이 잠재력의 발휘와 이론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기대되는 희망, 의미지향,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에 대해 쾌락적 안녕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실현적 안녕이 쾌락적 안녕과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고 시사한다. 쾌락적 안녕의 관점에서 Diener(1984)는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가 주관적 안녕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삶의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며, 긍정적 정서는 ‘행복, 만족, 흥분, 평온’ 등을 포함하며, 부정적 정서는 ‘화남, 슬픔, 불쾌함, 두려움’ 등을 포함한다. 이 정의에서 행복은 만족, 흥분, 평온과 함께 긍정적 정서의 일부로 여겨진다. 한편, 또 다른 쾌락적 안녕의 관점에서, 행복은 긍정적 정서의 잦은 경험으로 협소하게 정의되기도 한다(Lyubomisky et al., 2005). 이는 개인이 자주 느끼는 ‘행복한, 즐거운, 재미있는, 흥미로운’ 정서가 곧 행복이라고 본다. Kansky와 Diener(2017)는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과 안녕을 동일시하지만, 행복은 폭넓게 정의되는 주관적 안녕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한국인의 정서구조를 알아본 연구(최해연, 최종안, 2016)에 따르면, 행복은 긍정적 정서의 개별 범주(애정, 성취, 재미, 감동, 평안, 감사와 감동)에 속하기보다는 여러 요인에 걸쳐 교차 부하를 보여, 개별적 긍정적 정서를 포괄하는 용어로 해석되었다. 이는 한국인들이 개별적인 긍정적 정서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흡족하다고 느낄 때 행복을 경험한다고 시사한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개인화되어, 행복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관점(Disabato et al., 2016)과 맞닿아 있다. 즉, 모든 긍정적 정서에서 흡족해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치를 두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특정 정서에서 흡족하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해연과 최종안(2016)은 사람들이 편안한 상태를 행복으로 표현하거나, 자랑스럽고 정겨운 상태를 행복으로 보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최해연, 최종안, 2016; 최희철, 김영미 외, 2023)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긍정적 정서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 그리고 실제 행복의 측정에 있어서, 사람마다 행복을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의 범주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행복은 응답자에게 행복한 정도를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도록 개발되고 타당화된 주관적 행복 척도(Lyubomirsky & Lepper, 1999)에서의 점수를 뜻한다.
행복은 다양한 시간적 간격에서 측정될 수 있다. 횡단연구에서는 단일 시점으로, 단기 종단연구에서는 몇 개월 동안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장기 종단연구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측정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여러 번 행복을 측정하게 되면, 단기이든 장기이든 행복의 성장과 발달 궤적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궤적은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궤적은 반복측정을 할 때 간접적으로 관찰하고, 추정할 수 있는 잠재 궤적에 해당하며, 두 가지의 잠재성장요인(초기치, 변화율)으로 파악된다(Bollen & Curran, 2006). 그리고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은 첫째,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 궤적의 특성, 둘째, 개인별 궤적에서의 개인차 평가 즉, 초기치 변량, 개인별 궤적 간의 변량, 셋째, 초기치와 궤적에서의 변량을 예측하는 요인들(Bollen & Curran, 2006), 넷째, 초기치와 궤적의 변량에 의해 예측되는 결과요인을 알아볼 수 있다(Wickrama et al., 2016). 초기치 요인은 첫 조사 시점의 평균과 개인 간 차이 변량을 나타내며, 변화율 요인은 시간 경과에 따른 궤적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개인 간 차이 변량을 나타낸다. 이러한 궤적은 성장곡선 또는 시간 경로로 불리기도 한다. 개인별 궤적은 초기치의 높은 행복 수준이 시간이 지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초기치가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거나, 낮은 초기치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초기치가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등의 다양한 패턴을 갖는 성장곡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성장곡선을 결정하는 성장요인들의 모수치들은 잠재변인으로 다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 행복(초기치), 행복성장(변화율)으로 명명한다. 잠재성장모형에서 성장은 단순한 증가만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증가, 감소, 유지, 증가 후 감소, 감소 후 증가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Bollen & Curran, 2006).
일부 연구(최희철, 김영미 외, 2023)는 반복측정을 통해 수집된 행복 자료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두 가지 성장요인인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들 성장요인의 개인차가 이론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예측되는 변인들(예,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인관계)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선행연구들(구재선, 서은국, 2011; Diener, 1984; Diener et al., 1999)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성의 사람이 더 행복한가”에 중점을 두고 수행된 것과는 다른 관점이다. 즉, 행복 수준과 행복에서의 변화 둘 모두가 개인의 심리내적, 사회적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접근을 한 것이다. 다른 선행연구도 행복이나 행복성장의 이득(최희철, 2022; 최희철, 김영미 외, 2024; Veenhoven, 1988), 긍정적 정서의 이득(박상희 외, 2023; 최희철, 강혜진 외, 2023; Fredrickson, 1998)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행복(Maciejewski et al., 2017)이나 긍정적 정서(Griffith et al., 2021)의 평균 궤적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에서의 개인차가 다른 결과 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학생 시기 행복의 잠재평균을 종단적으로 비교한 선행연구(최희철, 2022)는 중1 시기보다 중2, 중3 시기에 행복의 잠재평균이 더 낮아짐을 보여주었으나, 그 궤적을 알아보지 않았다. 어쨌든 이 결과들은 청소년 시기의 행복성장(변화율)이 집단 평균적으로 하강함을 시사하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국내의 한 연구(양수연, 오인수, 2023)는 중1에서 고1까지 행복이 평균적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 중1 시기 행복(초기치)의 변량이 유의하여 행복에서 개인차가 있고, 이후 고1 시기까지의 행복성장(변화율)의 변량이 유의하여 행복의 개인 내 궤적의 방향이 학생마다 다름을 확인하여 선행연구들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행복의 잠재성장모형의 구조를 분석하거나(Maciejewski et al., 2017), 그 예측 요인(양수연, 오인수, 2023; Maciejewski et al., 2017)을 알아보는 데 그쳤다. 양수연과 오인수(2023)는 그릿, 학업열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행복의 초기치와 행복의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과 행복 성장이 결과 변인(그릿,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중·고등학생 시기는 초기 성인기, 성인기 발달의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한 연구(최희철, 2022)는 중학생 시기의 행복이 1년 뒤의 자존감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행복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행복은 건강, 사회적 관계, 직장, 회복력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는 것이 메타분석연구(Kansky & Diener, 2017; Lyubomisky et al., 2005)로 지지되었다. Fredrickson 과 Levenson(1998)의 연구는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의 활성화 시 자율신경계를 안정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여 부정적 정서의 좋지 못한 효과를 취소하는 힘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중·고등학생 시기에 장기간 동안(몇 년) 추적된 행복성장(변화율)이 청소년에게도 이득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탐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시기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긍정적 정서에서 해소 효과와 같은 이득이 있듯이,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의 개인차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인 학업성취, 학업수행, 목표달성, 수업집중, 출석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심리적 측면의 그릿 (흥미유지, 노력지속)(Duckworth et al., 2007), 그리고 우울 증상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측면의 수면의 질(정은혜, 이소연, 2017)과 같은 결과 변인에 보일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 평균의 종단적 변화(최희철, 2022), 행복과 긍정적 정서의 궤적 (Griffith et al., 2021; Maciejewski et al., 2017)의 시간 경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다른 선행연구들은 행복이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최희철, 2022), 행복과 행복 궤적에 대한 예측 변인(양수연, 오인수, 2023)에 대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최희철(2022)의 연구는 잠재평균의 종단적 변화를 보여주었으나, 학생 개개인의 행복성장의 변화에서 개인차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양수연과 오인수(2023)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으나 행복 변인을 잠재변인 수준에서 다루지 않아 행복 궤적의 추정 시 측정오차의 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는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잠재변인 수준에서 그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또한 행복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이득이 된다는 메타 분석 결과(Lyubomisky et al., 2005)가 강한 지지를 받았으나,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과 행복성장이 학생들의 삶에 유의한 이득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과 행복성장
행복은 그 자체로서 좋은 것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행복은 그에 따른 이득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행복이 삶의 다양한 측면(예, 건강, 사회적 관계, 직장, 회복력)에 미치는 이득이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Kansky & Diener, 2017; Lyubomirsky, et al., 2005)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중·고등학생 시기동안 경험하는 행복의 이득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여러 해에 걸쳐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여 개인 내 변화와 그 개인차가 어떠한지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메타 분석 연구들은 특정 시점의 행복의 개인차가 삶의 다양한 측면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데 국한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메타 분석 연구들은 행복의 개인 내 변화에서 발생하는 개인차가 삶의 여러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며, 행복성장의 과정과 그 결과변인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밝혀내게 될 때 어떠한 시점에서 행복향상을 위한 개입을 하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 이득을 낳을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우선, 이 절에서는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과 행복성장에 대해 더욱 엄밀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행복은 주관적 안녕과 동의어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한다(Kansky & Diener, 2017). 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이 인지적 요소(삶에 대한 평가)와 정서적 요소(삶에서 느끼는 정서)로 구성된다고 보며(Kansky & Diener, 2017),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을 높은 삶의 만족, 높은 긍정적 정서, 그리고 낮은 부정적 정서의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삶의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긍정적 정서는 “행복, 만족, 흥분, 평온” 등을 의미하며, 부정적 정서는 “화남, 슬픔, 불쾌함, 두려움”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행복을 만족, 흥분, 평온과 함께 긍정적 정서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Kansky와 Diener(2017)는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과 안녕을 동일시하지만, 행복은 주관적 안녕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제안과 일치되게 다수의 연구자(최희철, 김영미 외, 2023; Lyubomisky et al., 2005)는 행복을 긍정적 정서의 빈번한 경험과 같이 협의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실제로 긍정적 정서를 측정한 여러 연구(서은국, 구재선, 2011; 최해연, 최종안, 2016; Diener et al., 2010)에서 ‘행복’이라는 용어는 긍정적 정서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개의 긍정적 정서 단어들을 요인 분석하여 한국인의 정서구조를 분석한 연구(최해연, 최종안, 2016)에서는 ‘행복하다’가 여러 하위요인에 교차부하되어, ‘행복하다’가 개별 정서를 반영하기보다 전반적인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행복하다’를 이러한 해석에 따라 전반적인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행복 점수는 자기보고 형식의 주관적 행복 척도(Lyubomirsky & Lepper, 1999)로 측정된 점수이다. 이 척도는 ‘전반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와 같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은국과 구재선(2011)의 연구에서 단일 문항 즉, ‘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하다’는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는 즐거운(r=.669), 편안한(r=.617)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긍정적 정서를 상당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복을 경험하는 것에 따른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꾸준한 탐색이 있어 왔고, 그 결과는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Lyubomrisky와 동료들(Boehm & Lyubomisky, 2008; Lyubomisky et al., 2005; Walsh et al., 2018)은 행복이나 긍정적 정서가 사회적 관계, 높은 수입, 상사로부터의 긍정적 평가 등 다양한 삶의 측면에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Fredrickson(1998; 2001)은 긍정적 정서의 확장-구축 이론에서 긍정적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목록을 확장하고, 그 결과로 신체적, 지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행복이나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관점은 중·고등학생 시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예, 최희철, 2022; 최희철, 이미아 외, 2024; Bortes et al., 2021)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Bortes 외(2021)는 스웨덴 청소년(723명)을 대상으로 여학생(15세)의 주관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이 17세 때의 높은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다른 연구(최희철, 이미아 외, 2024)는 중학생의 긍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1년 뒤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희철(2022)의 연구에서도 1년 간격에서 선행시점의 행복이 높을수록 후행시점의 자존감이 높았다. 이 연구들은 행복할수록 학업성취가 향상되고 긍정적 자기지각이 강화된다고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행복의 개인 간 차이와 다른 개인차 변인 사이의 관계들을 중심으로 다루었을 뿐, 행복의 개인 내 변화와 그 개인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행복이 학업성취, 긍정적 자기지각과 같은 중요한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삶의 더욱 이른 시점에서 행복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민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행복 수준은 대학생이나 40~50대 장년층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국내외의 종단연구에서 청소년기의 행복성장의 궤적이 학년이 상승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양수연, 오인수, 2023; 최희철, 2022; Griffith et al., 2021; Maciejewski et al., 2017). 이 결과들은 긍정적 자아정체감(Erikson, 1959)과 같은 심리적 자원을 확보하여 이후의 발달단계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청소년기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행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 수준이 감소함으로써 다양한 자원의 확보에 취약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즉, 높은 행복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높은 자존감(최희철, 2022)과 같은 심리적 자원을 청소년 기의 중․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다. 실제로 Orth 외(2018)의 연구를 보면, 청소년기 동안의 자존감 수준이 성인기보다 낮은 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고등학생 시기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행복을 보이는 취약성에 주목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시기의 행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달하는지 그 성장 과정과 개인차의 정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최희철, 2022)는 초기 청소년기부터 청소년이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다양한 어려움(예, 학교급의 전환, 학습량과 난이도의 증가, 시험 결과로 인한 서열화)(김지연 외, 2021)을 경험하므로 중1 시기의 행복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중2와 중3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의 잠재평균이 더욱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기의 행복 잠재평균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또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추세(최희철, 2022)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의 경험이 점진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하는 누적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면 행복의 평균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하향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 궤적을 알아본 한 연구(양수연, 오인수, 2023)는 행복의 평균 성장 궤적이 중1 시기를 기점으로 고1까지 지속해서 하향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에서 행복성장 궤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변량이 모두 유의하였는데, 이 결과는 시작점과 그 이후의 성장 방향에서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시사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행복의 개인 내 변화의 방향(예, 상승, 유지, 감소, 상승 후 하락, 하락 후 상승)에서 개인차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수연과 오인수(2023)의 연구는 행복의 측정오차를 통제하지 않고 측정변인 수준에서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1에서 고1까지 네 번의 시점에 걸쳐 행복의 잠재변인에 대해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측정오차를 통제한 뒤에,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성장의 궤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차 잠재성장모형에서 행복성장의 궤적은 직접 관찰되지 않으므로 잠재변인으로 취급된다.
한편, 청소년기 행복에 관한 또 다른 연구(Maciejewski et al., 2017)에서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행복성장을 추적한 결과, 초기치 평균은 유의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행복성장의 궤적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iffith 외(2021)도 9세부터 17세까지 긍정적 정서를 추적 조사한 결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긍정적 정서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성장의 평균 궤적이 하향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초기치와 변화율의 변량이 유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행복성장 궤적의 방향은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행복, 행복성장과 그릿
청소년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목표 설정, 진로 계획, 진로 준비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다'라는 항목에 76.8%의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헌 외, 2021). 이는 많은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장기목표(예, 상급학교 진학, 취업)를 설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목표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김현순, 2014),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적응(김정현 외, 2014), 학업 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서보준, 이진열, 2018). 청소년들이 장기목표를 세우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심리적인 역경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고, 역경과 어려움이 학업이라는 주요한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시한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Duckworth 외(2007)는 장기목표를 성취한 사람들의 공통된 자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서 그릿(grit)이라는 특성을 발견하였다. 그릿은 장기목표의 달성을 위해 꾸준히 집중력 있게 몰두하며 목표를 쉽게 바꾸지 않으며,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실망하거나 지루함을 느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자질을 뜻한다. 따라서 그릿은 청소년기부터 구축되어야 할 심리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더 긴 학습시간을 투자하고,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진아,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그릿에 대해 행복과 행복성장이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행복하거나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원을 구축하고, 접근 목적에 대한 관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든다고 여겨진다(Lyubomisky et al., 2005). 예를 들어, 행복한 사람들은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가까운 친구가 있으며, 더 많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덜 행복한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한다(Diener & Seligman, 2002; Lucas et al., 2008; Mehl et al., 2010). 또한 행복한 근로자는 수입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Peterson et al., 2011). 한 종단연구(최희철 외, 2022)는 더 행복한 아동들이 1년 뒤의 후행시점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Fredrickson, 1998; Fredrickson & Levenson, 1998)는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로 발생하는 심리적·신체적 악영향을 완화하고, 부정적 행동을 하려는 심리적·생리적 준비를 해체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행복한 것은 청소년들이 장기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목표달성 과정에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분일치가설을 알아본 연구(Koster et al., 2005)에 따르면, 기분부전상태에 있을수록 긍정적 자극보다 부정적 자극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면,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실패와 좌절로 인해 부정적 기분에 빠지게 되면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목표달성의 성공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동기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행복이나 긍정적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좋지 못한 영향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edrickson, 1998; Fredrickson & Levenson, 1998). 따라서 행복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행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들의 부정적 효과를 예방함으로써 실패와 좌절을 하더라도 접근목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근로자의 높은 수입 등이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고려하면 행복하거나 행복이 상승해가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긍정적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며 목표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을지도 모른다.
행복한 상태는 긍정적인 자극과 긍정적인 측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일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연구(Raila et al., 2015)는 행복하거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정보에 대한 주의는 접근 동기와 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etz et al., 2008). 이러한 연구들에 기반하면,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목표달성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접근행동을 함으로써 흥미를 잃지 않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은 행복과 그릿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추론에 일치하는 결과가 확인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 연구(Singh & Jha, 2008)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Hill 외(2016)는 북미 대학생들의 긍정적 정서와 그릿 사이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Vela 외(2015)는 긍정적 정서의 한 측면인 희망이 높을수록 그릿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행복과 그릿의 하위요인(흥미유지, 노력지속)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Disabato 외(2019)의 연구는 15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행복은 노력지속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흥미유지 와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행복이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서로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시사한다. 어쨌든 이 상관관계 결과들은 행복과 그릿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상관관계 연구는 횡단연구여서 행복이 그릿에 미치는 시간차 효과, 즉 전망적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행복에서의 개인차만 다룰 수 있을 뿐이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행복성장(변화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향, 즉 개인 내 변화에서의 개인차가 그릿(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어떤 효과를 보일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Duckworth 외(2007)는 장기목표에 대해 흥미를 유지하고, 노력을 지속하려면 장기적인 의도적 연습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정서의 확장-구축이론(Fredrickson, 1998)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은 행동 레퍼토리와 사고의 유연성이 확장된다고 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실험연구(Raila et al., 2015)는 행복할수록, 삶에 만족할수록 부정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더욱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복의 수준이 높거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행복이 성장하는 사람은 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실패나 역경을 만나더라도 연습의 과정으로 여기고, 자신이 이룬 개선과 진보와 같은 긍정적인 자극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접근동기와 행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즉, 흥미를 잃지 않고,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 대상의 한 연구(권대훈, 2018)는 긍정적 정서가 목표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른 연구(박상희 외, 2023; 최희철, 김영미 외, 2024)는 행복과 행복성장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간주되는 자기효능감(Bandura, 1997)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기반하면, 행복한 중․고등학생, 그리고 행복이 성장해가는 중․고등학생은 긍정적인 자극에 주의를 더욱 기울이고, 목표에 몰입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흥미를 잃지 않고 유지하며,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복과 행복성장이 높을수록 그릿의 하위요인인 흥미유지가 높고, 노력지속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3. 행복, 행복성장과 수면의 질
본 연구는 행복과 행복성장이 중·고등학생 시기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중·고등학생 시기의 수면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 시기가 되면 수면시간이 더욱 줄어든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등교 시간은 빨라지고 학습량은 증가하는가 하면, 청소년 스스로 취침 시간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수면시간에 대한 알아본 Ivo 외(2003)는 3개월에서 16세까지 총수면 지속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총수면 시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중·고등학생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문제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적당한 시간만큼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면을 취하고 상쾌하게 일어났다는 느낌 또한 수면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그런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수면의 질 저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정은혜, 이소연, 2017). 그리고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와 수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 종단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연구(Bacaro et al., 2024)에 따르면, 선행 시점(T1)에서의 감정적 어려움, 우울, 불안 등은 이후 시점(T2)의 수면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종단적 연구 결과는 부정적 정서들이 청소년기 중․고등학생의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제안한다. 셋째, 사회환경적 변화가 중·고등학생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그 영향으로 인하여 청소년기에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향 또한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수면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감소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입 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 수면교육,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면을 개선하려는 노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cott et al., 2021).
최근에 일부 연구(Ong et al., 2017; Steenbergen et al., 2021)는 행복의 이득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 이 연구들이 수면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수면을 방해하거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것 같은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몸과 뇌에 축적되는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할 수 있고(Steenbergen et al., 2021),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 성향은 대인관계 갈등을 겪더라도 갈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줄이고 적응적 대처를 하게 촉진하므로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Ong et al., 2017). 그리고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실험실에서 유발되면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인 두려움, 공포, 슬픔 등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Fredrickson, 1998). 이러한 연구들은 행복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수면과 행복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수면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반대로 행복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한나 외, 2015; Lemola et al., 2013; Owens et al., 2014; Shen et al., 2018). 이 두 관점과 관련하여 Diener(1984)는 빈약한 수면은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고통받는 사람도 잠을 이루지 못하므로 두 변인은 양방향적(bidirectional)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쾌락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과 수면 사이의 종단적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Bacaro et al., 2024)는 이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욱 분명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기실현적 측면의 행복을 뜻하는 심리적 안녕은 장래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쳤고, 수면의 질 또한 장래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쾌락적 측면의 행복을 뜻하는 주관적 안녕(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과 관련해서는 수면의 질이 장래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쾌락적 측면의 행복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으로 포함될 연구가 없어서 메타 분석되지 않았다. 이러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쾌락적 측면의 행복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의 공백은 다수의 실증적 연구로 보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이 행복의 이득에 있으므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행복(초기치)의 개인차와 시간 경과에 따른 행복성장(변화율)의 개인내 변화가 중·고등학생 시기 수면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청소년기 행복과 수면의 관계에서 행복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국내 연구도 일부 있다. 예를 들어, 김영선 외(2015)는 청소년기 행복이 주중 평균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며, 초등학생 대상의 한 종단연구(최경일, 2022)는 행복이 이후 시점의 수면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채명옥(2017)의 연구는 주관적 행복이 수면의 질(수면 충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행복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므로 이런 격차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들(김영선 외, 2015; 채명옥, 2017; 최경일, 2022)과 선행종단 연구(Bacaro et al., 2024)는 행복의 개인차와 수면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았을 뿐이어서, 점진적인 행복성장의 궤적에서의 개인차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간의 관점에서 행복(초기치), 행복성장(변화율)과 청소년기 수면의 질에 대해 알아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보완 확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몸과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Steenbergen et al., 2021)를 가지고, 우울, 불안과 같이 수면을 방해하는 청소년기 내현화 증상(Bacaro et al., 2024)을 구성하는 부정적 정서의 악영향을 해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효과를 고려하면, 행복(초기치)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수면의 질이 좋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부정적 정서는 특정 시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생활상에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행복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상승해가는 중․고등학생은 지속적으로 이들의 부정적 효과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수면의 질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초기치), 행복성장(변화율)이 그릿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인과적 추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속변인의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1차 시점)의 흥미유지, 노력지속, 수면의 질 각각이 고등학교 1학년(4차 시점)의 흥미유지, 노력지속, 수면의 질 각각에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하였다. 어떠한 변인을 예측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통제변인 중의 하나는 이전시점의 변인 그 자체이므로 본 연구는 이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으로서 연령, 교육수준 등은 이미 중1학년부터 동일학년을 코호트로 하여 계속 조사되므로 이미 통제되거나, 시간 변인으로서 이미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되었으므로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의 중1학년 패널조사에 참여한 중학생 2,590명 중에서 4회의 조사(중1, 중2, 중3, 고1)에서 네 번 모두 응답한 2,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1학년 패널은 2018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교육부의 2017 교육기본 통계를 표집의 틀로 설정하였다. 중1학년 패널은 다단계층화집락표집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즉, 전국 17개 시도의 3,213개의 중학교 1학년 학급(16,501개)에 재학 중인 중학생 448,816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KCYPS 2018은 시도별 2개의 중학교를 최소 표본으로 먼저 할당하고, 각 시도별로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131개를 표집하였다. 이 방법은 층별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성 높은 표본을 표집하는 장점이 있다. 첫 조사에 참여한 중1학년 2,590명(남학생: 1,405명, 여학생: 1,185명)이었다. 이 중에서 2,160명이 1차 연도(2018년)에서 4차 연도(2021년)까지 4회 모두 조사에 응하였다.
2. 연구 도구
가. 행복
KCYPS 2018은 중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한 요소로 행복을 조사하였다. KCYPS 2018에서 행복은 주관적 행복 척도(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Lyubomirsky & Lepper, 1999)를 한국아동패널조사(이하: PSKC, 육아정책연구소, 2016)에서 번안한 4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원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이지만, KCYPS 2018은 4점 척도로 변형하였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나는 ...’와 같은 진술에 감정 이모티콘(예, 행복한 사람)을 제공하며, 4점 척도(‘①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 ‘④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4번 문항은 역산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1차(중1), 2차(중2), 3차(중3), 4차 연도(고1) 각각 .796, .758, .734, .705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김정호, 2007)는 이 척도와 긍정적 정서 척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r=.55, p<.01)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관계수는 긍정적 정서의 하위 요소들(애정, 성취, 재미, 평안, 감동과 감사) 간의 상관계수가 .38에서 .77 범위라는 결과(최해연, 최종안, 2016)와 유사하다. 이러한 상관관계 결과는 주관적 행복 척도가 긍정적 정서 요인과 수렴타당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척도가 긍정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그릿
KCYPS 2018은 중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의 한 측면으로 그릿(Grit)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그릿은 Duckworth 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용 그릿 척도(www.angeladuckworth.com)를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김희명, 황매향, 2015)로 측정되었다. KCYPS 2018에서 이 척도의 응답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2요인(흥미유지, 노력지속)으로 구성되어 있고(임효진, 2017), 흥미유지는 4개의 부정적 진술문(예,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곤 한다), 노력지속은 4개의 긍정적 진술문(예,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유지의 내적 일치도는 1차 연도(중1), 4차 연도(고1) 각각 .696, .702였다. 노력지속의 내적 일치도는 1차 연도(중1), 4차 연도(고1) 각각 .636, .574였다.
3. 자료 분석 및 모형 평가
가.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ype.re.kr/archive)에서 KCYPS 2018의 1차 (2018년, 중1), 2차(2019년, 중2), 3차(2020년, 중3), 4차 연도(2021년, 고1)의 자료를 내려받은 뒤 주관적 행복, 그릿, 수면의 질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4회의 조사 모두에 응답한 학생들은 2,160명이었고, 이들은 네 번의 조사에서 모든 문항에 100% 응답하여 결측 자료는 없었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는 SPSS21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무조건부 및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은 Mplus7로 처리하였다.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단변량 왜도와 첨도는 <부표 1>에 제시하였다. 단변량 왜도와 첨도의 값은 각각 절댓값으로 하였을 때 3.0, 10.0보다 크면 정상성에서 벗어났음을 뜻한다(Kline, 2005). <부표 1>을 보면 단변량 왜도와 첨도는 정상성을 충족하는 기준 안에 있었다. Mardia’s coefficients로 알아본 다변량 왜도(48.1, p<.001)와 첨도의 값(1552.4, p<.001)은 유의하여, 다변량 정상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 때 ML 추정은 x2의 값이 높아져서 모형을 과잉 기각하며, 모수 추정치들의 표준오차를 보통의 정도에서 심각한 수준의 정도까지 하향 추정하므로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최희철, 김영미 외, 2023; Brown, 2015). 본 연구는 다변량 정상성의 침해 문제를 보완하는 강건한 추정 방법인 MLR을 사용하였고, 이때의 x2의 값은 Yuan-Bentler T2*와 다르지 않다(Brown, 2015).
표 1
종단적 측정 모형의 적합도
| (N: 2,160) | ||||||
|---|---|---|---|---|---|---|
| 모형 | Scaled x2 | df | CFI | ΔCFI | TLI | RMSEA |
| 1. 형태 동일성 모형 | 3715.476*** | 515 | .947 | - | .935 | .031 |
| 2. 측정 동일성 모형 | 1584.356*** | 531 | .947 | .000 | .937 | .030 |
| 3. 절편 동일성 모형 | 1707.634*** | 547 | .942 | .005 | .933 | .031 |
나. 종단적 측정모형과 잠재모형의 분석
본 연구는 중1에서 고1까지 잠재변인의 수준에서 행복의 성장요인으로서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을 알아보고, 이 두 변인에서 개인차가 그릿과 수면의 질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종단적 측정모형, 무조건부 고차잠재성장모형, 조건부 고차잠재성장모형의 순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종단적 측정모형은 본 연구에서 분석을 목적으로 한 잠재변인들이 시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인동일성(형태동일성, 요인 계수동일성, 절편동일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종단적 구인동일성이 확보될 때 각 척도가 시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변인 수준에서 행복의 무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과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행복, 그릿(노력지속, 흥미유지), 수면의 질의 종단적 측정모형의 타당성 확보의 일환으로 구인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은 두 가지 형태 즉, 무조건부 잠재성장모형과 조건부 잠재성장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요인(초기치, 변화율)에서 개인차 즉, 변량이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다른 변인(독립변인,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변인 수준에서 행복의 무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행복 잠재변인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초기치와 변화율 각각의 변량이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중1에서 고1까지의 행복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고차 잠재성장모형의 잠재 성장요인으로서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을 구성하였다. 행복(초기치) 요인은 1차 연도의 잠재변인 수준에서 행복의 정도를 나타내고, 행복성장(변화율) 요인은 잠재변인의 수준에서 행복성장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뜻한다(Wickrama et al., 2016). 그리고 본 연구는 행복의 고차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부 모형으로 3가지 모형(무변화, 선형변화, 곡선변화)을 비교하여 자료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 하였다.
셋째, 무조건부 고차잠재성장모형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의 변량이 유의하여 개인차가 있어야 다른 독립변인 또는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데, 유의한 변량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이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과 수면의 질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와 모형의 비교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는 x2 값은 사례 수에 비례하여 그 값이 증가해서 모형을 기각하는 1종 오류가 발생하는 약점이 있다(Wang & Wang, 2020). 본 연구는 x2 값 대신에 CFI, TLI, RMSEA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Hair 외(2019)는 표본의 사례 수와 측정변인의 수를 동시에 고려한 적합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사례수가 250명 이상이면서 측정변수가 30개 이상일 때(예, 본 연구의 종단적 측정모형,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 CFI와 TLI는 각각 .92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CFI와 RMSEA 두 지수를 조합했을 때의 기준은 CFI가 .92 이상이면서 RMSEA는 .08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둘째, 표본의 사례 수가 250명 이상이면서 측정변인의 수가 12개에서 30개 미만일 때(예, 본 연구의 무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 CFI와 TLI는 각각 .94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CFI와 RMSEA 두 지수를 조합했을 때의 기준은 CFI가 .94 이상이면서 RMSEA는 .07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위계적 관계에 있는 두 모형의 비교는 x2 차이보다 사례 수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 차이 점수를 사용하였다. 그 차이가 .01 이내에 있으면 두 모형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Cheung & Rensvold, 2002).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가 의미가 있으려면 잠재변인이 타당해야 하므로, 우선,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측정 모형). 다음으로, 잠재성장모형에서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에서 유의한 개인차가 없으면 다른 변인과 관계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무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으로 개인차의 변량이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이 그릿(노력지속, 흥미유지)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구조모형은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으로 검증하였다.
1. 측정 모형
행복, 흥미유지, 노력지속, 수면의 질의 종단적 구인 동일성을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첫째, 형태 동일성 모형의 CFI 와 TLI 는 각각 .947, .935로 기준(.92 이상)에 적합하였고, CFI와 RMSEA를 조합할 때 각각 .947, .031로 기준(.92 이상, .08 미만)에 적합하였다. 둘째, 측정 동일성 모형의 CFI 와 TLI 는 각각 .947, .937로 기준 (.92 이상)에 적합하였고, CFI와 RMSEA를 조합할 때 각각 .947, .030으로 기준(.92이상, .08 미만)에 적합하였다. 셋째, 절편 동일성 모형의 CFI 와 TLI 는 각각 .942, .933으로 기준(.92 이상)에 적합하였고, CFI와 RMSEA를 조합할 때 각각 .942, .031로 기준(.92이상, .08 미만)에 적합하였다. ΔCFI 는 각각 .000, .005로 .01을 초과하지 않았고, 이는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 측정 동일성 모형과 절편 동일성 모형 간에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최종 모형으로 절편동일성 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인 절편 동일성 모형의 요인계수는 <표 2>와 같다. 척도 설정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요인계수는 유의하였다.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시점별로 동일화 제약이 설정되었으므로 그 값이 동일하다.
표 2
절편 동일성 모형의 요인계수
| (N: 2,160) | |||||||||
|---|---|---|---|---|---|---|---|---|---|
| 변인 | 요인 | B | SE | β | 변인 | 요인 | B | SE | β |
| 행복11 | 행복1 (중1) | 1.000 | .000 | .874 | 흥미11 | 흥미유지1 (중1) | 1.000 | .000 | .670 |
| 행복21 | 1.021*** | .016 | .828 | 흥미21 | 1.064*** | .034 | .716 | ||
| 행복31 | .863*** | .020 | .699 | 흥미31 | .591*** | .036 | .405 | ||
| 행복41 | .615*** | .023 | .460 | 흥미41 | .918*** | .039 | .620 | ||
| 행복12 | 행복2 (중2) | 1.000 | .000 | .840 | 흥미14 | 흥미유지4 (고1) | 1.000 | .000 | .689 |
| 행복 22 | 1.021*** | .016 | .787 | 흥미24 | 1.064*** | .034 | .708 | ||
| 행복32 | .863*** | .020 | .642 | 흥미34 | .591*** | .036 | .413 | ||
| 행복42 | .615*** | .023 | .412 | 흥미44 | .918*** | .039 | .622 | ||
| 행복13 | 행복3 (중3) | 1.000 | .000 | .860 | 노력11 | 노력지속1 (중1) | 1.000 | .000 | .343 |
| 행복23 | 1.021*** | .016 | .786 | 노력21 | 1.857*** | .143 | .643 | ||
| 행복33 | .863*** | .020 | .649 | 노력31 | 1.968*** | .152 | .654 | ||
| 행복43 | .615*** | .023 | .392 | 노력41 | 1.862*** | .157 | .607 | ||
| 행복14 | 행복4 (고1) | 1.000 | .000 | .828 | 노력14 | 노력지속4 (고1) | 1.000 | .000 | .293 |
| 행복24 | 1.021*** | .016 | .773 | 노력24 | 1.857*** | .143 | .573 | ||
| 행복34 | .863*** | .020 | .595 | 노력34 | 1.968*** | .152 | .622 | ||
| 행복44 | .615*** | .023 | .359 | 노력44 | 1.862*** | .157 | .577 | ||
| 수면11 | 수면의 질1 (중1) | 1.000 | .000 | .848 | 수면14 | 수면의 질4 (고1) | 1.000 | .000 | .845 |
| 수면21 | .830*** | .055 | .742 | 수면24 | .830*** | .055 | .781 | ||
잠재변인 사이의 상관계수는 <표 3>과 같다. 첫째, 중1, 중2, 중3, 고1 시기의 행복이 높을수록 고1 시기의 흥미유지가 높았다. 둘째, 중1, 중2, 중3, 고1 시기의 행복이 높을수록 고1 시기의 노력지속이 높았다. 셋째, 중1, 중2, 중3, 고1 시기의 행복이 높을수록 고1 시기의 수면의 질이 높았다.
표 3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 (N: 2,160) | |||||||||
|---|---|---|---|---|---|---|---|---|---|
| 행복1 (중1) | 행복2 (중2) | 행복3 (중3) | 행복4 (고1) | 흥미유지1 (중1) | 흥미유지4 (고1) | 노력지속1 (중1) | 노력지속4 (고1) | 수면의 질1 (중1) | |
| 행복2(중2) | .502*** | ||||||||
| 행복3(중2) | .411*** | .509*** | |||||||
| 행복4(고1) | .290*** | .409*** | .562*** | ||||||
| 흥미유지1(중1) | .367*** | .239*** | .243*** | .128*** | |||||
| 흥미유지4(고1) | .121*** | .135*** | .187*** | .199*** | .307*** | ||||
| 노력지속1(중1) | .517*** | .265*** | .235*** | .128*** | .524*** | .193*** | |||
| 노력지속4(고1) | .105** | .151*** | .205*** | .310*** | .214*** | .274*** | .269*** | ||
| 수면의 질1(중1) | .378*** | .261*** | .220*** | .119*** | .181*** | .089** | .175*** | .020 | |
| 수면의 질4(고1) | .083** | .108*** | .122*** | .228*** | .059* | .142*** | .035 | .028 | .184*** |
2. 행복과 행복성장: 무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
무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에서의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은 <표 4>와 같다. 곡선변화 모형의 CFI 와 TLI 는 각각 .985, .981로 기준(.94이상)에 적합하였고, CFI 와 RMSEA 를 조합할 때 각각 .985, .030으로 기준 (.94 이상, .07 미만)에 적합하였다. 선형변화 모형의 CFI 와 TLI 는 각각 .984, .980으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하였고, CFI 와 RMSEA 를 조합할 때 각각 .984, .028로 기준(.94 이상, .07 미만)에 적합하였다. 두 모형 간의 ΔCFI 는 각각 .001로 .01을 초과하지 않았고, 이는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으며, 더 간명한 모형이 선형변화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비교에서는 선형모형을 선택하였다. 무변화 모형의 CFI 와 TLI 는 각각 .968, .962로 기준 (.94 이상)에 적합하였고, CFI 와 RMSEA 를 조합할 때 각각 .968, .043으로 기준(.94 이상, .07 미만)에 적합하였다. 하지만 무변화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보다 적합도가 나빴고, ΔCFI 는 .016으로 .01을 초과하였으므로, 두 모형의 비교에서는 선형변화 모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조건부 고차잠재성장 모형에서 선형변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4
무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 (N: 2,160) | ||||||
|---|---|---|---|---|---|---|
| 모형 | Scaled x2 | df | CFI | ΔCFI | TLI | RMSEA |
| 곡선변화모형 | 283.651*** | 95 | .985 | - | .981 | .030 |
| 선형변화모형 | 258.154*** | 97 | .984 | .001 | .980 | .028 |
| 무변화모형 | 514.499*** | 102 | .968 | .016 | .962 | .043 |
행복과 행복성장의 고차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는 <표 5>와 같다. 선형변화 모형의 행복(초기치) 평균(3.212, p<.001)과 행복(초기치) 변량(.167, p<.001)은 유의하였다. 이는 행복(초기치)의 시작점의 수준이 0이 아니며,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행복성장(변화율)의 평균(-.045, p<.001), 행복성장의 변량(.017, p<.001)은 유의하였다. 이는 행복성장(변화율)의 평균 궤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고, 개인 간 행복성장의 방향에서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 (N: 2,160) | |||||||||||
|---|---|---|---|---|---|---|---|---|---|---|---|
| 모형 | 초기치 | 변화율 | |||||||||
| M | SE | V | SE | M | SE | V | SE | M | SE | V | |
| 곡선변화모형 | 3.218*** | .013 | .146*** | .022 | -.060*** | .014 | .009 | .027 | .005 | .004 | .002 |
| 선형변화모형 | 3.212*** | .012 | .167*** | .011 | -.045*** | .005 | .017*** | .002 | - | - | - |
| 무변화모형 | 3.314*** | .008 | .101 | .005*** | .000 | .000 | .000 | .000 | - | - | - |
3. 구조모형: 행복과 행복성장의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
행복(초기치), 행복성장(변화율)과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 수면의 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6>과 같다. CFI 와 TLI 가 각각 .942, .934로 기준(.92 이상)에 적합하였고, CFI와 RMSEA를 조합할 때 각각 .942, .031로 기준(.92 이상, .07 미만)에 적합하였다. 구조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7>, [그림 1]과 같다. 행복과 행복성장이 고1 시기의 흥미유지, 노력지속,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1 시기의 흥미유지에 대한 중1 시기의 흥미유지(B=.268, β=.277, p<.001), 노력지속(B=.239, β=.115, p>.05), 수면의 질 (B=.065, β=.075, p<.05)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뒤에, 행복(B=.137, β=.113, p<.05)과 행복성장(B=1.081, β =.296, p<.001)은 고1 시기의 흥미유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표 6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 (N: 2,160) | |||||
|---|---|---|---|---|---|
| 모형 | Scaled x2 | df | CFI | TLI | RMSEA |
| 1. 구조모형 | 1717.264*** | 557 | .942 | .934 | .031 |
표 7
구조모형의 추정치
| (N: 2,160) | |||||||||
|---|---|---|---|---|---|---|---|---|---|
| 구분 | 종속변인 | ||||||||
| 독립변인 | 흥미유지(고1) | 노력지속(고1) | 수면의 질(고1) | ||||||
| B | SE | β | B | SE | β | B | SE | β | |
| 흥미유지(중1) | .268*** | .041 | .277 | .043* | .019 | .108 | .032 | .043 | .029 |
| 노력지속(중1) | .239 | .127 | .115 | .316*** | .063 | .367 | .152 | .129 | .064 |
| 수면의 질(중1) | .065* | .033 | .075 | .017 | .016 | .046 | .213*** | .040 | .216 |
| 행복(초기치) | .137* | .064 | .113 | .080* | .034 | .160 | .200** | .069 | .146 |
| 행복성장(변화율) | 1.081*** | .229 | .296 | .780*** | .133 | .516 | 1.360*** | .236 | .329 |
| R2 | .147 | .237 | .097 | ||||||
둘째, 고1 시기의 노력지속에 대한 중1 시기의 흥미유지(B=.043, β=.108, p<.05), 노력지속(B=.316, β=.367, p<.001), 수면의 질(B=.017, β=.046, p>.05)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뒤에, 행복(B=.080, β=.160, p<.05)과 행복성장(B=.780, β=.516, p<.001)은 고1 시기의 노력지속에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셋째, 고1 시기의 수면의 질에 대한 중1 시기의 흥미유지(B=.032, β=.029, p>.05), 노력지속(B=.152, β=.064, p>.05), 수면의 질(B=.213, β=.216, p<.001)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뒤에, 행복(B=.200, β=.146, p<.01)과 행복성장(B=1.360, β=.329, p<.001)은 고1 시기의 수면의 질에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중·고등학생 시기(중1에서 고1까지)에 행복(초기치), 행복성장(변화율)의 시간 경과에 따른 발달,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행복(초기치), 행복성장(변화율)이 그릿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와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중1에서 고1까지의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에 대한 곡선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무변화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선형변화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변화 모형에서 중1 시점의 행복(초기치) 평균은 유의하였고, 행복성장(변화율)의 평균 궤적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iffith 외(2021)의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Mackejewski 외(2017)의 종단연구에서도 청소년기 행복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궤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누적되는 현상이 이루어져 행복의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추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중1 시점에서 행복(초기치)의 변량이 유의하게 나타나 학생들 간에 출발선상의 행복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양수연, 오인수, 2023)의 결과와 동일하다. 이는 9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Griffith 외(2021)의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예, 즐거운, 평온한)의 초기치 변량이 유의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예, 기쁜, 쾌활한)의 점수를 추적 조사한 연구(Mackejewski et al., 2017)에서 행복 초기치의 변량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행복성장(변화율)의 변량도 유의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성장(변화율)의 방향(상승, 유지, 감소)에서 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양수연, 오인수, 2023)의 결과에서도 동일하였다. Mackejewski 외(2017)의 연구에서도 행복성장의 변량은 유의하여 청소년들의 행복성장의 방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만을 비교한 선행연구(양수연, 오인수, 2023)와 다르게 본 연구는 곡선변화모형까지 비교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곡선변화모형에 대한 경쟁 가설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행복 구인의 측정 불변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연구(양수연, 오인수, 2023)와 다르게 측정오차를 통제하고 측정 불변성을 검증한 상태에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선행연구를 보완 발전시켰다.
둘째,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이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1 시점에서 행복(초기치)이 높을수록 고1 시기에 흥미유지가 높았고, 중1 시점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행복성장(변화율)이 클수록 고1 시기에 흥미유지가 높았다. 그리고 중1 시점에서 행복(초기치)이 높을수록 고1 시기에 노력지속이 높았고, 중1 시점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행복성장(변화율)이 클수록 고1 시점의 노력지속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1 시점의 행복(초기치)뿐 아니라 중1 시점에서 고1까지의 행복성장(변화율)이 클수록 고1 시기의 장기목표를 향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들은 행복과 행복성장이 그릿에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한다. 그리고 긍정적 정서가 심리적 자원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제안(Fredrickson, 1998)과도 상응한다. 행복(초기치)의 그릿에 대한 정적인 효과는 부정적 정서가 위협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 경향들(예, 싸움-도망 반응)에 돌입하도록 심신을 준비시키는 현상(Fredrickson, 1998)과 다르게 타인과 비교하여 행복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장기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그릿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을 더 많이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수록 목표달성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긍정적 자극(예: 실패에서의 교훈, 실패로 인한 새로운 것의 발견)에 주목하고 접근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추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행복성장(변화율)의 그릿에 대한 정적인 효과는 행복성장이 높을수록 심리적 요인(예,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장애수용 등)에서의 수준이 높다는 행복성장의 이득 관점을 알아본 연구들(박상희 외, 2023; 최희철, 김영미 외, 2023; 2024)을 지지한다. 행복성장(변화율)이 그릿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행복 수준이 낮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향상되는 경우에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전보다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감정은 덜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행복한 사람이 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실험연구(Raila et al., 2015) 에 근거해 볼 때, 행복이 상향되는 청소년은 자신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역경이나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목표경로를 변경하지 않고 목표와 관련된 새로운 흥미로운 점을 찾고, 목표에 접근하는 행동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그릿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고등학생 시기에 행복하거나 점진적으로 행복 수준이 향상되어 가는 청소년들은 학업과 학교생활에서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장기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단서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노력하고, 흥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흥미에 대해 고찰한 우연경(2012)은 흥미가 유지, 발달하는데 정서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학습자가 대상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가지면 개인적 흥미(지속적 특성을 가진 흥미)로 발달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런 관점과 일치되게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이 흥미유지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력 지속과 관련하여, 대학생 대상의 연구(권대훈, 2018)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수록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몰입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도 행복(초기치), 행복성장(변화율)이 장기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추구하는 노력지속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부 연구자(Fredrickson, 1998)는 긍정적 정서의 경험 상황에서는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위협에 대처하는 데 사용하던 자동적인 행동 각본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창의적인, 종종 각본에 없는 사고와 행동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결과들과 제안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더 행복한 중·고등학생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행복이 점점 성장하는 경험을 할 경우 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의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유경과 조한익(2018)은 학생들의 학업적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는 특정 교과 상황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실과 수업상황에서 행복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학업적 흥미유지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행복성장이 높을수록 역경을 노력으로 이겨내게 하는 자기효능감(Bandura, 1997)이 높았던 결과(박상희 외, 2023; 최희철, 김영미 외, 2023; 2024)를 고려하면 행복한 교실과 행복한 수업상황을 만드는 것이 노력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시사된다.
셋째,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본 연구는 중1 시기의 행복(초기치), 행복성장(변화율)이 높을수록 고1 시기에 수면의 질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좋지 못한 수면의 질은 청소년기 우울 증상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데(정은혜, 이소연, 2017),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 증상과 상반되는 행복(초기치)이 높거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행복성장(변화율)이 상승하는 것이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시사한다. 이 결과는 더 행복한 청소년들이 평균적으로 더 적은 수면문제를 보고한다는 연구(Kouros et al., 2022)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주관적 수면 충족감(만족감)에 영향을 준다는 국내 연구들(김애실, 박정미, 2022; 채명옥, 2017)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다는 연구(Ong et al., 2013), 청소년들이 평소보다 더 높은 행복을 느낀 날 밤에 수면 문제가 적다는 연구(Kouros et al., 202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짧은 시간 간격에서의 행복 또는 긍정적 정서와 수면 사이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뿐만 아니라 행복과 수면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핀 연구들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맥락에 있다. 즉, 한 메타 분석 연구(Bacaro et al., 2024)는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와 수면과의 관계를 살핀 종단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실현적 측면의 행복인 심리적 안녕이 장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메타 분석 연구(Bacaro et al., 2024)에서 쾌락적 측면의 주관적 안녕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는 기여를 하였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행복을 많이 느끼는 중·고등학생은 수면의 질이 좋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단,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쾌락적 측면의 행복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행복의 상승 또한 수면의 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선행연구(김한나 외, 2015; Lemola et al., 2013; Shen et al., 2018)에서 수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것과 다르게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이 수면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는 중1 시기의 높은 행복이 고1 시기의 수면의 질에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여를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1 시기에 행복이 낮더라도 이후로 행복한 상태가 개선되면 고1 시기에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행복의 수면의 질에 대한 장기적 이득과 시간 경과에 따른 행복의 상승이 수면의 질에 이득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결국 본 연구는 현재의 행복을 미루고 장래의 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행복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행복과 행복성장이 신체적 자원의 한 측면인 잠자고 일어날 때 상쾌함을 경험하는 데 일조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1학년에서 고1학년 사이의 행복 향상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관련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1 시기의 행복과 행복성장이 이후 고1시기의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과 좋은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초기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점진적으로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학창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급우와 친구들을 매일 매일 만나는 학교의 교실, 수업상황에서부터 학생들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안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긍정적 기본 정서의 요소가 개인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최해연, 최종 안, 2016)를 고려하면, 중·고등학생 개개인이 행복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정서를 알아보고 이에 알맞은 개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즐거운 것보다 평온한 것을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행복은 ‘평상심’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서구 사회에서는 상승되고 긴장된 정서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더라도(서은국, 구재선, 2011; Lu & Gilmore, 2004), 개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도 누군가는 평상심을 반영하는 정서를 행복으로 느낄 수 있고, 다른 이는 보람찬 감정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 교과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행복을 느끼는데 어떠한 정서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평가 도구는 없으나, 행복을 느끼는데 즐거움, 의미, 몰입 중 어떠한 성향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척도(Peterson et al., 2005)가 개발되어 한국어로 타당화되어 있다(황재원, 김계현, 2009). 이러한 척도를 근거로 하여 학생들의 행복 성향을 구분한 후 학급이나 수업상황에서 그에 알맞은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행복의 개인차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의도적인 노력과 활동에 의해 40%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Lyubomisky et al., 2005), 담임교사, 교과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가 학생들의 행복 성향에 바탕한 의도적인 활동을 제공할 경우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학교의 학급이나 수업상황에서 행복을 향상시키는 과정 중에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다. 예를 들어, Diener 외(2009)는 장기적으로 행복하려면 긍정적 경험을 강렬하게 느끼는 것보다 작은 경험이라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이 잠들기 전,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 중 기뻤거나 만족했거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보거나 글로 써보는 의도적인 활동도 감사 정서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감사 글쓰기는 국어 수업, 영작문 등에서 얼마든지 수업과 연계지어 학업능력과 관련이 있으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동안 감사와 같은 긍정적 정서를 체험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장기적으로 행복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장기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그릿과 좋은 수면의 질에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단기적인 과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이 어렵고 좌절감을 주기도 하지만 자부심, 낙관, 고무, 감탄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지지와 피드백을 하는 학급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주영(2021)의 연구에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의 능력 비교는 우울, 부러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의 의견 비교는 낙관, 고무, 감탄 등의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바탕하면, 능력과 같은 안정적 요인을 비교하는 식으로 타인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적 분위기보다 의견 교환과 같은 상황에서 우월한 타인을 역할모델로 인식하게 하거나 상호작용을 하게 하여 학생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유도하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연구(이국희 외, 2020)는 교과목 담당 교사가 정규교과와 연계하여 행복에 대한 10가지 주제(행복의 정의,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비교하지 않기, 목표 세우기, 몰입하기, 음미하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나누고 베풀기, 사과하고 용서하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교과목 연계형 행복수업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 긍정적 정서 등이 증진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복성장(변화율)의 점진적 상승이 그릿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교과목 연계형 수업은 학년별로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적 자원으로서 그릿(흥미유지, 노력 지속), 신체적 자원으로서 수면의 질에 대한 행복과 행복성장의 영향을 알아보았을 뿐이다. 후속 연구는 청소년기 발달과제로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 학업성취 등에 행복과 행복성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후속연구는 초등학생 시기, 대학생 시기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PubMed]
, &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1-84. [PubMed]
, , & (2019). Is grit relevant to well‐being and strengths? Evidence across the globe for separating perseverance of effort and consistency of interests. Journal of Personality, 87(2), 194-211. [PubMed]
, , , , & (2016). Different types of well-be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Psychological Assessment, 28(5), 471-482. [PubMed]
, , , &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PubMed]
, , , & (2003). Sleep duration from infancy to adolescence: Reference Values and Generational Trends. Pediatrics, 111(2), 302-307. [PubMed]
, , , , & (2005). Mood-congruent attentional bias in dysphoria: Maintained attention to and impaired disengagement from negative information. Emotion, 5, 446-455. [PubMed]
, , & (2008). Explaining the extraversion positive affect relation: Sociability cannot account for extraverts’ greater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76, 385-414. [PubMed]
, , &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PubMed]
, , , , & (2017). A daily diary study on adolescent emotional experiences: Measurement invariance and developmental trajectories. Psychological Assessment, 29(1), 35-49. [PubMed]
, , , & (2017). Positive affect and sleep: A systematic review. Sleep Medicine Reviews, 35, 21-32. [PubMed]
, , & (2018). Development of self-esteem from age 4 to 94 year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44(10), 1045-1080. [PubMed]
, , & (2015). Seeing the world through rose-colored glasses: People who are happy and excited see more opportunities. Emotion, 15(4), 449-462. [PubMed]
, , , , & (2018).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sleep duration and qual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 2584-2595. [PubMed]
부록
부표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 변인 | H11 | H21 | H31 | H41 | H12 | H22 | H32 | H42 | H13 | H23 | H33 | H43 | H14 | H24 | H34 | H44 | C11 | C31 | C51 | C61 | P21 | P41 | P71 | P81 | C14 | C34 | C54 | C64 | P24 | P44 | P74 | P84 | S11 | S21 | S14 | S24 |
|---|---|---|---|---|---|---|---|---|---|---|---|---|---|---|---|---|---|---|---|---|---|---|---|---|---|---|---|---|---|---|---|---|---|---|---|---|
| H11 | ||||||||||||||||||||||||||||||||||||
| H21 | .739 | |||||||||||||||||||||||||||||||||||
| H31 | .598 | .549 | ||||||||||||||||||||||||||||||||||
| H41 | .401 | .384 | .352 | |||||||||||||||||||||||||||||||||
| H12 | .386 | .336 | .296 | .217 | ||||||||||||||||||||||||||||||||
| H22 | .348 | .359 | .272 | .196 | .667 | |||||||||||||||||||||||||||||||
| H32 | .283 | .265 | .313 | .192 | .524 | .502 | ||||||||||||||||||||||||||||||
| H42 | .227 | .192 | .208 | .212 | .375 | .371 | .296 | |||||||||||||||||||||||||||||
| H13 | .304 | .284 | .244 | .192 | .350 | .336 | .285 | .223 | ||||||||||||||||||||||||||||
| H23 | .258 | .276 | .221 | .177 | .308 | .338 | .254 | .192 | .686 | |||||||||||||||||||||||||||
| H33 | .258 | .255 | .280 | .176 | .299 | .308 | .347 | .204 | .570 | .511 | ||||||||||||||||||||||||||
| H43 | .193 | .149 | .168 | .166 | .185 | .189 | .173 | .254 | .304 | .258 | .266 | |||||||||||||||||||||||||
| H14 | .197 | .199 | .151 | .141 | .289 | .239 | .230 | .141 | .407 | .334 | .338 | .154 | ||||||||||||||||||||||||
| H24 | .203 | .240 | .174 | .139 | .268 | .295 | .223 | .151 | .367 | .432 | .319 | .166 | .645 | |||||||||||||||||||||||
| H34 | .131 | .149 | .154 | .096 | .236 | .212 | .249 | .122 | .311 | .278 | .416 | .172 | .526 | .454 | ||||||||||||||||||||||
| H44 | .105 | .089 | .088 | .089 | .129 | .143 | .132 | .216 | .212 | .178 | .194 | .322 | .233 | .254 | .295 | |||||||||||||||||||||
| C11 | .215 | .201 | .227 | .182 | .162 | .121 | .118 | .088 | .167 | .116 | .160 | .109 | .089 | .076 | .094 | .047* | ||||||||||||||||||||
| C31 | .220 | .216 | .213 | .193 | .134 | .156 | .107 | .123 | .147 | .126 | .147 | .133 | .064** | .072** | .081 | .086 | .493 | |||||||||||||||||||
| C51 | .067** | .042* | .045* | .045* | .064** | .047* | .031n | .044* | .061** | .049* | .032n | .066** | .013n | .011n | .009n | .044* | .227 | .282 | ||||||||||||||||||
| C61 | .193 | .183 | .191 | .175 | .116 | .103 | .065** | .098 | .102 | .082 | .093 | .095 | .047* | .039n | .017n | .077 | .412 | .419 | .347 | |||||||||||||||||
| P21 | .281 | .276 | .298 | .211 | .155 | .134 | .169 | .133 | .130 | .142 | .148 | .077 | .101 | .116 | .074** | .072** | .054* | .013n | -.014n | .075** | ||||||||||||||||
| P41 | .274 | .275 | .258 | .175 | .137 | .127 | .093 | .088 | .129 | .136 | .149 | .110 | .057** | .075** | .048* | .046* | .189 | .242 | -.030n | .192 | .194 | |||||||||||||||
| P71 | .242 | .240 | .229 | .160 | .109 | .086 | .075 | .080 | .073** | .062** | .077 | .102 | .029n | .047* | .007n | .052* | .252 | .247 | .084 | .322 | .203 | .444 | ||||||||||||||
| P81 | .259 | .241 | .248 | .175 | .169 | .136 | .152 | .090 | .120 | .114 | .142 | .111 | .072** | .071** | .067** | .036n | .254 | .296 | .061** | .226 | .196 | .410 | .374 | |||||||||||||
| C14 | .059** | .053* | .080 | .079 | .084 | .079 | .087 | .039n | .104 | .084 | .162 | .021n | .108 | .116 | .111 | .056** | .205 | .147 | .040n | .168 | .022n | .082 | .076 | .076 | ||||||||||||
| C34 | .070** | .047* | .090 | .082 | .086 | .066** | .073** | .025n | .089 | .092 | .169 | .025n | .116 | .101 | .123 | .028n | .127 | .145 | .055* | .154 | .010n | .058** | .076 | .081 | .525 | |||||||||||
| C54 | .002n | .012n | .015n | -.012n | .017n | .027n | .011n | .012n | .053* | .001n | .084 | .012n | .026n | -.004n | -.002n | .033n | .073** | .066** | .119 | .122 | -.006n | .029n | .066** | .056** | .266 | .294 | ||||||||||
| C64 | .091 | .085 | .090 | .097 | .069** | .069** | .075 | .062** | .105 | .099 | .120 | .090 | .119 | .107 | .109 | .062** | .138 | .146 | .079 | .171 | .032n | .127 | .106 | .130 | .386 | .409 | .341 | |||||||||
| P24 | .072** | .068** | .088 | .056** | .122 | .085 | .127 | .148 | .148 | .116 | .127 | .151 | .175 | .182 | .222 | .207 | .077 | .073** | .013n | .043* | .121 | .040n | .022n | .031n | -.025n | -.124 | -.094 | .021n | ||||||||
| P44 | .026n | .030n | .035n | .056** | .053* | .069** | .091 | .071** | .090 | .060** | .084 | .095 | .126 | .118 | .150 | .140 | .061** | .057** | -.011n | .033n | .063** | .175 | .099 | .103 | .076 | .029n | -.087 | .115 | .184 | |||||||
| P74 | .037n | .032n | .060** | .050* | .037n | .044* | .057** | .080 | .076 | .073** | .088 | .068** | .122 | .116 | .120 | .128 | .125 | .097 | .056** | .117 | .057** | .107 | .155 | .095 | .101 | .101 | -.018n | .216 | .198 | .344 | ||||||
| P84 | .062** | .063** | .074** | .050* | .064** | .070** | .112 | .041n | .100 | .077 | .173 | .059** | .143 | .097 | .141 | .058** | .103 | .075 | .040n | .088 | .029n | .126 | .102 | .207 | .219 | .204 | .047* | .199 | .088 | .343 | .374 | |||||
| S11 | .281 | .272 | .248 | .148 | .191 | .152 | .159 | .101 | .167 | .143 | .151 | .102 | .088 | .085 | .076 | .035n | .141 | .114 | .078 | .078 | .120 | .084 | .054* | .124 | .092 | .035n | .049* | .084 | .043* | -.005n | -.006n | .043* | ||||
| S21 | .232 | .222 | .185 | .131 | .161 | .158 | .137 | .104 | .113 | .118 | .097 | .075 | .066** | .041n | .053* | .029n | .079 | .073** | .087 | .047* | .102 | .095 | .053* | .090 | .024n | -.010n | .010n | .040n | .009n | -.009n | .000n | .019n | .630 | |||
| S14 | .063** | .066** | .101 | .044* | .088 | .066** | .081 | .009n | .063** | .064** | .103 | .058** | .165 | .147 | .080 | .051* | .061** | .064** | .005n | .002n | .001n | .034n | .016n | .062** | .098 | .101 | .099 | .101 | -.006n | -.012n | -.040n | .117 | .164 | .105 | ||
| S24 | .037n | .028n | .048* | .018n | .074** | .055* | .066** | .001n | .093 | .088 | .079 | .059** | .162 | .155 | .084 | .080 | .050* | .019n | .007n | -.024n | -.005n | -.003n | -.008n | .009n | .026n | .037n | .061** | .058** | .009n | -.023n | -.008n | .060** | .125 | .121 | .661 | |
| M | 3.22 | 3.20 | 3.04 | 3.10 | 3.14 | 3.15 | 2.96 | 3.02 | 3.12 | 3.11 | 2.95 | 3.03 | 3.09 | 3.06 | 2.87 | 2.91 | 2.54 | 2.61 | 2.60 | 2.72 | 2.72 | 2.79 | 2.73 | 2.55 | 2.51 | 2.53 | 2.58 | 2.62 | 2.56 | 2.67 | 2.58 | 2.47 | 3.15 | 3.40 | 3.08 | 3.27 |
| SD | .64 | .69 | .68 | .75 | .55 | .61 | .62 | .71 | .53 | .59 | .62 | .71 | .51 | .56 | .63 | .72 | .77 | .77 | .75 | .77 | .74 | .74 | .77 | .79 | .73 | .75 | .72 | .73 | .75 | .71 | .70 | .72 | .66 | .62 | .65 | .58 |
| S | -.48 | -.58 | -.34 | -.51 | -.12 | -.29 | -.34 | -.29 | -.11 | -.35 | -.40 | -.40 | .02 | -.30 | -.29 | -.14 | .17 | .11 | .03 | -.10 | -.26 | -.14 | .01 | .01 | .19 | .25 | .16 | .14 | -.22 | -.21 | -.01 | -.10 | -.42 | -.68 | -.32 | -.25 |
| K | .42 | .31 | .10 | -.09 | .94 | .52 | .68 | -.23 | 1.33 | 1.17 | .86 | .07 | 1.23 | 1.47 | .40 | -.44 | -.43 | -.47 | -.38 | -.42 | -.14 | -.33 | -.54 | -.44 | -.29 | -.39 | -.35 | -.42 | -.27 | -.13 | -.25 | -.28 | .21 | .25 | .19 | .14 |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10-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4-12-09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12-18

- 956Download
- 4186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