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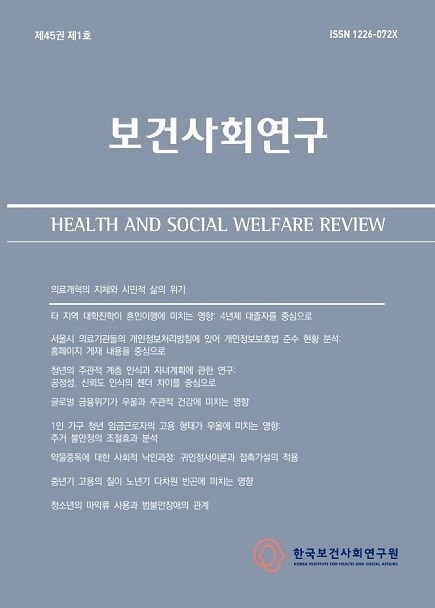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의 적용
The Social Stigma against Drug Addiction: Application of Attribution-Affection Theory and Contact Hypothesis
Kim, Seon-ja1; Seo, Mi-kyung1*
보건사회연구, Vol.45, No.1, pp.122-146, March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1.122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사회적 낙인은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부정적 속성이나 특정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치절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회피하고 삶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한다.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중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며 약물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낙인과정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이 적용하여 이론이 검증되는지 살펴보았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약물중독(자)에 대한 책임성 인식이 분노와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동정을 약화시켜 사회적 거리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책임성 인식이 두려움과 동정을 매개로 도움의향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접촉수준이 동정을 증가시켜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고, 도움의향을 높이는 경로만이 의미 있는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접촉가설은 매우 일부에서만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약물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대중을 교육하고, 중독 당사자들이 자신의 회복노력을 드러내는 접촉이 의미 있는 낙인 극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독자의 회복노력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려는 미디어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nti-stigma strategy by applying the attribution-affection theory and the contact hypothesis, both of which are known to explain the stigma process of mental illness to drug addiction. Applying the attribution-affection theory, it can be assumed that th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drug addiction affects behavioral responses (such as social distance, and helping responses), mediated by emotional reactions (including anger, fear, and pity). The contact hypothesis also assumes that various contact experiences influence behavioral responses mediated by emotion. To verify thesetheori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62 adults. The results showed that, out of the six paths in the attribution-affection theory, five paths, except for the responsibility awareness-anger-helping response, were verifie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drug addiction, the higher the anger and fear, the lower the pity, and the higher the social distance, with a lower helping response. However, the contact hypothesis revealed that only the path through which contact experience affects behavioral responses, mediated by p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the public needs to be educated about drug addiction as a disease requiring treatment, and that media coverage of drug addiction’ recovery experiences is importan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약물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낙인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낙인극복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귀인정서이론을 적용하여, 약물중독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 인식이 정서 반응(분노, 두려움, 동정)을 매개로 행동 반응인 사회적 거리감과 도움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접촉가설 역시 접촉 경험이 정서를 매개로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성인 4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귀인정서이론은 6개의 경로 중 책임성인식-분노-도움의향을 제외한 5개의 경로가 모두 검증되어 이론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중독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분노와 두려움이 높아지고, 동정이 감소하여 사회적 거리감은 증가하고 도움의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촉가설은 동정을 매개로 행동 반응인 사회적 거리감과 도움의향에 미치는 경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대중을 교육하고, 중독 당사자들이 자신의 회복노력을 드러내는 접촉이 의미 있는 낙인극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은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부정적 속성이나 특정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치절하 되는 것을 의미한다(Goffman, 1963, p. 4). 일반적으로 낙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회에서 차별받고,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어 삶의 질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한규석, 2017, p. 51).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공공낙인 혹은 대중낙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낙인 대상자가 이를 내면화한 자기낙인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고 고립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Corrigan & Nieweglowski, 2018). 이와 같이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 정체성이 정신장애인이다. 정신장애는 사고, 감정,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지어지는 장애이므로(이영호 외, 2020) 대중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그들을 사회적 기회에서 배제하고, 가급적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행동 반응을 보이게 된다(서미경 외, 2020, pp. 61-62). 이러한 대중의 태도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필수적인 지역사회통합을 심각하게 방해(Corrigan, 2004; Gaebel et al., 2005)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기낙인에 영향을 미쳐 치료를 회피하고(Patel et al., 2010), 삶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한다(Corrigan et al., 2009b).
이처럼 사회적 낙인이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치료에 심각한 방해요인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1970년대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주요 정신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중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사회적 낙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최근 10년간 약물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7,611명(대마 14.8%, 마약 14.4%, 항정신성의약품 70.8%)으로 2022년 18,395명 대비 13.9%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24).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2024. 4. 12.)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불법 사용경험이 있다고 한다. 2022년 마약류 사범 중 투약사범이 8,489명인데, 여기에 숨겨진 비율인 암수율 28.5배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마약중독자 수는 24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실제 치료받은 마약 중독자는 721명으로 0.3%에 불과하다(조선일보, 2023. 4. 25.). 기존의 연구들(Luoma et al., 2014; Taylor et al., 2021; Wakeman & Rich, 2018; Yang et al., 2017)에 의하면 약물중독자의 치료접근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낙인이 지목되고 있다. 즉, 낙인으로 인해 약물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 하여도 치료 순응도가 저하되어, 쉽게 중단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약물중독을 포함하여 정신장애 유형별 사회적 낙인 수준을 비교한 국외 연구들(Crespo et al., 2008; Hengartner et al., 2013; Link et al., 1999; Martin et al., 2000)에 의하면 약물중독의 경우 조현병이나 우울증에 비해 위험하고 두렵다는 인식이 더 높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의향도 현저히 더 높았다. 또한 책임성과 통제성에 관련된 ‘발병이나 상황 통제에 개인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도 약물중독에서 가장 높았다(Corrigan et al., 2009a; Crespo et al., 2008; Hengartner et al., 2013). 국내에서는 약물중독을 포함하여 사회적 낙인을 비교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 박근우와 서미경(2012a)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AIDS, 수형자 사례의 원인에 대한 이해, 정서 반응(동정, 두려움, 분노)과 통제 가능성 · 치료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다른 정신장애 유형에 비해 약물중독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 가능성과 개인적 ·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회적 거리감이 현저히 높았다.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마약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2023. 2. 15.). 이처럼 대부분의 국내 · 외 연구에서 예외 없이 대중은 다른 정신장애 유형에 비해 약물중독(자)가 더 위험하고, 원인과 상황 통제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더 높으며, 그들과 가급적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약물중독에 대한 이런 높은 사회적 낙인이 치료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이들을 위한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제한하는 구조적 낙인에 영향을 미침(Santos da Silveira et al., 2018; Van Boekel et al., 2013a)에도 불구하고 약물중독의 사회적 낙인에 초점을 둔 연구는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 현저히 적다.
특정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중에게 해당 정체성을 어떻게 교육시킬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얻는데 유용하다(Taylor et al., 2021). 또한 낙인 극복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이민화, 서미경, 2015; Gaebel et al., 2008).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귀인정서이론(attribution-affection theory)과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을 들 수 있다(Anagnostopoulos & Hantzi, 2011; Clement et al., 2012; Link & Cullen, 1986; Watson, 2001). 귀인정서이론에 의하면 정신장애의 원인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적 책임성을 높게 지각하면 부정적 정서가 자극되어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고 돕는 행동이 줄어든다고 가정한다. 접촉가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부정적 정서는 줄어들고 동정이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감은 감소하고 돕는 행동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주요 정신장애를 대상으로 이 이론들을 적용했을 때, 접촉가설은 거의 예외 없이 검증되어 직접적, 간접적 접촉경험을 제공하는 낙인극복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주장(Corrigan et al., 2002; Corrigan & Nieweglowski, 2019)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귀인정서이론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즉,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 거리감을 증가시키지만(Corrigan et al., 2003; Van Boekel et al., 2013a), 일부 연구(박근우, 서미경, 2012b; 서미경 외, 2010; Dietrich et al., 2004; Pescosolido et al., 2010)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생물학적 원인이라는 인식 역시 두려움을 자극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들은 ‘정신장애가 생물학적 장애’라는 대중의 교육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약물중독에 초점을 두어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을 검증한 연구는 국외에서 일부(Sattler et al., 2017; Taylor et al., 2021; Van Boekel et al., 2013a) 이루어졌으나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론이 지지되지만, 일부에서는 지지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약물중독이 심각하게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낙인 수준은 특정 사회가 해당 정체성을 얼마나 어느 정도 일탈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다른 지역적, 문화적 속성이 뚜렷한 개념이므로(서미경 외, 2020, p. 26) 국외의 연구 결과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중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한 국내 연구들(박수빈, 2023;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신현주, 박성수, 2015; 정현주, 박정숙, 2023; 채수미, 2015; 최봉실, 박정숙,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은 약물남용 실태와 경험(사용경험, 획득경로 등), 폐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태와 인식조사만으로는 약물중독(자)의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낙인극복 전략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약물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낙인과정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을 적용하여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낙인극복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이론적배경
1.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
정신장애는 중요한 행동적 · 심리적 증상을 보이는 병리적 장애이면서 동시에 사회 · 문화적 요인에 의해 질병의 경과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사회적 장애이다(서미경 외, 2020, p. 61).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사회통합과 회복을 방해하고, 이것이 자기낙인에 영향을 미쳐 치료적 도움을 거부하고, 위축된 삶을 살면서 사회적 기능이 악화되며 이것이 다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이론이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이다.
귀인정서이론은 일반적으로 낙인정체성을 이해하는 주요 속성인 통제성(controllability)과 관련된다. 즉, ‘낙인속성의 원인과 그것을 없애거나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대상자에게 있느냐’와 관련된다(Dovidio et al., 2000, pp. 5-7). 이는 낙인을 부여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차별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Crandall, 2000).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고, 인간은 자신이 한 만큼 받는 것이므로 낙인속성이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부당한 대우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정신장애인에게 적용하면, 정신장애의 원인과 책임이 대상자에게 있다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신장애의 원인과 책임이 대상자에게 있지 않다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대상자에게 동정을 느끼게 되어 돕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Watson, 2001).
이처럼 귀인정서이론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장애의 원인을 생물학적 원인으로 귀인하는 경우와 의지 부족이나 나쁜 성격 등 개인적 원인으로 귀인하는 경우의 사회적 낙인 수준을 비교 ·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그 결과 생물학적 원인으로 귀인하는 경우 사회적 낙인이 낮다는 결과들(Martin et al., 2000)도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두려움을 증가시켜 오히려 사회적 낙인이 증가한다는 결과들(박근우, 서미경, 2012b; 서미경 외, 2010; Dietrich et al., 2004; Pescosolido et al., 2010)도 있다. 이 연구들과 달리 정신장애의 원인이 아닌 책임성에 대한 인식으로 귀인을 평가한 연구들(Corrigan et al., 2003; Van Boekel et al., 2013a)이 있다. 즉, 정신장애를 스스로 해결할 책임이 있는 문제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정신장애의 책임이 대상자에게 있다고 인식할수록 동정은 줄어들고, 분노와 두려움이 증가하여 돕는 행동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감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귀인정서이론을 약물중독(자)에 적용하면, 약물중독의 문제를 개인적 책임이라고 인식할수록 긍정적 정서는 줄어들고, 부정적 정서는 증가하여 돕는 행동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감은 높아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접촉가설은 낙인부여자와 낙인대상자간의 직접적, 간접적 접촉이 서로의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쳐 차별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Link & Cullen, 1986). 접촉가설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과의 접촉이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서미경 외, 2010; 이민화 외, 2016; Anagnostopoulos & Hantzi, 2011; Angermeyer & Matschinger, 1996; Corrigan et al., 2001a; Corrigan et al., 2001b; Corrigan et al., 2002)이 있다. 연구 결과 거의 예외 없이 정신장애인과의 직접적, 간접적 접촉 경험은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켜, 도움의향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접촉이란 정신장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포괄하는 것(Corrigan et al., 2001b)으로 도서, 강의,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접하는 것에서부터 실습이나 직장에서 동료로 함께 일한 경험 혹은 친구나 가족, 자신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를 의미한다(서미경 외, 2017).
이와 같은 접촉의 긍정적 영향에 기반하여 다양한 접촉을 경험할 수 있는 낙인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이민화, 서미경, 2015; Bizub & Davidson, 2011; Clement et al., 2012; Pittman et al., 2010; Rusch et al., 2008)이 있다. 장단기 효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접촉 프로그램이 다른 낙인극복 전략에 비해 의미 있는 낙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접촉가설을 적용하면, 약물중독(자)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접촉경험 역시 긍정적 정서를 높이고, 부정적 정서를 줄여, 돕는 행동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킬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2. 약물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선행연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10여 년간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약물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연구는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현병이나 우울증 혹은 다양한 준거집단(AIDS, 신체질환, 수형자 등)과 약물중독의 낙인 수준(정서 반응, 행동 반응과 책임성과 통제성에 대한 이해 등)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두 번째는 물질중독 내에서 알코올과 비교하거나 약물 간 낙인 수준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세 번째는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도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약물중독을 다른 유형의 정신장애(우울증이나 조현병)나 준거집단과 비교한 연구들은 예외 없이 약물중독에서 사회적 거리감과 두려움, 회피, 비난의 부정적 반응이 의미 있게 더 높고, 동정과 돕고자 하는 의향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근우, 서미경, 2012a; Corrigan et al., 2000; Corrigan et al., 2009a; Crespo et al., 2008; Mushtaq et al., 2015). 또한 약물중독이 다른 정신장애 유형에 비해 통제 가능성과 책임성이 높다고 인식되었다(Corrigan et al., 2000; Corrigan et al., 2009a; Crespo et al., 2008). 즉, 약물중독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해당 정신장애를 나타내는 비네트를 사용한 연구들(Hengartner et al., 2013; Link et al., 1999; Mannarini & Boffo, 2015; Marie & Miles, 2008; Martin et al., 2000; Pescosolido et al., 1999)과 비네트 없이 진단명을 제시하여 조사한 연구들(Crisp et al., 2000; Crisp et al., 2005; Fernando et al., 2010)로 나눌 수 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였든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정서 반응 · 행동 반응과 책임성 인식)은 조현병이나 우울증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는 결과이다.
두 번째, 물질중독 간 사회적 낙인을 비교한 연구들 중에는 먼저 알코올중독과 약물중독을 비교한 연구들(Hamilton et al., 2023; Johnson-Kwochka et al., 2021; Krendl & Perry, 2022; Sattler et al., 2017; Sorsdahl et al., 2012)이 있다. 대부분 비네트를 활용하였는데, 알코올보다 코카인에서 비난, 두려움, 회피, 강제치료, 도움 거부 인식이 높았고(Sattler et al., 2017), 알코올보다 오피오이드, 헤로인, 메스암페타민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의미 있게 높았다. 또한 알코올중독은 양육방식과 생물학적 원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약물중독은 나쁜 성격 등 개인적 원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았다(Hamilton et al., 2023; Krendl & Perry, 2022). 그러나 이 연구들과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Johnson-Kwochka et al., 2021)에서는 알코올, 오피오이드, 마리화나, 각성제 간 사회적 낙인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알코올을 마리화나보다 더 위험하게 인식한다는 결과(Sorsdahl et al., 2012)도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하면, 대부분 불법 약물이 알코올보다 낙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는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합법적인 약물로 인정하고 있어 연구가 수행된 국가에 따라 다른 불법약물에 비해 사회적 낙인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알코올이 아닌 약물 간 사회적 낙인을 비교한 연구들도 있다. 터키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Çırakoğlu & Işın., 2005)에서는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항정신성약물 중 헤로인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마리화나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접촉 경험이 있으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에서 이루어진 헤로인과 마리화나의 비교 연구(Sattler et al., 2021)에서도 헤로인이 마리화나보다 낙인 수준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낙인 수준이 더 높아 헤로인 중독을 매우 위험하고 두렵게 생각하여 중독자들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높았다.
세 번째,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귀인정서이론이나 접촉가설을 약물중독에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귀인정서이론을 적용한 결과들을 보면, Van Boekel 외(2013a)는 네덜란드 대중 2,193명을 대상으로 통제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두려움, 동정, 분노를 매개로 약물중독자를 공직과 아동을 돌보는 것에서 배제하고, 강제치료를 하며,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제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책임성 인식이 정서를 매개로 사회적 제한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정서를 통제한 상태에서 책임성 인식이 사회적 제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제한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위험성 인식과 분노라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Taylor 외(2021)는 미국 성인 947명을 대상으로 오피오이드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사회적 관계 회피와 위험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 정책과 정부의 투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체포하거나 기소하는 것에 대한 태도 등을 질문하여 귀인이론을 검증하였다. 여기서 귀인은 오피오이드중독을 얼마나 의료적 상황(medical condition)으로 인식하는 지를 질문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오피오이드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을수록 낙인이 증가하고, 정부의 투자에 반대하며, 체포와 기소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아져 귀인이론이 지지되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귀인을 원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연구들이 있다. Sattler 외(2017)는 약물중독을 유전적 원인으로 인식할수록 비난은 감소하고, 동정은 증가하지만, 사회적 거리감에는 의미 있는 영향력이 없다고 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Jang 외(2023)의 연구에서는 약물중독의 원인을 성격적 원인과 질병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누었을 때, 어느 원인으로 이해하든 가족이나 동료로 같이 지내거나 집을 세주거나 고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회적 거리감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귀인방식을 원인으로 측정한 연구에서는 귀인이론이 검증되지 않았으나 책임성과 통제성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귀인정서이론이 지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약물중독에 접촉가설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접촉을 통한 친숙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자신의 약물중독 경험과 친구나 가족의 경험을 따로 질문하여 평가하고, 약물에 대한 지식수준을 질문하기도 하였다. 모든 접촉 경험이 사회적 권리제한을 의미 있게 감소시켰으나 영향력이 크지 않거나(Van Boekel et al., 2013a) 약물중독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비난, 회피를 감소시키고 가족이나 친구의 경험이 위험성 인식,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Adlaf et al., 2009; Sattler et al., 2017)고 하여 접촉가설이 일부 지지되는 결과들이 있다. 다른 연구들(Sorsdahl et al., 2012; Taylor et al., 2021)에서는 접촉 경험을 직접적, 간접적 경험으로 나누어 직접적 경험은 낙인을 감소시키지만 간접적 접촉은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접촉 경험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과들(Janulis et al., 2013; Rubinshteyn, 2015)도 있다. 따라서 다른 정신장애 유형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검증된 접촉가설이 약물중독에서는 그 효과가 일부에서만 나타나거나, 있다 하여도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을 약물중독에 적용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귀인정서이론을 적용할 경우 약물중독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할 경우 분노와 두려움이 증가하고, 동정이 감소하여 돕는 행동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감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접촉가설을 적용하면 약물중독(자)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접촉이 많을수록 분노와 두려움은 감소하고, 동정이 증가하여 돕는 행동은 향상되고 사회적 거리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약물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약물중독자에 대한 책임성 인식, 접촉 수준, 정서 반응, 도움의향,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였다. 연구 실시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조사대상은 전국에서 표집된 성인 462명이다. 표집 방법은 지역표본추출 방법, 비례층화표본추출법,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즉, 전체 표집 목표를 500명으로 정하고 광역 · 특별시, 시 단위, 군 단위 이하의 지역인구비례에 따라 지역단위별 사례수를 할당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의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집인원을 산출하고 남녀의 비율은 동등하게 하여 지역별, 연령별, 성별 목표 표집인원을 최종 산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에 소속된 패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표집 방법에 맞게 실시하고 할당 된 사례수가 채워지면 설문이 종료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배부 및 수거는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시행되었다.
대상자의 성별은 <표 1>과 같이 남성 233명(50.4%), 여성 229명(49.6%)이다. 연령은 20대 48명(10.4%), 30대 61명(13.2%), 40대 147명(31.8%), 50대 157명(34%), 60대 이상 49명(10.6%)이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하 47명(10.2%), 중하 177명(38.8%), 중 200명(43.3%), 중상 34명(7.4%), 상 4명(0.9%)이다. 교육년수는 평균 14년(±2.99)이다. 약물남용 선별검사(DAST-10)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약물중독 수준을 조사했을 때 365명(79%)이 0점으로 건강한 수준이었고, 85명(18.4%)이 1~2점으로 낮은 정도의 위험한 수준, 6명(1.2%)이 3~5점으로 중간 정도 위험한 수준이며, 6명(1.2%)이 6~8점으로 심각한 위험 수준이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중위험군 이상은 2.4%이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변수명 | 조사참여자(n=462) | ||
|---|---|---|---|
| n | % | ||
| 성별 | 남 | 233 | 50.4 |
| 여 | 229 | 49.6 | |
| 연령 | 46.13±10.86 | ||
| 연령대 | 20~29 | 48 | 10.4 |
| 30~39 | 61 | 13.2 | |
| 40~49 | 147 | 31.8 | |
| 50~59 | 157 | 34.0 | |
| 60~65 | 49 | 10.6 | |
| 주관적인 경제적수준 | 하 | 47 | 10.2 |
| 중하 | 177 | 38.3 | |
| 중 | 200 | 43.3 | |
| 중상 | 34 | 7.4 | |
| 상 | 4 | 0.9 | |
| 교육년수 | 14.94±2.99 | ||
| DAST-10 | 0점 | 365 | 79.0 |
| 1~2점 | 85 | 18.4 | |
| 3~5점 | 6 | 1.2 | |
| 6~8점 | 6 | 1.2 | |
2. 조사도구
가. 책임성 인식
약물중독의 책임성 인식은 문제의 원인과 통제 소재가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중독의 문제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병을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병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Crespo 외(2008)가 개발한 Attribution Questionnair(이하 AQ-27)의 책임성 하위 요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중독에 대한 책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AQ-27은 국내의 연구들(박근우, 서미경, 2012a; 박근우, 서미경, 2012b; 박근우, 서미경, 2017; 이민화, 서미경, 최경숙, 2016)에서 귀인과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활용된 측정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책임성의 Cronbach’s α값은 .701이다.
나. 접촉수준
접촉수준은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각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즉, ‘자신에게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지’,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지’, ‘친구 중에 약물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친척이나 지인 중에 약물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가족의 친구 중에 약물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동네 이웃 중에 약물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 ‘일터에서 만난 적이 있는지’, ‘일상생활 중 만난 경험이 있는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지’, ‘책을 읽은 적이 있는지’,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공익광고를 본 적이 있는지’, ‘미디어(TV, 유튜브 등)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지’ 등 15가지 상황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접촉 상황은 이민화 외(2016)가 사용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험을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경험한 것’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접촉 수준은 ‘예’라고 응답한 문항을 합산하여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점수는 0점에서 15점까지로 분포되어 있다. 접촉수준의 Cronbach’s α값은 .702이다.
다. 정서 반응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서 반응으로 ‘분노’, ‘두려움’, ‘동정’을 측정하였다. ‘분노’와 ‘동정’은 AQ-27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분노’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쾌하다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정’은 동정심을 느끼고, 걱정이 되고, 불쌍하다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려움’은 서미경 외(2008)가 사용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척도 하위요인 중 위험요인 3문항을 사용하였다. ‘두려움’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사람이고, 이웃에 있으면 아이들이 위험하며, 나를 해칠까봐 두렵다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서 반응의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 반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노의 Cronbach’s α값은 .837이고, 두려움의 Cronbach’s α값은 .830이며 동정의 Cronbach’s α값은 .770이다.
라. 도움의향
도움의향은 AQ-27의 하위요인 중 행동 반응에 해당하는 도움의향을 사용하였다. ‘‘도움의향’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도우며, 필요하면 도울 것이라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의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값은 .797이다.
마.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서미경 외(2008)가 사용한 차별행동 척도 중 ‘관계지양’에 해당되는 문항과 Bryan 외(2016)가 사용한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중의 태도 척도 중 ‘배제’ 하위요인을 참고로 문항을 구성하여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과 친구, 직장동료, 이웃으로 지낼 수 없고, 그들을 위한 시설이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가족 중 약물중독의 문제를 가진 사람과 결혼한다면 반대하며, 고용주라면 약물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베이비시터로 고용할 수 없다. 그리고 약물중독이 사회에 부담이 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들과의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874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신뢰도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 변수명 | 평균 | 표준편차 | Cronbach’s α |
|---|---|---|---|
| 책임성 인식 | 3.31 | ±.77 | .701 |
| 접촉 수준* | 2.97 | ±2.14 | .702 |
| 분노 | 2.87 | ±.80 | .837 |
| 두려움 | 3.81 | ±.72 | .830 |
| 동정 | 3.05 | ±.767 | .770 |
| 도움의향 | 3.06 | ±.71 | .797 |
| 사회적 거리감 | 3.80 | ±.63 | .874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7.0과 AMOS 24.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관련성 그리고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모형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χ²값과 RMSEA, 상대적 적합지수인 NFI, GFI, CFI, TLI를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Phantom변수를 이용한 Bootstrapping 분석으로 간접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 교육년수, DAST-10)과 주요 변수들(책임성 인식, 접촉 수준, 분노, 두려움, 동정, 도움의향,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성별은 책임감(r=-.186, p<0.01), 접촉(r=-.125, p<0.01), 분노(r=-.207, p<0.01), 사회적 거리감(r=-.107, p<0.05)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령은 분노(r=.213, p<0.01), 동정(r=.200, p<0.01), 도움의향(r=.103, p<0.05)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은 책임성(r=-.124,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육수준도 책임성(r=-.110, p<0.05)과만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DAST-10은 도움의향(r=.102, p<0.05)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요변수들과의 상관관계
| 변수명 | 성별 | 연령 | 경제적 수준 | 교육수준 | DAST-10 |
|---|---|---|---|---|---|
| 책임성 인식 | -.186** | .068 | -.124** | -.110* | .018 |
| 접촉 수준 | -.125** | -.031 | .050 | .072 | .039 |
| 분노 | -.207** | .213** | -.058 | -.076 | .091 |
| 두려움 | -.075 | -.074 | -.067 | .003 | -.005 |
| 동정 | .031 | .200** | .071 | .034 | .085 |
| 도움의향 | .056 | .103* | .059 | .079 | .102* |
| 사회적 거리감 | -.107* | -.067 | -.074 | .026 | -.072 |
2. 조사대상자의 약물 중독에 대한 인식
기존의 연구(채수미,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에서 오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되는 약물을 나열하고, ‘중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물에 체크(중복 체크 가능)하도록 했을 때 <표 4>와 같다. 히로뽕 425명(92%), 코카인 416명(90%), 대마초 415명(89.8%), 흡입제 370명(80.1%). 술 349명(75.5%), 기분이 좋아지는 약 345명(74.7%), 각성제 338명(73.2%), 담배 335명(72.5%), 수면제 324명(70.1%), 신경안정제 285명(61.7%), 카페인 276명(59.7%), 비만치료제 253명(54.8%), 진통제 221명(47.8%), 근육강화제 180명(39%), 발기부전치료제 136명(29.4), 감기약 67명(14.5%)이 중독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불법 약물인 히로뽕, 코카인, 대마초, 흡입제에 대해 중독될 수 있다는 인식률이 높았고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기분 좋아지는 약, 각성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비만치료제 등에 대한 인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
중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물 유형
| 문항내용 | 응답률(n=462) | |
|---|---|---|
| n | % | |
| 히로뽕 | 425 | 92.0 |
| 코카인 | 416 | 90.0 |
| 대마초(마리화나) | 415 | 89.8 |
| 흡입제(본드 등) | 370 | 80.1 |
| 술 | 349 | 75.5 |
| 기분이 좋아지는 약 | 345 | 74.7 |
| 각성제(집중력 좋아지는 약) | 338 | 73.2 |
| 담배 | 335 | 72.5 |
| 수면제 | 324 | 70.1 |
| 신경안정제 | 285 | 61.7 |
| 카페인 | 276 | 59.7 |
| 비만치료제(살 빼는 약) | 253 | 54.8 |
| 진통제 | 221 | 47.8 |
| 근육강화제 | 180 | 39.0 |
| 발기부전치료제(성기능이 좋아지는 약) | 136 | 29.4 |
| 감기약(진해거담제) | 67 | 14.5 |
| 주: 중복응답 | ||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먼저 정서 반응들 간의 관계를 보면 분노와 두려움(r=.368), 두려움과 동정(r=-.127) 간에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는 두려움과 정적 상관관계를, 두려움은 동정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와 동정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 변수명 | 1 | 2 | 3 | 4 | 5 | 6 | 7 |
|---|---|---|---|---|---|---|---|
| 1. 책임성 인식 | - | ||||||
| 2. 접촉 수준 | -.072 | - | |||||
| 3. 분노 | .457** | .017 | - | ||||
| 4. 두려움 | .336** | .002 | .368** | - | |||
| 5. 동정 | -.174** | .191** | .031 | -.127** | - | ||
| 6. 사회적 거리감 | .449** | -.057 | .424** | .754** | -.217** | - | |
| 7. 도움의향 | -.262** | .141** | -.139** | -.264** | .635** | -.371** | - |
귀인방식인 책임성 인식과 정서 반응, 행동 반응 간의 관련성을 보면, 책임성 인식은 분노(r=.457), 두려움(r=.336), 사회적 거리감(r=.449)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동정(r=-.174), 도움의향(r=-.262)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접촉 수준과 정서, 행동 반응 간의 관련성을 보면, 접촉 수준은 동정(r=.191), 도움의향(r=.14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과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 반응과 행동 반응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분노는 사회적 거리감(r=.424)과는 정적 관계, 도움의향(r=-.139)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동정은 사회적 거리감(r=-.217)과는 부적 관계, 도움의향(r=.635)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두려움은 사회적 거리감(r=.754)과는 정적 관계, 도움의향(r=-.264)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4. 연구모형검증
가. 귀인정서이론 모형검증
귀인정서이론을 약물중독에 적용한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책임성 인식에 대한 측정모형이 잘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는 총 6개(책임성 인식, 분노, 두려움, 동정, 도움의향, 사회적 거리감)이며 이를 구성하는 관찰변수는 19개이다. 이들 각각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 적합도 지수들과 함께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상 χ²값은 394.952(p=.000)로 부적합하게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FI .914, TLI .931, IFI .943, CFI .943, RMSEA .063으로 적합성이 인정되는 기준이어서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적재치가 0.5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나. 접촉가설 모형검증
접촉가설을 약물중독에 적용한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모형이 잘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는 총 6개(접촉 수준, 분노, 두려움, 동정, 도움의향, 사회적 거리감)이며 이를 구성하는 관찰변수는 19개이다. 이들 각각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 적합도 지수들과 함께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상 χ²값은 368.040(p=.000)로 부적합하게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FI .915, TLI .934, IFI .946, CFI .945, RMSEA .059로 적합성이 인정되는 기준이어서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적재치가 0.4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5. 구조모형분석
가. 귀인정서이론의 구조모형분석
귀인정서이론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두려움이 사회적 거리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β=.824). 그 다음으로 동정이 도움의향에(β=.778), 책임성 인식이 분노에(β=.618), 책임성 인식이 두려움에(β=.506), 책임성 인식이 동정에(β=-.224), 두려움이 도움의향에(β=-.187), 동정이 사회적 거리감에(β=-.158), 분노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β=.133)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두려움이고, 도움의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동정이다.
표 6
귀인정서이론 구조모형 경로계수
| 경로 | B | β | S.E | C.R | p | ||
| 책임성 인식 | → | 분노 | .601 | .618 | .065 | 9.210 | 0.000 |
| 분노 | → | 도움의향 | -.045 | -.059 | .033 | -1.373 | 0.170 |
| 분노 | → | 사회적 거리감 | .096 | .133 | .027 | 3.602 | 0.000 |
| 책임성 인식 | → | 두려움 | .482 | .506 | .058 | 8.250 | 0.000 |
| 두려움 | → | 도움의향 | -.146 | -.187 | .034 | -4.305 | 0.000 |
| 경로 | B | β | S.E | C.R | p | ||
| 두려움 | → | 사회적 거리감 | .609 | .824 | .040 | 15.239 | 0.000 |
| 책임성 인식 | → | 동정 | -.228 | -.224 | .060 | -3.801 | 0.000 |
| 동정 | → | 도움의향 | .570 | .778 | .052 | 11.058 | 0.000 |
| 동정 | → | 사회적 거리감 | -.109 | -.158 | .024 | -4.626 | 0.000 |
Phantom변수를 이용한 Bootstrapping 분석 방법으로 살펴본 각 경로별 간접효과는 <표 7>과 같다. 책임성 인식이 분노를 매개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58, 책임성 인식이 두려움을 매개로 도움의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70, 책임성 인식이 두려움을 매개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94로 나타났다. 책임성 인식이 동정을 매개로 도움의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30, 책임성 인식이 동정을 매개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5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간접효과가 큰 것은 책임성 인식이 두려움을 매개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경로였다. 다음은 책임성 인식이 동정을 매개로 도움의향에 미치는 경로이고 책임성 인식이 두려움을 매개로 도움의향에 미치는 경로 순이다. 책임성 인식이 분노를 매개로 도움의향에 미치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7
귀인정서이론 간접효과 분석
| 경로 | 간접효과 | 편차교정 |
|---|---|---|
| 책임성 인식 → 분노 → 도움의향 | -.027 | -.078 ~ .023 |
| 책임성 인식 → 분노 → 사회적 거리감 | .058** | .017 ~ .107 |
| 책임성 인식 → 두려움 → 도움의향 | -.070** | -.128 ~-.037 |
| 책임성 인식 → 두려움 → 사회적 거리감 | .294** | .210 ~ .395 |
| 책임성 인식 → 동정 → 도움의향 | -.130** | -.226 ~-.040 |
| 책임성 인식 → 동정 → 사회적 거리감 | .025** | .010 ~ .052 |
나. 접촉가설 구조모형분석
접촉가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검토한 결과 <표 8>과 같다. 두려움이 사회적 거리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β=.828). 그 다음으로 동정이 도움의향에(β=.809), 접촉 수준이 동정에(β=.247), 두려움이 도움의향에(β=-.194), 동정이 사회적 거리감에(β=-.186), 접촉 수준이 두려움에(β=-.123), 분노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β=.118)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감을 가장 예측하는 요인은 두려움이고, 도움의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동정이다.
표 8
접촉가설 구조모형 경로계수
| 경로 | B | β | S.E | C.R | p | ||
|---|---|---|---|---|---|---|---|
| 접촉 수준 | → | 분노 | .719 | .044 | .987 | .728 | 0.466 |
| 분노 | → | 도움의향 | -.069 | -.091 | .035 | -1.960 | 0.050 |
| 분노 | → | 사회적 거리감 | .085 | .118 | .028 | 3.005 | 0.003 |
| 접촉 수준 | → | 두려움 | -1.955 | -.123 | .962 | -2.032 | 0.042 |
| 두려움 | → | 도움의향 | -.152 | -.194 | .036 | -4.157 | 0.000 |
| 두려움 | → | 사회적 거리감 | .613 | .828 | .042 | 14.700 | 0.000 |
| 접촉 수준 | → | 동정 | 4.412 | .247 | 1.208 | 3.652 | 0.000 |
| 동정 | → | 도움의향 | .563 | .809 | .051 | 10.945 | 0.000 |
| 동정 | → | 사회적 거리감 | -.122 | -.186 | .023 | -5.261 | 0.000 |
Phantom변수를 이용한 Bootstrapping 분석 방법으로 살펴본 각 경로별 간접효과는 <표 9>와 같다. 접촉 수준이 동정을 매개로 도움의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490로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다음이 접촉 수준이 동정을 매개로 사회적 거리감으로 가는 경로이고, 간접효과는 -.563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경로들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9
접촉가설 간접효과 분석
| 경로 | 간접효과 | 편차교정 |
|---|---|---|
| 접촉 수준 → 분노 → 도움의향 | -.048 | -.555 ~ .086 |
| 접촉 수준 → 분노 → 사회적 거리감 | .081 | -.216 ~ .689 |
| 접촉 수준 → 두려움 → 도움의향 | .300 | -.041 ~ 2.169 |
| 접촉 수준 → 두려움 → 사회적 거리감 | -1.237 | -8.551 ~ .280 |
| 접촉 수준 → 동정 → 도움의향 | 2.490** | .591 ~ 10.537 |
| 접촉 수준 → 동정 → 사회적 거리감 | -.563** | -2.476 ~ -.147 |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약물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을 약물중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집된 성인 462명의 약물중독(자)에 대한 책임성 인식, 사회적 거리감, 도움의향, 접촉수준 그리고 정서 반응(분노, 두려움, 동정)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적 낙인관련 변수들간의 관계를 보면, 먼저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접촉이 더 많지만, 책임성 인식이 더 높고, 분노와 사회적 거리감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은 도움의향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여성이 더 높은 것(Lo et al., 2021; Suen et al., 2021)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통제를 하지 못하거나 무책임한 것에 대해 더 비판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Sattler 외(2021)도 남성의 경우 약물중독을 범법행위와 연결하여 더 비판적으로 보는 반면 여성은 ‘취약한’ 집단으로 여겨 돕는 행동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약물중독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낙인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결과들(Brown, 2011; Jang et al., 2023)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결과들(Corrigan & Watson, 2007)이 혼재되어 있다. 연령과 사회적 낙인 변수들간의 관계에서는 연령이 높으면 분노도 높지만 동정과 도움의향도 높은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약물중독에 분노하면서도 그들을 도울 의향은 있다는 것으로 다소 모순되는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으면 다른 유형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높다는 기존 연구들(박근우, 서미경, 2020; 서미경 외, 2008; Lauber et al., 2000; Lo et al., 2021; Pescosolido et al., 1999; Pescosolido et al., 2021)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약물중독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연령 역시 성별과 마찬가지로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제시한다. 즉, 연령이 높으면 사회적 낙인이 높다는 결과(Adams et al., 2021; Taylor et al., 2021)와 오히려 낮다는 결과(Sattler et al., 2017; Sorsdahl et al., 2012)가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성 인식만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낙인관련 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요 변수들과의 관련성은 국외 연구들에서도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제한적이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DAST로 측정한 조사대상자의 약물중독 수준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에서는 도움의향만이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돕고자 하는 의향이 더 높았다. 전체 대상자 중 79%가 경험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관련성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은 회복과정에서 동료의 지원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에게 중독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한(중복체크 가능) 결과 많은 사람들이 술보다 더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히로뽕, 코카인, 대마초, 흡입제였다.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이 세 가지 약물은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즉, 불법 약물을 술보다 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술과 담배보다 중독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은 약물에는 비만치료제, 진통제, 근육 강화제, 발기부전제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중의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기존의 국내연구들(정현주, 박정숙, 2023; 최봉실, 박정숙, 2022)에서도 대중들은 불법 약물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면서도 처방으로 시작하는 약물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였다.
셋째, 귀인정서이론을 적용하여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예측하면, 책임성 인식이 분노와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동정을 약화시켜 사회적 거리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이 지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움의향으로 가는 경로는 책임성 인식이 두려움과 동정을 매개로 도움의향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노를 거친 경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 일부만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두려움이며, 책임성 인식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유형의 정신장애나 약물중독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하거나 원인을 질병이나 생물학적 원인으로 보지 않을 경우, 비난, 위험성 인식, 분노가 높아지고(Corrigan et al., 2003; Van Boekel et al., 2013a),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며 (Corrigan et al., 2003; Hamilton et al., 2023; Martin et al., 2000; Sattler et al., 2021; Taylor et al., 2021; Watson, 2001), 책임성 인식이 정서적 반응 중 분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Rubinshteyn, 2015), 사회적 거리감을 가장 강력히 예측하는 요인이 두려움이라는 결과들(박근우, 서미경, 2012b; Corrigan et al., 2002; Corrigan et al., 2003; Martin et al., 2000)과 일치한다. 또한 도움의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 동정이라는 것 역시 기존의 연구들(Corrigan et al., 2003)과 유사하다. 즉, 대부분의 정신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약물중독의 문제 역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 행동 반응으로 인해 약물중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치료 확대에 반대하며, 그들을 법적 체계에서만 징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중의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약물중독자로 하여금 치료를 회피하고, 가급적 자신의 문제를 숨기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약물중독의 문제를 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적 모델로 이해하고(윤명숙, 2010), 마약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는(신선희, 2022)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정신장애 유형과 차별적인 낙인극복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접촉가설을 약물중독에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도움의향을 높일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접촉수준이 동정을 증가시키고, 두려움을 줄이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하고, 분노에는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결국 접촉수준이 동정을 증가시켜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고, 도움의향을 높이는 경로만이 의미 있는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접촉가설은 매우 일부에서만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정신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낙인 연구들(서미경 외, 2010; 이민화, 서미경, 2015; Anagnostopoulos & Hantzi, 2011; Angermeyer & Matschinger, 1996; Angermeyer et al., 2004; Corrigan et al., 2001b; Couture & Penn, 2006; Link & Cullen, 1986; Vezzoli et al., 2001)에서 예외 없이 접촉경험으로 인한 친숙함이 부정적인 정서 · 행동 반응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들과 차이가 있다. 즉, 조현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접촉이 의미 있는 낙인극복 효과를 보이지만, 약물중독의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이는 다른 정신장애와 달리 약물중독이 범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이해하지 못해 막연히 두려웠던 조현병은 접촉경험을 통해 친숙해지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두려움이나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약물중독은 질병이나 치료가 필요한 문제라기보다 불법적 행동으로 간주되고, 대부분의 접촉 경험 역시 부정적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접촉 경험이 동정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물중독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회복 노력이나 그들의 치료 과정에 대한 간접적 접촉 경험이 동정과 돕고자 하는 의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약물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이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초, 중, 고등학교 종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약약물 예방교육에서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치료를 받음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독이 발생하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의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요청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중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나 캠페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접촉의 효과가 크지 않지만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독자의 회복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려는 미디어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낙인 반응에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과 연령에 맞춘 미디어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을수록 SNS보다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미디어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중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Rao et al., 2009; Van Boekel et al., 2013b)에 의하면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자들의 부정적 태도가 그들의 회복과 치료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약물중독(자)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전문가와 치료자의 낙인극복 노력이 그들의 회복에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매우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로 대두된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낙인극복 전략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약물중독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 조사대상자가 응답과정에서 어떤 약물중독을 염두에 두고 응답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물 유형에 따라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약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연구들이 비네트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네트를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주요 변수들을 측정하는 문항을 일반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 문항에서 가져와 약물중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즉, 구속이나 기소 등 법적 제재에 대한 인식, 중독의 시작이 처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오락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의 측정도구 중 일부를 연구자가 만들어 사용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접촉 경험을 경험 여부로만 질문하여 해당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경험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일부 연구들(Lee & Seo, 2018; Nguyen et al., 2012; Pettigrew et al.,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접촉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따라 낙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제시하여 이러한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 한계라 생각된다.
References
. (2023. 12. 7.). 청소년 마약실태 및 대처 [심포지엄], 국립정신건강센터 심포지엄. 서울, 대한민국. 청소년 마약류 실태. https://www.youtube.com/watch?v=tMRnW_KjxP4
. (2024. 4. 12.).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불법 사용경험 응답. [보도자료] www.mfds.go.kr/brd/m_99/view.do?seq=48602
. (2023. 4. 25.). 국내 마약중독 24만명··· 치료는 연 700명뿐. [보도자료]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04/25/MFZAM74NBJAPXDE32YLQHSTMJM/
. (2023. 2. 15.). 기획: 마약문제 확산? 금기는 여전하다-마약에 대한 인식. [보도자료] https://hrcopinion.co.kr/archives/25788
, , , & (2009). Adolescent stigma towards drug addiction: Effects of age and drug use behaviour. Addictive behaviors, 34(4), 360-364. [PubMed]
, & (1996). The effect of personal experience with mental illness on the attitude towards individuals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1(6), 321-326. [PubMed]
, , & (2004). Familiarity with mental illness and social distance from people with schizophrenia and major depression: testing a model using data from a representative population survey. Schizophrenia research, 69(2-3), 175-182. [PubMed]
(2011). Standardized measures for substance use stigma.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16(1-3), 137-141. [PubMed]
, & (2005). Perception of drug addiction among Turkish university students: Causes, cures, and attitudes. Addictive behaviors, 30(1), 1-8. [PubMed]
, , , , , , , , & (2012). Filmed v. live social contact interventions to reduce stigm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01(1), 57-64. [PubMed]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 [PubMed]
, , , , & (2001a). Prejudice, social distance, and familiarity with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bulletin, 27(2), 219-225. [PubMed]
, , , , & (2001b). Familiarity with and social distance from people who have serious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52(7), 953-958. [PubMed]
, , , , & (2003). An attribution model of public discrimination towards persons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 162-179. [PubMed]
, & (2018). Stigma and the public health agenda for the opioid crisis in Ame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59, 44-49. [PubMed]
, & (2019). How does familiarity impact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Clinical Psychology Review, 70, 40-50. [PubMed]
, , , , , , , & (2002). Challenging two mental illness stigmas: Personal responsibility and dangerousness. Schizophrenia bulletin, 28(2), 293-309. [PubMed]
, & (2007). The stigma of psychiatric disorders and the gender, ethnicity, and education of the perceiver.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3(5), 439-458. [PubMed]
, , , & (2008). Descriptive study of stigma associated with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of Madrid (Spai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4(6), 393-403. [PubMed]
, , , , & (2000). Stigmatisa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7(1), 4-7. [PubMed]
, , & (2010). Sri Lankan doctors’ and medical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5, 733-739. [PubMed]
, , , , , , & (2008). Evaluation of the German WPA “program against stigma and discrimination because of schizophrenia—Open the Doors”: results from representative telephone surveys before and after three years of antistigma interventions. Schizophrenia research, 98(1-3), 184-193. [PubMed]
, , & (2023). Contact reduces substance use stigma through bad character attributions, especially for US health care professional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37(6), 734. [PubMed]
, , , & (2021). Development and examination of the attribution questionnaire-substance use disorder (AQ-SUD) to measure public stigma towards adolescents experiencing substance use disorde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21, 108600. [PubMed]
, & (2022). Addiction onset and offset characteristics and public stigma toward people with common substance dependencies: A large national survey experiment.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37, 109503. [PubMed]
, , , & (2000). Public acceptance of restrictions on mentally ill peopl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2, 26-32. [PubMed]
, & (2018). Effect of direct and indirect contact with mental illness on dangerousness and social dist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4(2), 112-119. [PubMed]
, & (1986). Contact with the mentally ill and perceptions of how dangerous they a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4), 289-302. [PubMed]
, & (2015). Anxiety, bulimia, drug and alcohol addiction, depression, and schizophrenia: what do you think about their aetiology, dangerousness, social distance, and treatment? A latent class analysis approach.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0, 27-37. [PubMed]
, & (2008). Social distance and perceived dangerousness across four diagnostic categories of mental disorder.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2(2), 126-133. [PubMed]
, , & (2000). Of fear and loathing: The role of 'disturbing behavior,' labels, and causal attributions in shaping public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2), 208-223. https://www.jstor.org/stable/2676306
, , & (2012). Evaluating the impact of direct and indirect contact on the mental health stigma of pharmacy stud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 1087-1098. [PubMed]
, , & (2010).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 consumer delivered anti-stigma program: replication with graduate-level helping professional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33(3), 236. [PubMed]
, , , , , & (2009). A study of stigmatized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health professional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3), 279-284. [PubMed]
, , , & (2017). Public stigma toward people with drug addiction: A factorial surve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78(3), 415-425. [PubMed]
, , , , , , , , , & (2021).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stigma and life satisfaction with the willingness of disclosure of psychotic illness: A community study in Hong Kong. Early Intervention in Psychiatry, 15(3), 686-696. [PubMed]
, , , & (2013a). Public opinion on imposing restrictions to people with an alcohol-or drug addiction: a cross-sectional surve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8, 2007-2016. [PubMed]
, , , & (2013b). Stigma among health professionals towards patient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and its consequences for healthcare delivery: systematic review.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31(1-2), 23-35. [PubMed]
, , , , , & (2001). Attitude towards psychiatric patients: a pilot study in a northern Italian town. European psychiatry, 16(8), 451-458. [PubMed]
, & (2018). Barriers to medications for addiction treatment: how stigma kills. Substance use & misuse, 53(2), 330-333.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10-28
- 수정일Revised Date
- 2024-12-28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1-22

- 1958Download
- 3869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