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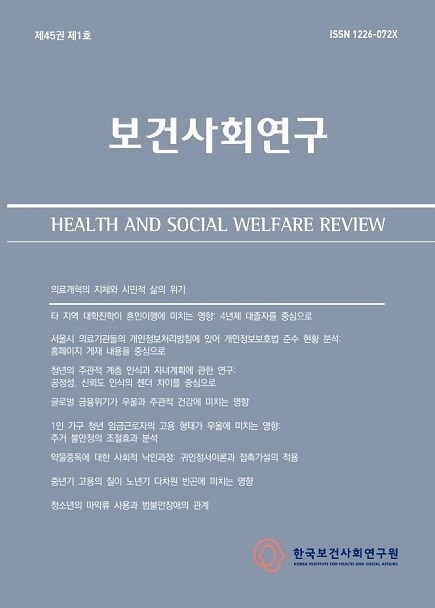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1인 가구의 의료수요 발생과 미충족의 결정요인: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표본선택 프로빗 분석
Determinants of Unmet Medical Demands within Single-Person Households: A Sample Selection Probit Analysis of the 2022 Community Health Survey
Park, Chaelin1; Kim, Hyun Woo1*
보건사회연구, Vol.45, No.1, pp.221-239, March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1.221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이 연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이들이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수요 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의료수요 발생 과정과 지역 수준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1인 가구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청년 1인 가구는 의료수요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지만, 일단 의료 수요가 발생하면 그것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농촌에서는 지역사회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도시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이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와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시간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접근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는 후속 연구 또한 요구된다.
Abstract
The current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key factors affecting unmet medical demands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ecent growth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has raised concerns that they may be relatively disadvantaged in accessing medical services. To address this concern, this study utilizes the 2022 Community Health Survey dataset and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edical demands and unmet medical demands within this population. A two-stage model is employed to separately analyze the occurrence of medical demands and the subsequent unmet demands, distinguishing between the process of demand generation and the occurrence of unmet demands. Ke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economic factors, health status, social networks, the availability of medical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and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se variables significantly impact unmet medical demands, with systematic differences observe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초록
이 연구는 1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수요의 결정요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의료수요 발생 여부와 그 이후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2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수요 자체의 발생 과정과 그 이후 미충족 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경제적 요인, 건강 상태, 지역 내 1인 가구 비율, 지역 내 의료 공급 수준,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차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 경제적 요인과 1인 가구 비율, 지역 내 의료 공급 수준이 미충족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와 농어촌 간에도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Ⅰ. 서론
우리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34.5%는 1인 가구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내부의 다양성도 증대하여, 1인 가구 대부분이 노년층이었던 과거와 달리 2022년에는 29세 이하가 19.8%, 30대가 17.1%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3). 1인 가구는 사회구조의 변화 및 경제적인 이유 등 비자발적인 동기로 인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주거, 안전, 고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이여봉, 2017). 이들이 가정을 꾸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결혼 자금 부족(30.8%)’,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 불안정(14.4%)’ 등 생활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었다(통계청, 2022).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0.9%로 나타나는데, 전체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56.2%라는 것을 고려하면 1인 가구의 거주 형태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3). 허재헌(2018)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과 더불어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적인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흡연 및 과음 등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 수준에서도 2022년 1인 가구의 유병률은 38.3%로 전체 인구 대비 11.8%p 높았으며, 1인 가구의 20.3%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8.3%p 높은 수치다(통계청, 2022).
타인과 사회적으로 잘 연결된 사람일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수월한 의료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삶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이 배태되어 있고(Marshall, 2011, p. 493), 따라서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는 주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가족은 건강 증진을 돕는 사회적 토대 중 하나인데 (Diaz et al., 2013, p. 195), 1인 가구는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가족 자원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므로 의료수요가 발생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1인 가구는 다른 유형의 가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demands)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미충족 의료를 분석한 Marshall(2011)의 연구에서 청년 1인 가구가 청년 동거 가구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으며, 연령대와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낮을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화와 강민아(2016)의 연구는 취약계층 행동모델을 통해 비독거노인에 대비 독거 노인이 의료 이용에 취약함을 밝혀내었다. 한국 노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이혜재와 허순임(2017)의 연구에서도 1인 가구의 경우, 부부 가구 및 자녀 동거 가구 대비 미충족 의료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유나 외(2019)에 따르면 1인 가구 청년은 동거 가구 청년 대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오즈가 낮았으며, 특히 경제적, 방문 시간의 제한 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오즈가 1.8배 높았다. 성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손미선(2022)의 연구에서는 1인 가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충족 의료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밝혀졌다.
1인 가구가 의료수요의 발생 및 의료서비스의 이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특성이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미충족 의료 연구는 의료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집단과 의료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히 충족된 집단을 분류하지 않고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해왔다(박민정, 2014; 문정화, 강민아, 2016; 김윤정 외, 2018; 채현주, 김미종, 2020; 손미선, 2022; 신숙, 이원재, 2022). 그러나 의료수요의 발생 여부는 어떤 특성을 가진 개인이 건강 문제를 더 경험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미충족 수요와의 별개로 의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수행된 미충족 의료수요에 관한 연구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 Quintal et al.,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에 집중하여 분석하되, 특히 미충족 의료 이전에 발생하는 의료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미충족 의료
미충족 의료는 대상자가 원하거나 의료전문가의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대상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김윤정 외, 2018),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지표로 사용된다. 미충족 의료는 증상의 완화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미충족 의료는 판단 주체에 따라 크게 주관적인 미충족 의료와 객관적인 미충족 의료로 나뉘는데, 주관적 미충족 의료는 환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대다수의 미충족 의료 연구가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객관적인 미충족 의료는 의료전문가의 판단으로, 환자 판단에 존재하는 주관성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아쉽게도 대표성을 가지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우세린 외, 2020, p. 596).
지금까지의 미충족 의료 연구는 노인, 장애인, 특정 질병의 환자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미충족 의료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거나, 주관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 특정 요인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1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채현주와 김미종(2020)은 1인 가구의 성별에 따른 미충족 의료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과 관계없이 대다수가 시간 문제로 인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남성은 증상이 가벼움, 여성은 경제적인 이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 인지, 치과 미충족 의료 여부, 자살 생각 여부에 따라 미충족 의료의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 인지, 건강검진 여부, 치과 미충족 의료,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 자살 생각에 따라 미충족 의료의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김윤정 외(2018)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1인 가구는 노년기에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혼인이 종결된 상태이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을 확인한 바 있다.
2. 앤더슨 행동 모형
앤더슨 행동 모형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왜,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해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접근성의 공평함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Andersen & Newman, 2005). 앤더슨 행동 모형은 독립변수들을 범주화하여 분석에 사용하므로 개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개인의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미충족 의료와 관련해서 특히 앤더슨의 행동 모형을 분석 틀로써 사용한 연구가 많은데(김광묘, 김창엽, 2020), 이는 많은 연구에서 요인 분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기 때문이다(이동명, 박종두, 2011).
앤더슨의 행동 모형은 행동을 발생시키는 세 가지 요인으로 소인 요인(predisposing factors)과 가능 요인(enabling factors), 필요 요인(need factors)을 제시한다. 소인 요인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나이,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여부 등을 포함한다. 가능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서, 소득이나 거주 지역,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포함하며, 필요 요인은 직접적으로 의료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장애, 만성질환, 우울증, 삶의 질 등을 포함한다.
우세린 외(2020)는 앤더슨 행동 모형의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고용 형태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규직과 비교하였을 때 남성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앤더슨 행동 모형을 활용하여 여성 노인의 미충족 의료를 분석한 박숙경(2022)의 연구에 따르면, 소인 요인 중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거나 혼자 사는 경우, 가능 요인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필요 요인 중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과 김서현(2023)은 앤더슨 행동 모형을 기반으로 성인의 미충족 의료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소인 요인과 관련하여 남성일 때, 최종 학력이 무학인 것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에서, 미혼보다 기혼 및 이혼, 사별,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 가능 요인 중 가구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직이거나 기타 업종이 아닌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필요 요인 중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소인 요인에서 여성일 때, 연령이 높을 때, 미(비)혼일 때, 교육 수준이 낮을 때, 가능 요인 중 고용 형태가 무직 등 불안정한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dersen & Newman(2005, p. 16)은 가구의 자원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 공급량 등 지역 수준의 변수도 가능 요인에 속한다고 밝혔으나, 앤더슨 행동 모형을 사용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 수준의 변수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지 않다(김광묘, 김창엽, 2020; 박숙경, 2022; 신숙, 이원재, 2022; 박민정, 2014; 박선주, 이원재, 2017; 손미선, 2022; 한상윤, 남석인, 2021; 김보름 외, 2020; 박현섭, 홍성애, 2021). 그러나 1인 가구의 주된 특징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므로 가족의 자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인 가구의 건강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자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의 크기에 따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사회의 파편화와 의료 이용의 도농 격차
다수의 연구는 지역 내 커뮤니티 혹은 타인과 연결된 수준이 개인의 건강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Bryant et al., 2009, p. 26). 박경순과 박영란(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의 강도가 농촌 노인의 건강에 성별과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의영(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이 확대형 집단에 속한 노인일수록 건강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2009)은 응집력이 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의 경우 건강에서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가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Hendryx 외(2002)는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의료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를 겪을 위험이 낮다고 밝혔다. 이는 주변인들이 의료 정보를 제공하거나 건강 문제를 먼저 발견해 주고, 병원으로의 이동을 도와주는(Laporte et al., 2008, p. 395)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지역 내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 지역 내의 개인화와 개별화, 사회구성원의 고립과 단절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이명진, 2019, p. 17), 사회적 자본의 형성 또한 지체되기 쉽다(Putnam, 2009)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1인 가구 비율을 지역사회의 파편화의 척도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인 가구 비율이 의료수요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농어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2년 4분기를 기준으로 농어촌의 1인 가구 연령은 50세 이상이 72.8%, 65세 이상이 42.7%로 노령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김태완 외, 2023), 이들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와 비교하여 의료 및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자녀의 지원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농어촌 노인의 의료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Chi & Han, 2022), 도시 노인이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높은 것에 반해, 농어촌의 노인은 이웃과의 접촉 빈도가 높았다(박경순, 박영란,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농어촌의 1인 가구 비율이 의료이용에 대해 도시의 1인 가구 비율과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분석 계획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첫째, 1인 가구가 건강과 의료에 부정적인 제약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1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수요의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미충족 의료수요는 의료수요가 먼저 발생하고, 그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과정이 명확히 나뉘어 분석되지 않았다. 그 결과, 미충족 의료수요를 보고하지 않은 집단 속에 (1) 의료수요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집단과 (2) 의료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히 충족된 집단이 뒤섞이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한’ 의료수요에 따른 미충족 의료수요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실제 이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이전에, 의료수요의 발생 자체를 먼저 분석하는 2단계 모형(two-stage model)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지역 수준의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지역 내의 의료 공급량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가장 대표적인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의 천 명당 1차 병원 수와 천 명당 의료인 수를 함께 투입하여 의료 공급량이 개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끝으로 (1) 지역 내의 커뮤니티에 연결된 강도가 강할수록 더 건강하고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이 낮으며, (2) 이러한 지역사회 파편화의 효과가 도농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측정된 1인 가구비와 농어촌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지역 변수로 투입하여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이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미충족 의료수요는 본질적으로 (1) 의료수요의 발생과 (2) 발생한 의료수요의 미충족이라는 두 단계에 걸쳐 발생한다. 이때 의료수요가 발생한 집단만이 자료에서 미충족 여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정이 이루어지는 모집단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일단 의료수요가 발생한 표본을 대상으로 미충족 의료수요의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면, 처음부터 의료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집단은 분석에서 당연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얻어진 추정량은 선택 편의(selection bias)로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체 (잠재적) 의료수요자에 대하여 일반화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의료수요의 발생을 모형화하고, 그 다음으로 미충족 여부를 모형화하는 2단계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에서는 의료수요의 발생을 설명하는 선택 방정식(selection equation)과 미충족 여부를 설명하는 모형 방정식(model equation)을 각각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이때 의료수요의 발생은 잠재변수 d*로 모형화되고, 미충족 여부는 잠재변수 y*로 모형화된다. 두 잠재변수가 각각 0보다 크면 관찰된 값 1, 그렇지 않다면 0에 대응한다. μ와 ∈은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이변량 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한다고 가정하고, 두 오차항의 상관계수 ρ를 아래 로그우도함수에 포함하며 수치해석으로 회귀계수를 얻으므로 표본선택이 있는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이 된다. 네덜란드의 본인부담제 건강보험 선택을 연구한 van de Ven과 van Praag (1981)의 선택 방정식과 모형 방정식 그리고 로그우도함수 도출을 참고하였다.
만일 ρ =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면 선택 방정식 없는 단순 프로빗 모형으로 환원되고, 반대로 그러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면 단순 프로빗 모형은 무시할 수 없는 선택 편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모형의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해서는 선택 방정식에 모형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변량을 하나 이상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앤더슨 행동 모형의 이론적 취지에 근거하여 소인 요인과 가능 요인 위에 필요 요인에 해당하는 공변량을 선택 방정식에 투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의료수요를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 요인을 투입하고 해석해 왔으나, 본 연구는 필요 요인을 의료수요 발생의 결정요인 차원으로 해석하였기에 필요 요인은 선택 방정식에만 투입하였다.
기존의 분석 방식에서는 의료수요의 발생 여부 단계와 (그 이후) 미충족 여부 단계의 회귀계수를 별개로 파악하지 않아 그 효과가 혼합적으로 추정된다. 가령 특정 변수가 의료수요와는 긍정적(+)으로 연관되고, 미충족 의료수요와는 부정적(-)으로 연관된다면, 기존 분석 방식을 통해서는 오로지 두 효과가 상쇄된 회귀계수를 얻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수요 발생 여부 단계와 미충족 여부 단계를 나누어 독립변수의 상이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2. 연구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따라 보건의료계획의 기반이 되는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표본 지점은 통•반/리 내의 주택유형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을 통해 추출되었으며, 표본 가구는 표본 지점으로 선정된 가구 수를 통해 계통추출로써 추출되었다. 연구 대상은 전체 231,785명 중 “세대 유형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에 1인 가구라고 응답한 41,462명으로 하였다.
3. 변수의 측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미충족 의료 수요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1년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해당 변수를 측정하였다. (1) “예”라고 응답한 경우 의료수요가 발생했고,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2)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의료수요가 발생하였으나 미충족 의료는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3) “필요한 적이 없었음”이라 응답한 경우 의료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앤더슨 행동 모형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1) 소인 요인
소인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성별, 혼인 여부와 사회경제적 특성인 교육 수준, 직업을 사용하였다. 연령은 20살 단위로 나누어 가변수(dummy variable)로 투입하였다. 혼인 여부는 기혼, 미혼으로 나누었으며 기혼 동거는 배우자가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만을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 교육 수준은 무학/서당/한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한 문항을 통해 전문행정관리,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 기능단순노무직/기타, 무직으로 구분하였다.
2) 가능 요인
가능 요인으로는 개인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개인 특성으로는 가구 연 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지난 1년간 소득 증감 여부, 농어촌 거주 여부를 사용하였다. 이때 행정구역상 동에 거주하는 경우 도시 거주,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지역 특성으로는 지역 내 의원과 병원의 천 명당 의료인 수, 그리고 지역 내 1인 가구 비율과 농어촌 거주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사용하였다. 지역 내 천 명당 의료인 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QGIS에서 공간 결합(spatial join) 및 속성 결합을 통해 시•군•구 단위로 추출하였다. 이후 202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데이터를 통해 천 명당 의료인 수를 계산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를 통해 추출하였다.
3) 필요 요인
필요 요인으로는 당뇨 진단 여부, 고혈압 진단 여부, 주관적인 건강 수준과 스트레스 수준, 흡연 여부와 연간 음주량, 삶의 질과 우울증 지수를 사용하였다. 주관적인 건강 수준은 5점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순으로 재구성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의 경우 4점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대단히 많이 느낌 순서로 재구성하였다. 흡연 여부는 (전자담배 등) 담배 종류와 상관없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해당(1)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성이 39.9%, 여성이 60.1%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24.1%(9,982명), 23.5%(9,744명)로 가장 많았다. 직업의 경우 ‘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44.3%(18,365명)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단순노무직/기타’가 23.2%(9,612명), ‘판매서비스직’이 10.5%(4,352명), ‘전문행정관리’가 9.2%(3,806명), ‘농림어업’이 6.6%(2,735명), ‘사무직’이 6.2%(2,5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42.25%(17,51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세 이상 60세 미만이 21.58%(8,948명)로 많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55.7%(23,095명),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44.3%(18,365명)이었으며, 11.9%(4,945명)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21%(8,684명)가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1.8%(4,875명)가 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49.1%(21,107명)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16.8%(6,962명)가 당뇨, 39.8%(16,502명)가 고혈압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N=41,462) | ||||
|---|---|---|---|---|
| 구분 | 변수 | N | % | |
| 소인 요인 | 성별 | 남성 | 16,553 | 39.9 |
| 여성 | 24,909 | 60.1 | ||
| 학력 | 무학/서당/한학 | 5,331 | 12.9 | |
| 초등학교 | 9,982 | 24.1 | ||
| 중학교 | 4,833 | 11.7 | ||
| 고등학교 | 9,744 | 23.5 | ||
| 2/3년제 대학 | 3,079 | 7.4 | ||
| 4년제 대학 | 7,203 | 17.4 | ||
| 대학원 이상 | 1,261 | 3.0 | ||
| 직업 | 전문행정관리 | 3,806 | 9.2 | |
| 사무직 | 2,586 | 6.2 | ||
| 판매서비스직 | 4,352 | 10.5 | ||
| 농림어업 | 2,735 | 6.6 | ||
| 기능단순노무직/기타 | 9,612 | 23.2 | ||
| 무직 | 18,365 | 44.3 | ||
| 연령 | 연령 < 40 | 7,188 | 17.34 | |
| 40 ≤ 연령 < 60 | 8,948 | 21.58 | ||
| 60 ≤ 연령 < 80 | 17,518 | 42.25 | ||
| 80 ≤ 연령 | 7,808 | 18.83 | ||
| 가능 요인 | 경제활동 여부 | 해당 | 23,095 | 55.7 |
| 비해당 | 18,365 | 44.3 | ||
|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 | 4,945 | 11.9 | |
| 비해당 | 36,508 | 88.1 | ||
| 총소득 변화 | 줄어들음 | 8,684 | 21.0 | |
| 변함없음 | 27,881 | 67.3 | ||
| 늘어남 | 4,875 | 11.8 | ||
| 농어촌 여부 | 해당 | 21,107 | 49.1 | |
| 비해당 | 20,355 | 50.9 | ||
| 필요 요인 | 당뇨병 | 해당 | 6,962 | 16.8 |
| 비해당 | 34,498 | 83.2 | ||
| 고혈압 | 해당 | 16,502 | 39.8 | |
| 비해당 | 24,954 | 60.2 | ||
| 흡연 | 해당 | 9,073 | 21.88 | |
| 비해당 | 32,389 | 78.12 | ||
| 연간 음주 빈도 |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음 | 8,997 | 21.7 | |
| 한 달에 1번 미만 | 5,156 | 12.4 | ||
| 한 달에 1번 정도 | 3,464 | 8.4 | ||
| 한 달에 2~4번 정도 | 6,501 | 15.7 | ||
| 일주일에 2~3번 정도 | 4,487 | 10.8 | ||
| 일주일에 4번 이상 | 2,235 | 5.4 | ||
| 평생 술을 마신 적이 없음 | 10,622 | 25.6 | ||
2.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 영향 요인
가. 의료수요의 발생
의료수요에 대한 선택 방정식의 결과는 <표 2>의 좌측 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본선택 프로빗 회귀 분석 결과, 소인 요인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여부가, 가능 요인에서는 가구 소득과 지난 1년간 소득의 증가, 1,000명당 의료인 수, 지역 내 1인 가구비와 농어촌 여부의 상호작용항이, 필요 요인에서는 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삶의 질, 우울, 스트레스,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표 2
의료수요 및 미충족 의료 영향 요인
| 선택 방정식 (의료수요 발생) | 모형 방정식 (미충족 의료수요 발생) | |||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
| 소인 요인 | ||||
| 연령 < 40 | (기준 집단) | |||
| 40 ≤ 연령 < 60 | 0.231*** | (0.034) | -0.187*** | (0.032) |
| 60 ≤ 연령 < 80 | 0.529*** | (0.043) | -0.473*** | (0.038) |
| 80 ≤ 연령 | 0.443*** | (0.065) | -0.528*** | (0.050) |
| 여성 | 0.212*** | (0.028) | -0.113*** | (0.025) |
| 교육수준 | 0.029* | (0.012) | -0.024* | (0.010) |
| 직업: 전문행정관리 | 0.009 | (0.047) | 0.115* | (0.045) |
| 직업: 사무직 | 0.062 | (0.053) | 0.038 | (0.050) |
| 직업: 판매서비스직 | 0.034 | (0.047) | 0.098* | (0.042) |
| 직업: 농림어업 | 0.100 | (0.061) | 0.074 | (0.051) |
| 직업: 기능단순노무직/기타 | 0.029 | (0.039) | 0.073* | (0.033) |
| 직업: 무직 | (기준 집단) | |||
| 기혼 | 0.154* | (0.067) | -0.231*** | (0.062) |
| 가능 요인 | ||||
| 로그 연평균 가구소득 | 0.058*** | (0.013) | -0.080*** | (0.011) |
| 지난 1년간 소득 증가: 감소 | -0.044 | (0.031) | 0.143*** | (0.028) |
| 지난 1년간 소득 증가: 불변 | (기준 집단) | |||
| 지난 1년간 소득 증가: 증가 | -0.147*** | (0.036) | 0.172*** | (0.033) |
| 기초생활 수급자 | 0.024 | (0.052) | 0.141*** | (0.036) |
| 1차 병원 수 | 0.093 | (0.058) | -0.122* | (0.053) |
| 1,000명당 의료인 수 | 0.025* | (0.013) | -0.026* | (0.012) |
| 지역 내 1인 가구 비율 (A) | 0.635** | (0.206) | -0.582** | (0.190) |
| 농어촌 거주 (B) | 0.640* | (0.267) | -0.712** | (0.250) |
| A ˟ B | -1.744** | (0.568) | 1.743*** | (0.521) |
| 필요 요인 | ||||
| 당뇨 진단받음 | 0.100* | (0.040) | ||
| 고혈압 진단받음 | 0.132*** | (0.030) | ||
| 삶의 질 지수(EQ-5D) | -1.945*** | (0.170) | ||
| 우울증 지수(PHQ-9) | 0.020*** | (0.004) | ||
| 스트레스 수준 | 0.084*** | (0.016) | ||
| 주관적인 건강 수준 | -0.118*** | (0.016) | ||
| 흡연자 | -0.005 | (0.022) | ||
| 연간 음주 빈도 | -0.001 | (0.004) | ||
| 상수 | 1.933*** | (0.236) | 0.158 | (0.130) |
| 정보통계량 | ||||
| 사례수 | 40992 | |||
| 로그 유사우도 | -3089414 | |||
| 아카이케 정보기준 | 6178929.41 | |||
| atanh(ρ) | -2.286*** | (0.152) | ||
| 왈드 검정(H0 : ρ=0) | 226.79*** | (<0.001) | ||
기준 집단으로 설정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의료수요 경험 확률이 가장 낮았으며, 60세 이상 80세 미만의 연령대의 의료수요 경험 확률이 가장 높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수요를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기혼인 경우, 미혼보다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았다.
작년과 소득이 동일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소득이 증가한 경우 의료수요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수준에서 1,000명당 의료인 수가 많을 때 의료수요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농어촌 여부와 1인 가구비의 상호작용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2]와 같다.
농어촌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나, 지역사회의 1인 가구비가 증가할수록 그 확률이 감소하는 반면, 도시의 경우 반대로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이 낮으나 지역사회의 1인 가구비가 증가할 때 그 확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1인 가구비가 40% 이상인 영역에서는 델타 방법(delta method)으로 추정된 95% 신뢰구간이 서로 중첩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비가 40% 이내의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과 도시에서 의료수요 발생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표본에 따르면 1인 가구비가 40% 이하인 경우까지 의료수요의 경험과 관련하여 도농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뇨와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람이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삶의 질 지수와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반면, 우울증 지수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은 높아졌다.
나. 미충족 의료수요의 발생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한 모형 방정식의 결과는 <표 2>의 우측 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본선택 프로빗 회귀 분석 결과,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직업 중 전문행정관리, 판매서비스직, 기능단순노무직/기타, 기혼, 가구 소득과 지난 1년 간 가구 소득의 증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1차 병원 수와 천 명당 의료인 수, 역 내 1인 가구비와 농어촌 여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다.
(기준 집단으로 설정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연령대의 경우 미충족 의료수요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은 감소하였다. 여성과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은 미충족 의료수요를 덜 경험하였다. 무직과 비교하였을 때, 전문행정관리, 판매서비스직, 기능단순노무직/기타에 종사하는 경우 미충족 의료수요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는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지난 1년간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모두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일 때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았으며, 지역 내 의원이 많고 천 명당 의료인이 많을수록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은 낮아졌다. 거주 지역의 농어촌 여부와 1인 가구비의 상호작용이 미충족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3]과 같다. 농어촌에서는 1인 가구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낮았던 미충족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도시에서는 1인 가구비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높았던 미충족 의료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고찰
1. 연구의 요약
미충족 의료수요에 관한 연구는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취약성이 우려되고 있는 오늘날 1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 기존 연구는 의료수요 발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 편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의 의료 공급량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않고 있었으며, 지역의 자원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의 의료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2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수요의 영향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지역 수준의 변수를 투입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수요의 경우, 소인 요인 중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여부, 가능 요인 중 로그 연평균 가구 소득과 1년 전 대비 소득의 감소, 거주 지역의 천 명당 의료인 수, 지역 내 1인 가구비와 농어촌 거주의 상호작용항, 필요 요인 중 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삶의 질, 우울증, 스트레스,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충족 의료수요의 경우, 소인 요인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혼인 여부, 가능 요인 중 로그 연평균 가구 소득과 지난 1년간의 소득 변화,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지역 내 1차 병원 수와 천 명당 의료인 수, 지역 내 1인 가구비와 농어촌 거주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우선 본 연구를 통해 (소인 요인으로 투입된) 개인의 인구학적 변수들이 의료수요의 발생과 뒤이은 수요 충족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인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어온 것과 반대된다(이미숙, 2005; 강은정, 2008; 고수정, 2010; 김동배 외, 2012; 윤병준, 2016).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교육이 건강 행태를 결정하는 인지적 요소로 작용하여 건강 지식,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한 넓은 범위의 능력을 향상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박은옥, 송효정, 2003; Raghupathi & Raghupathi, 2020; 김민, 박선주, 2023). 다시 말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유한 건강 정보,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건강 문제를 더 잘 포착할 수 있고,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즉, 교육이 건강 문제의 발견과 의료이용의 촉진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령대별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수요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 2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층과 비교하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의료수요는 비교적 많이 경험하나 미충족 의료수요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노화, 질병 등으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하나, 경제적인 안정, 은퇴 등으로 인해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이용이 수월해진 것일 수 있다. 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하는 것과 더불어 노인들이 환자 역할을 쉽게 인정하고 병원에 방문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Quintal et al., 2019) 높은 연령층에서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대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의료수요는 적게 경험하였으나, 미충족 의료수요는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진 1인 가구 내에서도 특히 청년층이 미충족 의료수요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은 청년 1인 가구가 직업, 거주, 경제적인 측면의 불안정성과 부족한 가족의 지원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저소득, 농어촌 거주, 장애, 노령기 등의 특성은 지금까지 의료이용에 취약한 계층의 특성으로서 주목받아 왔으나, 지금까지 청년 1인 가구는 의료이용의 취약 계층으로서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추후 청년 1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수요의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요인으로 투입된) 경제적 요소와 관련하여 먼저 1년 전과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였을 때 모두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영준 외(202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1년 전과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원인, 증가한 경우는 근로 시간의 증가로 인한 시간 문제 등 각각 다른 원인에 의해 미충족 의료의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의 1인 가구비가 개인의 의료수요 발생과 미충족 의료수요에 도농 간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의료수요를 경험할 가능성은 커지고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반면,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의료 수요를 경험할 가능성은 적지만 의료수요가 발생했을 시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가능성은 증가하여 도농 간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건강 취약 집단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에서 오히려 의료수요가 적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기인한 적은 건강 정보로 인해 건강 문제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더불어, 1인 가구의 증가와 지역사회의 파편화가 건강 행동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고(Fagg et al., 2008), 주변인과의 교류를 통해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1인 가구비가 약 40% 이내인 경우, 도농 간 격차가 유의했기에 1인 가구비가 과반에 근접한 농어촌에 더 특별한 보건의료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의 위와 같은 특성은 의료수요의 인지와 동시에 미충족 의료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은, 함명일(2021)은 농어촌의 미충족 의료와 관련하여 물리적 접근성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위험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의 1.22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의 3.95배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해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에 거주할 때 (30~40% 구간을 제외하고) 미충족 의료수요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 내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주민들의 전반적인 경제적 취약성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의존도가 높을 수 있으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이라면 주변인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도와줄 수 없거나, 혹은 여력이 있음에도 서로 돕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에서 병원으로의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의 부재는 개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지역사회의 파편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도농 간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도시와 달리 농어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화 수준과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등으로 인해) 가족 외의 의료 정보 등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지역사회 파편화는 의료 정보로의 접근성과 건강 행동을 조력 받을 기회 차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서 설령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져 지역사회 파편화가 진행되더라도 미충족 수요가 커지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면, 특히 농어촌에서 미충족 의료수요 문제와 지역사회 파편화 문제는 동시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의료 공급량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천 명당 1차 병원 수와 의료인 수를 의료 공급량으로 활용하였는데, 두 변수 모두 미충족 의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지역의 파편화 정도를 차치하고도 지역 내에 공급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이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 결론
이 연구는 1인 가구의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수요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지역적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상태 등의 개인적인 요소는 물론, 시•군•구 내의 의료 공급량으로 측정된 물리적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미치는 영향과 1인 가구비로 측정된 지역사회의 파편화 강도의 도농 간 다른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의 특성 또한 1인 가구의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1인 가구는 의료수요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의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지역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같은 1인 가구임에도 거주하는 지역 내 1,000명당 의료인 수 등의 특성에 따라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의 파편화가 금전적인 지원을 주거나 병원으로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주변인을 감소시키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약화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청년 1인 가구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미충족 의료의 발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생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미래에 더 큰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1인 가구비가 40% 이상인 경우 특히 미충족 의료수요의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에 파편화된 농어촌을 위해 특화된 정책이 고안되어야 한다. 1인 가구의 증대로 의료 공급과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연결이 해체되고, 이것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저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의료 시설로의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건강 지식 확산의 장이자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 생성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시한 정책적인 대안을 실현하기에는 민간중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장시간 노동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차이와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이 그동안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치중하여 ‘시간 부족’이나, ‘돌봄 부족’ 등 비재정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우진, 2023). 더 넓고 보편적인 건강보장을 위해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는 비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보건의료정책 뿐 아니라 노동 정책, 교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수요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지 못한 이유에 따라 그 결정요인을 세세히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상이한 생애 과정을 겪고 있는 1인 가구인 만큼 제때 병원에 방문하지 못한 이유 또한 다양하고, 그 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매우 상이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건강 형평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후 연구에서 좀 더 세세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2022).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2143
. (2023).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8414
, , & (2009). Unmet healthcare need, gender, and health inequalities in Canada. Health Policy, 91(1), 24-32. [PubMed]
, , , , , & (2008). Area social fragmentation, social support for individuals and psychosocial health in young adults: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in Eng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66(2), 242-254. [PubMed]
, , , & (2002). Access to health care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HSR: Health Services Research, 37(1), 87-104. [PMC]
(2011). Do young adults have unmet healthcare need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9(5), 490-497. [PubMed]
, , , & (2019). No unmet needs without needs! Assess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using data from European social survey 2014. Health Policy, 123(8), 747-755.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10-02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2-11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2-17

- 1398Download
- 1404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