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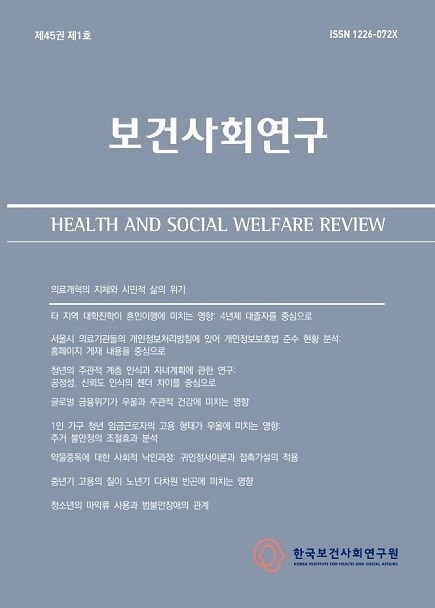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중독 행동의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Addictive Behaviors
Kim, Yong Seok1*; Ahn, Joseph1; Oh, Eun Jung1; Cho, Hanna1; Jo, Woo Gwan1; Park, Hyun Jung1; Kim, Eun Seo1; Ko, Hyun Bin1; Kim, Seong Goo1
보건사회연구, Vol.45, No.1, pp.332-356, March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1.332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본 연구는 물질 중독(예: 알코올, 마약)과 행위 중독(예: 도박, 인터넷)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복합 중독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기존의 단일 중독 중심 연구로는 복잡한 중독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중독 행동 간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유형 분류를 시도했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중독 행동은 크게 ‘돌봄형 중독’과 ‘쾌락형 중독’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돌봄형 중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거나 사회적 활동에 몰두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쾌락형 중독’은 즉각적인 쾌락 추구를 목적으로 외부 자극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이러한 유형 분류는 중독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하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봄형 중독은 애착 유형이나 대인 관계 문제와 같은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쾌락형 중독은 충동성이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Abstract
The increasing severity of addiction in Korean society, coupled with the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substance and behavioral addictions, presents a complex challenge. This is the first in-depth analysis of addictive behavior types using the Shorter PROMIS Questionnaire (SPQ) in a sample of Korean college students (N=392). The SPQ, a self-report instrument designed to assess multiple addictive behaviors simultaneously, measures 16 addictive behaviors, including substance use, gambling, sexual activity, eating, exercise, shopping, work, and relationships. In this study, the 16 addictive behaviors were categorized into two primary types: Nurturant and Hedonistic addictions. Nurturant addictions encompass behaviors aimed at seeking psychological security or satisfaction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including submissive and dominant compulsive caregiving, submissive and dominant relationship behaviors, shopping, work, binge eating, anorexia, and caffeine consumption. Hedonistic addictions, on the other hand, are characterized by the pursuit of immediate pleasure or satisfaction, including substance use, gambling, sexual behavior, smoking, prescription drug use, and alcohol consumption. Exercise was not clearly categorized into either type. These findings align with previous research, particularly Stephenson et al. (1995). The study also revealed consistent results between the female subsample and the overall sample.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reven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that address the underlying motivations and psychological mechanisms associated with each addiction type.
초록
한국 사회는 물질 및 행위 중독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복합 중독 양상이 심화되는 중독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단일 중독 중심적인 연구 접근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중독 행동 간의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 표본(N=392)을 대상으로 단축형 PROMIS 설문지(Shorter PROMIS Questionnaire, SPQ)를 사용하여 중독 행동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다. SPQ는 다양한 중독 행동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가 보고 도구로 물질 사용, 도박, 성행위, 섭식, 운동, 쇼핑, 일, 관계 등 16가지 중독 행동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16개 중독 행동은 돌봄형 중독과 쾌락형 중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형 중독에는 복종형 및 지배형 강박적 돌봄, 복종형 및 지배형 관계 형성, 쇼핑, 일, 폭식, 거식, 카페인 섭취가 포함되었으며(총 9개), 쾌락형 중독에는 약물 사용, 도박, 성행동, 흡연, 처방 약 사용, 음주가 포함되었다(총 6개). 운동은 두 유형 중 어느 곳에도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였다.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중독 행동의 유형을 분석하였을 때 분석 결과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중독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게임 중독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법질서 등을 위협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중독 지표 모음집』(국립정신건강센터, 2024)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 1년 유병률은 2.6%로 우리 국민 중 11.6%(약 596만 명)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마약류 투약 사범은 밀수, 밀매, 소지 등을 포함한 전체 마약류 사범(18,395명)의 46.15%를 차지하였고, 이 중 향정신성 약물 투약 사범은 6,208명으로 전년(5,726명) 대비 8.42%p 증가하였다.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의 도박 유병률은 5.5%(중위험 3.4%+문제성 2.1%)로 집계되었고,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69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연령의 5.9%가 게임중독 고위험군으로 관찰되었다.
전통적으로 중독 연구에서는 중독을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구분해 왔다. 물질 중독은 알코올, 니코틴, 약물 등 외부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포함하며, 내성 및 금단과 같은 생리적, 심리적 영향을 특징으로 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2013). 행위 중독은 도박, 인터넷 사용, 쇼핑 등 특정 행위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나타내며, 외부 물질을 섭취하지 않고도 유사한 중독 패턴을 유발한다(Grant et al., 2010; Kardefelt‐ Winther et al., 2017, p. 1711). 그러나 중독 행동을 단순히 중독 대상(물질 vs. 행위)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개인의 중독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독의 그물망(web of addiction)이라는 개념은 중독 행동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서 여러 중독 행동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Gossop, 2001). 즉, 다양한 중독 행동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중독 문제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중독 행동 간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험적 연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도박 문제가 있는 개인은 도박 문제가 없는 개인에 비해 알코올 또는 대마초에 중독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장수미, 2016; Larsen et al., 2013). 또한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의 공존(Barrett et al., 2006)은 물론, 알코올 중독과 섭식 장애(Azevedo et al., 2021; Mustelin et al., 2016), 도박 중독과 섭식 장애의 공존(Kim et al., 2018; Tang et al., 2020)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공존 패턴은 단순한 우연적 현상이 아니라 중독 행동 간 겹치는 신경전달물질(예를 들어, 코르티솔) 또는 심리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Escrivá-Martínez et al, 2020).
이상과 같이 여러 중독 행동이 공존하는 패턴을 분석하고, 공존 가능성이 높은 중독 행동들의 공통된 특징을 밝혀내는 연구는 학술적·실천적 가치가 크다. 이러한 연구는 중독 행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Haylett et al., 2004). 예를 들어, 중독 행동의 공존 패턴을 파악하면 특정 중독 문제를 가진 개인에게 다른 중독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예측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중독 문제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공존하는 중독 행동들의 공통된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다양한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치료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중독 행동의 공존(co-occurrence) 또는 공변성(covariation) 정도에 따라 중독 행동을 분류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Haylett et al., 2004; Konkolÿ et al., 2016).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 Stephenson 외(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독 행동을 쾌락형(hedonism)과 돌봄형(nurturance)이라는 두 가지 포괄적인 범주로 구분하였다. 쾌락형 중독 행동은 알코올 및 약물 사용, 도박과 같이 즉각적인 쾌락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한 행동을 포함한다. 반면, 돌봄형 중독은 강박적 돌봄, 일, 쇼핑과 같이 타인에 대한 돌봄, 통제 욕구, 또는 이를 통한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는 단순히 중독 행동의 표면적 특성을 넘어, 행동의 내재적 동기와 심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의미가 크다. Stephenson 외 연구 이후 중독 행동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들(예; Haylett et al., 2004; MacLaren & Best, 2010)이 이어졌으며 이들 연구는 다양한 중독 행동을 분류하기 위해 PROMIS Questionnaire 또는 그 단축형(Shorter PROMIS Questionnaire, SPQ)을 사용하였다. SPQ는 다양한 중독 행동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가 보고 도구로(Lefever, 1988) 물질 사용(알코올, 니코틴, 약물 등), 도박, 성행위, 섭식, 운동, 쇼핑, 일,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16가지 중독 행동을 측정한다.
중독 행동 유형에 대한 신뢰성 있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는 설문 조사 연구가 가장 적합하다. 면접 조사나 여러 중독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MacLaren & Best, 2010). 이러한 측면에서 중독 행동 유형 연구를 위해 SPQ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SPQ는 하나의 도구로 다양한 중독 행동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SPQ는 알코올, 니코틴, 약물, 도박, 섭식, 쇼핑 등 여러 중독 행동을 통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다차원적인 중독 행동 유형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특성은 대규모 표본 연구나 다양한 중독 행동 간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는 연구에서 특히 유용하다. SPQ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임상 및 비임상 집단 모두에서 중독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Christo et al., 2003; Haylett et al., 2004; MacLaren & Best, 2010), 쾌락형 및 돌봄형 중독과 같은 다차원적 중독 행동 유형을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SPQ가 중독 행동의 복잡한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데 있어 신뢰할 만한 도구임을 입증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중독 유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외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들 연구는 중독 행동을 유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SPQ를 사용하여 중독 행동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는 Stephenson 외(1995)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중독 치료센터에 입원한 47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인 분석을 통해 16개의 중독 행동을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유형에는 폭식, 거식, 카페인 섭취, 쇼핑, 일중독, 운동, 복종형 및 지배형 강박적 돌봄, 복종형 및 지배형 관계 형성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유형에는 성행동, 약물 사용, 처방약 사용, 도박, 흡연, 음주가 포함되었다. 연구자들은 첫 번째 유형을 돌봄형 중독(nurturant addiction)으로 두 번째 유형을 쾌락형 중독(hedonistic addiction)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돌봄형 중독은 개인의 안녕과 욕구 충족을 위해 과도하게 몰두하는 행동으로,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활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통제 욕구와 자기 조절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Button et al., 1997, p. 40). 쾌락형 중독은 즉각적인 쾌락을 통한 흥분과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Haylett 외(2004)는 SPQ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두 가지 중독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네 가지 주요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돌봄형 중독은 자기 돌봄형 중독(self-regarding nurturance addiction)과 타인 돌봄형 중독(other-regarding nurturance addiction)으로 나뉘었다. 자기 돌봄형 중독은 식습관, 쇼핑, 카페인 섭취, 운동과 같이 신체 이미지와 소비 통제와 관련된 행동을 포함하며, 주로 여성에게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Chrisler, 1991). 타인 돌봄형 중독은 친사회적 특성을 지니며, 강박적 돌봄과 일을 포함한다. 쾌락형 중독은 감각 추구형 쾌락형 중독(sensation-seeking hedonism addiction)과 지배 관련 쾌락형 중독(dominance-related hedonism addiction)으로 세분화되었다. 감각 추구형 중독은 약물 사용, 처방약 사용, 흡연, 음주와 같은 화학적 물질을 통해 기분을 변화시키고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지배 관련 쾌락형 중독은 도박, 성행동, 지배적 관계 형성과 같은 타인에 대한 착취적 행동과 심리적 지배성을 포함한다.
MacLaren과 Best(2010)는 앞의 연구들과는 달리 대학생 948명을 대상으로 SPQ를 사용하여 중독 행동의 유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유형에는 강박적 돌봄, 일, 관계, 쇼핑, 섭식 행동, 운동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유형에는 처방약, 도박, 카페인이 포함되었으며, 세 번째 유형에는 약물 사용, 음주, 흡연, 성행동이 포함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중독 행동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요인은 Haylett 외(2004)의 연구에서 분류된 돌봄형 중독과 유사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은 쾌락형 중독의 하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SPQ를 활용한 중독 행동 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마다 일관성을 보이면서도, 특정 하위 요인의 구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앞서 소개한 세 편의 연구(Stephenson et al., 1995; Haylett et al., 2004; MacLaren & Best, 2010)는 모두 SPQ를 통해 중독 행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며, 쾌락형 중독과 돌봄형 중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밝혀진 하위 유형의 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다. Stephenson 외(1995)는 돌봄형 중독과 쾌락형 중독으로만 구분했지만, Haylett 외(2004)는 돌봄형 중독을 자기 돌봄형 중독과 타인 돌봄형 중독으로, 쾌락형 중독을 감각 추구형 쾌락형 중독과 지배 관련 쾌락형 중독으로 세분화했다. MacLaren과 Best(2010)는 Haylett 외(2004)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지만, 카페인이 쾌락형 중독에 포함되었고, 지배적 관계와 복종적 관계가 돌봄형 중독에 포함되는 등 하위 유형의 구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표본의 특성, 즉 임상 집단과 비임상 집단의 차이, 또는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SPQ는 중독 행동의 유형을 밝히는 연구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과 연령층에서 중독 행동을 평가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Tang 외(2020)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도박 장애 치료 센터에 내원하는 성인 458명을 대상으로 SPQ를 사용하여 도박 장애와 공존하는 행위 중독(일 중독, 운동 중독, 폭식, 성행동, 쇼핑 중독)의 유병률 및 관련 특징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도박 장애 환자의 45%가 하나 이상의 행동 중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흔한 공존 행동 중독은 폭식(8.1%) 이었고, 운동 중독(3.6%) 이 가장 낮은 유병률을 보였다. 또한, Cowie 외(2019)는 SPQ를 통해 강박적 성행동과 도박 장애의 공존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및 임상적 특징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도박 장애 환자 368명 중 6.5% 가 강박적 성행동을 보였으며, 이들은 더 젊은 연령, 남성, 높은 운동 충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Pallanti 외(2006)는 이탈리아 고등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SPQ를 사용하여 다양한 중독 행동의 유병률과 관련된 장애를 평가했다. 그 결과, 카페인, 성행동, 도박, 거식, 폭식 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인터넷 중독과 같은 다른 중독 문제도 함께 나타났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SPQ를 활용하여 다양한 집단과 연령층에서 중독 행동을 평가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SPQ가 다양한 행동 중독의 공존을 밝히고, 그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중독 유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SPQ를 활용한 중독 행동 유형 연구는 주로 서구 문화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국내 상황에 적용 가능한 중독 행동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진은 대학 관련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에 Google Form 설문지 링크를 게시하여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몇몇 대학교의 학생 상담소에 연구 참여 협조를 요청하여 더욱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였으며, 중복 응답을 제외한 총 392개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연구 시작 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및 승인을 받았다(1040395-202411-01).
2. 측정 도구
가. SPQ 척도와 번역 과정
SPQ 초판은 Lefever(198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6가지 중독 행동을 측정하는 16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개정판의 각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판은 Shorter PROMIS Questionnaire로 명명되었다. SPQ에 포함된 중독 행동은 아래와 같다(Haylett et al,, 2004).
-
물질 관련 중독 행동: 음주, 약물 사용, 처방 약 사용, 흡연, 카페인 섭취
-
과정 관련 중독 행동: 복종형 관계 형성, 지배형 관계 형성, 복종형 강박적 돌봄, 지배형 강박적 돌봄
-
음식 관련 중독 행동: 섭식, 거식
-
행위 관련 중독 행동: 쇼핑, 도박, 성행동, 일, 운동
SPQ의 160개 문항은 중독 행동의 7가지 공통 특성, 즉 집착, 단독 사용, 효과를 위한 사용, 약물로서의 사용, 공급 확보, 계획된 것보다 과도한 사용, 내성 증가를 반영한다(Lefever, 1988). SPQ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 ‘그렇지 않다’에 1점, ‘약간 그렇지 않다’에 2점, ‘약간 그렇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클수록 해당 중독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4가지 종류의 중독 행동 중에서 과정 관련 중독 행동(process related addiction)은 다른 중독 행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진 행동이다. 과정 관련 중독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relationships)과 강박적 돌봄(compulsive helping)을 포함하며 각각은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한 상태와 타인을 강박적으로 돕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과정 관련 중독 행동은 복종형(submissive)과 지배형(dominant)으로 구분된다. 복종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태도(예;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 안정감을 느낀다’(복종형 관계 형성 문항),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만 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복종형 강박적 돌봄 문항))를 측정하며 지배형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유형(예; ‘모든 인간관계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지배형 관계 형성 문항),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계속 조언하는 편이다’(지배형 강박적 돌봄 문항))을 측정한다.
SPQ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가 없어 척도 번역 과정을 거쳤다. 척도 문항 번역에 앞서 한국어판 SPQ 척도 개발을 위해 원척도 개발자(R. Lefever)로부터 한국어판 개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2021. 3. 23.). SPQ 척도 번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번역 프로토콜의 과정을 준수하여 번역의 완성도를 높였다(Menon & Praharaj, 2019). 번역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정방향 번역’, 2단계 ‘전문가 패널’, 3단계 번역된 문항을 원래의 언어로 구사하는 ‘역번역’, 마지막으로 4단계 예비조사를 통한 사전 테스트 과정이다. 척도 번역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진은 원척도의 번역에 참여하여 각 문항의 단어와 문장이 적합한지 검토 및 재검토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예비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둘째, 연구진은 번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번역의 검토를 의뢰하였다. 번역 검토를 담당한 전문가는 한국계 캐나다 국적 소유자로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며 국내 대학에서 수년간 교양 영어를 담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 전문가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 영어문항검토 위원을 맡고 있으며 영문 교정 컨설팅 업체를 운영 중에 있어 SPQ 척도의 영어 문항과 한국어 문항을 비교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 번역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논의가 필요한 문항들은 수정 및 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척도 문항에서 중독의 범주가 다르지만 반복되어 나타나는 ‘comfort and a strengh’와 ‘a real person’과 같은 표현이 범주의 연결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원문의 의미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한국어로 번역한 문항들의 역번역을 진행하였다. 역번역을 담당한 전문가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교육 박사를 수료하였다. 연구진은 역번역된 문항들과 원척도의 문항들을 비교하여 연구진의 번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였고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번역된 문항들에서 어색한 표현, 띄어쓰기, 오탈자 등의 국문법적 오류의 수정과 표현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국어국문학전공 교수의 검토를 받았고 이 과정을 통해 문항 번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각 문항을 읽고 응답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나. 중독 문제 치료 및 상담 경험
중독 문제로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3개 문항은 중독 문제로 인해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 동일 문제로 외래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 동일 문제로 인해 치료 관련 처방 약을 복용한 경험 유무를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미국의 약물 사용 및 건강에 관한 국가 조사(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에서 정신과 치료 지표(psychiatric treatment indicator)로 사용되는 문항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정신과 치료 지표로 정신 건강 문제 때문에 입원, 외래 치료나 상담받은 경험, 약을 복용한 경험을 사용하였다(Swartz, 2008). 3개 문항 중 1개 이상의 문항에 ‘있음’으로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중독 문제 치료 및 상담 경험이 있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가.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한국어판 SPQ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첫째,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3가지 방식(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 분석, Cronbach’ alpha 계산)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16개 하위척도 각각에 대해서 문항 간 상관관계(inter-item correlation)를 분석하여 문항들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항 간 상관관계가 .30 이상이면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Hair et al., 2018, p. 161). 다음으로, 각 문항과 해당 척도의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총점 상관관계(item-total correlation)를 분석하였다. 문항-총점 상관관계는 문항이 척도의 전체적인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문항이 척도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Hair et al., 2018, p.161).
SPQ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 중독 문제 치료 및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런 경험이 없는 집단 간 16개 중독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독 분야 연구에서 척도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 중독 문제로 도움을 제공받았는지의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다(Boudreau & Poulin, 2007). 앞서 설명하였듯이 중독 문제 치료 및 상담 경험은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3개 문항 중 1개 문항 이상에 대해서 ‘있다’로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3개 문항 모두에 대해서 ‘없다’로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SPQ가 측정하는 16개 중독 행동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SPQ의 타당도가 확보되는 것이다.
나. 중독 행동의 유형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SPQ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예; MacLaren & Best, 2010; Stephenson et al., 1995)은 중독 행동의 유형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도 동일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목적은 서로 관계가 강한 항목을 묶어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시키는 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SPQ가 측정하는 16개의 중독 행동이 어떻게 묶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중독 행동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개별 문항이 분석 대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SPQ의 16개 척도의 총점이 분석 대상이었다. 즉 한국어판 SPQ의 16개 척도 점수가 탐색적 요인분석의 대상이었고 이는 원척도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데이터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왜도, 첨도, Bartlett(1954)의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 Kaiser-Meyer-Olkin(KMO, Kaiser, 1974)을 분석하였다(Cain et al., 2017, p. 1717; Hair et al., 2018; Watkins, 2018, p. 226).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프로맥스(promax) 회전을 적용한 사각 회전(oblique rotation)을 실시하였다. Watkins(2018, p. 229)에 따르면, 최대우도법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클 때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정규성 검토 결과 |왜도| < 2, |첨도| < 7 기준을 충족하였다. 둘째, 표본 크기는 392명으로 ML 적용에 충분히 큰 규모이다. 또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요인 간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각 회전을 적용하였다(Watkins, 2018, p. 233). 최적의 요인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 분석 결과(parallel analysis),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s), 스크리 검사 결과(scree test), 선행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Preacher et al., 2013; Watkins, 2018, Hair et al., 2018). 평행 분석에서는 실제 데이터의 고윳값(eigenvalues)이 무작위 데이터의 고윳값보다 큰 경우 해당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Watkins, 2018). 즉, 무작위 데이터에서 추출한 고윳값을 초과하는 실제 데이터의 고윳값에 해당하는 요인 수를 적정 요인 수로 선택한다. 요인적재값은 .5 이상을 기준으로 해석했으며, 스크리 검사 결과를 통해 고윳값 그래프에서 변곡점을 확인하여 요인의 수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였다(Hair et al., 2018, p. 142, 151). 앞장에서 서술하였듯이 SPQ는 선행 연구에서 2요인(2개 유형)(Stephenson et al., 1995), 3요인(3개 유형)(MacLaren & Best, 2010), 4요인(4개 유형)(Haylett et al., 2004) 등 다양한 요인 구조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 과정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실행한 후 성별로 각각 실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8.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총 392명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8.7%,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1.3%로 여학생이 더 많이 참여하였다. 학년별로는 2학년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에 속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다양한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70.6%로 가장 높았고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 강원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율 순서였다.
표 1
연구별 중독 행동 유형 결과 분류
| 중독 행동 | Stephenson 외 (1995) | Haylett 외(2004) | MacLaren 외(2010) | ||||||
|---|---|---|---|---|---|---|---|---|---|
| 요인Ⅰ | 요인Ⅱ | 요인Ⅰ | 요인Ⅱ | 요인Ⅲ | 요인Ⅳ | 요인Ⅰ | 요인Ⅱ | 요인Ⅲ | |
| 돌봄 | 쾌락 | 자기돌봄 | 타인돌봄 | 감각쾌락 | 지배쾌락 | 돌봄 | 쾌락1 | 쾌락2 | |
| 음주 | ○ | ○ | ○ | ||||||
| 쇼핑 | ○ | ○ | ○ | ||||||
| 쇼핑 | ○ | ○ | ○ | ||||||
| 복종형 강박적 돌봄 | ○ | ○ | ○ | ||||||
| 흡연 | ○ | ○ | ○ | ||||||
| 도박 | ○ | ○ | ○ | ||||||
| 거식 | ○ | ○ | ○ | ||||||
| 지배형 강박적 돌봄 | ○ | ○ | ○ | ||||||
| 약물 사용 | ○ | ○ | ○ | ||||||
| 성행동 | ○ | ○ | ○ | ||||||
| 일 | ○ | ○ | ○ | ||||||
| 지배형 관계 형성 | ○ | ○ | ○ | ||||||
| 카페인 섭취 | ○ | ○ | ○ | ||||||
| 처방약 사용 | ○ | ○ | ○ | ||||||
| 운동 | ○ | ○ | ○ | ||||||
| 복종형 관계 형성 | ○ | ○ | ○ | ||||||
2. 조사대상자의 중독 행동 수준
<표 2>는 SPQ로 측정한 16가지 중독 행동의 수준이다. 16개 하위척도의 평균은 최소 17.64점에서 최대 25.55점이었다. SPQ의 각 하위척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50점의 점수를 갖는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25.55점은 가능한 최대 점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므로 SPQ가 측정하는 16개 중독 행동의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척도는 성중독을 측정하는 척도였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하위척도는 쇼핑 중독을 측정하는 척도였다.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복종형 강박적 돌봄을 측정하는 척도의 점수(25.82점)가 가장 높았고 도박중독과 성중독을 측정하는 척도의 점수(21.02점)가 가장 낮았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쇼핑중독을 측정하는 척도의 점수(25.70점)가 가장 높았고 성중독을 측정하는 척도의 점수(15.26점)가 가장 낮았다. 16개 평균 점수 중에서 15개의 점수가 남학생 집단에서 높았고 유일하게 쇼핑중독의 평균 점수만이 여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N | % | |
|---|---|---|---|
| 성별 | 남학생 | 162 | 41.3 |
| 여학생 | 230 | 58.7 | |
| 학년 | 1학년 | 26 | 6.6 |
| 2학년 | 192 | 49.0 | |
| 3학년 | 108 | 27.6 | |
| 4학년 | 66 | 16.8 | |
| 계열 | 인문 | 174 | 44.4 |
| 사회 | 89 | 22.7 | |
| 공학 | 74 | 18.9 | |
| 자연 | 33 | 8.4 | |
| 예체능 | 17 | 4.3 | |
| 의약학 | 5 | 1.3 | |
| 지역 | 수도권 | 277 | 70.6 |
| 강원권 | 23 | 5.9 | |
| 경상권 | 24 | 6.1 | |
| 전라권 | 39 | 9.9 | |
| 충청권 | 29 | 7.4 | |
<표 2>는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이 연구(MacLaren & Best, 2010)는 캐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와 MacLaren과 Best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16개 평균 점수가 모두 본 연구에서 높았다. 평균 점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평균의 차이가 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중독 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acLaren과 Best의 연구는 2010년에 발표되어 약 15년 전의 중독 행동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중독 행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의 분위기,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표의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3
중독 행동의 수준 및 선행 연구와의 비교
| 중독 행동 | 본 연구 | MacLaren 외(2010) | |||||||
|---|---|---|---|---|---|---|---|---|---|
| 전체(N=392) | 남학생(N=162) | 여학생(N=230) | 전체(N=948)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물질 관련 중독 | 음주 | 22.32 | 13.88 | 24.09 | 14.11 | 21.07 | 13.61 | 15.27 | 12.46 |
| 약물 사용 | 18.43 | 15.37 | 21.57 | 15.50 | 16.21 | 14.92 | 4.86 | 9.4 | |
| 처방약 사용 | 19.92 | 14.62 | 22.14 | 15.20 | 18.35 | 14.03 | 3.11 | 6.19 | |
| 흡연 | 19.95 | 15.35 | 24.49 | 14.70 | 16.75 | 15.02 | 4.39 | 10.29 | |
| 카페인 섭취 | 22.80 | 14.27 | 23.03 | 14.43 | 22.63 | 14.18 | 4.11 | 6.86 | |
| 과정 관련 중독 | 복종형 관계 형성 | 23.67 | 12.57 | 24.23 | 13.40 | 23.27 | 11.96 | 8.78 | 8.40 |
| 지배형 관계 형성 | 22.86 | 13.04 | 24.02 | 13.45 | 22.04 | 12.71 | 11.17 | 10.06 | |
| 복종형 강박적 돌봄 | 25.07 | 12.36 | 25.82 | 12.72 | 24.53 | 12.10 | 19.53 | 10.45 | |
| 지배형 강박적 돌봄 | 23.93 | 12.32 | 24.69 | 13.12 | 23.40 | 11.72 | 14.52 | 9.83 | |
| 음식 관련 중독 | 폭식 | 23.71 | 12.57 | 24.48 | 13.80 | 23.18 | 11.63 | 13.73 | 10.34 |
| 거식 | 22.75 | 12.60 | 23.49 | 13.78 | 22.23 | 11.69 | 11.28 | 9.52 | |
| 행위 관련 중독 | 쇼핑 | 25.55 | 13.20 | 25.33 | 13.43 | 25.70 | 13.05 | 15.26 | 10.94 |
| 도박 | 18.28 | 15.33 | 21.02 | 15.44 | 16.35 | 14.99 | 2.28 | 4.97 | |
| 성행동 | 17.64 | 14.94 | 21.02 | 15.16 | 15.26 | 14.34 | 4.8 | 7.91 | |
| 일 | 23.67 | 12.45 | 24.09 | 13.62 | 23.37 | 11.57 | 13.92 | 9.72 | |
| 운동 | 23.53 | 12.33 | 25.59 | 13.19 | 22.07 | 11.50 | 15.71 | 10.84 | |
3. 한국어판 SPQ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어판 SPQ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신뢰 계수는 모두 .90 이상이었고, 모든 문항 간 상관계수는 .30 이상,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지면 관계상 표에는 각 척도별 최솟값과 최댓값만 제시하였다. 문항 간 상관계수와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모두 권고 기준을 넘어섰다.
중독 문제 상담 또는 치료 경험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중독 행동 수준을 비교한 결과 16개 모든 중독 행동의 평균이 상담 또는 치료 경험이 있는 집단이 높았고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4>는 일반적으로 예견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한국어판 SPQ의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가 확보되었다.
표 4
신뢰도 평가 결과
| 중독 행동 | α | 문항 간 상관 | 문항-총점 간 상관 | ||
|---|---|---|---|---|---|
| 최솟값 | 최댓값 | 최솟값 | 최댓값 | ||
| 음주 | .95 | .47 | .75 | .71 | .87 |
| 약물 사용 | .97 | .72 | .82 | .85 | .89 |
| 처방 약 사용 | .95 | .52 | .83 | .75 | .88 |
| 흡연 | .97 | .72 | .81 | .85 | .90 |
| 카페인 섭취 | .95 | .52 | .80 | .73 | .87 |
| 복종형 관계 형성 | .92 | .40 | .75 | .70 | .79 |
| 지배형 관계 형성 | .94 | .43 | .77 | .70 | .85 |
| 복종형 강박적 돌봄 | .93 | .40 | .73 | .67 | .82 |
| 지배형 강박적 돌봄 | .92 | .40 | .74 | .67 | .80 |
| 폭식 | .93 | .40 | .70 | .68 | .83 |
| 거식 | .92 | .37 | .71 | .67 | .79 |
| 쇼핑 | .94 | .41 | .74 | .62 | .84 |
| 도박 | .97 | .68 | .83 | .83 | .91 |
| 성행동 | .97 | .66 | .82 | .82 | .90 |
| 일 | .93 | .37 | .71 | .68 | .79 |
| 운동 | .92 | .30 | .75 | .56 | .85 |
표 5
타당도 평가 결과
| 중독 행동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
|---|---|---|---|---|---|
| 음주 | 무 | 240 | 16.15 | 11.67 | -13.32*** |
| 유 | 152 | 32.06 | 11.29 | ||
| 약물 사용 | 무 | 240 | 11.72 | 12.08 | -12.54*** |
| 유 | 152 | 29.01 | 14.03 | ||
| 처방 약 사용 | 무 | 240 | 13.25 | 11.49 | -13.82*** |
| 유 | 152 | 30.44 | 12.76 | ||
| 흡연 | 무 | 240 | 13.86 | 12.81 | -11.13*** |
| 유 | 152 | 29.57 | 14.09 | ||
| 카페인 섭취 | 무 | 240 | 17.62 | 12.95 | -10.14*** |
| 유 | 152 | 30.97 | 12.32 | ||
| 복종형 관계 형성 | 무 | 240 | 17.94 | 10.16 | -13.83*** |
| 유 | 152 | 32.72 | 10.54 | ||
| 지배형 관계 형성 | 무 | 240 | 17.20 | 10.67 | -12.69*** |
| 유 | 152 | 31.80 | 11.36 | ||
| 복종형 강박적 돌봄 | 무 | 240 | 19.93 | 10.56 | -12.1*** |
| 유 | 152 | 33.17 | 10.54 | ||
| 지배형 강박적 돌봄 | 무 | 240 | 18.76 | 10.31 | -12.29*** |
| 유 | 152 | 32.10 | 10.73 | ||
| 폭식 | 무 | 240 | 18.82 | 10.60 | -11.08*** |
| 유 | 152 | 31.43 | 11.56 | ||
| 거식 | 무 | 240 | 17.32 | 10.25 | -12.74*** |
| 유 | 152 | 31.32 | 11.12 | ||
| 쇼핑 | 무 | 240 | 20.88 | 12.69 | -10.28*** |
| 유 | 152 | 32.92 | 10.32 | ||
| 도박 | 무 | 240 | 12.16 | 12.49 | -11.1*** |
| 유 | 152 | 27.93 | 14.42 | ||
| 성행동 | 무 | 240 | 11.29 | 11.41 | -11.88*** |
| 유 | 152 | 27.67 | 14.37 | ||
| 일 | 무 | 240 | 18.25 | 10.34 | -12.94*** |
| 유 | 152 | 32.23 | 10.55 | ||
| 운동 | 무 | 240 | 18.45 | 10.20 | -11.74*** |
| 유 | 152 | 31.55 | 11.11 |
4. 중독 행동의 유형 분석 결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상관관계 행렬이 무작위가 아님을 나타냈으며(χ2(120) = 11755.27, p<.001), KMO 통계량은 .96으로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 .70)을 훨씬 상회했다. 따라서 상관관계 행렬이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은 스크리 검사 결과이다. 스크리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적정 요인 수를 찾는 지점은 선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나 그 직전 지점이 된다(이순묵, 2006; Costello & Osborne, 2005). [그림 1]에서 선은 요인 수가 3개일 때부터 안정되기 시작하여 스크리 검사 결과에 기초하면 적정 요인 수는 2개 또는 3개가 된다. 이는 16개 중독 행동은 2개 또는 3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2]는 평행 분석의 결과이다. [그림 2]에서 주황색 선은 실제 데이터의 고윳값을, 초록색 선은 무작위 데이터의 고윳값을 나타내며, 실제 데이터의 고윳값이 무작위 데이터의 고윳값을 초과하는 요인은 2개이다. 따라서 평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정 요인 수는 2개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선행 연구는 SPQ가 2개, 3개, 4개 요인을 갖는 척도로 분석하였다. 스크리 검사 결과, 평행 분석 결과, 선행 연구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2요인, 3요인, 4요인 모형을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요인과 4개 요인은 추출되지 않았고 2개 요인만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tephenson 외(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Stephenson 외의 연구에서도 16개 중독 행동이 2개 요인으로 묶였다. 본 연구와 Stephenson 외(1995) 연구의 유일한 차이점은 지배형 관계 형성과 운동이다. 지배형 관계 형성은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에 적재되었고 Stephenson 외(1995) 연구에서는 쾌락형 중독에 적재되었다. 운동의 경우 본 연구는 요인 2에 적재되었으나 Stephenson 외 연구에서는 돌봄형 중독에 적재되었다. 요인 1에는 복종형, 지배형 강박적 돌봄, 복종형, 지배형 관계 형성, 쇼핑, 일, 폭식, 거식, 카페인 섭취가 적재되었다. 관계 관련 중독 행동 4가지(복종형, 지배형 강박적 돌봄, 복종형, 지배형 관계 형성), 음식 중독 행동 2가지(폭식, 거식) 모두 요인 1에 적재된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1) Stephenson 외(1995)의 연구 결과는 요인 1을 돌봄형 중독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약물 사용, 도박, 성행동, 흡연, 처방약 사용, 음주, 운동이 적재되어 다수의 물질 관련 중독 행동이 적재된 점이 특징이다. Stephenson 외(1995)의 연구 결과는 요인 2를 쾌락형 중독으로 명명하였다.
표 6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중독 행동 유형 분석 결과(전체)
| 중독 행동 | 본 연구 | Stephenson 외(1995) | ||
|---|---|---|---|---|
| 요인1 (돌봄형 중독) | 요인2 (쾌락형 중독) | 요인1 (돌봄형 중독) | 요인2 (쾌락형 중독) | |
| 복종형 강박적 돌봄 | .958 | -.012 | .67890 | .05353 |
| 쇼핑 | .941 | -.023 | .68777 | .12309 |
| 지배형 강박적 돌봄 | .862 | .132 | .69732 | .16714 |
| 복종형 관계 형성 | .812 | .193 | .50475 | .33045 |
| 일 | .764 | .242 | .46153 | .18157 |
| 지배형 관계 형성 | .762 | .234 | .24068 | .57720 |
| 폭식 | .725 | .245 | .80844 | -.35926 |
| 거식 | .715 | .313 | .75508 | -.18889 |
| 카페인 섭취 | .710 | .265 | .71943 | -.08804 |
| 약물 사용 | .043 | .948 | -.10636 | .69383 |
| 도박 | .048 | .929 | .09214 | .55597 |
| 성행동 | .120 | .839 | -.13326 | .71866 |
| 흡연 | .104 | .831 | -.03654 | .61441 |
| 처방약 사용 | .288 | .741 | .12834 | .60685 |
| 음주 | .382 | .587 | -.00261 | .50566 |
| 운동 | .427 | .521 | .40671 | .03101 |
성별로 구분하여 중독 행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16개 중독 행동을 적절하게 분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중독 행동이 요인 1에 적재되었고 요인 2에는 7개의 행동이 적재되었으나 그중에서 카페인 섭취, 거식, 성행동, 흡연은 요인 1과 요인 2에 교차 적재되었다.
표 7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중독 행동 유형 분석 결과(성별)
| 구분 | 남학생 | 여학생 | ||
|---|---|---|---|---|
| 요인1 | 요인2 | 요인1 | 요인2 | |
| 쇼핑 | .659 | .340 | 1.004 | -.138 |
| 복종형 강박적 돌봄 | .880 | .085 | .993 | -.061 |
| 지배형 강박적 돌봄 | .830 | .173 | .877 | .111 |
| 복종형 관계 형성 | .786 | .221 | .818 | .192 |
| 지배형 관계 형성 | .768 | .241 | .774 | .214 |
| 카페인 섭취 | .530 | .495 | .762 | .188 |
| 일 | .735 | .297 | .759 | .229 |
| 거식 | .610 | .430 | .750 | .272 |
| 폭식 | .657 | .368 | .730 | .190 |
| 약물 사용 | .150 | .852 | .014 | .977 |
| 도박 | .172 | .835 | .004 | .952 |
| 성행동 | .480 | .506 | .014 | .930 |
| 흡연 | .559 | .405 | .014 | .918 |
| 처방약 사용 | .223 | .799 | .319 | .725 |
| 음주 | .611 | .378 | .312 | .643 |
| 운동 | .735 | .252 | .312 | .593 |
Ⅴ.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한국 사회의 중독 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동시에 다양한 중독 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단일 중독 중심적인 연구 접근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중독 행동 간의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특히, 다양한 중독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도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PQ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통해 한국 사회의 중독 문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중독 행동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단축형 PROMIS 설문지(Shorter PROMIS Questionnaire, SPQ)를 사용하여 중독 행동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다. SPQ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가 없어 척도 번역 단계를 거쳤으며 한국어판 SPQ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16개 중독 행동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16개 중독 행동은 두 가지 유형, 즉 돌봄형 중독과 쾌락형 중독으로 분류되었다. 16개 중독 행동 중에서 돌봄형으로 분류된 중독 행동으로는 복종형 강박적 돌봄, 지배형 강박적 돌봄, 복종형 관계 형성, 지배형 관계 형성, 쇼핑, 일, 폭식, 거식, 카페인 섭취로 모두 9개였고 쾌락형으로 분류된 중독 행동은 약물 사용, 도박, 성행동, 흡연, 처방 약 사용, 음주로 6개였다. 16개 중독 행동 중 운동만이 적절히 분류되지 않았다. 돌봄형으로 분류된 중독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얻으려는 행동,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행동, 또는 일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락형으로 분류된 중독 행동의 특징은 약물 사용, 도박, 성행동, 흡연, 처방약 사용, 음주 등 즉각적인 쾌락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주로 외부 자극이나 물질을 통해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Stephenson et al., 1995)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였다.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중독 행동의 유형을 분석하였을 때 분석 결과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에서는 16개 중독 행동이 두 가지 유형으로 적절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2. 중독 행동의 유형에 관한 새로운 지식 제공: 돌봄형 중독과 쾌락형 중독
본 연구는 중독 행동의 유형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였다. 즉 본 연구는 다양한 중독 행동을 돌봄형 중독과 쾌락형 중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중독 행동의 동기(motives)에 따른 유형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독 행동의 동기에 따른 구분은 국내에서는 최초의 유형 구분이다.
돌봄형 중독과 쾌락형 중독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1) 돌봄형 중독
돌봄형 중독2)은 개인이 심리적 안정감이나 통제감을 얻기 위해 특정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중독 유형을 말한다. 즉각적인 쾌락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내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며, 종종 타인이나 환경의 요구를 지나치게 충족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돌봄형 중독의 특징은 중독 행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서적 보상을 위한 전략적 행동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Bechara et al., 2021), 이는 기존의 단순한 강박적 행동 모델과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돌봄형 중독에는 아홉 가지의 중독 행동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행동은 각각 독특한 형태를 띠지만, 공통적으로 정서적 보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형 중독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였다. 첫째는 애착 이론과 관련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과도하게 표출되어 나타나는 중독 행동이다. 둘째는 자기 조절 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를 돌보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행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중독 행동이다.
애착 이론(Bowlby, 1969; 1977)은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 패턴을 기반으로 성인기에도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욕구를 설명한다(Gillath et al., 2016; Feeney & Noller, 199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돌봄형 중독은 타인의 인정과 애정을 얻기 위한 노력, 즉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Pincus & Wilson, 2001; Alpsoy, 2023; Torres, 2019; 김나연, 장재홍, 2023). 예를 들어, 복종형 강박적 돌봄은 타인의 요구를 과도하게 충족시키려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지배형 강박적 돌봄은 타인을 통제하고 조언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onroy et al., 2008; Costa et al., 2015; Zapf et al., 2008; Alpsoy, 2023). 또한, 복종형 관계 형성은 타인에게 의존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시도이며, 지배형 관계 형성은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Flores, 2004; Hunter & Maunder, 2001; Giacolini et al., 2021).
자기 조절 이론은 개인이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할 때, 특정 행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설명한다(Baumeister, 2014; Vohs & Baumeister, 2004). 이러한 관점에서, 폭식, 거식, 쇼핑, 일 중독, 카페인 섭취 등은 자기 돌봄과 위로의 측면에서 돌봄형 중독과 연결될 수 있다. 폭식은 음식을 통해 정서적 위안을 얻으려는 행동이며, 거식은 불안감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Lichtenstein et al., 2014). 쇼핑은 스트레스 해소와 일시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며(오세연, 송혜진, 2013), 일 중독은 일에 몰두함으로써 불안감과 외로움을 회피하려는 행동일 수 있다(최은정, 장유진, 2023). 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장문선 외, 2011; 곽주현, 최한나, 2015).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관계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김보연, 라수현, 2024). 또한, 쇼핑 중독은 단순한 소비 행태가 아니라 강한 감정적 애착과 반복적 소비 충동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사회적 비교로 인해 소비 행동이 중독적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Le, 2020 ). 카페인 섭취는 각성 효과를 통해 불안감을 줄이고 일시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Wang et al., 2016; Bertasi et al., 2021; ). 이처럼 개인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할 때, 다양한 행동들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Padykula & Conklin, 2010; Hovelius et al., 2021).
돌봄형 중독은 여러 중독 행동들을 통해 심리적 공허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회피 동기(Elliot & Church, 1997)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정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는 것이다(Burka & Yuen, 2008; Wonderly, 2021). 예를 들어, 복종형 관계 형성에서는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며, 강박적 돌봄은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다(Weiss, 2018; Özal et al., 2023). 이러한 행동들은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중독적인 성향을 띨 수 있다.
요컨대, 돌봄형 중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건강한 애착 형성 및 자기 조절 능력의 부족과 관련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적응적인 대처 방식을 개발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Carnes, 2019; Starr et al., 2023).
2) 쾌락형 중독
쾌락형 중독은 개인이 순간적인 쾌락, 자극, 또는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독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자극적 경험과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추며, 외부적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 쾌락형 중독 요인에는 총 일곱 가지의 행동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즉각적인 보상과 자극 추구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기 보상 심리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쾌락형 중독 행동을 강화(reinforcement)의 개념으로 설명한다(Treisman & Clark, 2011; 신맹식, 2014). 즉, 쾌락형 중독 행동은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Newton et al., 2009).
약물 사용, 흡연, 음주 등의 물질 중독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쾌락이나 각성 효과를 유발한다(George & Koob, 2017). 예를 들어, 알코올은 GABA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진정 및 이완 효과를 유발하며, 마약류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강렬한 쾌락을 유발한다(정재훈, 2017; Czapla et al., 2017). 니코틴은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하여 각성 효과와 함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Cavicchioli et al., 2018). 이처럼 물질 사용은 생리적인 쾌락을 통해 중독 행동을 강화한다(Mahoney et al., 2015).
도박, 성행동 등의 행위 중독은 위험 감수, 흥분 추구, 성취감 등 심리적인 쾌락을 통해 중독 행동을 강화한다(Cheetham et al., 2010). 도박은 예측 불가능성과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성행동은 친밀감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이러한 심리적 보상은 중독적인 행동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Ferrer-Pérez et al., 2024; Negash et al., 2016).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적 도박자들이 일반 성인에 비해 자극 추구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한영옥, 2012), 이는 즉각적인 쾌락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한 쾌락형 중독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불법 도박 참여자들이 높은 흥분 동기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도박 행위 자체가 주는 스릴과 흥분과 같은 심리적 보상이 중독 행위를 강화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이준복 외, 2014).
결론적으로, 쾌락형 중독은 다양한 형태의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 중독 행동을 강화하며, 이는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어려운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 중독 행동에 의존할 수 있으며(Byrne et al., 2024),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Koob & Vendruscolo, 2023). 따라서 쾌락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서 조절 전략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박현숙, 정선영, 2013; Köpetz et al., 2013). 이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중독 행동의 악순환을 끊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 표집된 국내 대학생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다양한 연령 및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중독 행동의 변화 양상이나 동시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횡단적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현상을 조사하는 데 유용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거나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중독 행동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다양한 중독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중독 행동 유형의 차이를 확인했지만, 그 원인이나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 남녀 간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차이는 중독 행동의 유형과 발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독 예방 및 개입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SPQ를 사용하여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중독 행동 유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돌봄형 중독과 쾌락형 중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중독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효과적인 중독 예방 및 치료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다. 특정 중독 행동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한 가지 중독 문제를 가진 개인이 다른 중독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치료적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독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와 심리적 기제를 고려하여, 돌봄형 중독에는 애착 유형, 대인 관계 문제, 자존감 등의 심리적 요인을, 쾌락형 중독에는 충동성, 감각 추구, 스트레스 대처 방식 등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각 유형에 특화된 개입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독 문제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인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otes
일반적으로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경우, 요인적재값이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문항이나 2개 이상의 요인에 교차 적재되는 문항을 제외한 후 추가 분석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중독 행동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으므로, 엄격한 척도 개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모든 문항(16개 중독 행동)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이는 중독 행동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잠재적인 유형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16개 중독 행동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중독 행동 유형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References
(2023). The mediating role of selfobject needs and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codependency. [Master's thesis, Izmir University of Economics, Department of Psychology] https://hdl.handle.net/20.500.14365/5064
, , , , & (2021). Binge eating and alcohol consumption: an integrative review. Eating and Weight Disorders: EWD, 26(3), 759-769. [PubMed]
, , & (2006). Patterns of simultaneous polysubstance use in drug using university students. Human Psychopharmacology, 21(4), 255-263. [PubMed]
(2014). Self-regulation, ego depletion, and inhibition. Neuropsychologia, 65, 313-319. [PubMed]
, & (2007). The South Oaks Gambling Screen-Revised Adolescent (SOGS-RA) revisited: A cut-point analysi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3(3), 299-308. [PubMed]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I. Aetiology and psychopathology in the light of attachment theory. An expanded version of the Fiftieth Maudsley Lecture, delivered before the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19 November 1976.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the journal of mental science, 130, 201-210. [PubMed]
, , , , , & (2024). Anxiety sensitivity is associated with heightened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individuals with alcohol use disorder.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32(6), 693-705. [PubMed]
, , & (2017). Univariate and multivariate skewness and kurtosis for measuring nonnormality: Prevalence, influence and estimation. Behavior Research Methods, 49(5), 1716-1735. [PubMed]
, , , & (2018). Addictive behaviors in alcohol use disorder: dysregulation of reward processing systems and maladaptive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Addictive Diseases, 37(3-4), 173-184. [PubMed]
, , , & (2010). The role of affective dysregulation in drug addic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6), 621-634. [PubMed]
, , , , , & (2003). The Shorter PROMIS Questionnaire: further validation of a tool for simultaneous assessment of multiple addictive behaviours. Addictive Behaviors, 28(2), 225-248. [PubMed]
, , & (2008). Prospective Relations between 2 × 2 Achievement Goals and the Quality of Sport Training. Revue internationale de psychologie sociale, 21(1), 109-134. https://shs.cairn.info/revue-internationale-de-psychologie-sociale-2008-1-page-109?lang=fr
, , , , & (2015). Pathological jealousy: romantic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emotional and personality aspects, an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74, 38-44. [PubMed]
, , , , , , , , & (2017). Do alcohol-dependent patients show different neural activation during response inhibition than healthy controls in an alcohol-related fMRI go/no-go-task?. Psychopharmacology, 234(6), 1001-1015. [PubMed]
, , , , , & (2020). Binge Eating and Binge Drinking: A Two-Way Road? An Integrative Review. Current Pharmaceutical Design, 26(20), 2402-2415. [PubMed]
(2001). A web of dependence. Addiction (Abingdon, England), 96(5), 677-678. [PubMed]
, , & (2004). Covariation in addictive behaviours: a study of addictive orientations using the Shorter PROMIS Questionnaire. Addictive behaviors, 29(1), 61-71. [PubMed]
, & (2001). Using attachment theory to understand illness behavior. General hospital psychiatry, 23(4), 177-182. [PubMed]
, , , , & (2018). Demographic, psychiatric, and personality correlates of adults seeking treatment for disordered gambling with a comorbid binge/purge type eating disorder.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26(5), 508-518. [PubMed]
, , & (2013). Harmful alcohol use and frequent use of marijuana among lifetime problem gamblers and the prevalence of cross-addictive behaviour among Greenland Inuit: evidence from the cross-sectional Inuit Health in Transition Greenland survey 2006-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circumpolar health, 72, 19551. [PubMed] [PMC]
, , , , & (2014). Exercise addiction: a study of eating disorder symptoms, quality of life, personality traits and attachment styles. Psychiatry research, 215(2), 410-416. [PubMed]
, & (2010). Multiple addictive behaviors in young adults: student norms for the Shorter PROMIS Questionnaire. Addictive behaviors, 35(3), 252-255. [PubMed]
, , , , , & (2015). A comparison of impulsivity, depressive symptoms, lifetime stress and sensation seeking in healthy controls versus participants with cocaine or methamphetamine use disorders.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Oxford, England), 29(1), 50-56. [PubMed]
, , , , , & (2016). Risky drinking behaviors among women with eating disorders-A longitudinal community-based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9(6), 563-571. [PubMed]
, , , & (2016). Trading Later Rewards for Current Pleasure: Pornography Consumption and Delay Discounting. Journal of Sex Research, 53(6), 689-700. [PubMed]
, , & (2006). The Shorter PROMIS Questionnaire and the Internet Addiction Scale in the assessment of multiple addictions in a high-school population: prevalence and related disability. CNS Spectrums, 11(12), 966-974. [PubMed]
, & (2001). Interpersonal variability in dependent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9(2), 223-251. [PubMed]
, , , & (2013). Choosing the optimal number of factor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model selection perspectiv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8(1), 28-56. [PubMed]
, , , , & (2020). Gambling disorder and comorbid behavioral addictions: Demographic, clinical, and personality correlates. Psychiatry Research, 284, 112763. [PubMed]
, & (2011). A behaviorist perspective. Advances in Psychosomatic Medicine, 30, 8-21. [PubMed]
, , , & (2016). Coffee and caffeine consumption and depression: A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50(3), 228-242. [PubMed]
(2021). Attachment and Character: Attachment Theory, Ethics, and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Vice and Virtue. Oxford University Press. Attachment, Addiction, and Vices of Valuing, . (Retrieved December 24, 2024,https://philarchive.org/archive/WONAAA-2)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24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2-25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2-26

- 942Download
- 5050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