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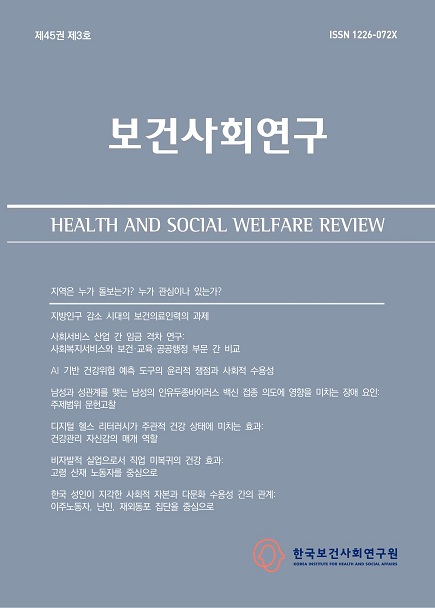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노인과 비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A Longitudinal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Situational Change of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Daily Living and Employment: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on-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Seok, Mal Sook; Song, Jin Yeong*; Park, Yong Soon
보건사회연구, Vol.37, No.1, pp.278-306, March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1.278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change in daily life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employment status on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and non-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Forthis purpose, the sample consists of 3,710 individuals drawn from 3rd~8th waves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constant non-discrimination and change to non-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regardless of age. On the other hands, constant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n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both groups, whereas change to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d no relationship. (2) Maintaining employment and becoming employed were likely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for the non-elderly, however, only remaining employed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3) Becoming unemployed and maintaining unemployment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non-elderly, however, for the elderly, only maintaining unemployment had negative impa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reducing daily life discrimination experiences or promoting employment.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에 따라 그들의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노인과 비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구축한 제3차에서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3,710명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노인과 노인 모두에서 일상생활차별 없음이 유지된 경우와 차별이 없음으로의 변화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상생활차별 있음이 유지된 경우는 비노인과 노인 모두에서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일상생활차별 있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노인 경우에는 취업을 유지한 경우와 취업으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만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셋째, 비노인 경우에는 미취업으로의 변화와 미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미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만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을 줄이거나 취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를 제언하였다.
Ⅰ. 서론
현대사회는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은 그리 높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0으로서 OECD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5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기획재정부, 2016). 특히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사회연계지원은 100점 만점에 72.37으로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34위 로서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한지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인 소득은 2배로 증가하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고 있는 환경파괴,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 기타 사고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장애인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김순옥, 2014, p.2).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995 년에 1,053,000명에서 2005년에는 1,789,44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 2,494,460명으로서, 최근 20년 동안에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장애인의 88.9%는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선천적 장애인의 11.1%보다 월등히 높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p.6).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사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장애발생 원인이 선천적이든 또는 후천적이든 간에,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제정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등 장애인 관련한 법들은 그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장애인들이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자신이 인식하는 생활만족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생활에서의 행복과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목표이며, 모든 인간은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소외와 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Beckles, 2004).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오세란, 2006, p.52; 정형진, 2010, p.82; 이한나, 박단비, 2012, p.17; 조용운, 조경훈, 2014, p.298; Sheppard-Jones et al., 2005).
실제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신고 건수 중에 차별사유가 장애로 인한 경우가 38.4%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우리사회의 장애인차별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p.3). 또한 2014년 말에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차별은 37.8%로서, 취업에서의 장애차별 35.8%, 소득에서의 차별 23.9%,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의 차별 20.0%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p.409). 이와 같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은 장애인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 또한 장애차별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박수미 등, 2004, p.53). 이에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중섭, 2009, p.95; 이지수, 2011, p.291; 김종일, 2013, p.76; 송진영 등, 2013, p.9; 김승렬, 송진영, 2016, p.88; Bjornskov et al., 2007).
최근 장애인의 단순한 업무수행과 취업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질이 나빠진다는 보고가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고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의 수는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을 하는 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이 빈곤에 처할 위험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p.24). 이에 장애인의 취업과 생활만족도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장애인의 취업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류시문, 2003, p.113; 우선미, 2006, p.60; Warren, 1996; Carter & McGoldrick, 1999; Thoren-Jossen et al., 2001; Miller & Dishon, 2006).
이렇듯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일부 보고되고 있지만, 이들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연구에 국한되어 진행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 또는 취업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와 같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가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단편적, 횡단적 선 행연구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연령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다고 한 박용순과 송진영(2012, p.129)과 같은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박순미 등, 2009, p.3; 김경애, 황혜원, 2010, p.157; 박용순, 2016, p.69; Hillman & Mcmillan, 2005)를 통해 비노인과 노인이 상이한 결과를 보일 것을 예측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조사, 배포한 전국 규모의 제3차 연도에서 제8차 연도까지의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와 생활만족도 간의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를 비노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여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 또는 취업여 부의 상태변화가 비노인과 노인에 따라, 그들의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를 ‘차별경험 없음 유지’, ‘차별경험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 ‘차별경험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 ‘차별경험 있음 유지’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상태변화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상태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비노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여 규명하는 연구는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비노인과 노인에 따라 그들의 생활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로서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를 비노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여, 그들 각 그룹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할 방안을 도출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만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 각 집단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실천적, 정책적인 관점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분야의 실천적, 정책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공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는 비노인과 노인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둘째, 장애인의 취업여부의 상태변화는 비노인과 노인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014년 말 기준으로 대략 2,494천명으로 전체인구수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 24만명에 비해 10배 이상, 2005년도 1,789천명 대비 140%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수는 39.6%로서 비장애인의 수인 63.0%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 수치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p.6).
차별(discrimination)은 크게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적 차별로 나뉠 수 있는데, 합리적 차별은 자격요건이나 특수한 능력에 근거한 차별이며, 불합리적 차별은 능력, 업적, 장점 등과 무관한 것들로서 개인이나 집단을 비의도적 또는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다루는 행동을 말한다(유동철, 2000, p.11).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상생활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연구(유동철, 2000, p.23; 나운환 등, 2003, p.372) 와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 실태연구(강동욱, 2002, p.169; 이미라, 2011, p.57), 그리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의 원인연구(이선우, 2004, p.47) 등이 대부분이었다. 오혜경 (2006)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경우가 35.3%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차별경험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차별이 37.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에서의 장애차별 35.8%, 소득에서의 차별 23.9%,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의 차별 20.0%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결과, ‘많은 편이’가 44.6%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별로 없다’ 28.1%, ‘매우 많다’ 26.3%, ‘전혀 없다’ 1.0% 순으로 장애차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수준에 대해 장애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가 67.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지법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가 23.7%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사회 장애인들의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지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p.409).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일상생활에서의 행복 추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주된 목표이며, 인간은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삼고 있다. 생활만족도는 Campbell 등(1976)이 제시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개념에서부터 사용되었다. 이후 생활만족도는 삶의 질, 행복감, 주관적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Clover(2008)는 생활만족도를 객관적인 면에 추가하여 주관적인 개인의 느낌, 지역 환경,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 조건, 관계 그리고 국가들 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하면서도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이론가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장애인 개개인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는 장애인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일상생활상태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이중섭(2009, p.95)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지수(2011, p291)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김종일(2013, p76)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진영 등(2013, p.9), 김승렬과 송진영(2016, p.88)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 냈다. 국외의 연구에서 Bjornskov 등(2007)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적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제공한 장애인고용패널 3차 연도와 8차 연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를 ‘차별경험 없음 유지’, ‘차별경험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 ‘차별경험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 ‘차별경험 있음 유지’ 등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취업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며, 일을 통해 성취감, 행복감, 그리고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원천이다(손정녀, 2015, p.2). 특히 장애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사회의 성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근홍 등(2005)은 직업은 장애인에 있어 단순히 소득을 위한 활동의 의미를 넘어 자아실현과 삶의 의미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므로, 장애인들에게 있어 그들에 적합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제약과 사회의 차별적 대우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5, p.6)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 2,494,460명 중에서 취업자는 906,267명으로서 고용률은 37.0%이고, 실업자는 64,333명으로서 실업률은 6.6%로 나타남에 따라, 전체 인구에 대한 고용률 60.8%와 실업률 3.6% 대비 약 두 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0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고용률이 스웨덴 62.3%, 독일 50.4%, 영국 45.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장애인들이 빈곤에 처할 위험성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다. 이에 정부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을 1990년도에 제정하여 장애인 고용차별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으며, 2000년 1월에 장애 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1991년 0.43%에 불과하였던 장애인 고용률이 2013년 말에 정부부문 2.65%, 민간부문 2.48%로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15).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장애인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직업유지가 매우 어려워 그들의 이직률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김광자, 2011, p.191).
최근 장애인의 취업정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줄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근무환경에서 잘 적응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의 성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이 취업을 하여 자신의 역량을 직장 내에서 발휘하고, 그 직업을 유지해나간다는 것은 장애인의 고용정책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의 핵심이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취업요인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류시문, 2003, p.113; 우선미, 2006, p.60; Warren, 1996; Carter & McGoldrick, 1999; Thoren-Jossen et al., 2001; Miller & Dishon, 2006). 국외의 연구에서, Warren(1996)은 취업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Miller와 Dishon(2006)은 취업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Thoren-Jossen 등(2001)은 경제활동과 생산활동 참여가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취업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연구에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류시문(2003, p.113)은 취업상태인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활에서의 만족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우선미(2006, p.60)는 취업한 장애인이 미취업한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제공한 장애인고용패널 3차 연도와 8차 연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취업여부의 상태를 ‘미취업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전환’, ‘취업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등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선행연구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살 펴보면,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동거여부, 중증여부, 건강상태, 만성질환여부, 종교보유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발생시기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동거여부를 일반적 변인, 중증여부, 건강상태, 만성질환여부를 장애 및 건강 요인, 종교보유여부, 사회경제적 지위를 사회경제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를 통제 변수로 정의하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장애발생 시기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하다고 보여져 장애인고용패널자료에서 장애등록시기를 확인해 본 결과, 후천성 장애가 98.2%로 나타남에 따라,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일반적 요인 중 성별과 생활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Liang(1982)은 성별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없다고 보고한 반면, Krause(1991)는 남성일수록 생활만 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박현숙 등(2013)은 남성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 성인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정지영 등, 2010; 손애리 등, 2010). Walters 등(2001)은 노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폭이 정신적 측면보다는 신체적 측면이 더 크다고 하였다. 반면, 박용순과 송진영(2012, p129)는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박현숙 등(2013, p.68)에서는 배우자와 동거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반면, 학력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장현과 이철우(1996, p.144)도 학력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 및 건강요인 중 건강행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있음을 밝혔다(최영희 등, 2007; Maggs & Abedi, 1997).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없는 노인보다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년기의 건강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최연희, 2004, p.93). 송진영(2012, p.38)은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요인 중 종교는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숙, 박 민정, 2000). 또한 박준성 등(2011)과 Chatfield(1977)에 의하면,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의 불편과 건강문제,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이동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이중 삼중으로 생활만족도를 낮누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8년째 조사하여 구축한 ‘장애인 고용패널’ 중에서 제3차 연도에서 제8차 연도까지의 자료를 ‘wide data’형태로 변형하여 종단연구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제공된 등록장애인 총 5,092명 중 결측치가 있는 대상자를 제거하고, 3,710명을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중 비노인은 2,770명이었으며, 노인은 94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UN에서 정의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 정의되어 있는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65세 이상을 노인, 64세 이하를 비노인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도구
가. 독립변수: 일상생활차별경험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 연도에서 8차 연도까지 제공한 항목 중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정도’를 활용하였다. 일상생활차별정도는 구직이나 일자리를 제외한 가정, 여가, 친구,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정도(‘1=전혀 없음, 2=조금 있음, 3=많음, 4=매우 많음‘으로 구성됨)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차별정도를 연속변수 형태의 일상생활차별경험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이를 ‘1=전혀 없음’을 ‘0’으로, ‘2=조금 있음, 3=많음, 4=매우 많음’을 ‘1’로 더미변수처리하고 다음의 4개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즉,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는 ‘1=3차 연도부터 8차 연도까지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지속적으로 없음을 유지’, ‘2=일상생활차별경험이 3차 연도에 없다가 이후 변화되어 8차 연도 현재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로 변화된 경우’, ‘3=일상생활차별경험이 3차 연도에 있다가 이후 변화되어 8차 연도 현재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로 변화된 경우’, ‘4=3차 연도부터 8차 연도까지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지속적으로 있음을 유지’ 등 4가지 경우로 구성하였다.
나. 독립변수: 취업여부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 연도에서 8차 연도에서 제공한 항목 중 취업과 미취업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상태를 ‘0=미 취업, 1=취업’으로 더미변수처리하고 다음의 4개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즉, 취업여부의 상태변화는 ‘1=3차 연도부터 8차 연도까지 미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2=취업상태가 3차 연도에 미취업이었다가 이후 변화되어 8차 연도 현재 취업상태로 변화된 경우’, ‘3=취업상태가 3차 연도에 취업상태였다가 이후 변화되어 8차 연도 현재 미취업상태로 변화된 경우’, ‘4=3차 연도부터 8차 연도까지 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취업 유지’ 등 4가지 경우로 구성하였다.
표 1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
| 변수명 | 범주 | 년차 | |
|---|---|---|---|
| 3년차 | 8년차 | ||
| 일상생활차별경험 | 일상생활차별 없음 유지 | 없음 | 없음 |
| 일상생활차별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 | 없음 | 있음 | |
| 일상생활차별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 | 있음 | 없음 | |
| 일상생활차별 있음 유지 | 있음 | 있음 | |
| 취업여부 | 미취업 유지 | 미취업 | 미취업 |
|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 | 미취업 | 취업 | |
|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전환 | 취업 | 미취업 | |
| 취업 유지 | 취업 | 취업 | |
다.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종속변수인 8차 연도의 생활만족도는 본인의 일상생활 만족정도로서 가족과의 관계 만족, 친구들과의 만족, 거주 지역만족, 현재 건강상태만족, 본인의 한 달 수입만족, 여가 활동만족, 현재하는 일만족, 현재 결혼생활만족, 전반적인 만족도 등 9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어 있었는데, 이 중 현재 하는 일만족과 결혼생활만족 문항의 결측치가 각각 58.4%와 39.2%로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여, 이들 2문항을 제외하고 7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의 문항은 ‘매우 불만족한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합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8차 연도의 생활만족도의 Cronbach's α는 비노인의 경우 .789, 노인의 경우 .792로 나타났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일반적 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요인 중 성별은 ‘남성 1, 여성 2’로 되어 있는 것을 회귀분석을 위해 ‘여성은 0, 남성은 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연령은 비노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학력은 ‘무학이 1, 초졸이 2, 중졸이 3, 고졸이 4, 대졸 이상이 5’로 정의된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결혼상태가 ‘미혼 1, 유배우(결혼/동거) 2, 이혼 3, 사별 4, 별거 5’와 같이 서열이 없는 범주로 되어 것을 배우자동거여부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혼, 이별, 사별, 별거’를 ’기타(0)‘으로, 유배우(결혼/동거)를 ’배우자동거(1)‘로 더미처리하였다.
장애 및 건강요인 중 중증여부는 ‘경증 1, 중증 2’로 되어 있는 것을 회귀분석을 위해 ‘경증을 0, 중증을 1’로 더미처리하였으며,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음(1)’에서 ‘매우 좋음(4)’로 정의된 것을 사용하였다. 만성질환보유여부는 ‘있음 1, 없음 2’로 되어 있는 것을 회귀분석을 위해 ‘없음을 0, 있음을 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 중 종교보유여부는 ‘있음 1, 없음 2’로 되어 있는 것을 회귀분석을 위해 ‘없음을 0, 있음을 1’로 더미처리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이 0, 중하층이 1, 중상층이 3, 상층이 4’로 정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이, 일반적 요인 중 성별은 비노인인 경우 남성이 1,761명(63.6%)로서 여성의 36.4%보다 높게 분포되었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남성이 548명(58.3%)로서 여성의 41.7%에 비해 높게 분포되었다. 연령은 비노인이 74.7%로서 노인의 25.3%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력은 비노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6.3%로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초등학교 졸업이 22.6%, 중학교 졸업이 19.2%, 무학이 11.1%,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8% 순으로 분포되었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이 39.9%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무학이 23.3%, 중학교 졸업이 17.3%, 고등학교 졸업이 16.6%, 대학교 졸업 이상이 2.9% 순의 분포를 보였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대상자는 비노인의 경우 57.7%, 노인의 경우 70.2%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n=3,710명) | ||||||
|---|---|---|---|---|---|---|
|
|
||||||
| 요인 | 변수명 | 구분 | 비노인 | 노인 | ||
|
|
|
|||||
| 빈도(명) | 백분율(%) | 빈도(명) | 백분율(%) | |||
|
|
||||||
| 일 반 적 요 인 | 성별 | 여성 | 1,009 | 36.4 | 392 | 41.7 |
|
|
||||||
| 남성 | 1,761 | 63.6 | 548 | 58.3 | ||
|
|
||||||
| 연령 | 비노인 | 2,770 | 74.7 | |||
|
|
||||||
| 노인 | 940 | 25.3 | ||||
|
|
||||||
| 학력 | 무학 | 307 | 11.1 | 219 | 23.3 | |
|
|
||||||
| 초등학교 졸업 | 626 | 22.6 | 375 | 39.9 | ||
|
|
||||||
| 중학교 졸업 | 533 | 19.2 | 163 | 17.3 | ||
|
|
||||||
| 고등학교 졸업 | 1,005 | 36.3 | 156 | 16.6 | ||
|
|
||||||
| 대학교 졸업 이상 | 299 | 10.8 | 27 | 2.9 | ||
|
|
||||||
| 배우자동거 여부 | 기타 | 1,172 | 42.3 | 280 | 29.8 | |
|
|
||||||
| 배우자동거 | 1,598 | 57.7 | 660 | 70.2 | ||
|
|
||||||
| 장애 및 건강 요인 | 중증여부 | 경증 | 1,538 | 55.5 | 654 | 69.6 |
|
|
||||||
| 중증 | 1,232 | 44.5 | 286 | 30.4 | ||
|
|
||||||
| 건강상태 | 매우 좋지 않다 | 276 | 10.0 | 197 | 21.0 | |
|
|
||||||
| 좋지 않은 편이다 | 1,341 | 48.4 | 552 | 58.7 | ||
|
|
||||||
| 좋은 편이다 | 1,105 | 39.9 | 188 | 20.0 | ||
|
|
||||||
| 매우 좋다 | 48 | 1.7 | 3 | .3 | ||
|
|
||||||
| 만성질환여부 | 아니오 | 1,182 | 42.7 | 167 | 17.8 | |
|
|
||||||
| 예 | 1,588 | 57.3 | 773 | 82.2 | ||
|
|
||||||
| 사회 경제 요인 | 종교보유여부 | 없다 | 1,666 | 60.1 | 556 | 59.1 |
|
|
||||||
| 있다 | 1,104 | 39.9 | 384 | 40.9 | ||
|
|
||||||
| 사회경제적 지위 | 하층 | 1,577 | 56.9 | 560 | 59.6 | |
|
|
||||||
| 중하층 | 1,063 | 38.4 | 323 | 34.4 | ||
|
|
||||||
| 중상층 | 124 | 4.5 | 55 | 5.9 | ||
|
|
||||||
| 상층 | 6 | .2 | 2 | .2 | ||
장애 및 건강요인에서 중증여부는 비노인의 경우 경증이 55.5%, 노인의 경우 69.6% 로서 중증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건강상태는 비노인의 경우 ‘좋지 않은 편이다’가 48.4%, ‘좋은 편이다’가 39.9%, ‘매우 좋지 않다’가 10.0%, ‘매우 좋다’가 1.7% 순으로 분포되었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편이다’가 58.7%, ‘매우 좋지 않다’가 21.0%, ‘좋은 편이다’가 20.0%, ‘매우 좋은 편이다’가 0.3%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 만성질환여부는 있는 경우가 비노인의 경우 57.3%, 노인의 경우 82.2%로서 없는 경우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종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비노인의 경우 60.1%, 노인의 경우 59.1%로서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노인과 노인 보두 하층이 절반 이상 분포되었으며 중하층이 그 다음으로 낮게 분포되었으며, 이 둘의 합이 대략 95% 정도 차지함에 따라, 본 연구대상자들 대구분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산층 이하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주요 변인들의 특성
독립변수의 상태변화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일상생활차 별경험의 상태변화는 3차 연도 패널자료의 상태에서 8차 연도의 상태변화로의 변동으로서,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를 ‘일상생활차별경험 없음 유지’,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 ‘일상생활차별 경험이 있음 유지’의 4개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일상생활차병경험이 없음을 유지한 경우는 비노인의 경우 30.7%, 노인의 경우 37.5%이었으며, 일상생활차병경험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비노인의 경우 11.4%, 노인의 경우 11.1%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차병경험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비노인의 경우 17.6%이었으며, 노인의 경우 18.2%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을 유지한 경우는 비노인의 경우 40.3%, 노인의 경우 33.2%로 분포되었다.
표 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 변수명 | 범주 | 비노인 | 노인 | ||
|---|---|---|---|---|---|
|
|
|
||||
| n | % | n | % | ||
|
|
|||||
| 일상생활차별 경험의 상태 | 일상생활차별 없음 유지 | 828 | 30.7 | 345 | 37.5 |
|
|
|||||
| 일상생활차별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 | 308 | 11.4 | 102 | 11.1 | |
|
|
|||||
| 일상생활차별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 | 476 | 17.6 | 167 | 18.2 | |
|
|
|||||
| 일상생활차별 있음 유지 | 1,089 | 40.3 | 305 | 33.2 | |
|
|
|||||
| 취업여부의 상태 | 미취업 유지 | 1,234 | 45.7 | 575 | 62.6 |
|
|
|||||
|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 | 201 | 7.4 | 38 | 4.1 | |
|
|
|||||
|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전환 | 231 | 8.6 | 77 | 8.4 | |
|
|
|||||
| 취업 유지 | 1,035 | 38.3 | 229 | 24.9 | |
|
|
|||||
| 생활만족도 | 최소값 7, 최대값 35 | 평균 21.53 | 평균 20.89 | ||
| 표준편차 3.92 | 표준편차 3.81 | ||||
취업여부의 상태변화는 3차 연도 패널자료의 상태에서 8차 연도의 상태변화로의 변동으로서, ‘미취업 유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전환’, ‘취업 유지’ 등 4개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취업여부가 미취업을 유지한 경우는 비노인의 경우 45.7%, 노인의 경우 62.6%를 차지하였으며,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된 경우는 노인의 경우 7.4%, 노인의 경우 4.1%로 나타났다. 취업여부가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된 경우는 비노인의 경우 8.6%, 노인의 경우 8.4%로 분포되었으며, 취업을 유지한 경우는 비노인의 경우 38.3%, 노인의 경우 24.9%를 차지하였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최소 7에서 최대 35의 범위에서 비노인의 경우 평균이 21.53(표준편차 3.92), 노인의 경우 평균이 20.89(표준편차 3.81)로서 비노인이 조금 높게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비노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현재 차별이 없는 경우와 현재 차별이 있는 경우는 상호 대칭되어 배재되는 개념이며, 실제로도 SPSS에서 차별경험이 ‘지속적으로 있음’과 ‘지속적으로 없음’은 둘 중 하나가 분석결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차별이 없는 그룹과 차별이 있는 그룹으로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모든 변수의 VIF값이 1.55 미만이 나옴에 따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었다(표 4).
표 4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변수명 | 비노인 | 노인 | ||||||
|---|---|---|---|---|---|---|---|---|
|
|
|
|||||||
| 현재 차별 없음 | 현재 차별 있음 | 현재 차별 없음 | 현재 차별 있음 | |||||
|
|
|
|||||||
| β | t | β | t | β | t | β | t | |
|
|
||||||||
| 성별 | -.008 | -.501 | -.009 | -.526 | -.030 | -.930 | -.027 | -.827 |
|
|
||||||||
| 연령 | -.013 | -.661 | -.015 | -.781 | -.042 | -1.445 | -.037 | -1.300 |
|
|
||||||||
| 중증여부 | .006 | .336 | .008 | .451 | -.013 | -.464 | -.006 | -.217 |
|
|
||||||||
| 최종학력 | .005 | .261 | .001 | .079 | .072 | 2.346² | .071 | 2.310² |
|
|
||||||||
| 건강상태 | .337 | 18.154²²² | .337 | 18.232²²² | .288 | 9.322²²² | .291 | 9.469²²² |
|
|
||||||||
| 만성질병 보유 여부 | -.021 | -1.175 | -.023 | -1.243 | -.073 | -2.499² | -.074 | -2.539² |
|
|
||||||||
| 배우자동거여부 | .080 | 4.418²²² | .082 | 4.510²²² | .052 | 1.687 | .051 | 1.642 |
|
|
||||||||
| 종교보유여부 | .107 | 6.570²²² | .104 | 6.383²²² | .055 | 1.904 | .056 | 1.947 |
|
|
||||||||
| 사회경제적 지위 | .236 | 13.151²²² | .236 | 13.199²²² | .265 | 8.569²²² | .269 | 8.837²²² |
|
|
||||||||
| 일상생활차별 없음 유지 | .160 | 8.555²²² | .135 | 4.200²²² | ||||
|
|
||||||||
| 일상생활차별 없음으로 전환 | .078 | 4.587²²² | .073 | 2.448² | ||||
|
|
||||||||
| 일상생활차별 있음으로 전환 | -.029 | -1.724 | -.025 | -.878 | ||||
|
|
||||||||
| 일상생활차별 없음 유지 | -.174 | -9.512²²² | -.144 | -4.770²²² | ||||
|
|
||||||||
| R2 | .316 | .320 | .304 | .307 | ||||
| Adj R2 | .312 | .317 | .296 | .299 | ||||
| F | 112.861²²² | 114.885²²² | 36.026²²² | 36.583²²² | ||||
분석결과 비노인의 경우, 현재 차별이 없는 상태의 모델은 설명력(R2값)이 31.6%, F변화량이 112.861(p<.001)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차별이 없는 상태의 모델의 설명력과 적합도 모두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는 일상생활차별경험 없음을 유지한 경우의 β값이 .160(p<.001),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의 β값이 .078(p<.001)으로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차별이 있는 상태의 모델은 설명력(R2값)이 32.0%, F변화량이 114.885(p<.00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 변화는 일상생활차별경험 있음으로 전환된 경우의 β값이 -.029(p>.05)로서 생활만족도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을 유지한 경우의 β값은 -.174(p<.001)로서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현재 차별이 없는 상태의 모델은 설명력(R2값)이 30.4%, F변화량이 36.026(p<.001)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차별이 없는 상태의 모델의 설명력과 적합도 모두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는 일상생활 차별경험 없음을 유지한 경우의 β값이 .135(p<.001),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의 β값이 .073(p<.05)으로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차별이 있는 상태의 모델은 설명력(R2값)이 30.7%, F변화량이 36.583(p<.001)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는 일상 생활차별경험 있음으로 전환된 경우의 β값이 -.025(p>.05)로서 생활만족도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을 유지한 경우의 β값은 -.144(p<.001)로서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취업여부의 상태변화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비노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취업 상태인 경우와 현재 미취업상태인 경우는 상호 대칭되어 배재되는 개념이며, 실제로도 SPSS에서 취업상태가 지속적인 경우와 지속적으로 미취업상태인 경우는 둘 중 하나가 분석결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현재 취업상태인 그룹과 미취업상태인 그룹으로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이, 모든 변수의 VIF값이 1.4 미만이 나옴에 따라,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5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변수명 | 비노인 | 노인 | ||||||
|---|---|---|---|---|---|---|---|---|
|
|
|
|||||||
| 현재 취업 상태 | 현재 미취업상태 | 현재 취업 상태 | 현재 미취업상태 | |||||
|
|
|
|||||||
| β | t | β | t | β | t | β | t | |
|
|
||||||||
| 성별 | -.028 | -1.640 | -.028 | -1.638 | -.040 | -1.216 | -.043 | -1.307 |
|
|
||||||||
| 연령 | -.002 | -.093 | -.001 | -.059 | -.029 | -.992 | -.027 | -.936 |
|
|
||||||||
| 중증여부 | -.007 | -.420 | -.007 | -.380 | -.023 | -.799 | -.021 | -.721 |
|
|
||||||||
| 최종학력 | .018 | .989 | .018 | .996 | .079 | 2.528² | .080 | 2.581² |
|
|
||||||||
| 건강상태 | .326 | 17.163²²² | .326 | 17.172²²² | .285 | 9.099²²² | .284 | 9.055²²² |
|
|
||||||||
| 만성질병 보유 여부 | -.012 | -.674 | -.012 | -.651 | -.071 | -2.395² | -.070 | -2.378² |
|
|
||||||||
| 배우자동거여부 | .073 | 3.953²²² | .073 | 3.937²²² | .042 | 1.359 | .042 | 1.345 |
|
|
||||||||
| 종교보유여부 | .113 | 6.861²²² | .112 | 6.846²²² | .068 | 2.326² | .069 | 2.375² |
|
|
||||||||
| 사회경제적 지위 | .243 | 13.487²²² | .243 | 13.500²²² | .288 | 9.411²²² | .286 | 9.410²²² |
|
|
||||||||
| 취업 유지 | .123 | 6.375²²² | .070 | 2.239² | ||||
|
|
||||||||
| 취업으로 전환 | .061 | 3.625²²² | .044 | 1.544 | ||||
|
|
||||||||
| 미취업으로 전환 | -.066 | -3.856²²² | -.030 | -.981 | ||||
|
|
||||||||
| 미취업 유지 | -.127 | -6.360²²² | -.089 | -2.636²² | ||||
|
|
||||||||
| R2 | .308 | .308 | .295 | .295 | ||||
| Adj R2 | .305 | .305 | .286 | .287 | ||||
| F | 108.686²²² | 108.687²²² | 34.491²²² | 34.539²²² | ||||
분석결과 비노인의 경우, 현재 취업상태의 모델은 설명력(R2값)이 30.8%, F변화량이 108.686(p<.001)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취업상태의 모델의 설명력과 적합도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취업여부의 상태변화는 취업을 유지한 경우의 β값이 .123(p<.001),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된 경우의 β값이 .061(p<.001)으로서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미취업인 상태의 모델은 설명력(R²값)이 30.8%, F변화량이 108.687(p<.001)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취업여부의 상태변화는 미취업을 유지한 경우의 β값이 -.127(p<.001),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된 경우의 β값은 -.066(p<.001)으로서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현재 취업상태의 모델은 설명력(R2값)이 29.5%, F변화량이 34.491(p<.001)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취업상태의 모델의 설명력과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취업여부의 상태변화는 취업을 유지한 경우의 β값이 .070(p<.05)으로서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된 경우의 β값이 .044(p>.05)로서 생활만족도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미취업인 상태의 모델은 설명력(R²값)이 29.5%, F변화 량이 34.539(p<.00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취업여부의 상태변화는 미취업을 유지한 경우의 β값이 -.089(p<.01)로서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된 경우의 β값은 -.030(p>.05)으로서 생활만족도에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와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노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구축한 전국 규모의 제3차 연도에서 제8차 연도까지의 ‘장애인고용패널’ 자료 중 종단연구에 적합하도록 제공한 ‘wide data’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차별경험 없음을 유지한 경우와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에서 없음으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차별경험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된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을 유지한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차별경험 없음을 유지한 경우와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에서 없음으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차별경험 있음을 유지한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에서 없음으로의 변화는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노인이나 노인 모두가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 없음을 유지하거나 차별없음으로의 변화는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주는 요인인 반면, 일상생활차별경험 있음을 유지하는 경우는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 그리고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변화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요인임을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를 낮춘다고 한 연구(이중섭, 2009, p.95; 이지수, 2011, p.291; 김종일, 2013, p.76; 송진영 등, 2013, p.9; 김승렬, 송진영, 2016, p.88; Bjornskov et al., 2007) 등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노인의 경우, 취업을 유지한 경우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을 유지한 경우와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변화는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경우, 취업을 유지한 경우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변화는 생활만족도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을 유지한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변화는 생활만족도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노인과 노인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는 노인이나 비노인 모두에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주는 요인인 반면, 장애인의 미취업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는 비노인이나 노인 모두에서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취업으로 전환되거나 미취업으로의 변화는 비노인과 노인이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즉, 비노인인 경우는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노인의 경우는 영향이 없게 나타났다. 또한 비노인의 경우 미취업으로의 변화는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인 반면, 노인의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이 생활만족도를 높인다고 한 연구(류시문, 2003, p.113; 우선미, 2006, p.60; Warren, 1996; Carter & McGoldrick, 1999; Thoren-Jossen et al., 2001; Miller & Dishon, 2006) 등을 대체적으로 지지하였다.
2. 연구결과의 함의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이 비노인이나 노인이 동일하게 ‘일상생활차별경험 없음 유지’와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주는 요인인 반면, 일상생활차별경험이 있음을 유지한 경우는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 현재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반면,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노인이나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차별하는 것을 발견할 시에는 신고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과 같은 소극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처벌을 부가함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만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장애인, 독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치를 절하시키지 않고 수용하려는 장애수용이나 노후소득보장 등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실천적 측면의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들 스스로가 일상생활차별 극복과 관련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각 관련 복지관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과 정부 간 통합된 전산네트워크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암암리에 뿌리박힌 곳곳의 일상적 차별적 습관과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는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반면, 미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는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노인과 노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노인인 경우는 취업으로의 변화는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반면, 노인의 경우는 영향이 없게 나타났으며, 비노인인 경우 미취업으로의 변화는 생활만족도를 낮춘 반면, 노인의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미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와 취업상태가 중간에 변화된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미취업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비노인이나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고용주와 담당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의 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고용이 다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과 장애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지자체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직장을 잘 적응한 사례를 담은 교육과 성공한 사례에 대한 노하우를 홍보하는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이 해당 기업의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개선과 장애인을 채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 또한 요구된다.
또한 비노인의 경우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생활만족도를 높이며 미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생활만족도를 낮춘다는 결과는 직업을 갖는 것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한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와 같이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미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다는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장애인들을 취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서 비노인과 노인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 이다. 즉, 비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력이 노인 장애인에 비해 높고 자가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활동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들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패키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 등의 그들에 적합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취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재택근무와 같은 형태의 일자리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작업장 등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 등에 이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취업에 대한 의지를 낮춤으로써 취업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해 구직역량을 높이고 취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탈수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와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비노인과 노인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종단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 및 함의를 제시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장애인의 취업여부의 상태변화에서 취업자와 미취업자로만 나누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거나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장애유형별로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임금근로자, 자영영주,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상용직, 일용직, 일시적 실직상태 등 다양한 상태 및 장애유형별로 확장한 연구를 시도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지와 같은 작업을 하여 변인들을 좀 더 확장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다 더 실증적으로 제시하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의 상태변화와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노인과 비노인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장애인고용패널자료의 차수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노인의 취업여부의 상태변화 중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38명(4.1%), 미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77명(8.4%)으로서 낮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3차 연도의 생활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8차 연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마지막 해의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지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차수가 좀 더 늘어났을 때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 없다가 있는 경우로의 전환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는 장애차별이 없다가 발생한 것은 생활만족도가 정적인 영향에서 부적인 영향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에 향후 추가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2(5), 593-599. [PubMed]
(1991). Stressfu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46(2), 84-92. [PubMed]
(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6(1), 85-89. [PubMed]
, & (1997). Identifying the health needs of elderly people using the Omaha Classification Schem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4), 698-703. [PubMed]
, & (2006).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ultiple sclerosis: The impact of disability,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Quality of life Research, 15, 259-271. [PubMed]
, , & (2005). Quality of life dimension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comparative study. Mental Retardation, 43(4), 281-291. [PubMed]
, , & (2001). Distress in everyday life in people with poliomyelitis sequela.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33(3), 119-127. [PubMed]
, , & (2001). Using the SF-36 with older adults: a cross-sectional community-based survey. Age and Aging, 30(4), 337-343.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6-10-29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1-17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1-31

- 2320Download
- 1448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