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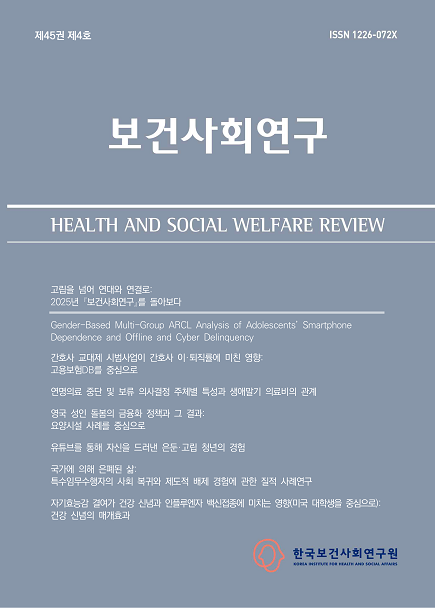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Actor-Partner 상호 의존성 모델을 사용한 분석
The Effects of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on in Middle-Aged Couples: Analysis Using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Cha, Geunyeong; Kim, Suk-Sun*; Gil, Minji
보건사회연구, Vol.37, No.2, pp.126-149, June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2.12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iddle-aged couples’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on individually and interactively between wife and husband b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Data from 207 middle aged couples have been analysed with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egree of similarities between husband and wife on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Stress had significant actor effect on the depression of husband and wife alike, revealing the influence of positive stress on depression. In contrast, there was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the partner effect between husband and wife. That is, the stress of husband had no partner effect on the wife’s depression, whereas, the stress of wife had negative partner effect on the husband’s depression. Martial satisfaction had also actor effect presenting that when martial satisfaction was high, individual depression of husband and wife was low. Likewise the stress, marital satisfaction had no partner effect on the wives’ depression, indicating that wives’ marital satisfaction had negatively influenced the depression of their partner. However, the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had no influence on their partners’ depression. These finding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wife and husband when planning interventions and programs in regards to improving the depression of middle aged coupl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상호의존성을 검증하고, 이 후 모형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40-60세까지의 중년 부부로,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중년부부 207쌍의 커플자료를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분석방법을 통하여 경로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에서 모두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APIM 모형 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는 중년 부부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 자신의 우울이 증가하는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방 효과에서는 부인의 스트레스만이 남편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남편의 스트레스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효과로는 부인의 결혼만족도만이 남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년기 부부의 우울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Ⅰ.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중년기 성인은 우울과 자살에 취약하여 예방과 조기개입이 시급하지만 노인의 우울에 관심이 편중되어 중년기 우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2년 591,276명에 비해 2016년 643,102명으로 약 8.8%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또한 2012년 217,667,490천원에서 2016년 258,340,221천원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특히 연령대로 구분하면 2016년 50대 우울증 환자가 130,3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97,156명을 합하여 40-59세 중년 우울증 환자는 227,47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이러한 증가된 중년기 우울증 환자 수는 자살률로 이어져, 자살은 중년기 사망원인 중 2위로(통계청, 2015), 중년기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중년기에 발생하는 우울은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면 식욕감소, 체중 변화, 두통 등의 신체 변화와 함께 죄의식이나 무가치감, 불면, 집중력의 저하, 자살사고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허명륜, 임숙빈, 2012, p.243; Taher, Ben Emhemed, & Tawati, 2012, p.181). 선행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신체적, 가족적, 사회・경제적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우울증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 폐경, 성기능 감소 등 중년의 신체적 변화와 함께 불안, 초조, 절망감, 불면 등과 같은 갱년기 정신적 증상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미정, 이지현, 2013, pp.280-281). 또한, 중년기의 부모-자녀와 부부관계의 과도기적 변화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년기에는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이제까지 기능해 왔던 부모 역할이 줄고 빈 둥지 증후군과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김귀애, 홍창희, 2012, p.315). 동시에 퇴직과 함께 부부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재조정 하게 되면서 부부관계 안에서 발생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 결혼생활의 회의감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증가하고, 심하면 이혼 등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게 된다(김시연, 서영석, 2010, p.196; 김길현, 하규수, 2012, p.263). 국내의 이혼건수는 2010년 11만 6,900건에서 2013년 10만 9,200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중년기의 이혼건수는 2005년 2만 2,829건, 2015년 4,382건으로 증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통계청, 2016).
또한 은퇴나 실직 등 직장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우울과 자살로도 이어지게 된다(Lundin, Lundberg, Allebeck, & Hemmingsson, 2012, p.373). 특히 직장생활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온 중년 남성의 경우, 은퇴 및 실직은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상실하는 사건으로 삶의 만족감이 저하되고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원, 김동배, 이주연, 2008, pp.119-120; 강양희, 2016, p.349). 또한 중년 여성의 경우 퇴직으로 인한 낮은 소득 등 사회경제적 변화는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하여 우울증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허제은, 태영숙, 2014, p.184).
반대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부부친밀감, 가족 지지가 중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이희연, 전혜성, 2011, p.280; 김수진, 김세영, 2013, p.185; 박주희, 2015, pp.85-87). 또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고(Aichberge et al, 2010, p.472),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서적지지가 강화되어 외부적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incoln & Chae, 2010, p.1094; Vento & Cobb, 2011, p.921).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가족지지 등 가족적 요인을 변수로 추가하였더라도 가족구성원 개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단위의 연구에만 그치고, 부부를 단위로 부부의 상호의존성 안에서 개인 뿐 아니라 상대방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스트레스 교차전이 이론(Cross-over stress)(Westman, 2002, p.143)에 따르면 부부는 상호의존적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개인의 스트레스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외의 기존연구에서는 성인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가 지각하는 긍정-부정 정서가 부부 사이에서 교차전이 되는 것을 통해 스트레스 교차전이 이론을 증명하였다(Munyon, Breaux, Rogers, Perrewé, & Hochwarter, 2009, pp.414-416). 이와 유사하게 가족체계이론에서도 가족구성원 한명의 변화는 다른 가족구성원 뿐 아니라 가족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간 우울의 유사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Desai, Schimmack, Jidkova, & Bracke, 2012, p.312).
연구자들은 이처럼 부부간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 변수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는 경우 모든 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지켜지지 않아 분석결과의 타당성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Cook & Kenny, 2005, p.105). 따라서 부부를 단위로 부부의 상호 의존성을 가정하여 부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분석단위로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검증한 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Cook & Kenny, 2005, p.105)을 통하여 부부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상호의존성을 검증하고, 이 후 모형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중년기 성인의 정신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Cook & Kenny, 2005)을 이용하여 부부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상호의존성을 검증하고,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부부의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정도와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중년부부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중년부부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상호의존성을 검증한다.
넷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부인과 남편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스트레스 교차전이 이론(Westman, 2002, p.143)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년부부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에게 미치는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경기 및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만 40~60세의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년 부부 쌍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집은 편의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남편과 부인 중 한 명이라도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신 장애의 진단을 받은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는 남편과 부인용을 구분하여 각자의 응답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고, 설문이 끝난 후에는 설문지를 함께 배부된 회수용 봉투에 밀봉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전체 표집수는 250쌍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12쌍이 회수되어 85%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한쪽 배우자만 응답하거나, 부분적으로 응답)을 보인 5쌍을 제외한 총 207쌍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가.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Frank와 Zyznaski(1988)가 개발한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dex)를 임지혁, 배종면, 최순식, 김성원, 황환식, 허봉렬(1996)이 수정, 번안하여 타당도 검증을 한 한국판 BEPSI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생활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즉 ‘전혀 없다’ 1점, ‘간혹 있다’ 2점, ‘종종 여러 번’ 3점, ‘거의 매번’ 4점, ‘언제나 항상’ 5점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5-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평균 1.8 미만 시 저스트레스군, 1.8 이상 2.8 미만 시 중등도 스트레스군, 2.8 이상 시 고스트레스군으로 분류하며 최근 겪은 1개월 내의 스트레스에 대해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문항의 신뢰도는 남편 .87, 부인 .88이었다.
나.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 척도는 Roach, Frazier, Bowden(1981)이 개발한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이인수와 유영주(1979)가 타당도 검증을 한 38문항을 윤영과 신효식(1991)이 재구성한 32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2개의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이고, 16개의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5점에 가까울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남편 .95, 부인 .97로 나타났다.
다.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은 일반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depressive symptomatology) 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Index(CES-D)를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난 2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증상의 빈도에 따라 4단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드물었다’ 0점, ‘가끔 있었다’ 1점, ‘종종 있었다’ 2점, ‘대부분 그랬다’ 3점까지 구성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0~60점으로, 유력우울증(probable depression)의 절단점(cut-off point)으로는 16점을, 확실우울증 (definite depression) 의 절단점으로는 25점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남편 .92, 부인 .91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년 부부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실수와 백분율, Chi-squa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중년 부부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및 우울 정도와 차이는 평균, 표준편차,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년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부부를 쌍으로 하는 짝관계(Dyadic data)로서, 부부체계 안에서 남편과 부인이 주고받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Cook과 Kenny(2005)이 제안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PIM)에 근거하여 모형을 수정 및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수의 특성
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연령이 40-60세 미만으로 분포되어 있고 남편 ‘46-50세’ 31.4%, 부인 ‘40-45세’ 36.7%로 가장 많았다. ‘대학교 졸업’ 학력자들이 남편 56.5%, 부인 51.7%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남편은 ‘종교 없음’ 42.5%, 부인은 ‘기독교’ 52.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남편은 ‘회사원・공무원’이 5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과 ‘전문직’이 각각 21.7%, 13.5%였다. 부인의 경우, 39.1%가 ‘전업주부’이고 다음으로 ‘회사원・공무원’과 ‘전문직’이 16.4%, 15.0%를 차지하였다. 월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남편 46.4%, 부인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입만족은 부부 모두 ‘보통’(남편 54.1%, 부인 47.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남편과 부인(남편 60.9%, 부인 63.8%) 모두 ‘매일’이 가장 많았다. 하루에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에서는 남편의 경우 ‘30분~1시간’이 41.5%로 가장 높았으나, 부인의 경우 ‘30분’이 3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평균 20.49±8.63년, 자녀수는 평균 1.94명±.65명 이었다(표 1 참조).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N=207쌍) | |||||||||||
|---|---|---|---|---|---|---|---|---|---|---|---|
|
|
|||||||||||
| 구분 | 남편 | 부인 | 구분 | 남편 | 부인 | ||||||
|
|
|
|
|
||||||||
| 빈도 (명) | 백분율 (%) | 빈도 (명) | 백분율 (%) | 빈도 (명) | 백분율 (%) | 빈도 (명) | 백분율 (%) | ||||
|
|
|||||||||||
| 연령 | 40-45세 | 49 | 23.7 | 76 | 36.7 | 교육 정도 | 중학교 졸업 | 5 | 2.4 | 4 | 1.9 |
| 46-50세 | 65 | 31.4 | 70 | 33.8 | 고등학교 졸업 | 45 | 21.7 | 70 | 33.8 | ||
| 51-55세 | 51 | 24.6 | 42 | 20.3 | 대학교 졸업 | 117 | 56.5 | 107 | 51.7 | ||
| 56-60세 | 42 | 20.3 | 19 | 9.2 | 대학원 이상 | 40 | 19.3 | 26 | 12.6 | ||
| 종교 | 종교 없음 | 88 | 42.5 | 54 | 26.1 | 직업 | 가사(전업) | 0 | 0 | 81 | 39.1 |
| 기독교 | 87 | 42 | 108 | 52.2 | 회사원・공무원 | 104 | 50.2 | 34 | 16.4 | ||
| 천주교 | 6 | 2.9 | 16 | 7.7 | 자영업 | 45 | 21.7 | 22 | 10.6 | ||
| 불교 | 21 | 10.1 | 28 | 13.5 | 판매・서비스직 | 7 | 3.4 | 13 | 6.3 | ||
| 월 수입 | 기타 | 5 | 2.4 | 1 | 0.5 | 전문직 | 28 | 13.5 | 31 | 15 | |
| 100만원 이하 | 3 | 1.4 | 9 | 4.3 | 생산직 | 4 | 1.9 | 7 | 3.4 | ||
| 101-200만원 | 9 | 4.3 | 12 | 5.8 | 기타 | 8 | 3.9 | 17 | 8.2 | ||
| 201-300만원 | 23 | 11.1 | 20 | 9 | 수입 만족 | 만족 | 37 | 17.9 | 54 | 26.1 | |
| 301-400만원 | 33 | 15.9 | 31 | 15 | 보통 | 112 | 54.1 | 99 | 47.8 | ||
| 401-500만원 | 43 | 20.8 | 45 | 21.7 | 불만족 | 58 | 28 | 53 | 25.6 | ||
| 500만원 이상 | 96 | 46.4 | 88 | 42.5 | 배우자 대화 | 30분 | 59 | 28.5 | 79 | 38.2 | |
| 가족과 보내는 시간 | 매일 | 126 | 60.9 | 132 | 63.8 | 30분~1시간 | 86 | 41.5 | 77 | 37.2 | |
| 주 1회 | 47 | 22.7 | 53 | 25.6 | 1시간~2시간 | 41 | 19.8 | 30 | 14.5 | ||
| 한 달 2~3번 | 18 | 8.7 | 11 | 5.4 | 2시간 이상 | 21 | 10.1 | 21 | 10.2 | ||
| 한 달 1번 | 16 | 7.7 | 11 | 5.2 | |||||||
| 결혼 기간 | 평균 (표준편차) | 20.49(8.63) | 자녀 수 | 평균 (표준편차) | 1.94(.65) | ||||||
나.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에서 남편의 스트레스는 1.73±.65점으로 부인 1.71±.63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3.50±.43점으로 부인 3.34±.5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중년 부부의 우울 점수는 부인이 11.50±8.05점, 남편이 10.71±8.28점으로 부인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APIM 모델 검증을 위해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값인 왜도 ±2 이하, 첨도 ±4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t검증, ICC
| (N=207쌍) | ||||||||
|---|---|---|---|---|---|---|---|---|
|
|
||||||||
| 변수 | 남편(n=207) | 부인(n=207명 | paired t-test | ICC | ||||
|
|
|
|||||||
| 왜도 | 첨도 | 평균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평균 (표준편차) | |||
|
|
||||||||
| 스트레스 | 1.48 | 3.24 | 1.73(.65) | 1.41 | 2.37 | 1.71(.63) | .71 | .593*** |
|
|
||||||||
| 결혼만족도 | -.35 | -.30 | 3.50(.43) | -.39 | -.14 | 3.34(.50) | 3.63*** | .743*** |
|
|
||||||||
| 우울 | 1.50 | 2.54 | 10.71(8.28) | 1.15 | .90 | 11.50(8.05) | -1.15 | .613*** |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투입될 주요 연구 변수의 유의한 상관관계 및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상관관계
| (N=207쌍) | ||||||
|---|---|---|---|---|---|---|
| 변수 | 1 | 2 | 3 | 4 | 5 | 6 |
| 1. 남편의 스트레스 | 1 | |||||
| 2. 남편의 결혼 만족도 | -.419*** | 1 | ||||
| 3. 남편의 우울 | .678*** | -.388*** | 1 | |||
| 4. 부인의 스트레스 | .421*** | -.375*** | .421*** | 1 | ||
| 5. 부인의 결혼 만족도 | -.358*** | .602*** | -.454*** | -.539*** | 1 | |
| 6. 부인의 우울 | .351*** | -.388*** | .454*** | .728*** | -.536*** | 1 |
남편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r = -.419, p < .001),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678, p < .001),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면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88, p < .001). 부인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r = -.539, p < .001) 우울이 증가하며(r = .728, p < .001),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면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36, p < .001).
남편과 부인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부인의 스트레스(r = .421, p < .001)와 우울(r = .351, p < .001)이 증가하고,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58, p < .001).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할 때 부인의 스트레스(r = -.375, p < .001)와 우울(r = -.388, p < .001)은 낮아지고 결혼만족도(r = .602, p < .001)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우울이 증가하면 부인의 우울은 증가하고(r = .454, p < .001),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54, p < .001). 분석 결과 변수들 간의 .7이상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부부의 상호의존성 검증
본 연구는 남편과 부인 2명을 하나의 쌍으로 간주하였으며 ‘부부의 모든 변수가 상호의존성(유사성)을 가지고 있다’의 가설은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중년 부부의 스트레스는 59%(ICC = .593, p < .001), 결혼만족도 74%(ICC = .743, p < .001), 우울 61%(ICC = .613, p < .001)의 유사성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 부부의 유사성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APIM 모형 분석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4. 모형 1: 스트레스와 우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경로분석
가. 연구 모형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본 연구의 모형 1을 검증하기 위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경로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 소득, 소득만족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NFI, GFI, TLI, RMSEA로 평가하였다. 연구 모형은 자유도가 0인 포화 모형(Saturated Model)로서 완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에서 남편과(β = .61, p < .001) 부인(β = .70, p < .001) 모두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스트레스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인의 스트레스는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7, p < .01).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남편의 스트레스가 부인의 우울로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모형을 본 연구의 수정 모형으로 도출하였다(표 4 참조).
표 4
모형의 경로계수
| (N=207쌍) | ||||||||
| 연구 모형 경로 | B | β | SE | CR | ||||
| 남편의 스트레스 → 남편의 우울 | .425 | .608 | .039 | 10.999*** | ||||
| 부인의 스트레스 → 남편의 우울 | .118 | .165 | .040 | 2.977** | ||||
| 남편의 스트레스 → 부인의 우울 | .039 | .057 | .036 | 1.077 | ||||
| 부인의 스트레스 → 부인의 우울 | .484 | .696 | .037 | 13.112*** | ||||
| 수정 모형 경로 | B | β | SE | CR | ||||
| 남편의 스트레스 → 남편의 우울 | .382 | .550 | .037 | 10.464*** | ||||
| 부인의 스트레스 → 남편의 우울 | .090 | .127 | .038 | 2.404** | ||||
| 부인의 스트레스 → 부인의 우울 | .461 | .665 | .034 | 13.507*** | ||||
| 모형 | 모형적합도 검증 | 모형비교 검증 △χ² |
||||||
| χ² | df | χ2/df | p-value | RMSEA | GFI | NFI | ||
| 연구모형 (포화모형) | 0 | 0 | 0 | - | 1 | 1 | 1 | 16.183(1) |
| 수정모형 | 16.183 | 7 | 2.312 | .023 | .080 | .985 | .981 | |
| **p < .01. ***p < .001. | ||||||||
| 통제 변인 경로 | B | β | SE | CR | ||||
| 남편의 교육수준 → 남편의 우울 | -.057 | -.089 | .032 | -1.793(n.s) | ||||
| 남편의 소득 → 남편의 우울 | -.033 | -.093 | .019 | -1.739(n.s) | ||||
| 남편의 소득만족도 → 남편의 우울 | -.116 | -.173 | .036 | -3.243** | ||||
| 부인의 교육수준 → 부인의 우울 | -.037 | -.058 | .031 | -1.175(n.s) | ||||
| 부인의 소득 → 부인의 우울 | -.034 | -.114 | .016 | -2.151* | ||||
| 부인의 소득만족도 → 부인의 우울 | -.062 | -.102 | .032 | -1.946(n.s) | ||||
다. 수정 모형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스트레스와 우울의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계수를 삭제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계수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수정 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에서 남편과(β = .55, p < .001) 부인(β = .67, p < .001) 모두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인의 스트레스는 여전히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3, p < .01). 다음으로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간의 비교를 통해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비교는 <표 5>와 같다. 남편과 부인 모두 자기효과, 상대방 효과의 경로를 가정한 모형 1(χ²=0, df=0, GFI=1, NFI=1)과 수정 모형(χ²=16.183, df=7, p=.023, GFI=.985, NFI=.997, RMSEA=.080)의 적합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χ² 차이를 통한 모형비교 검증에서도 χ²의 차이가 16.183로서 기준치로 설정한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연구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남편 우울의 설명력은 48.2%, 부인의 우울 설명력은 52.2%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표 5
모형의 경로계수 및 모형 적합도 비교
| (N=207쌍) | ||||||||
| 연구 모형 경로 | B | β | SE | CR | ||||
| 남편의 결혼만족도→남편의 우울 | -.326 | -.403 | .056 | -5.767*** | ||||
| 부인의 결혼만족도→남편의 우울 | -.177 | -.261 | .047 | -1.411*** | ||||
| 부인의 결혼만족도→부인의 우울 | -.312 | -.474 | .048 | -6.463*** | ||||
| 남편의 결혼만족도→부인의 우울 | -.081 | -.103 | .057 | -3.733 | ||||
| 수정 모형 경로 | B | β | SE | CR | ||||
| 남편의 결혼만족도→남편의 우울 | -.251 | -.324 | .053 | -4.781*** | ||||
| 부인의 결혼만족도→남편의 우울 | -.145 | -.221 | .045 | -3.230*** | ||||
| 부인의 결혼만족도→부인의 우울 | -.271 | -.425 | .041 | -6.562*** | ||||
| 모형 | 모형적합도 검증 | 모형비교 검증 △χ2 | ||||||
| χ2 | df | χ2/df | p-value | RMSEA | GFI | NFI | ||
| 연구모형 (포화모형) | 0 | 0 | 0 | - | 1 | 1 | 1 | 21.839(1) |
| 수정모형 | 21.839 | 7 | 3.120 | .003 | .101 | .980 | .972 | |
| ***p < .001 | ||||||||
| 통제 변인 경로 | B | β | SE | CR | ||||
| 남편의 교육수준 → 남편의 우울 | -.012 | -.019 | .036 | -.331(n.s) | ||||
| 남편의 소득 → 남편의 우울 | -.039 | -.112 | .022 | -1.803(n.s) | ||||
| 남편의 소득만족도 → 남편의 우울 | -.117 | -.174 | .041 | -2.869** | ||||
| 부인의 교육수준 → 부인의 우울 | -.021 | -.033 | .039 | -.529(n.s) | ||||
| 부인의 소득 → 부인의 우울 | -.022 | -.073 | .020 | -1.112(n.s) | ||||
| 부인의 소득만족도 → 부인의 우울 | -.108 | -.177 | .041 | -2.655** | ||||
5. 모형 2: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경로분석
가. 연구 모형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모형 2,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자기효과-만족도효과의 경로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 소득, 소득만족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연구 모형 역시 자유도가 0일 포화모형으로 완전 적합하였다(표 5, 그림 3 참조).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남편과(β = -.40, p < .001) 부인(β = -.47, p < .001) 모두 결혼만족도가 우울을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남편의 우울을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6, p < .001).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서 부인의 우울로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모형을 본 연구의 수정 모형으로 도출하였다(표 5 참조).
나. 수정 모형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계수를 삭제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수정 모형에서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는 남편과(β = -.38, p < .001) 부인(β = -.54 p < .001)의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우울을 낮추며, 영향력이 연구 모형에 비하여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β = -.28, p < .01).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간의 비교를 통해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그림 3]과 같다. 남편과 부인 모두 자기효과, 상대방 효과의 경로를 가정한 연구 모형(χ²=0, df=0, GFI=1, NFI=1)과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한 수정 모형(χ²=21.839, df=7, p=.003, GFI=.980, NFI=.972, RMSEA=.101)의 적합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χ² 차이를 통한 모형비교 검증에서도 χ²의 차이가 21.893로서 기준치로 설정한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연구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남편 우울의 설명력은 35.7%, 부인의 우울 설명력은 29.4%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교차전이 이론(Westman, 2002, p.143)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하는 중년기에 급증하고 있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개개인을 단위로 분석하였던 기존연구에서 더 나아가, 부부를 분석 단위로 부부의 상호의존적 관계 안에서 중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중년 부부의 상호의존성 안에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Cook & Kenny, 2005)을 이용하여 모형 분석함으로써 부부단위의 정신건강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부를 단위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기 전, 급내 상관계수를 통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그리고 우울의 부부 상호의존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연구변수에서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 부인의 스트레스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유사성은 결혼만족도와 우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스트레스가 배우자에게 교차 전이 될 수 있다는 스트레스 교차 전이이론(Westman, 2002, p.14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120쌍 성인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영화, 고재홍, 2005, p.74)와 벨기에 905쌍 부부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부부의 우울변화를 잠재 패널 모형을 통해 측정하여 부부간 우울의 유사성이 시간에 따라 지속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Desai, Schimmack, Jidkova, & Bracke, 2012, p.312).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가족 내에서도 가장 가까우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로서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환경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Cook과 Kenny(2005)는 부부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서 상호의존성이 검증되면, 부부단위가 아닌 남편과 부인 등 개인단위로 자료를 분석할 경우 영가설이 실제로 참이지만 잘못 기각되는 제 1종 오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이용하여 개인의 특징이 자신에게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즉 개인의 특징이 상대방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Cook & Kenny, 2005, p.102). 본 연구에서는 모형1에서 중년 부부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우울이 증가하는 자기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우울 점수를 높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안경남, 김민선, 김동구, 서영성, 김대현, 2012, p.184). 또한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에게 미치는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인의 스트레스는 남편의 우울에 상대방 효과가 있었으나, 남편의 스트레스는 부인의 우울에 상대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인의 높은 스트레스는 남편의 우울을 높이지만, 남편의 스트레스는 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효과의 남편과 부인의 차이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교차 전이 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스트레스 교차전이 이론에서의 공감적 교차전이로 설명할 수 있다(Young, Schieman, & Milkie, 2014, p.3). 먼저, 여성노인은 자녀를 배우자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남성노인은 배우자를 더 중요시 한다는 연구 결과(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 2012, p.28)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해 보면, 중년남성의 경우 가족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인의 스트레스에 공감을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년 여성의 경우 자녀를 더 중요시 하면서 남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중년기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신체적, 가족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아내의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신체적, 가족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공감할 수 있지만, 아내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39.1%가 전업주부인 것을 감안할 때 남편의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남편의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상대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을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 결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의 중요도와 상대방 스트레스에 공감하는 수준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모형2에서는 중년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우울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결과를 비교할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와 중국의 성인 부부에게서 높은 결혼만족도는 우울을 낮추고(Vento & Cobb, 2011, p.921; Miller, Mason, Canlas, Wang, Nelson, & Hart, 2013, p.680), 국내 노년기 부부에서는 결혼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연, 정혜정, 2013, p.138). 이는 중년부부에게 행복한 결혼생활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우울을 예방할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을 증진 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중년 부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만족도의 상대방 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우울에 상대방 효과를 나타냈지만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이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남편의 우울은 낮아졌지만,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정도는 부인의 우울과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중국의 성인 부부를 대상으로 부인의 높은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우울을 낮추었으나,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ller, Mason, Canlas, Wang, Nelson, & Hart, 2013, p.680). 이는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주연, 정혜정, 2015, p.58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129; 허은경, 김영희, 2016, p. 435)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부인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현하면서 남편의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Miller, Mason, Canlas, Wang, Nelson, & Hart, 2013, p.681). 반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우울위험을 완충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기는 성장한 자녀가 독립해 떠나가고 부부만 남게 되는 빈둥지 시기로, 중년기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집중되었던 관심을 부부 관계로 다시 되돌리고 결혼생활의 의미를 회복하며 부부관계의 갈등과 문제 해결을 돕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중년 부부의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여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서울과 경기 및 경북 지역의 지역사회의 일부 중년부부를 편의 표집하여 조사하였다는 지역적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추론하였지만, 변수 간의 반대의 인과관계 또는 동시성(simultaneity)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부부의 개인적 측면에 국한하여 중년 부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APIM 모형을 적용하여 부부의 상호의존성 내에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파악하고 효과크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스트레스 교차전이 이론(Westman, 2002, p.143)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상호의존성과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APIM 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남편과 부인의 스트레스가 낮고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자신의 우울을 낮추는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남편의 우울을 낮추는 상대방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하는 중년기에 급증하고 있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개개인을 단위로 분석하였던 기존연구에서 더 나아가, 부부를 분석 단위로 부부의 상호의존적 관계 안에서 중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부부단위의 정신건강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 결혼만족, 우울에서 모두 부부의 유사성이 검증되어 남편과 부인을 함께 부부를 대상으로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중년기 부부의 우울증 예방을 위해 부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배우자만을 고려하여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파악하였는데, 이외에도 자녀와 관련된 변인들을 고려한 중년 부부의 우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References
. (2015.08.19). 국민관심질병통계: 우울증.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IlnsInfo.do에서 2017.5.10. 인출
. (2016). 2015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aSeq=356345&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7.5.10. 인출
.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pi/6/4/index.action?bmode=read&seq=562에서 2017.5.10. 인출
, , , , , , et al. (2010). Depression in middle-aged and older first generation migrants in Europe: results from th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European Psychiatry, 25(8), 468-475. [PubMed]
, , , & (2012). Spousal similarity in depression: a dyadic latent panel analysis of the panel study of Belgian household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1(2), 309-314. [PubMed]
, , , & (2012). Unemployment and suicide in the Stockholm population: a register-based study on 771,068 men and women. Public Health, 126(5), 371-377. [PubMed]
, , , , , & (2013).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n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4), 677-682. [PubMed]
, , & (2012). Menopausal age, related factors and climacteric symptoms in Libyan women. Climacteric, 16(1), 179-184.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01-30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5-18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6-05

- 4816Download
- 3360Viewed
